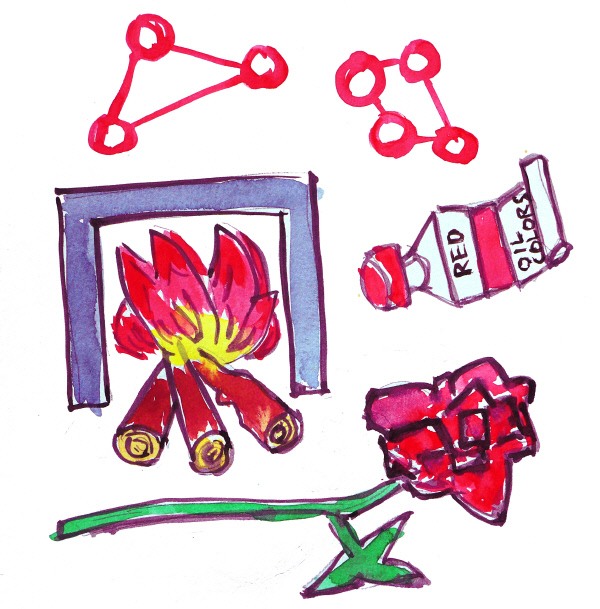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악양에 사는 시인 형이 택배로 부쳐주시는 대봉감 한 박스. 뒷방 광에 앉혀놓고 꺼내 먹는 재미가 쏠쏠해. 연일 내리는 폭설에 갇혀 홍시를 먹는데 내가 까치인지 까치가 나인지 헷갈려라. 매일 아침 눈뜨면 식어버린 난로에 장작불을 지핀다. 전에 강진 살 때는 아궁이가 밖에 있어 춥고 눈 내리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나가 군불을 지피곤 했었지. 게으른 잠이 밀려오는 날, 차라리 냉방에서 웅크리고 견디곤 했는데 그때 몸이 많이 상한 것 같아. 담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는 태양열을 쓸까, 심야전기를 연결할까 고심하다가 그래도 장작개비 타는 냄새를 버릴 수 없어 실내에 벽난로 아궁이를 설치했다. 순환모터가 돌아가는 순간부터 기름값 절약. 집 안에 꽉 찬 훈기는 물론이거니와 불꽃을 바라보며 지내노라니 신비롭고 감사해. 홍시 한 알 먹은 힘으로 팬 장작개비를 무쇠로 된 아궁이에 집어던진다. 홍시처럼 붉고 노란 불꽃이 활활 일어난다. 덤으로 흰 가래떡이나 고구마를 구워 먹기도 하고, 팔팔 끓인 물로는 유자차를 타먹을 수 있어서 좋아.
백무산의 대표 시집 <만국의 노동자여>에 실린 ‘장작불’이라는 시를 잊지 못한다. “우리는 장작불 같은 거야. 먼저 불이 붙은 토막은 불씨가 되고 빨리 붙은 장작은 밑불이 되고 늦게 붙는 놈은 마른 놈 곁에, 젖은 놈은 나중에 던져져 활활 타는 장작불 같은 거야. 몸을 맞대어야 세게 타오르지.” 몸을 맞대고, 엉겨 붙어 짱짱하게 단합하면 장작불은 활기를 되찾아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 아무리 갑이 설쳐대는 세상이라도 을이 작심하고 의기투합하면 모래시계를 뒤엎듯 크게 한번 판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서로들 불꽃이 되어….
한 수도원에 찾아온 나그네가 원장 수도승에게 물었단다.
“세상이 왜 이다지도 춥고 어둡답니까?”
“아집과 교만을 불태우고 버려야만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겠지요.” 나그네는 더 궁금해졌다.
“나를 불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서는 결코 불탈 수 없지요. 여럿이 함께여야죠. 짐을 풀고 우리랑 같이 지냅시다.”
나그네는 그날로 한식구가 되었단다.
ⓒ임의진 | 목사·시인 201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