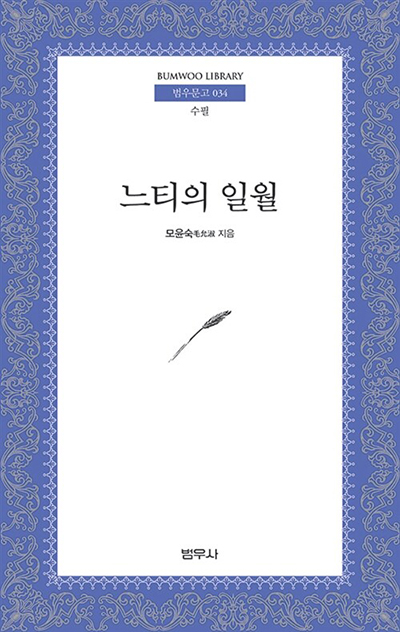[범우문고읽기034] 느티의 일월 -모윤숙
<독서일기>
모윤숙 하면 대표적인 ‘친일파’라는 것만 생각난다. 그녀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언론인, 기자, 수필가, 정치인(국회의원), 시인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그녀의 변신은 화려하다. 일본제국에서는 친일파, 이승만 정권에서는 친미파,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회의원 전두환 밑에서는 문학진흥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그녀는 왕십리라고 부르는 화양동에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 옆에 있던 650년 된 7그루의 느티나무와 그 터를 사서 자신의 집으로 편입시켰다. 평생 ‘글’을 써서 먹고 살았던 사람답게 느티나무가 자신의 집안 안으로 들어온 내막을 아름답고 정겨운 필치의 수필로 정당화시킨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왕십리 느티나무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나무로 남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최용우
<책소개>
한국 문학사에서 여류 문학의 선구적 공적인 남긴 그녀의 수필은 '나'보다는 '우리'라는 객관적 입장, 사회적 입장에서 쓰인 테마가 우선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 문화의 발굴과 창조라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꼽을 수 있다.
<저자소개>
한국의 언론인, 기자, 수필가, 정치인(국회의원), 시인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목차>
느티의 일월
고독의 상태
4월의 본능
착각
생각하는 생활
남성, 그 허구의 초상화
황진이의 인생, 애정의 배후
나의 사우록
숲의 비애
진달래
반향
다랫골
가을
부전 고원
영이에게

느티의 일월日月
갈색 잎새들이 조용히 깔렸다. -돌아 서울이 멀 리서 웅웅거린다. 혼선과 혼선이 서로 엇갈려 어떤 음정도 정확하지 않은 도시의 소리이다. 손을 마주 비볐다. 우右와 좌左가 기진맥진해서 잘 어울리지 않는다. 치마허리에 왼손을 넣어 온기를 찾는다. 몸은 무겁도록 벅찬 고목 허리에 기대어 서 있다. 비 먹은 눈서리에 6백년이란 나이를 안고 서 있는 느티, 여기 왕십리 벌에 자리잡은 이 능터는 긴 세월 배추만 심어 살던 땅이었다. 오색의 낡은 헝겊들이 주렁주렁 매달렸던 성황당 나무, 전기도 없는 이 집에서 처음 2년을 사는 동안엔 밤이면 머리가 오싹하도록 겁도 나고 무서워서 이 나무를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러나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면서부터 마을이 조금씩 개명 開明을 해가더니 밥을 던져 빌고 헝검을 매달아 절을 하던 아낙네들이 하나 둘 줄어들기시작했다. 그러나 늙은 느티나무의 영양은 말이 아니었다. 벼락에 부서진 중간 허리에 비만 오면 물이 흘러 들어가 느티는 여위기 시작했다. 비록 울밖에 서 있는 나무였지만 측은한 마음 참을 수 없어 마을 노인들과 의논을 했다. 처음에는 잘 통하지 않았으나 작년에야 겨우 타협이 되어 내 뜰의 50평 땅과 바꾸게 되었다. 느티의 둘레를 정돈하여 내 뜰 안에 넣고 헐벗겼던 뿌리를 감싸 주었다.
어느 날 마을 노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660년이나 된 이 나무에는 이 능터에 묻었던 장희빈 다음 후궁이 또 묻힌 곳이라면서 창덕궁에서 일년에 한두번 청사초롱을 밝혀 들고 제사 행렬이 휘황했었 다고도 했다. 또 이조 말엽, 어느 임금이었는지는 몰라도 말을 몰아 이 벌에 나오면 이 느티에 말고삐를 잡아매고 물도 먹이고 그늘에서 쉬기도 했다는 것이다. 역사 풀이야 어찌되었든 개인의 나무 아닌 마을의 나무라고 마구 푸대접했던 일은 너무 무심한 처사인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어느 여름날을 잡아 이 마을 노인네들을 청해서 느티 그늘에 멍석을 깔고 막걸리와 빈대떡, 돼지고기 몇 점씩을 곁들여 대접을 했다. 이때부터 나는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은 이 느티 그늘에 정을 붙여 바둑도 두고 인생사를 허허 담소로 주고받던 이들을 가끔은 막걸리로나마 목을 축이도록 하리라 마음먹 었다.
벌써 12월이라 가지만이 팔을 벌린 채 뻗어 있어도 하늘이 새어 내려오는 밤이면 가슴이 후련해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느티의 몸에서 뻗어 간 좌우상하의 가지가지에는 그대로 별의 숙소가 있고 바람과 노을의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는 것이다. 오후 4시, 따스한 12월 오후다. 여독旅毒에서 아직 풀리지는 못했으나 친구들이 곁에 있었으면 싶다. 친구라야 C나 D 나 L같은 이들이지만 때가 때인지라 조용한 자세들이다.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전화를 했으나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요즘은 그저 혼자 독서나 하고 해빙解氷하면 한번들 만납시다" 한다. 이 허한 대답에서 나는 그 대답보다 더 큰 허무를 느끼며 혼자 앉았다.
차가운 왕십리 별들이 검은 가지 사이로 빛을 뿌린다. 밤은 길고 또 멀다. 느티에 초저녁이 지나면 늦달이 찾아오리라. 노엽다. 문득 나 자신에 노엽고, 정과 사랑에 노엽고, 고독 그 자신에게도 노엽다.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맵싸한 노여움이 가득 가슴을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