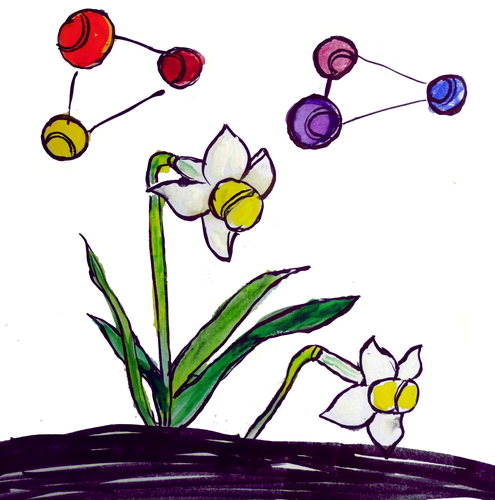
새벽안개가 좋아 이슬바심 하면서 얼쩡거렸는데 봄싹들이 살그래 일어나고 있더라. 지구별의 보푸라기인가, 봄싹들은…. 별이 생긴 날부터 싹들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테고, 억겁 세월을 겪다가 보푸라기 머리칼을 지닌 시인들이 생겨난 날부터 봄싹들도 올라오는 걸 게야. 누구는 지구가 젊은 별이라고 하더라만, 나는 늙은 별, 늙은 어머니라 생각해. 오그라진 젖무덤 같은 주름진 산골에 깃들어 살면서 늙은 어머니가 입은 대지의 털실 스웨터에 일어난 봄싹 보푸라기들을 쳐다본다.
낮엔 추운 바람도 잦아들었어. 생쥐가 풀방구리 드나들 듯 뻔질나게 문지방을 넘나드는 햇살을 보아. 술래놀이인 양 개구진 차일 구름이 장난을 치기는 하지만 완연한 햇살의 세상이 되었구나. 그래 하루 날을 잡아 지난 겨울 입었던 두꺼운 솜털 옷들을 정리하고 빨래도 했지. 달포해포 세월이 쌓이면서 자주 껴입는 털실 옷엔 보푸라기가 톨톨 일어났더라. 처음엔 거슬리는 보푸라기를 잡아 뜯기도 했으나, 언제부턴가 그냥 내버려 둔다. 내 돈으로 새 옷을 장만한 때가 언제였던가? 겉만 번지르르한 속거지 살림이라 까마득하구나. 지난달에 생일 선물로 친구들이 바지, 모자, 목도리를 안겨 주었는데, 내가 너무 단벌옷만 입고 다녀서 그랬나 싶기도 했다. 한 빠숑(?)하고 싶어도 얼굴과 키가 안 따라주고, 장롱엔 옷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형편. 그래도 보푸라기 일어난 오래된 옷들이 나는 익숙하고 좋아. 동무도 새동무보다는 그런 익숙한 옛동무가 좋더라. 늙어지면 머리카락 하얀 보푸라기가 돋은 오래된 인연들과 봄싹 돋은 옛길을 산보하고 싶다. 목사·
<임의진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