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dabia.net/xe/1099104 |
|---|
성경 해석
사람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야기를 즐겨 사용해 왔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바위에 새기고 토판에 적었다.
성경도 다를 바 없다. 성경 역시 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로 기록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형식을 빌려 기록했다. 두 가지 형식 곧 히브리 말로 ‘이야기’란 뜻의 ‘학가다’(Haggadha)와 ‘법전’이란 뜻의 ‘할라카’(Halacha) 형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학가다(Haggadha-이야기, 종교적 교훈)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고, 할라카(Halacha-행동 규칙들-계명, 율례, 법도)는 ‘법전’이란 뜻인데, ‘걸어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할락(halak)’에서 유래하여 ‘걷는 길’(할라카)이란 뜻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곧 ‘율법’을 가리킨다. 학가다(이야기)와 할라카(법전) 형식은 그 당시 고대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표현 양식이다.
성경은 한 마디로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이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미를 전달하며,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다.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문화, 전통, 지식 등을 세대 간에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현대에도 스토리텔링은 문학, 영화,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 이야기가 사실일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더 나아가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이스라엘 왕조 역사도 사실일까? 대부분의 근본주의, 즉 문자주의자들은 그것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대로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책이다. 그렇게 때문에 성경은 그 의미가 깊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팩트(fact)가 아닌 팩션(faction)이다. 팩션은 ‘사실’을 뜻하는 영어 'fact'와 허구를 뜻하는 'fiction'의 합성어이다. 사실과 허구가 합쳐진 것으로서 문화계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 낸 것인데, 영화, 드라마, 연극 등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팩션은 역사적 사실을 사용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꾸미고, 풀어낼지에 대해서는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많은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팩션류의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실미도>, <황산벌> 등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팩션의 유행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화 콘텐츠들은 경제적 이익과도 관련있는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역사적 사실에까지 오락성을 더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무엇보다도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전래의 ‘전설의 고향’이 그러하듯이 성경은 오랜 세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면서 많은 각색을 거쳤다. 그러면서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정말 멋진 팩션이다. 성경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설의 고향’이나 팩션과 같은 소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대하 드라마이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만 그럴까? 모든 나라의 설화가 다 그러하다. 우리나라의 설화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가 잘 아는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도 그러하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도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학가다와 할라카 표현양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준다. 설화 속에의 곰과 호랑이 이야기는 ‘학가다’이고,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금기사항은 ‘할라카’ 양식이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에 나오는 쑥은 고통을 상징하고, 마늘은 고통을 끈질기게 감수하는 자세를 상징하고, 마늘 20개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의 손가락과 발가락 수를 합한 수가 마늘 20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 20개를 먹으라”라고 한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조건에서 각자 제 몫의 온갖 고통을 끈질긴 인내로 극복해야만 된다.”라는 뜻이다. 결국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은 “온갖 고통과 그 좌절을 맞보면서 끝까지 굴하지 않는 인내와 열정을 홀로 간직하고 지켜나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100일이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온전한 숫자, 완전의 완전수’인데, “기약할 수 없는 많은 세월”을 뜻한다. 37일이란 3의 일곱 제곱으로서, 산모가 출산의 과정에서 받았던 육체적 고통과 타격으로부터 회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바로 3·7일로서 21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출산을 하면 산후 조리를 위해 21일 동안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줄을 쳐 놓았다. 그러므로 곰이 3·7일 만에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정한 기간을 거쳐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모했다”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학가다와 할라카를 통해 단군설화는 고조선 사회를 이상화시켜, “사람다운 사람,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국가 건설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를 간략히 요약한 말이 곧 ‘홍익인간(弘益人間)’인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이 학가다(이야기)와 할라카(법전) 형식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 그에 대한 예를 보자. 예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 10:25)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눅 10:26)라고 물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내용을 네가 어떻게 이해(또는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표면에 나타난 이야기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달았느냐?”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겉의 이야기가 아니라 속의 이야기, 표면적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적 이야기,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 담긴 뜻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에수님의 해석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설화 속에서 교리를 보지 말고,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늘,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다. 교리는 단지 지식만을 주지만 이야기 속에 담긴 하늘,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성경이나 설화만이 아니라 소설이나 시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모든 팩션(faction)이 모두 다 그러하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하늘, 즉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어린이 인솔자이기 때문이다(갈 3:24-25).
=======
브니엘남님의 성경해석의 글을 읽고서
예전에 미드라쉬에 관련된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매우 놀랍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네요.
와~~~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 이건 완전히 이현령비현령을 뛰어넘는 억지와 어거지의 해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읽었던 책은 미드라쉬 입문 (바로로딸) , 모세오경 미드라쉬의 랍비들의 설교(한국기독교연구소)였습니다. 신학의 수준까지 낮은 저에게는 무척 충격적이었고, 그 이후로 성서의 해석에 대해서 뭔가 저 스스로가 현대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안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유대인 중 개신교로 개종을 한 후에 유대인 성경을 쓴 데이비드 H. 스턴의 주석인 유대인신약성경주석에서 나온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어플로 글을 만들어서 올렸기에 원책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책의 본문을 사진으로도 올려봅니다.
랍비의 네 가지 기본 성경 해석 방법을 이해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다.
(1) 페샤트(P'shat, '단순한 ')ㅡ성경 본문의 평이한 문자적 의미로 현대 학자들이 '문법적.역사적 주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언어의 문법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서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한다. 현대 학자들은 문법적.역사적 주해만 본문을 다루는 타당한 방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에 다른 접근법을 사용할 때 학자들 앞에서 주눅 들 수 있다. 그러나 랍비들은 다른 세 가지 성경 해석 방법도 있다. 그것들을 미리 배제하지 말고 타당성을 살펴봐야 한다.
(2) 레메즈(Remez, '힌트')- 본문의 단어, 구절, 다른 요소로 페샤트가 전달되지 않는 진리를 암시한다. 여기에 함축된 가정은 성경 저자가 기록할 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구절에 암시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3) 드라쉬 혹은 미드라쉬(Drash or midrash, '탐색') -알레고리나 교훈으로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 해석(외산, eisegesis)의 일종이다. 즉 자기 생각을 넣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본문에서 말하는 바를 추출하는 주해(exegesis)와 반대다. 여기에 함축된 가정은 인간의 지성이라는 방앗간에서 성경 말씀을 곡식처럼 빵아서 본문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성을 직접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4) 소드(Sod, '비밀') ㅡ히브리 문자의 숫자 값을 계산하거나, 특별한 스펠링에 주목하거나, 문자의 위치를 바꾸거나 해서 신비한 숨은 의미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단어의 숫자 값 총합이 같으면 어떤 비밀을 계시하는것 일 수 있다고 본다. 아더 코슬러(Arthur Koestler)는 창의적 생각에 관한 책 에서 이것을 "아이디어의 이합(bisociation)"이라고 했다. 여기서 함축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소한 세부 사항, 가령 단어의 스펠링에도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다.
레메즈, 드라쉬, 소드에서 가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마음과 생각에 다가가는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신다. 반면에 레메즈, 드라쉬, 소드는 오용되기 쉽다. 주관적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객관성을 추구하는 학자 들은 사용하기를 꺼린다.
본문을 다루는 이 네 가지 방법을 네 방법의 두음을 조합한 히브리어 '파르 데스(PaRDeS)'로 기억한다. '과수원' 혹은 '정원'이라는 의미다



|
|
혹 글을 퍼오실 때는 경로 (url)까지 함께 퍼와서 올려 주세요 |
|
자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이단 자료는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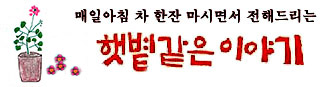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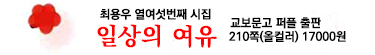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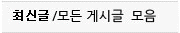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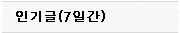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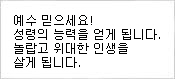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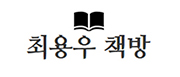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