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
1. 희년에 대한 어의론적 의미
'희년'이라는 말은 '요벨' 즉, '양의 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용어로서 히브리 성경에 모두 26번 나온다. 희년을 맞이하는 해의 일곱 번째달의 열번째 되는 날 즉, 대속죄일에 이 양의 나팔이 울려퍼지게 되면, 기업의 원주인에게로의 회복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자유가 선포된다. Liber, van Selms, Lemche 그리고 Wright와 같은 학자들은 '요벨'의 정확한 어원적 의미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지만, Morgenstern, Noth, Patrick, Heinisch, Chirichigno, North, Snaith 그리고 Neufeld등과 같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양의 뿔'에서 그 어원적 의미를 찾는다.
Morgenstern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졌다고 보면서, 일반평민들은 '쇼파르'라는 나팔을 사용한 반면 제사장들만이 요벨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일반적인 해는 그 해의 첫해에 '쇼파르'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반면에 희년은 '요벨'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Chirichigno는 '요벨'과 '쇼파르'를 동의어라고 보았는데, 출 19:16절과 여 6:4-8, 13절에 나타나는 '쇼파르' 역시도 양의 뿔로서 묘사가 되어진 점을 본다면 이 Chirichigno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2. 희년의 선포는 49년째인가? 50년째인가?
희년주기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49번째 되는 해에 희년이 선포되었는가? 아니면 50번째 되는 해에 희년이 선포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차적으로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번인즉 안식년 일곱번 동안 곧 사십 구년이라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라고 한 레 25:8-9절과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라고 한 레 25:10-11절 사이의 텍스트 상의 희년선포 시기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제기되어지며, 부차적으로는 2년 연속되어지는 땅의 휴경이 가져오게 될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는 학자들의 견해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첫째, 희년이 50년째에 선포되었다는 견해
50년 희년 설은 주로 초기의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주장되었다. Lesetre는 신 16:9절의 "칠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에 나타나는 맥추절은 49일 다음에 오는 날이며, 요세프스와 파일로등과 같은 랍비 주석가들이 모두 50년에 동의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한 레 25:11절의 파종을 금지하며 충분한 양식을 약속한 말씀은 50년설에 더욱 적당한 것이라고 보았다. Paton역시도 49년 설은 본문과 고대증언들과 상치된다고 보았고, 구체적으로 랍비중 한 사람인 Yehuda Ben-Ilai를 들며 랍비의 전통적인 견해는 50년 설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Delitschz는 49년 희년 주기설은 인본주의적인 계산법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레 25장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는 희년은 레 25장에 기록된대로 7번째 안식년 다음 해, 일곱 번째 달, 열흘 째 되는 날 양의 뿔나팔 소리로 선포되었다고 보았다. Strack 역시도 50년 희년 설을 받아들이면서, 매 7번째 희년은 어느 한 안식년과 일치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희년은 안식년주기의 어느 해와 겹쳐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둘째, 2년 연속 땅의 휴경의 농경적 비현실성
Wetzstein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토양은 안식년이 지난 8년째에는 기경을 해야만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농경적 환경조건에 주목하면서, 만약에 2년 연속 휴경이 되어진다면 양식을 얻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Kugler역시도 땅과 기후의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땅의 기경이 없는 연속된 휴경은 곡물을 생산할 수 없는 땅의 황폐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North는 마카비 일서 6:49절의 안식년 준수로 인한 기근의 도래를 사례로 들면서, 2년 연속의 휴경을 전제로 하는 50년 희년설 보다는 일곱 번째 안식년과 희년의 일치를 주장하는 49년설을 이야기 했다.
셋째, 희년이 49년째에 선포되었다는 견해
Hoenig와 Wenham은 희년을 49일의 '도약된 점핑된 해'(leap year)로 제안을 했는데 제 2성전기의 월력에서 희년에 사라진 것은 이 견해를 뒷받침해준다고 보았다. Box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14장까지의 역사를 49주기로 등분하여 재구성한 가경중의 하나인 'The Book of Jubilees'의 저자가 50에 대한 이해를 49로 하여 역사를 49등분하여 기록한 것을 주목하면서 일곱 번째 안식년과 희년의 동일성을 이야기 한다. Morgenstern역시도 'The Book of Jubilees'의 49주기를 주목하면서 마키비와 마카비후기에는 희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Heinisch, Reventlow, Elliger, Cardellini, van Selm, Kugler 그리고 Noth와 같은 학자들은 히브리인들이 날짜 계산시에 마지막 숫자에서 처음 숫자를 빼고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히브리 계산법을 염두에 두면서 49년설을 지지한다. 즉, 히브리인들은 7일에서 12일 사이에는 6일이 아닌 5일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Vaccari는 또한 고대 로마의 월력에서 희브리 계산법과 비슷한 자료 즉, 이틀전이라는 것을 'tertio calendas'로 표현한 것을 들어 49년설을 이야기 한다. 한편 Kaufmann은 '요벨'과 고대 바빌론의 'misarum' 선포를 비교하면서 희년은 49년에 선포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희년주기의 마지막 해는 다음 희년 주기의 첫해가 되어진다고 보았다. Hartley는 만약에 단 9:24절의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에 나타나는 490년을 10번째 희년이라고 본다면, 일곱 번째 안식년이 희년이라고 하는 견해를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50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인 특별한 월력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희년은 다른 안식년들과는 달리 일곱 번째 안식년을 구별하기 위한 특별한 표식이라고 보았다. Stone은 50년은 두 월력 체계 즉, Sun과 Moon력의 상이한 길이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희년을 두 월력사이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Moon력에 부가된 길이의 시간으로 보았다. Klostermann역시 두 월력사이의 차이점을 보면서 49번째 Sun year는 50번째 Moon year의 이어지는 달 수로 보았다. 그러므로 49년의 Sun year 시작은 50년의 Moon year의 후반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즉, 50년 Moon year는 49년 Sun year 일곱번째 달 열흘째 되는 날에 끝나게 되는데 이때 희년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희년선포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은 확실한 희년 선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다니엘서의 490년에 대한 해석과 중간기 가경인 'The Book of Jubilees' 저자의 희년의 49주기 이해나 Sun-Moon 월력의 차이는 49년째 희년 선포를 더 지지해주고 있는 듯하다.
3. 레위기 25장의 안식년법과 희년법
3.1. 서 론
레위기 25장에는 세가지 희년규례 즉, 땅의 휴경과 노예해방 그리고 토지의 원주인에게로의 반환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나타나 있지만 부채탕감에 대한 규례는 언급이 없다. North나 Noth와 같은 학자들은 부채에 대한 용어의 언급은 레위기 25장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25a, 35a, 39, 47a)과 같은 조건절을 들어 25장이 부채탕감의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Elliger와 Wenham과 같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말하듯이 부채탕감에 대한 특별한 규례를 레위기 25장에서는 찾아볼 수 가 없다.
3.1.1. 레위기 25장의 구조
레위기 2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즉, 하나는 2-7절의 안식년과 그에 따른 규례들이며 다른 하나는 8-55절의 희년과 그에 따르는 규례들로 구분할 수 있다. Hartley는 조금 다르게 레 25장의 구조를 보고 있는데, 그는 2-22절의 안식년과 희년의 월력과 몇몇규례와 23-55절의 희년과 관련된 부속규례들로 나눈다. 특별히 그는 희년을 'a high sabbatical year'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두 구조가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후반부에 등장하는 세가지 규례 즉, 땅의 매매와 대여 (23-34절),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부 (35-38절) 그리고 부채로 인한 노예해방 (39-55절) 등의 규례등은 그 각각의 계약만기 시점을 모두 희년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가난-대부-기업을 잃음-노예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관련성 때문에 이 세가지 규례들은 희년에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는 규례들이라고 이야기 한다.
3.1.2. 안식년에 관한 규례 (레 25: 2-7)
이 안식년 법에 관한 규례에서 우리는 안식년 법들의 기초가 되고 있는 땅에 대한 여호와의 소유권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Henry는 이 법이 출애굽기 23:10-11절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레위기의 이 규례에서는 아주 독특한 동기가 발견되어진다고 이야기 한다. 즉, 출애굽기 23:10-11절에는 가난한 자들이 경작하지 않는 땅에서 자연히 자라난 곡식들을 먹을 수 있게 한 인도주의적인 사회적 기능을 볼 수 있는데 반하여, 레 25:4의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는 안식의 개념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종교적인 동기롤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Wright는 Gordon과 Lemche의 견해에 동의 하면서 안식년 법이 고대 이스라엘에 하나의 제도(Institution)로서 정착하기전에, 이미 안식년 법의 개념과 그 실행에 있어서 분명한 종교적이며 제의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안식년 법은 어떻게 지켜졌으며, 안식년의 양식의 종류와 용도는 무엇이었으며, 안식년 법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A) 안식년은 개별적 혹은 부분적으로 지켜졌는가? 아니면 동시에 전체적으로 지켜졌는가?에 대한 학자들간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llian 과 Porter는 개별적인 안식년 즉, 돌아가면서 땅을 휴경하는 견해에 동의하는데, 이들은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안식년은 농부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안식년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로, Ginzberg는 전체적인 땅의 휴경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굶주림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가나안의 정복이 같은 해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안식년이 지켜졌는지 결정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 했다. 셋째로, Wright는 안식년 법은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들에 대해 인도주의적인(Humanitarian)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땅의 휴경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땅의 휴경은 전체 농부들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농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적으로 돌아가면서 땅의 휴경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식년 즉, 땅의 휴경을 지켰을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진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첫째로, Wacholder는 안식년 법과 안식일 사이의 매우 밀접한 성격과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안식일 법이 모든 백성이 동시에 전체적인 준수를 했다면, 안식년도 동시적이며 전체적인 준수를 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둘째로, Safrai와 Eisenstein은 만약에 개별적인 안식년의 준수가 이루어진다면 희년의 계산에 아주 치명적인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년의 준수는 모든 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은 뒤에 이루어졌다고 했다. 셋째로, Paton은 땅의 휴경와 노예해방과의 관계를 주시하면서, 특별한 부분적인 휴경은 땅의 주인으로 하여금 나머지 7분의 6에 해당하는 땅을 매년 농사지어야 하는 부담과 욕심을 주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노예해방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넷째로, 제 2성전 말기의 제 1 마카비서와(I Macc. 6:49, 53) 요세프스의 기록(Ant. XII. 377-378; Ant. XIV 475ff)의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식부족으로 인한 기아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인 휴경의 준수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로, 레 25:20절의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에 있는 질문은 7분의 6의 농사를 지을 땅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물음이다.
이러한 안식년의 휴경법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역사적인 증거 그리고 성서 텍스트의 증거들은 부분적인 휴경보다는 전체적이며 동시적인 안식년 법 준수의 견해를 더 타당한 안식년 준수 방법으로 말하고 있다.
B) 안식년의 양식의 종류와 용도
레 25장에는 안식년을 위한 두가지 양식 즉, 레 25:5-7절의 저절로 자라난 양식과 레 25:20-22절의 저장된 양식이 나타난다. Noth와 Saith는 비록 안식년에 수확하는 것이 없다하더라도 전년도 수확기에 떨어진 이삭으로부터 저절로 자라난 곡물들이 양식이 되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Hartford-Battersby도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안식년에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한 것은 상거래를 목적으로하는 일련의 수확들을 금지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Brown, Driver 그리고 Briggs도 '떨어진'의 히브리어 어원적 접근을 통하여 이전 수확기에 우연히 떨어진 곡물들이 안식년에 자라난 것으로서 이것을 양식으로 사용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5절의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네지레'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나실인의 모습중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민 6:2, 13, 18-21절), 이처럼 전혀 수확을 위한 노력이 들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가르킨다. Ginzberg도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난 곡물의 매일 양식으로서의 이용은 저자의 humanitarian적인 배려라고 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견해들을 볼 때 안식년에 사용된 양식은 전해에 저장된 양식과 저절로 자라난 곡물인데, 특별히 이 저절로 자라난 곡물은 가난한 자들을 비롯해서 필요한 사람들 모두에 의해서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되어졌음을 볼 수 있다.
C) 안식년의 기원
안식년의 원래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첫째 견해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이다. Weber와 Kugler는 휴경 즉, 안식년은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반영한다고 했다. Eichrodt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곡물뿐만 아니라 모퉁이에 곡물도 남겨놓으라고 한 레 19:9-10절에 주목하면서 the Holiness Code의 전반적인 인도주의적인 강조점을 말했다. 둘째 견해는 안식년의 제의적인 기원을 이야기 한다. North는 소유주의 땅의 소산물에 대한 권한포기를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방법으로 간주하면서 안식년 제의의 기원을 이야기 한다. 셋째 견해는 안식년의 농경적인 기원을 이야기 한다. Penderson은 땅과 사람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주목하면서 안식년의 농경적인 관점을 이야기 한다. 그는 토양의 성질에 대한 성경의 구절 즉,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이랑이 일시에 울었던가"(욥 31:38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눅 19:40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롬 8:19-22절)을 언급하면서 땅의 본질상 자유의 시간 즉, 휴경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안식년의 기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은 각각 어느 한 기원의 설명이 안식년 기원증거로서 필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비록 안식년의 일차적인 초점이 인도주의적인 관심에 있다하더라도 다른 두 요소 즉, 제의적이고 땅에 대한 농경적인 관점도 또한 이 안식년 기원의 한 뿌리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한 듯하다.
3.1.3. 희년에 관한 규례들(레 25:8-22)
양의 뿔인 요벨은 희년의 일곱째달 열번째 날에 울려퍼졌다 (8-9절). 이 희년에 모든 백성들은 모든 빚의 탕감과 노예해방 그리고 그들의 원래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포함한 자유의 선포를 받게된다 (10절). 희년의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견고성을 지키려고 했던 것으로서, 무름(redemption)에 관한 규례들은 유산의 소유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게 하는 주요한 원칙들이었다.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애굽에서의 구출의 두가지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으로하여금 이와같은 해방의 규례들을 선포하게 만들었다. 다음 돌아오는 희년까지의 남은 햇수가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 가격 결정의 중요한 요소였다 (15-16절). 이 법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착취하지 말아야 할 것과 야훼 하나님께서 충분한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권면도 가지고 있다 (20-22절). Hartley는 특별히 21절의 "내가 명하여 제 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에서 '나의 축복' 전에 있는 '명령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하면서 이는 충분한 수확을 보장하는 야훼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3.1.4. 땅의 회복에 관한 규례들 (레 25:23-34)
안식년 법전과 비교해서 희년 법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하게 보이는 규례는 레 25장에서만 발견되는 유산의 본래의 주인에게로의 회복에 관한 규례이다. 레 25장에는 6가지 유업의 회복에 대한 규례가 있다. 23절에 농경을 위한 땅은 팔수 없고 오로지 임대만이 가능하며, 25절에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유산을 팔 수밖에 없는 형제를 위해서 근족의 구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26절 하반절에는 근족이 없는 원주인이 땅을 다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29-31절에는 집에 대한 규례로 성곽안의 집과 시골에 있는 집의 거래에 대한 규례와, 32절에 레위인의 재산에 대한 특별규례등이 그것들이다.
3.1.4.1. 땅의 거래에 대한 규례 (레:23-28)
이 구절들에는 야훼의 땅에 대한 소유권과 모든 가계의 유산에 대해서 무를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다시금 규정하고 있다.
A) 땅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소유권
땅의 소유주가 임차인과 농경지에 대해서 일정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진정한 주인은 야훼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자 한 것이었다. Wilkie는 야훼의 명령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은 땅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이야기라고 보았다. 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에서 야훼의 땅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이다. Fager는 특히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한 23절에 대해서 모든 희년법규의 궁극적인 기초 (the ultimate moral basis or the cornerstone of the Jubilee) 라고 했다.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 야훼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유주라는 것이 모든 희년법규 시행의 동기가 되는 신학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땅이 주어이며 미완료 수동형의 동사(닢알 3인칭 여성 단수)가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는 영원히 팔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이것은 곧 이어지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선포와 더불어 토지는 인간이 자의적으로 팔고 살 수 없는 야훼 하나님의 것임이 더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 히브리 성경 구절의 번역본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개역성경),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표준 새번역), "The land must not be sold permanently, because the land is mine and you are but aliens and my tenants" (NIV), "The land shall not be sold in perpetuity, for the land is mine; with me you are but aliens and tenants" (NRSV), "The land shall not be sold permanently, for the land is Mine; for you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with Me" (NKJV), "The land shall not be sold for ever: for the land is mine, for ye are strangers and sojourners with me" (KJV).영문성경들이 이 문장을 땅을 주어로 하여 수동으로 번역해 놓은 것과는 달리, 개역성경을 비롯한 한글성경들이 능동형으로 번역해 놓은 것은, 토지와 직접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용주체에 강조를 두고 번역을 한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개역성경에서도 곧 이어지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고 하는 문구가 명확히 야훼 하나님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선언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개역성경도 궁극적으로는 23절의 문맥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Hartley는 '하에레쯔'가 23절 문장 첫머리에 쓰인 것은 강조를 위함이라고 보았으며, Hogg는 개역성경 '영원히'에 해당하는 '쯔미투트'를 'without right of redemption' 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문맥의 이해들은 야훼 하나님의 토지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을 더욱 잘 말해주는 생각들이다. 23절에 하나님과 함께 쓰여진 두 개의 히브리어 즉,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는 노예의 상태에 대해서 쓰여지곤 했던 단어들인데, Wright는 이러한 두 단어를 가나안인들이나 이주민들의 후손을 언급하는데 쓰였다고 보았다. 그들은 단지 땅을 소유하지 못한 거주하는 고용인들로서 주인에게 그들의 노동력을 주었다.
B) 근족의 기능
근족의 책임은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라고 한 25절에 나타나 있다. 즉, 근족은 '기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원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킴을 보여준다. Noth는 '고엘'에 대해서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으며, Hubbard는 부채로 인한 모든 노예들이 희년에 그들의 지위를 회복할 때 야훼께서 그들의 근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한 Ginzberg는 고엘의 기능에 대해서 넓은 가족의 범위안에 그 기업을 둠으로 해서 가족의 견실성을 지키려는 수단으로 보았으며, 한편으로 Buhl은 이 고엘의 기능을 개인의 기능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회의 집단의 기능으로 보기도 했다. 이러한 각 가족의 유산을 최소한 친족의 소유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룻 4:9절) 예레미야가 하나멜의 땅을 사는 것(렘 32:6-15절)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규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기업을 팔아야만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의 친족안에 머무름을 위해서 사야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근족의 제도를 보면서 Bellefontaine은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는 그들의 땅에 대한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도 희년이 가까워 짐에 따라 땅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잃었던 땅을 다시 살 수도 있었다 (26-27절). 따라서 원래의 주인이 그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는 길은 고엘을 통해서나, 그것을 얼마뒤에 다시 사든지, 아니면 희년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3.1.4.2. 집의 매매에 대한 규례 (레 25:29-34)
(A) 성곽안에 있는 집과 시골에 있는 집 (레 25:29-31)
일반백성의 집에 대한 두가지 종류의 규례가 있다. 성곽이 없는 마을에 있는 집들은 팔린 후 언제든지 무를 수가 있었으며,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주인에게로 회복이 되어진다 (31절). Kellog에 따르면 성곽이 없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자들이거나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목축과 경작을 위해서 그들의 집들은 매우 중요했다. 그러므로 성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희년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에 성곽안에 있는 집은 팔린 뒤 일년안에 무르지 않으면 무를 수가 없었다 (29-30절). 다른 말로하면 언제든지 무를 수 있는 권한이 성곽안에 있는 집들에게는 적용이 되어지지 않았다. 성곽안에 있는 집들이 희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희년의 규례들이 농경에 사용되어지는 땅들에만 적용되어졌기 때문이다. Sulzberger는 성곽안의 경제제도와 시골 땅의 경제제도의 차이점을 보면서 귀족들은 성곽안에 있는 재산들을 영구히 살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레위기 저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으로부터 나온 견해로서 Ginzberg는 저자의 부자와의 타협책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상업적인 이익 때문에 성곽안의 유업의 배제가능성을 이야기 하기도 했다.
(B) 레위인들의 집들과 그들의 재산 (레 25:32-34)
레위인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도시에 있는 그들의 집들을 무를 수가 있었다 (32절). 또한 레위인들의 성에 있는 그들의 집은 그들의 유업이었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33절).
3.1.5.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빌려주는 대부에 대한 규례 (레 25:35-38)
이자의 종류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네섹'이라고 하는 것과 음식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이 있는 '타르빗' 혹은 '마르빗'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자는 이스라엘 백성사이에서는 늘어나는 이자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36절). 이러한 규례들의 정신 역시도 야훼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속박에서 놓여난 출애굽 정신과 관련이 있다 (3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경에 처한 형제들로부터 이자를 받는 대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35절). 그렇지만 Noth는 이법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라고 한 출 22:25절의 초점이 가난한 자들이라는데 주목하면서 구약성경의 규례들이 이자를 받는 대부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러한 이자를 반대하는 규례가 돈을 빌려주는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3.1.6. 부채에 의한 노예에 관한 규례 (레 25:39-55)
희년의 마지막 규례는 노예해방에 관한 규례이다. 노예와 함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 되어 요벨이 울려퍼질 때 그 노예들을 놓아주었다. 그러면, 노예들은 그들의 지파와 유산인 그들의 땅을 다시 얻을 수 있었다. 이 규례의 동기도 역시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군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고 한 레 25:42절의 애굽으로부터 구속한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에 있다. 노예해방에 관한 이 희년법은 다음과 같은 규례들을 말하고 있다. (1) 노예를 다루는 방법 즉, 가혹하지 않고 고용된 일군을 다루듯이 친절하게 (39-40a, 43, 50c, 53절), (2) 노예해방의 기간 (40a-41절), (3)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규정 (44-46절), 그리고 (4) 이방인과 이주민에게 팔린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규정 (47-55절)등이 그것들이다.
노예가 되는 원인들은 풍족하지 못한 수확, 전염병, 질병, 다른 어려운 상황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 43절은 주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심하게 다루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0절의 "품군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는 그 노예들의 성격과 조건에 대해서 '고용된 일꾼들' 이나 '우거하는 자'라고 묘사 했다. 고용된 일꾼들로서의 지위를 갖는 노예들은 집들과 얼마간의 땅과 같은 것들이 함께 제공 되었다. 그러므로 Fuchs는 "이스라엘 백성들사이에는 전혀 노예가 없었다......단지 때때로 자유를 잃었을 뿐이다."라고 했다. Buhl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팔리기 보다는 일정기간동안 부림을 당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한편 Noth는 레 19:13절과 신 24:15절의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하므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하노라"의 고용된 일꾼들에게 해가지기전에 품삯이 주어진 것에 주목하면서, 해마다 노예들에게 고용된 일꾼처럼 임금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Wolf, Reviv, de Vaux 그리고 Driver와 Miles같은 학자들은 다른 고대 근동의 법률 모음집들과 계약서등을 보면서 고용된 일꾼들의 의무는 목수, 대장장이, 보석공 등과 같은 숙련된 노동자들의 특별한 일들이었다고 했으며, Warhaftig 또한 노예주는 노예와 맺은 계약외의 일들을 그들에게 시킬 수 없었다고 보았다.
48-49절의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에서 쓰인 근족의 범위는 25절에서 쓰여진 근족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Japhet은 또한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과 그들 각각의 하나님의 관계로서 보았다. 그녀는 이러한 종교적인 개념이 땅과 노예들의 구속을 위한 규례들을 하나의 사회 복지를 위한 제도로서 묵어주게 된다고 보았다
* Reflections on the Stipulations of the Sabbatical Year and of the Jubilee Year
레위기 25장에 나타나 있는 안식년법과 희년법의 규례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몇가지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애굽 노예신분에서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바꾸어주신 것은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죄인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며, 야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가나안 땅의 복된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날마다 주시는 커다란 은혜들이며, 출애굽과 야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가나안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더불어 살게 하신 안식년 법과 희년법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 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의 그 분의 나라를 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과 행함을 요청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합니다.
희년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의 첫째 근거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이들에게는 '그러면 이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학적 전거는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년사상은 이 물음에 대한 실천을 위한 고민의 한 대답으로 삼을 수 있는 규례이기 때문에 그 적용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천당'식의 복음 전도가 잘못되어서라기 보다는, 시대마다의 사명이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면, 오늘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행함의 방법과 표현은 다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비율적인 균형이 아닌,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사상의 현대적 적용의 둘째 근거는 희년법의 이른 기원에 대한 견해입니다. 희년법 기원에 대한 논의는 분분합니다. 아주 이른 연대기를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바벨론 포수기 이후 제사장계열의 문서편집기에 첨가되고 신학화되어진 사상이라고 보는 편이 있습니다. 후자를 취하면 희년사상은 단순히 메시야 도래시에 이루어지게될 유토피아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 본질적으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규례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희년사상의 이른 연대기를 주장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고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이른 연대기는 희년사상이 유토피아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사회적용을 위한 규례였음을 보여주는 견해입니다. 먼저는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을 나타내는 '요벨'을 비롯한 4가지 중요한 단어들은 후기 성서에 관련된 문헌들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단어들인 반면에, 고대 우가릿어 'mk'나 'samid adi dariti'에서 그 기원을 찾게 되어지는 것은 이 희년사상의 초기 발생설을 지원해주는 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고대근동에서 시행된 노예와 부채의 탕감에 대한 실제 사례들과의 여러면에서의 유사성은 초기 발생설을 주장하게 되는 또 다른 설명입니다. 이러한 초기 발생설은 희년규례가 단순히 유토피아를 지향한 실현할 수 없는 규례가 아니었으며,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실현을 위한 규례였음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정의를 위한 규례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용하느냐는 그 당위성에 있어서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각론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여러면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우리모두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안식년과 희년법 규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 행함으로 옮기게 하는 것은 그 어느 길보다도 지극히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을 내딛을 때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음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2) 역사서와 예언서
'거룩한' 안식일, '나'의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자료 가운데 지난 호의 모세 오경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역사서와 예언서에 나타난 안식일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역사서
역사서 가운데 나타나는 안식일 자료 대부분은 안식일의 특성을 암시적으로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그 자료들에 나타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안식일 제의적 활동들
열왕기하 4장 23절·11장 4∼12절, 역대하 23장 1∼11절에 의하면, 주전 9세기 말에 이르러 사람들과 왕도 안식일에 거룩한 곳(즉 성전 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거처)을 방문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기에 이르러 사람들과 왕이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거룩한 장소에 함께 모이는 식으로 안식일을 정규적으로 준수하였으리라는 결론을 추론해 보게 된다.
역대상 9장 32절·23장 28∼31절, 역대하 2장 3절·8장 13절·31장 3절에 의하면, 안식일 제사는 일찍이 솔로몬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따라 드려졌다. 안식일 제사의 주요 구성 요소는 진설병(레 24:5∼9 참조)과 번제물(민 28:9∼10 참조)이었다. 제사에 소용되는 비용은 왕정 하에서는 왕들에 의해서 공급되었으나, 포로기 이후에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성전세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이 명백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첫째, 역대기 저자의 시대에 이르러 안식일 제사는 성전 제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정착되었다. 둘째, 적어도 역대기 저자 자신에게는 안식일 제사가 안식일 준수의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
# 안식일 관련 세부 규례들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세부적 안식일 규례들을 포함하는 두 개의 분리된, 그러나 아마도 연관된 구절들(10:31, 13:15∼22)을 발견하게 된다.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느헤미야 시대에 안식일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으며, 느헤미야는 그 문제들을 단호하게 다룬다. 그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포괄하기 위해 안식일 율법에 대한 확대 규정을 제정한다(즉 상행위를 안식일에 금지된 일로 규정한다). 그는 또한 확대 규정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몇몇 세부 규정들을 제정한다(즉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짐을 들여오는 것을 금하고, 성문들을 닫도록 하며, 성문들을 지키도록 한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이러한 조처들은 유대교 문학에 나타나는 규정들이 보여주는 지나칠 정도로 세밀한 조항들과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느헤미야가 보기에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가져왔던, 그리고 또다시 가져올지도 모르는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였다.
예언서
예언서 안식일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측면들을 보여준다.
# 안식일 제의적 활동들
예언서에 나타나는 안식일 제의적 활동들에 관한 자료들은 주전 8세기께 이르러 안식일이 국가적 축제들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어 있었으며, 그 날에 모종의 형태의 회합이 이루어졌음을 제안해준다(사 1:13, 호 2:13). 늦어도 에스겔 시대에 이르러서는 안식일에 제사장들과 군주뿐만 아니라 백성도 성전에 출석하는 것이 기대되었다(겔 46:1∼3).
예언서들은 늦어도 주전 6세기 초에 이르러 안식일 제사가 안식일 준수의 일부로 당연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겔 45:16∼17, 46:4∼5). 백성은 제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군주에게 종교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고, 군주는 제사를 준비할 책임이 있었다(겔 45:16∼17). 일찍이 8세기 때 이미 안식일 제도의 진정한 언약적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헛되이 지키는 위험의 조짐들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 1:13 /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 안식일의 언약적 의의
예언서들에서 발견되는 안식일 자료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언약적 뉘앙스를 띄고 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여호와와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표로서 이해되고 있다(겔 20:12).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이 언약 전체의 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예를 들어 사 56:1∼8, 렘 17:19∼27).
그와 같은 언약적 이해에 있어서, 안식일 준수는 다양한 언약적 축복들에 대한 조건이 된다(예를 들면 여호와를 경배하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 사 56:1-8 /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 사 58:13∼14 / 메시아적 왕국의 종말론적 완성, 렘 17:25∼26). 이와 반대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대개 언약적 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다양한 언약적 형벌들에 대한 원인이 된다(예를 들면 가장 특징적으로 포로나 예루살렘 멸망, 렘 17:27·겔 20:23 등 /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제외됨, 겔 20:15 등).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가 축복들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구절들에서 안식일 제도의 언약적 성격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 피상적이거나 율법주의적인 안식일 준수는 여호와에 의해 거절되고 있다(사 1:13, 호 2:11, 암 8:5). 안식일 준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기초해 있을 때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식일이란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언약의 표로서의 의미에서 진정한 중요성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출 31:12∼17, 겔 20:10∼26 참조).
안식일의 이러한 언약적 특성은 안식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적인 두 형용사들에 의해서도 감지된다. 즉 '거룩한' 안식일(사 58:13, 렘 17:22, 겔 20:20 등)과 '나의' 안식일(사 56:4, 겔 20:12∼24, 44:24 등). 그렇다면 예언서들에 있어서 안식일의 거룩성과 그 날에 대한 여호와의 소유권은 안식일의 언약적 특성에 대한 기반을 제공해준다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3) 바리새인들
'어떻게'에 치중한 불편한 안식일
이번 호에서는 구약을 물려받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 체제 안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또한 지켰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예수께서 안식일 문제와 관련하여 바리새인들과 부딪치시게 된 배경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1세기 당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관한 자료는 주로 200년께 편집된 미쉬나와 토세프타 그리고 그밖의 랍비 문학 작품들에 나타나 있다. 다음의 내용은 그러한 작품들에 기초한 것들이다.
# 안식일 이전에 일 끝내기
랍비들은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일을 끝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 라반 시므온 벤 가말리엘 2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은 보통 이방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에 안식일 3일 전에 흰색 옷들을 맡기고는 하였다'. 여기서 '안식일 3일 전'이라는 시간 제한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까지 세탁 일을 끌고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조처다. 랍비 엘리에젤은 '케이크 밑바닥이 딱딱해질' 시간이 남아 있지 않는 한 케이크를 숯불에 올려놓는 것을 금하고 있다.
#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들
랍비들은 안식일에 허용된 행동들과 금지된 행동들을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랍비 엘리에젤은 여인이 안식일에 관(冠;일명 '황금 도시'), 헤어네트, 향수병 등을 장식하고 집을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들 모두를 금하고 있다. 한편 한 사람이 말린 무화과 용량보다 적은 양의 채소 씨앗이나, 두 개의 오이 씨앗, 두 개의 조롱박 씨앗 등을 집에서 가지고 나간다면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랍비 엘리에젤은, 만일 한 사람이 그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을 깎거나 뽑으면 그리고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거나 자신의 눈꺼풀에 화장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그러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선언한다.
안식일에 두 글자를 이어 쓰는 것을 금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라반 가말리엘 2세는 만일 한 사람이 동일한 안식일에 무심코 행한 두 행동 중에 각각 한 자씩 써서 두 자를 썼을 경우, 그가 과실이 있다고 선언한다. 이에 반해 현자(賢者)들은 그가 과실이 없다고 선언한다. 랍비 엘리에젤은 꿀벌 통에서 꿀을 긁어모으는 자는 과실이 있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그는 꿀을 긁어모으는 행동을 '추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랍비 요하난은 인간의 안전을 위해 전갈을 접시로 덮어놓는 행동을 허용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는 아마도 그가 그러한 행동을 동물을 사냥하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인 것 같다.
# 안식일에 우선하는 문제들
1세기 랍비들은 안식일의 구속력을 벗어나는 몇 가지 예외 규정들을 만들었다. △할례 △안식일 제사 △유월절 △화재로부터 성경이나 음식물을 구해내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자기 방어적 전쟁. 한편 랍비 아키바는 무슨 일이든지 안식일 전날에(혹은 전야에) 행해질 수 있는 일은 안식일에 우선하지 않지만, 안식일 전날에(혹은 전야에) 행해질 수 없는 일은 안식일에 우선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 여행 한계에 관한 규례들
안식일 여행 한계가 2천 규빗(약 900m)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식일 여행 한계에 관한 1세기 랍비들의 규칙은 매우 상세하고 세부적이다. △이방인이 한 사람을 다른 도시나 가축(家畜) 우리에 데려다 놓았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바다 위에 항해하고 있는 배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전 영역; 4 규빗) △여행 중에 밤이 된 줄을 모르고 잠이 들었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2천 규빗, 4 규빗, 2 규빗) 등.
# 안식일과 언약
3세기 랍비 문학 전체를 통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자들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두 가지 언급을 발견한다. 랍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개의 축제들(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랍비 엘리에젤은 그들이 세 가지 재앙(즉 곡의 날,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있게 될 환난, 대심판의 날)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언급들이 3세기 랍비 문학 전체를 통해 안식일의 언약적 의의(意義)에 대한 바리새적 사상을 그것도 간접적으로나마 증거해주는 모든 경우이다.
랍비 문학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랍비 문학에서 안식일의 언약적 의의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신학적 진술을 발견해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많은 양의 세부 규례들에 비교해볼 때 안식일의 언약적 의의에 관한 간접적인 자료조차도 지극히 희귀하다는 사실은, 랍비들이 안식일의 언약적 성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으리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1세기 때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이해 및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점들을 제안해주고 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 랍비들은 지극히 세밀한 결의론을 발전시켰다는 점 △그들의 세부적인 규례 가운데는 다양성이 존재하였다는 점 △그들의 논의에 있어서 안식일의 언약적 의의와 축제적 성격에 대한 강조가 결여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볼 때, 랍비들은 주후 100년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에 금지된 일들에 관한 구약 성경의 일반 규칙들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결의론적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아마도 안식일 율법을 당대의 상황보다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례의 증가 수효는 안식일 율법을 보다 불편하고 짐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주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로부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돌려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결국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정면 충돌을 일으키시게 된다.
예수님의 안식일 신학 이해를 위한 준비 -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 전통 -
1. 서론
지금부터 우리는 막 2:23-28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안식일 신학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배경이란 예수님 당시의 안식일에 대한 전통입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 즉 context를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본문 즉 text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배경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경연구를 할까요? 당시 배경을 기록해놓은 당시에 출판된 책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 보다 일찍 쓰여진 구약과 중간기 문헌, 그리고 예수님 당시 보다 이후에 쓰여진 신약, 랍비문헌들을 통해 당시 배경을 추론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재구성을 위해 이 문헌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구약의 안식일
- 하나님의 선물
안식일은 본래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 2:2를 봅시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칠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부르십니다. 출 31:13을 봅시다: "...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 또한, 성경은 이날을"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신 5:14 을 봅시다: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러한 표현들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Lordship)을 암시합니다. (이점은 한국의 양용희 박사가 그의 박사논문에서 잘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의 것인 안식일을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명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적 휴식 장치인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 하나님을 본받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또한 제칠일에 쉬신 하나님을 본받는 행위입니다. (이점은 핀란드의 젊은 학자 Back이 그의 박사논문에서 잘 입증하였습니다.) 출 20:8-11을 봅시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또한, 레 19:2-3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있습니다: "...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 따라서, 안식일 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인간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 예외 규정들 (제사법과 할례법)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평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레 23:3을 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나,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안식일이 제8일과 중복되면 할례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 24:8을 봅시다: "항상 매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찌니 ..." 또한 민 28:9-10을 봅시다: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썪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 창 17:12와 레 12:3에 나오는 할례법에는 예외가 없으므로 유대인들은 이 법이 안식일법에 우선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안식일날 제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제사법도 역시 안식일법 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식일의 종말
호 2:11은 하나님께서 남용된 안식일을 없애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인 안식일은 "바알들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 날을 없애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 2:15 (한글성경은 2:13) 히브리어 본문은 "예메이 하베알-리-임" 즉 "바알들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인 휴식보장책, 노예화 방지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도구인 안식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닮는 존재가 아니라 내어던저져서 방향을 읽고 표류하는 존재 즉 포기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예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는 사회들,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장치가 없는 사회들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은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망각한 인간과 사회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중간기 문헌에 나타난 안식일 - 막 2:23-28과 관련하여 -
막 2:23-28과 관련하여 중간기 문헌에 나타난 안식일을 살필 때 특기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음식 만드는 것 금지와 금식 금지입니다.
중간기 문헌 희년서 2:29은 안식일에 음식준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날에 그들은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 다메섹문서 10:22도 역시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미리 준비된 것 외에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하지 말라는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계명을 적용한 것입니다. 출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은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음식을 하려면 불을 피워야 하므로 불을 피우지 않아야 한다면 당연히 음식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간기 문헌은 아니지만 요세푸스의 책 "유대전쟁"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준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만들지 말라는 희년서나 다메섹문서의 규율은 실제로 지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년서 50:12-13은 안식일에 금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날에 일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 금식을 하거나 ... 이 중에 어떤 것을 안식일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죽여야 한다." 다메섹문서 11:4-5도 안식일 금식을 금지합니다: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금식하지 말아야 한다." Judith 8:6은 경건한 유대인이 금식을 하는 경우에도 안식일에는 금식을 중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금식을 금한 이유는 랍비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었으며, 안식일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중간기에도 구약의 안식일이 본래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이날에 금식을 금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금식도 말고 음식준비도 않으려면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4. 신약교회에서의 안식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 24: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예수님께서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을까요? 청중들이 안식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는 마을을 떠나 멀리 여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따라서 안식일에 환란이 닥치면 도망칠 수가 없게 되니 곤란해 지는 것입니다. 눅 23:56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음을 분명히 합니다: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규칙적으로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행 17:2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Bacchiocchi는 로마 교황청 대학에서 박사논문에서 이것은 유대교적 장소와 집회 시간에서부터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행 15:1-29에 언급된 이방인의 율법준수 문제를 논의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식일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이방교회도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면 행 20:7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는 도대체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어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하고 나옵니다. 즉 이 모임은 Bacchiocchi의 주장대로 바울을 송별하기 위한 특별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고전 16:2에는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주일이 안식일 대신 지켜졌다는 증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Bacchiocchi의 주장처럼 매 주일 첫날은 단지 재정을 지출하기 전에 효과적으로 저축하게 위한 방안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 2:16은 어떤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안식일 폐지의 증거는 아닙니다. 유명한 주석시리즈인 WBC 주석시리즈에 실린 골로새서 주석을 쓴 O'Brien에 의하며 골로새에서는 성일들이 "우주의 기초 영들"을 위해 지켜졌으며, 바울은 성일들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일을 다른 신을 위해 사용하는 안식일 남용에 대해 위에 언급한 호세아서의 정신에 의해 경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에는 안식일을 폐지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 신약성경의 교회들은 구약과 유대교의 상당히 연속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5. 랍비문헌에 나타난 안식일 - 막 2:23-28과 관련하여 -
주후 약 200년경에 구두전승을 토대로 결집된 유대인들의 경전 미쉬나 Shabbath 7:2은 39가지 항목의 일들을 안식일에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추수 즉, 곡식 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40에서 하나 감한 것은 40가지가 되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쉬나를 다시 자세히 토론한 예루살렘 탈무드 Shabbath 7:2에서 랍비 Hiya는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훑어내는 것이나 포도, 올리브, 무화과등을 따는 것을 추수의 일부로서 금지합니다.
미쉬나 Pesahim 4:8에서 유대의 현자들이라 부를 수 있는 랍비들은 안식일에 나무 아래 떨어진 과일을 먹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바벨로니안 탈무드 Shabbath 128a에서 갈릴리 사람인 랍비 Judah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훑어내어 손바닥으로 비비는 것은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도구를 사용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른 주류 랍비들에 의해 거절 당했습니다. 다른 랍비들은 손가락 끝으로 소량만을 비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출애굽기 주석인 메킬타는 출 31:14 주석에서 생명이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안식일 계명을 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많은 안식일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위해 하루의 안식일을 범하라." 미쉬나 Yoma 8:6도 생명이 위험할 경우 안식일 규례를 어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을 의문이 있는 모든 경우들은 안식일을 초월한다." 메킬타의 출 31:13 주석에서 랍비 Akiva는 이점을 잘 논증합니다: "만일 사형이 안식일을 능가하는 제사를 능가한다면, 생명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더 안식일을 능가하겠는가?"
메킬타의 출 31:13 주석에서 주후 180년 경의 랍비 Simeon ben Menasha는 주장합니다: "너희들에게 안식일이 주어진 것이지, 너희들이 안식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메킬타 출 31:14에서 약간 바뀌어 반복됩니다: "안식일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아니다! 너희가 안식일에게 주어진 것은 ..."
메킬타 출 31:14와 미쉬나 산헤드린 7:8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을 당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2:24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지적한 것은 제자들이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어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 2:23-28과 관련해서 우리는 미쉬나 Peah 8:7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 세끼의 음식이 가난한 나그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규례는 중간기 문헌에서 살핀 금식금지 규례와 관련됩니다. 금식이 금지되므로, 안식일에 나그네들이 굶는 것을 막기 위해 음식을 주는 것입니다.
6. 예수님 당시 유대교와 안식일
위에서 살핀 자료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자료들은 예수님 이전 자료들과 이후 자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시간 속에서 변해 갔기 때문에 한 시대의 유대교의 모습을 다른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도 여러 가지여서 한 유대교의 모습을 다른 유대교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유대교의 모습으로 제한해서 어떻게 이 바리새유대교의 안식일 전통을 복원할 수 있을지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시딤은 바리새파와 쿰란 공동체의 공통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E.P. Sanders 등의 학자는 바리새파와 랍비 유대교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을 받아들인다면, 쿰란 및 에센파의 공동조상인 희년서 내지 쿰란문헌과 랍비문헌 사이에 일치되는 전통은 결국 그 중간에 끼이는 바리새파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유대 종파 간에 아무런 연결이 없다고 해도, 연결이 없는 유대교파간의 일치는 그 일치점이 널리 퍼진 보편적 전통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 문헌들의 일치를 바리새파의 전통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년서와 쿰란문헌에 속하는 다메섹 문서, 미쉬나는 모두 안식일에 금식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일치로 보아 바리새파도 안식일 금식금지 규례를 지켰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파의 전통을 알아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전통의 변화 경향을 통한 것입니다. 미쉬나 결집에서 빠진 유대구두전승을 모은 토세프타 Shabbath 14;1에서는 바리새파의 두 학파인 샴마이파와 힐렐파의 규율들이 벌써 상당히 느슨해졌음을 암시합니다. 미쉬나 Erubin 5:5은 "현자들은 규례를 더 엄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볍게 하려고 그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즉, 랍비들이 이 전의 규례들을 더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경향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바리새파의 규례의 강도를 미루어 추측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랍비들이 나무 아래 떨어진 열매를 먹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의 규례가 이보다 엄했다면 당연히 밀이삭을 훑어내어 비벼 먹는 것도 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알렉산드리아의 예수님 당시 유대인 Philo는 그의 책 "모세의 생애" 2:22에서 "잎을 자르는 것이나 어떤 과일이든지 훑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열매를 따는 것이 안식일에 금지되는 전통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도 그러한 전통을 따랐을 가능성을 높여 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금식이나 밀이삭을 훑어내는 것 모두를 금하고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7. 결론
우리는 막 2:23-28을 위한 배경을 막 파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왜 이 골치 아픈 작업을 길게 하느냐면, 성경을 더 바르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작업을 한 후에 성경을 읽을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런 작업을 해 주어야 하고, 바로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교회는 신학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본문을 직접 다루겠습니다.
양용의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일 문제와 관련해 양용의 교수의 글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연재되는 글은 필자의 책 「예수와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레서원 펴냄)의 내용을 <뉴스앤조이> 독자들을 위해 요약 재구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혹 글을 퍼오실 때는 경로 (url)까지 함께 퍼와서 올려 주세요 |
|
자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이단 자료는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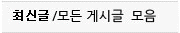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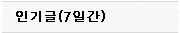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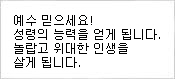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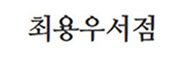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