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
십자가의 요한 성인(1542-1591)은, 흔히 대(大)데레사라고 불리우시는 성녀 예수의 데레사와 함께 가르멜수도회의 개혁을 주도하셨던 16세기 스페인 성인이시고, 교회학자이시고, 신비가, 즉, Allison Peers의 해석에 따르면 '하느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이시고, 뛰어난 신앙의 스승이십니다. 최민순 신부님 번역으로 작품 일부가 우리 말로 소개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다소 난해한 작품들로 인해서 어렵고 딱딱한 무서운 분으로 느껴지는 성인이십니다. 1991년 성인 서거 400주년을 전후해서 스페인에서는 많은 연구서들이 쏟아져나왔고, 성인의 가르침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입문서가 될 만한 글 하나를 여기 올립니다. 성인의 작품 전집의 서문이지만, 작은 책 한 권 분량의 글이고, 성인과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만한 글입니다.
번역에 사용된 원문은 «San Juan de la Cruz, Obras completas, 5a edición crítica, Editorial de espiritualidad, Madrid, 1993.»의 서문으로, 스페인 가르멜회원이자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영성에 대한 권위자이신 '페데리꼬 루이쓰' (Federico Ruiz) 신부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전집(全集)에 대한 총괄적 개관(槪觀)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은 ‘인격적인 통교’에 있어서 비상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저자(著者)의 살아있고 현실적인 영(靈)으로부터 유래하는데, 사실 당신 작품들 안에는 그분의 영(靈)이 살아 숨쉬고 있다. 오늘의 이 접촉은 옛날 책과 오늘의 독자 사이의 만남이라기보다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서 이루어진다. 마음으로부터의 이 대화 안에서 중요한 주제(主題)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곧 하느님· 인간· 실존(實存)· 사랑· 고통· 죽음, 그리고 영성생활 등이다.
바로 그런 주제들 안에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계시는 것이다. 성인은 돌아가신 후에 많은 영예들을 -신비가(神秘家)로서, 박사(博士)로서, 시인(詩人)· 성인(聖人)· 저술가(著述家)· 신학자(神學者)로서의 영예들을- 누리고 계신다. 사실 이런 칭호들은 정말 그분께 어울리는 것들이고, 많은 수고들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십자가의 요한 신부님 안에는 -그런 전통적인 칭호들이나 성인(聖人)이라는 칭호를 빌리지 않더라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아직 감추어져 알려지지 않은 어떤 독창성이 보인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관상적(觀想的)인 가르멜회원으로서, 온갖 다양한 일들을 다 하시고 때로는 글을 쓰기도 하시면서 당신 형제들 가운데에 계신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단순하고 선(善)하고 용감하고 분별있고 지성적이고 무엇보다 대단히 종교적인 그런 분이시다.
요한 성인의 작품들과 그분의 인격은 점진적인 긍정(肯定)이라는 동일한 길을 따라왔다. 역사는 그분의 작품들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 제기되었던 경망스런 열광들을 가라앉히면서 또 그분의 명성이 지나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무마시키면서, 그분의 작품들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해왔다. 그분의 중요한 칭호들 -최고의 서정시인· 교회박사· 신비신학자라는 칭호들-이 마침내 인정되기 시작한 바로 이 20세기에 우리가 살고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그 시대의 경험과 문화에 아주 밀접히 연관된 작품들로서 쓰여졌던 이 작품들은,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그분의 열망과 그분의 도식(圖式), 그분의 두려움들은, 이미 많은 부분이 오늘 우리의 그것들과는 같지가 않다. 이런 부분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작품들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다른 문화와 다른 경험들을 대면함으로써, 그분의 작품들은 성인(聖人)으로서 또 저술가(著述家)로서의 그분의 인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들을 더욱 부각시킨다. 세월의 흐름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듣는 데는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근원적인 이해는 오히려 쉽게 해준다. 말하자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작품들이 그 당시의 문화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은 차츰 사라지게 되고, 반면에 이 작품들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로부터 온 것들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 친히 독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첨부된 서문들은 성인의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성인과 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투명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서문들을 첨부한 목적은 용어 이해를 더 명확하게 하고 성인의 작품들의 구조와 그분의 사고(思考)의 흐름을 찾아내고, 삶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께 어떤 개념이나 느낌들을 빌려드린다든지 혹은 성인의 말씀에 무슨 장식을 덧붙이거나 모난 부분들을 깎아없애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셨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그대로일 뿐이다.1
1. 성인의 생애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신앙인(信仰人)이셨고 관상적(觀想的)인 분이셨다. 이 사실은 그분의 말씀과 저서들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그분의 작품들은 단순히 지성(知性)이나 감수성(感受性)의 산물(産物)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존재 전체에서 우러나온 열매이다. 그분의 삶에 주어진 전체적인 환경과 그 삶 자체의 흐름들을 알아야 함은 필수적인 것인데, 이는 그런 부분 그런 과정들 안에서 성소(聖召)가 주어졌고 그 성소로부터 그분의 체험과 사상(思想)이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분의 자서전(自敍傳)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외견상 해설적이고 교의적(敎義的)인 그분의 작품들은 그분의 개성과 그분의 체험의 비밀을 -의도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어떤 자서전(自敍傳)보다도 훨씬 더 충실하게- 간직하고 있고 우리에게 드러내보인다. 이렇게 드러나는 성인의 모습은,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더 완전해진다. 성인의 작품들과 함께 현대에 브루노(Bruno) 신부나 실베리오(Silverio) 신부나 크리소고노(Crisógono) 신부 등에 의해 훌륭하게 쓰여진 전기(傳記) 중 하나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분의 ‘외적(外的) 삶’이라는 틀은 다소 굴곡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그 외적(外的)인 삶 안에 어느 정도는 인지(認知)될 수 있는 어떤 ‘내적(內的) 성숙’의 과정이 새겨져 있다. 그분의 49년간의 생애는 다음과 같이 세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즉, 21년간의 세속에서의 생활, 5년간의 완화가르멜에서의 생활, 23년간의 개혁가르멜 혹은 맨발가르멜에서의 생활이다. 여기서 지리적(地理的) 자료들과 역사적(歷史的) 자료들을 통합해본다. 이름의 변화도 이 세 시기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뻬스의 요한 (Juan de Yepes); 세속에서 (1542-1563)
1542 아빌라(Ávila)의 폰띠베로스(Fontiveros). 직조공(織造工)들이었던 곤쌀로 데 예뻬스 (Gonzalo de Yepes)와 까딸리나 알바레쓰 (Catalina Alvarez) 사이에서, 세 아들 -프란씨스꼬(Francisco)· 루이스(Luis)· 후안(Juan)- 중의 막내로 태어남. 가정의 극심한 빈곤을 수년간 체험함. 아버지와 형 루이스(Luis)가 일찍 죽음.
48-51 3년간 어머니와 큰형 프란씨스꼬(Francisco)와 함께 아레발로(Arévalo)에서 살았음.
1551 바야돌리드(Valladolid)의 메디나 델 깜뽀 (Medina del Campo).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사함. 거기서 13년간 (51-64) 생활함. 전 생애에 걸쳐 한 곳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시기임. 이 시기에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첫째는 신심(信心), 즉 성당에서 보미사로서 봉사했음. 둘째는 병자(病者)들에 대한 사랑, 즉 병자들을 위해서 자선을 청하고 병원에서 보조원으로 일했음. 셋째는 인문과학(人文科學)에 대한 취미, 이로 인해 4년간 (59-63) 예수회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게 됨.
성 마티아의 요한 (Juan de Santo Matía); 완화가르멜에서 (1563-1568)
1563 메디나 델 깜뽀 (Medina del Campo)에서 가르멜수도원에 수련자로 들어감. ‘성 마티아의 요한 수사’ (fray Juan de Santo Matía)라는 이름을 받음. 자신의 관상적(觀想的) 성격과 마리아 신심의 계발로 인해 가르멜수도회로 이끌린 것임. 이듬해에 수도서원을 발함.
1564 살라망까(Salamanca). 여기서 4년간 철학과 신학을 공부함. 그 재능과 성성(聖性)으로 인해 가장 모범적인 학생으로 알려짐. 성 안드레아 신학원 (colegio de San Andrés)에서 살면서 살라망까 대학 (Universidad de Salamanca)에서 강의를 들었음.
67. 사제로 서품됨. 가르멜회에서의 환경과 관상적 체험을 살아가는 방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카르투시안(Cartuja) 수도회로 옮겨갈 것을 생각함.
같은 해 여름, 메디나(Medina)로 미사를 드리러 감. 거기서 데레사 수녀 (Santa Teresa)와 만남. 데레사 수녀는 당시 두 번째 개혁가르멜수녀원을 창설하기 위해 거기 있었음. 데레사가 그를 불러 자신의 계획들을 제시하고, 그를 가르멜개혁에로 초대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부탁함. 데레사는 가르멜수사들에게서도 개혁된 가르멜의 삶이 시작되기를 바랐음. 요한이 이를 수락함. 살라망까에서 자신의 마지막 신학과정 1년을 마침. 그동안 데레사는 필요한 준비들을 갖춤.
십자가의 요한 (Juan de la Cruz); 맨발가르멜에서 (1568-1591)
1568 두루엘로(Duruelo). 11월 28일에 두 명의 동료와 함께 가르멜수사들 중에서 데레사적으로 개혁된 수도생활을 시작함. 열렬한 기도와 보속의 생활과, 인근 마을들에서 적절한 사도직을 행함. 수련장을 역임함.
70. 6월에 만쎄라 데 아바호 (Mancera de Abajo)의 창설을 위해 이사함. 7월부터 9월까지 과달라하라(Guadalajara)의 빠스트라나(Pastrana)에서 수련자들을 지도함.
71. 4월에 알깔라 데 에나레스 신학원 (colegio de Alcalá de Henares)의 원장으로 임명됨. 개혁가르멜의 첫 번째 신학원이었음. 거기서 1년간 체류함.
1572 아빌라(Ávila). 데레사 수녀의 요구에 따라 엔까르나씨온(Encarnación) 수녀원의 고해신부로 옴. 데레사는 1571년부터 엔까르나씨온 수녀원의 원장이었음. 요한 신부는 처음으로 수녀들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함. 그 수녀들 가운데는 데레사 수녀도 포함됨. 체험과 지도방법에 있어서 성숙해짐. 그렇게 5년간을 계속함.
74. 세고비아(Segovia)의 개혁수녀원 창설에 데레사 수녀를 동행함.
76. 9월에 씨우닫 레알 (Ciudad Real)의 알모도바르(Almodóvar)에서 열린 개혁가르멜 총회에 참석함.
1577 똘레도(Toledo). 10월 2일 밤에 아빌라의 숙소로부터 완화가르멜 수사들에 의해 납치됨. 몇 일 만에 똘레도로 압송됨. 이는 완율가르멜회와 개혁파와의 사이에 생긴 권한에 대한 분쟁을 이유로 반역자로 판단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 혹독한 취급을 당하며 아주 좁고 격리된 구석진 다락방에 감금됨. 78년 8월까지의 이 9개월의 기간은 그에게 신비적이고 인간적이고 문학적인 성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줌. 이 감옥 안에서 그는 ‘로망스’들 (los Romances)과 ‘내 그 샘을 잘 아노니’ (la Fonte)와 ‘영혼의 노래’ 시(詩)를 씀.
1578 안달루씨아(Andalucía). 감옥에서 탈출한 후 안달루씨아로 옮겨감. 10월에 알모도바르(Almodóvar)에서 열린 개혁가르멜 총회에 참석함. 11월에 하엔(Jaén)의 엘 깔바리오 (El Calvario)에 원장으로 임명되어 도착함. 가까운 베아스(Beas) 수녀원의 가르멜수녀들을 도우기도 함.
79. 6월 14일에 바에싸(Baeza)에 개혁가르멜의 새 신학원 창설.
81. 3월에 알깔라(Alcalá) 총회에 참석. 그 총회에서 완율가르멜회와 개혁파의 분리에 대한 교황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됨. 제 3 평의원이 됨.
1582 그라나다(Granada). 로스 마르띠레스 (Los Mártires)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어 1월에 도착함. 6년간 많은 활동을 함 (수도원 통치, 여행, 저술). 수도원 신축과 확장. 까스띠야(Castilla)와 안달루씨아(Andalucía) 여러 곳을 여행함.
그라나다(Granada)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집필장소였음. 똘레도(Toledo)로부터 엘 깔바리오 (El Calvario)· 바에싸(Baeza)를 거치면서 요한 신부는 이미 집필한 시(詩)들과 충고의 말씀들, 단편들을 그라나다로 가져왔음. 그러나, 요한 신부가 몇몇 시(詩)들 뿐 아니라 네 권의 주해서들을 체계적으로 집필한 것은 그라나다에서였음.
85. 그라나다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는 2년 동안 안달루씨아 관구의 관구장을 역임했음.
87. 그라나다 관구장을 사임한 후 그는 로스 마르띠레스 (Los Mártires)의 원장으로 재선됨.
1588 세고비아(Segovia). 6월에 마드리드(Madrid)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맨발가르멜 총회가 소집됨. 요한 신부는 제 1 평의원으로 선출됨. 맨발가르멜회의 총본부는 세고비아에 있게 됨. 요한 신부는 세고비아 수도원의 원장직을 겸임함. 3년간 체류함.
이 기간 동안 요한 신부는 여행도 하지 않고 집필도 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수도회 통치와 수도원 건축, 그리고 영적 지도에만 전념했음. 90년부터 그라씨안(Gracián) 신부와 개혁가르멜 수녀들에 반대한 도리아(Doria) 신부의 일련의 조치들에 반대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남.
1591 총본부의 통치 문제에서 일어난 긴장관계들의 결말. 그의 지상생애의 결말.
6월에 마드리드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함. 모든 직책을 벗어나고 멕시코로 가기로 결정됨. 그러나 상황이 변화되고 그는 병(病)에 걸려 스페인에 남게 됨.
8월초에 하엔(Jaén)의 라 뻬뉴엘라 (La Peñuela) 은둔소로 옮겨감.
우베다(Úbeda). 치료가 필요한 병자로서 9월말에 우베다에 도착함. 병고(病苦)와 정신적 고통을 겪음. 12월 13일 밤 자정이 막 지난 무렵 (14일) 선종함.
선종 후에 받은 영예들
1593 유해를 세고비아로 옮김. 오늘까지 그곳에 안치되어 있음.
1618 그의 작품들이 처음으로 출판됨. (초판)
1675 1월 25일, 교황 끌레멘스(Clemente) 10세에 의해 시복됨.
1726 12월 27일, 교황 베네딕도(Benedicto) 13세에 의해 시성됨.
1926 8월 24일, 교황 비오(Pío) 11세에 의해 교회박사로 선포됨.
1952 3월 21일, 스페인 시인(詩人)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됨.
1993 3월 8일, 교황 요한 바오로 (Juan Pablo) 2세에 의해 스페인어권의 모든 시인(詩人)들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됨.
그분의 생애에 대한 묘사
한 증인은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도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묘사한다: “나는 십자가의 요한 수사신부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과 사귀었고 여러 번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은 평범한 체구에 얼굴은 무게있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었고 약간 거무스름하지만 인상이 좋았다. 그분의 몸가짐과 대화는 평온하고 대단히 영성적이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모든 이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분은 독특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남자나 여자나 그분과 사귄 모든 사람들은 더욱 영성적인 사람들이 되었고 경건하고 덕(德)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또 하느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그 맛을 깊이 느끼고 계신 분이셨다. 기도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털어놓는 모든 의심들에 대해서 그분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해주셨고, 당신께 상담을 청한 모든 이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기도생활에 있어서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분은 홀로 고요히 머물기를 좋아하셨고 말씀을 적게 하셨으며, 가끔 웃기는 하셨지만 매우 조심성있으셨다. 장상으로서 누구를 책망하실 때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엄격하면서도 부드럽게 형제적 사랑을 가지고 타이르셨고, 항상 감탄스러울 정도로 침착하고 진지하게 타이르셨다.2
이는 정확한 묘사이지만 너무 간결하다. 그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더 광범위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자료들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분의 특징적인 모습들에 대해 최근에 시도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다. 두드러지게 부족한 부분은 깊이있는 심리학적 연구에 의한 묘사이다.3
성인의 삶에 있어서의 과제는 긴밀하게 서로 연결된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단일화(單一化)되고 활성화(活性化)되어있다: 첫째는, 믿음과 사랑과 희망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나섬인데, 이는 그분의 실존(實存)의 총체적 의미였고, 그분이 체험한 위기들과 당신 자신의 성소(聖召)에 대한 결단의 이유였으며, 일상적인 삶 안에서 당신의 업무들을 추진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둘째는, 사랑 그 자체의 농축된 힘으로써 인간을 엄습하는 그런 ‘사랑의 체험’이었고, 이 체험이 그분을 어떤 선택 혹은 어떤 포기에로 이끌어간 그런 것이었는데, 이는 그분이 ‘밤’이라고 부르셨던 어떤 지엽적(枝葉的) 체험으로서의 금욕이나 절제를 실천해오신 결과라기보다는, 하느님을 애타게 찾으셨던, 혹은 이미 그분을 소유하셨던 결과였다. 셋째는, 그 사랑과 포기의 열매로서, 하느님께서는 흘러넘칠 정도로 성인에게 당신 자신을 통교해주셨고, 당신과의 일치의 열망들을 채워주셨고, 희생으로 바쳐진 듯 보였던 그분의 인간적 능력들을 더 풍요롭게 되돌려주신 것이다.4
2. 성인의 세계
성인과 관련된 어떤 날짜들이나 장소들· 활동들을 다시 헤아려보는 일은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하지가 못하다. 성인은 역사적인 흐름과 영성적인 흐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셨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사셨다 하더라도 더 뛰어난 분이 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께서 몸담고 사셨던 그 세계와 그분께 주어졌던 어떤 전체적인 환경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그분께 주어졌던 세계 혹은 여러 변수들의 총체와 여러 조건들과 여건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 인간 실존의 주변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둘째는, 개인적인 세계인데,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창안(創案)으로, 또 그 자신에게 주어진 주변환경의 수많은 요인들 중에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등급을 매김으로써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이다. 이는 자질을 갖춘 사람의 독창적인 창조물인데, 이것이 자기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자료들을 조직하고 통합하고 정돈해서 그 자신의 생애와 활동을 위해 쓸모있는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세계는 일련의 동심원(同心圓)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바깥쪽의 원(圓)에서 시작해서, 가장 내면적이고 그분의 인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가운데에까지 접근해보기로 하자. 이 가장 내면의 부분이야말로 다른 모든 요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이고, 여기에까지 도달하게 될 외부로부터의 동심원(同心圓)들의 연속이란 말하자면 그분께서 사셨던 세기(世紀), 가르멜수도회, 성서(聖書), 대단히 개인적인 체험 등이다. 성인의 작품들 안에서 그분이 몸담고 사셨던 그 주변환경이 반영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자료들을 전달해주는 어떤 작품이나 어떤 저자(著者)를 성인께서 인정하신 일도 드물고 우리가 그런 것을 판별해낼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 다른 저자들의 단편들은, 성인의 고유한 창작에 의한 부분들과 융화되어 당신 작품들 안에 온전히 동화(同化)되거나 재창작(再創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한 성인의 지평을 축소시키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보편성을 감소시키는 듯한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확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구체화’(具體化)란 뿌리를 내리는 것 혹은 생명을 부여하는 것을 뜻하고, 오로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대중을 위해서 일반적인 어떤 체험을 기록하는 그런 저술가(著述家)는 아무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열정을 잃어버린 절충주의(折衷主義)로는 결코 진정한 보편성에 도달하지 못한다. 진정한 보편성에 도달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존(實存)의 어떤 한 ‘형태’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내어드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는 그 주어진 삶을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가능성들과 그에 따른 모든 요구들의 핵심에 이르기까지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바루지 (J. Baruzi) 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인품과 작품들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개별성에 대해서 두 페이지의 훌륭한 글을 썼다.5 요한 성인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이셨으며, 가톨릭교회의 사상과 의지에 자신을 일치시키기를 열망하신 분이셨다. 그분은 가르멜회원이셨고, 당신 자신의 성소(聖召)에 심취된 분이셨다. 동시에 그분의 체험과 말씀은, 살아계신 진정한 하느님을 향한 갈증에 갈피를 잡지 못하던 모든 신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신자들 뿐 아니라 마음으로 자기 인간실존의 의미를 찾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달되었다.
종교적· 문화적인 환경
지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은 스페인에서, 16세기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16세기 후반에- 사셨던 분이시다. 이 시기는 스페인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창한 시기였고, 동시에 이런 번영이 가져다 준 온갖 비참함들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한 성인은 당신 작품들 안에서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 성녀 데레사의 경우에 나타나는 ‘성(城)’이나 ‘대장(大將)’ 처럼 예(例)로써 언급하신 적도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주변환경을 구성하는 강력한 요인이었고, 요한 성인도 역시 이런 환경을 당신 작품들 안에서 드러내셨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영성적 세계와의 교류는 더 명백히 나타난다. 당시의 이런 흐름들과 운동들은 성인께 일반적으로 혹은 어떤 개별적인 문제들에 있어서의 어떤 틀을 제공했다. 종교개혁과 반동종교개혁, 아랍인들의 정신적 유산(遺産), 아랍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남겨진 정신적 유산, 에라스모주의(erasmismo), 복음주의(evangelismo), 북부의 신비주의자들, 씨스네로스(Cisneros) 추기경(樞機卿)6에 의해 시작된 -후에 요한 성인께서도 가르멜회 안에서 실현하신- 수도회들의 개혁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조명주의자들(alumbrados)· 이단자들· 몽상가들의 오류들, 그리고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한 이단심문소(Inquisición)의 활동 등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될 수 있다.7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에 내포된 교의적(敎義的) 가르침의 핵심을 알아듣기 위해서, 영적인 저술 -특히 신비적(神秘的)인 저술-에 있어서 스페인 역사 안에서 생겨난 구분을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이는 시기적으로 네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단계는 입수와 번역의 시기로서, 중세기로부터 1500년까지, 둘째 단계는 동화(同化)와 완성의 시기로서, 1500년부터 1559년까지, 셋째 단계는 창조적 충만함의 시기, 위대한 저술가들과 독창적인 작품들의 시기로서, 1559년부터 1591년까지, 넷째 단계는 체험도 독창성도 없는 편집의 시기로서, 1591년부터 그 이후의 세기들이다.8
이 도식(圖式)에 따른다면, 신비박사 요한 성인은 완전히 스페인 영성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안에 계신다. 이 일치는 우선, 그 시기를 스페인 영성의 절정이 되게 한 것이 요한 성인의 인품과 그분의 뛰어난 작품들이었다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 세기의 스페인 영성의 일반적인 특징들 안에서 성인께서 당신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저술하시기에 적합한 어떤 환경을 만나셨다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 적합한 환경이란, 말하자면 깊은 영성생활, 묵상기도의 중요성,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성격, 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깊이와 뛰어난 문학적 표현력을 갖춘 신비가(神秘家)이셨던 성녀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르멜 성소(聖召)
성인은 자신의 성소(聖召)에 심취되셨고 그 성소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셨던 가르멜회원이셨다. 메디나 델 깜뽀 (Medina del Campo)에서 당신께 주어졌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가능성들 중에서 성인은 신중한 생각 끝에 가르멜 성소를 택하셨다. 살라망까(Salamanca)에서 신학공부를 끝내실 즈음에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셔야 했다. 그렇게 산만해진 가르멜 안에서 수도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카르투시안(Cartuja) 수도회로 옮겨가서 열정적인 관상(觀想) 생활을 찾을 것인가? 성녀 데레사와의 만남은 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고, 결국 당신께서 이미 몸담고 계신 그 가르멜수도회 안에서 더 열정적인 관상의 어떤 생활형태를 회복시키셨던 것이다.
완화가르멜 안에서 -적어도 회원들의 영적 양성에 이용된 책들 안에서- 성인은 풍요로운 관상적(觀想的) 유산(遺産)을 만나셨다. 그 첫째는 성서적(聖書的) 전통이다. 엘리아(Elías), 엘리사(Eliseo), 예언자들, 가르멜의 적막함, 사막 등. 그 외에 신약성서의 수많은 인물들도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건 없건 이들 모두는 성령(聖靈)의 감도를 받은 훌륭한 모범으로서 성인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교부(敎父)들과 중세기의 성인(聖人)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전통이 수도원의 환경을 통해서 또 더 분명하게는 영성서적들과 역사서들과 전례적 기도를 통해서 요한 성인께까지 전달되었던 것이다. 수도회를 개혁하실 때, 성인은 그 관상적 체험을 더욱 강화(强化)하려고 애쓰셨고, 매일의 일상적 삶 안에 그 체험을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고 애쓰셨다.9
요한 성인께 있어서는 데레사적 개혁이란 수도생활과 활동을 위한 이상적(理想的)인 환경을 의미했다. 요한 성인과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데레사 성녀는 요한 성인 안에서 대단히 성숙된 한 인간, 위대한 영(靈)을 가진 한 인간을 만나셨다. 성녀는 그분께 개혁에 따른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해 기본적인 몇 가지 가르침들을 주셨다. 그 기본적인 가르침들은 기도에 중심을 둔 삶, 그 기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둠’과 ‘극기’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소탈하고 꾸밈없는 사귐, 필요한 휴식의 방법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요한 성인은 개혁가르멜의 수사들· 수녀들 사이에서 삶의 강렬한 체험들을 주고받으시면서 최선의 사도직 수행을 이루어내셨다.
성녀 데레사와의 만남은 성인께 있어서 단지 개혁수도원 창설에 있어서의 협력만이 아니라 서로간에 어떤 영적 친교도 가능하게 했다. 메디나(Medina)에서 두 분은 처음 알게 되셨고, 후에 바야돌리드(Va- lladolid)에서는 두루엘로(Duruelo)의 개혁수도원을 위한 삶의 규범들을 함께 결정하셨다. 그러나, 두 분의 관계가 더욱 인격적인 통교(通交)가 되고 신비적 체험들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은 아빌라(Ávila)에서의 몇 년 동안의 일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두 영혼들이 함께 교회의 역사 안에서 한 몫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이후 여러 세기에 걸쳐 함께 활동해주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현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적 신비가(神秘家) 두 분이 시대와 장소와 그 성소(聖召)에 있어서 일치되셨다는 것은, 이 두 분에게 하느님께서 큰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聖書)
글로 기록된 성인의 작품들에 있어서 성서(聖書)는 끊임없는 명백한 원천이었다. 이 원천은 성인의 작품들 안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 사실은 다음의 숫자들이 분명히 말해준다. 성인의 작품들 안에는 도합 1,653회의 인용문이나 참조문들이 나오는데 1,160회는 구약성서에서, 그리고 493회는 신약성서에서 유래한다. 성인께서 다른 저자들을 매우 드물게 또 아주 짧게 인용하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실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10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 있어서 성서는, 구원의 역사이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영속적인 계약의 ‘틀’이라는 점에서, 당신께서 몸담고 사셨던 그 시대의 역사나 당신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만큼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 수많은 인용들은 기억력이나 지식에 대한 열망의 표현이 아니다. 이는 성서적(聖書的) 계시(啓示)라는 세계 안에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것이다. 성인은 성서의 사건들과 말씀들을 당신 자신의 고유한 체험의 자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셨고, 당신 자신의 고유한 체험은 곧 성서의 그 사건들과 말씀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 고통스런 순간들 안에서는 성인은 마치 다른 많은 증인들처럼 행동하셨는데, 다윗· 욥· 바울로,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건’이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같은 기쁨과 같은 아픔들을 체험하셨던 것이다. 성인은 성서를 머리로 또 마음으로 잘 알고 계셨다.
교회(敎會) 역시 성인은 언제나 성서의 빛 안에서 바라보셨는데, 이는 비추임을 받은 존재인 동시에 다른 이들을 비추어주는 그런 존재였다. 성인의 모든 작품들의 서문들은 이 불가분한 연관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교회는 성서를 자신에게 맡겨진 무엇으로 받아들여왔다. 요한 성인은 바로 그 교회로부터 진리에 대한 해석을 기대하셨고, 당신 자신의 고유한 사상이나 어떤 성서적 반성들 안에서 당신께서 범하실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한 교정을 교회로부터 기대하셨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는 이 신비박사께 있어서, 마치 성서 말씀 뿐 아니라 계시(啓示)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자체가 당신께 안전하게 전달되게 해주는 ‘강의 뚝’(河床)과도 같은 것이었다. (산길 서문 2; 산길 2,22,7).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가르침의 정통성’을 위한 조심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몇몇 저자들이 이 조심성을 그분의 영혼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 혹은 많은 것들을 하나로 묶는 밧줄과도 같이 해석한 것은, 그들이 성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성인은 이런 것을 주관적인 좁은 소견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느끼셨고, 있을 법한 어떤 독단성(獨斷性)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느끼셨다. ‘성서와 함께’ 생각하고 ‘교회와 함께’ 생각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신비나 피조물들의 신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에 대한 깨달음을 앞당겨주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그 여정(旅程)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개인적 세계
성인께서 사셨고 그분의 작품들이 흘러다녔던 그 개인적인 세계의 비밀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요인이나 외적 환경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한 인간으로서, 성인(聖人)으로서, 저술가(著述家)로서, 그분은 현격(懸隔)한 개성(個性)을 가지고 계셨다. 이는 종국적으로, 신비스러운 은총과 특별한 자질을 갖춘 그분의 본성으로 이루어진, 지극히 개인적인 그분의 소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분의 작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사셨던 그 환경을 알아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수많은 대조들과 문제점들로 가득찬 그분의 작품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개인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더 긴급한 이런 상황에 합당하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깥에서만 바라보는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반면에,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바라볼 때는 그런 문제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개인적인 세계를 특징짓는 몇몇 양상들을 다섯 가지 모습으로 요약해보겠다:
1) 삶의 모습: 무엇보다 먼저 이것이, 이 말 자체가 가진 깊고 총체적인 의미 안에서, 존재의 양상이고 삶의 양상이다. 이것은 자연적 삶과 초자연적 삶, 자연의 법칙에 따른 존재와 은총의 선물에 따른 존재를 구별한다. 그러나, 성인의 세계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삶이 모두 그분께 맡겨져 있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들 다양한 범주들이 이 삶을 구성하는데, 말하자면 동물적인 삶, 거룩한 삶, 지상적 삶, 영광스러운 삶, 욕구를 따르는 삶, 사랑의 일치를 이룬 삶 등등이다. 성인은 학문으로부터나 존재 자체에 약간의 종교적 관심을 섞어서 어떤 세계를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의도는 내적(內的)이고 외적(外的)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삶 전체’를 최상(最上)의 현실 안에 놓으려고 하셨고, 이 최상의 현실이란 곧 ‘하느님과의 친교’이다.
2) 인격적인 모습, 서로 관계를 가지는 모습: 요한 성인이 사셨고 발견해내신 그 세계는 대단히 인격화(人格化)된 세계였다. 그 최전면(最前面)에 위격적 존재들이 위치하는데, 이는 곧 하느님· 그리스도· 인간이고, 이 존재들은 모든 행위와 모든 관심들을 자신들을 향해 집중시키고 있다. 하느님과 인간은 -대조(對照)를 혹은 조화(調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 대하려고 끊임없이 상대를 찾아나선다. 그분의 저서들은 ‘인격’들과 그들이 가지는 ‘관계’들을 더 확실히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진정한 엑스(X)선 사진이 되는 셈인데, 다른 모든 것은 희미한 그림자로 혹은 아득히 멀리 보이는 배경(背景)으로 남게 된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오로지 인간과 하느님과의 온전한 일치에 재빠르게 도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인격들의 탁월함에 온전히 종속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3) 대신덕적(對神德的)인 모습: 그분의 삶은 단순히 내적(內的)인 삶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삶이었다. 거룩한 행위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양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 만큼 심리학적인 많은 요인들이 그 안에 개재(介在)된다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누구보다 먼저 활동하시고 이 관계들에 힘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豫定)· 창조(創造)· 구원(救援)· 인격적 부르심· 변모(變貌)시키심· 일치시키심· 영광스럽게 하심-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聖靈)께서 하시는 일인데, 사실 성령이야말로 이런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主體)이시다. 이런 과정은 그 원점(原點)에서부터 이미 신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요한 성인은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시는데, 이는 당신 자신의 신비적 체험이 덧붙여진 때문이다. 자기 영성생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인간은 즉시 제 자신의 성장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나아감은 맹인(盲人)처럼 하느님의 손길에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4) 영적(靈的)인 모습: 이것은 가장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간과(看過)될 수도 없는 점이다. 인간을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聖靈)이시다. 그러나, 그 특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이미 ‘대신덕적(對神德的)인 모습’을 언급할 때 확인된 것이다. 여기서 ‘영적’(靈的)이라 함은 인간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 있어서 감각과 영(靈) 사이에 존재하는 그 집요한 구분에 관계된 것이다. ‘감각’과 ‘영’(靈), 이 두 가지는 각각 온전한 인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둘은 그 존재와 완전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차원에서 움직여진다. 이 ‘거룩함’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영(靈)에 따라 살아가고 영(靈)에 따라 활동하기에 다다라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제 자신의 감성(感性)으로부터가 아니고 제 인간존재의 깊은 내면(內面)으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 당신 작품들 안에서 우리와 대면시키실 그 현실들과 체험들을 감각의 기준에서 -즉 유용성· 만족감· 맛,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줄 어떤 평온함 따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전혀 아무 것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비교적 더 훌륭한 신적(神的) 보화들이나 인간의 더 소중한 걸작품(傑作品)들은 종종, 인간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어려움들을 감수(甘受)해내는 그런 순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5) 역동적(力動的)인 모습: 이 마지막 특징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후에 ‘일치의 길’에 대해 언급할 때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모든 작품들은 펼쳐진 삶의 역사 혹은 펼쳐진 삶의 계획으로서 제시된다. 어느 한 작품도 어떤 고착(固着)된 주제(主題)에 대한 교의적(敎義的)인 논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움직임’이라는 인상은 -마치 여러 단계의 ‘밤’들이 그러하듯이- 이 움직임이 더욱 가속되고 현기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영성생활의 여러 ‘단계들’을 성인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실을 통해 더 분명해진다. 각각의 단계들은 가능한 한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간단히 설명한다.
3. 저자(著者)와 그분의 작품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생애와 활동에 있어서 저술가(著述家)로서의 일은 상당히 이차적이고 주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을 그분의 작품들을 통해서만 바라봄으로써 우리 모두는 좀 직업적인 저술가(著述家)의 사고방식에로 물러나 있었다. 그 감탄할 만한 예술적 완전함과 놀랄 만한 교의적 일관성을 갖춘 성인의 작품들은 그분의 성소에 의한 거의 필연적인 열매이자 그 강렬한 자기성화(自己聖化)의 열매인 듯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각(視覺)을 바꾸어 요한 성인의 작품들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는, 그 삶 안에서 저술(著述)이라는 것은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일이었음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우리에게 그분의 작품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내보이는데, 그분의 작품은 간결하고 우연한 기회에 나온 것이지만 스페인어권의 서정시(敍情詩)에 있어서나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 있어서의 최고의 작품인 것이다.”11
그분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치(價値)들의 척도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간다: 1) 수도자로서의 삶. 여기는 그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즉, 신심생활, 공동체생활, 건축공사나 청소 따위의 모든 육체노동들-이 다 포함된다. 2) 수도회 통치와 양성에 관련된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은 성인의 생애 거의 전체에 걸쳐서 그분께 맡겨진 일들이었다. 3)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영적 지도. 이는 가르멜회원들 뿐 아니라 재속 신자들도 그 대상이 되었다. 4) 마지막으로 저술(著述). 이는 그분께 시간과 힘이 남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을 그분의 작품들로만 평가하는 사람은, 놀라고 아마 상당히 실망할 것이다. 성인은 여러 달 동안, 재능이 적은 다른 어떤 수사라도 할 수 있었을 ‘미장이’ 일을 계속하셨다. 매 주간 상당한 시간들을, 교리는 거의 모르는 신심깊은 어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치셨다. 반면에, 일반적인 가치를 가진 중요한 저서들을 미완성인 채 혹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셨다. 요한 성인에게 이런 활동들의 어떤 선후관계를 따르게 한 것은 ‘순명서원’이 아니었다. 그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 사실은 성인 자신도 당신을 저술가(著述家)로 우선평가(優先評價)하지 않으셨음을 잘 말해준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매일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이었다. 그리고 당신께서 당면하신 책임들이었고, 당신의 삶 안에서 만나시게 된 모든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었다. 당신 사후(死後)의 명성 따위는 생각하지 않으셨다. 성인은 글쓰기를 늦게 시작하셨고, 토막시간들을 이용해서 글을 쓰셨고, 불과 몇 년만에 끝마치셨다. 그분의 작품들은 1578년부터 1586년까지의 기간에, 성인께서 36세 되셨을 때부터 44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쓰여졌다.
저술에 대한 성인의 충동은 똘레도(Toledo)의 감옥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열정의 폭발이었고, -여러 편의 ‘로망스’들· ‘영혼의 노래’· ‘내 그 샘을 잘 아노니’ 등 사랑의 노래로 탈바꿈된- 억제된 눈물의 터짐이었다. 스페인 시(詩) 중에서 최고의 작품인 그분의 시(詩)는 애숭이 시인(詩人)의 첫 번째 습작(習作)이었고 어떤 개작(改作)의 흔적조차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분의 시(詩)들은 마음에서 자연스레 흘러넘친 것이었다. 소품들과 주해서들은 다른 이들의 요구에 따라 쓰여졌다.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의 장상들이 아니었으므로, 순명을 요구하는 데레사적 수도회 통치 계통이 그분께 그런 일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분의 작품들은 마치 순명을 요하는 수도회 장상의 명령만큼이나 효력을 발휘하는 어떤 요구를 만났던 것이다. 그것은 우정의 끈덕진 간청이었다. 또 한편으로 이런 간청들은, 성인께서 이미 여러 번 확인하셨던 현실 -수많은 사람들의 일탈(逸脫)과 확실하고 본질적인 가르침을 필요로 했던 많은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 성인께서 소신(所信)을 굳히실 수 있도록 했다.
그분은 이미, 비록 당신 자신의 미래의 문학적인 활동을 고려해서 준비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바탕을 열심히 닦아놓으셨다. 메디나(Medina)와 살라망까(Salamanca)에서 인문학과 철학· 신학의 과정을 모두 마치셨고, 알깔라(Alcalá)와 바에싸(Baeza)에서 계속 신학원에서 사셨고, 성서(聖書)를 계속 연구하고 계셨던 것이다. 게다가 그분은 수많은 훌륭한 영혼들과의 친교를 누리고 계셨고, 살라망까· 아빌라(Ávila)· 그라나다(Granada)· 세고비아(Segovia)에서 머무르셨던 오랜 기간 동안에 자연(自然)과 예술과도 접촉을 가져오셨던 것이다.
작품들
글로 기록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은 간결하다. 아주 적게 기록하셨고, 그나마 중요한 당신 작품들 중 세 편의 작품들은 마무리를 짓지도 않고 그냥 두셨다. 이 간결함의 주된 동기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가르멜에서의 당신 소명의 다른 많은 봉사들과 활동들에 더 중점을 두셨다는 점이고, 둘째는, 당신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이다. 그분의 작품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I. 소품들
1. 시집(詩集) (Poesía): 두 편의 ‘로망스’, 다섯 편의 시(詩), 다섯 편의 주해(註解)들.
2. 빛과 사랑의 말씀 (Dichos de luz y amor): 200여편. 절반 가량이 친필로 남아있음.
3. 경계의 말씀 (Cautelas)과 네 편의 충고말씀들(Avisos): 수도공동체생활을 위한 규범들.
4. 서간집(書簡集) (Epistolario): 33편 정도의 편지들. 어떤 것들은 단편들임.
II. 저서들
5. 가르멜의 산길 (Subida del Monte Carmelo): 3권. 각 권은 15; 32; 45장으로 구성됨.
6. 어둔 밤 (Noche oscura): 2권. 각 14장, 25장으로 구성됨.
7. 영혼의 노래 (Cántico espiritual): (첫째 판과 둘째 판). 각 39절 40절로 구성되고, 각 절에 대 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음.
8. 사랑의 산 불꽃 (Llama de amor viva): (첫째 판과 둘째 판). 4절. 각 절들에 대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음.
여기서 각 작품들의 구조를 분석하지는 않더라도, 독자의 관심을 끄는 사실이 있다. 첫 번째 부류에서, 우리는 시(詩)들과 산문으로 쓰인 짧은 소품들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부류의 저서들은 모두 저자(著者)에 의해 엄밀하게 해설된 시(詩)들이다. 시(詩)들도 산문들도 성인께서 좋아하셨던 것이고 같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가꾸셨던 것이고, 서로 밀접하게 교감(交感)된 것이다. 서로 대치되거나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 교감(交感)을 통해 우리는 저자(著者)이신 요한 성인께서 양(兩) 부류의 작품들 안에서 갖고 계신 천성적 재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부류의 작품들이 동일한 동기(動機)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시(詩)와 그에 대한 해설은 아주 긴 어떤 내적(內的)인 과정의 양쪽 극단(極端)인데, 이 내적인 과정은 하느님의 생명에 대한 체험 그 자체로부터 나와서 독자(讀者) 편에서의 이해(理解)에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상징적인 시(詩)는 그 체험 자체를 문제삼으시는 것이고, 해설은 독자에게 건네주시는 것이다. 이 양극단(兩極端) 사이에서 우리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상, 그분의 영감(靈感) 또는 그런 연결점을 만들어주시려는 성인의 문학적인 노력을 만날 수 있다.
작품들의 배열
이번 판(版)에서 독자(讀者)는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정돈된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앞서 언급된 두 번째 부류의 저서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각 작품은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도에 의해 저술되었고, 어떤 우발적 동기(動機) 혹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쓰여졌다. 네 권의 저서들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이고 일원적(一元的)인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네 권의 저서들은 상호보완적인 책들이 되었고, 이 네 권의 책들 전부를 통해서 성인께서 사실상 영적(靈的) 여정(旅程) 전체를 설명하신 것이 되었다. 다만, 이 저서들에 있어서 -하나가 끝나는 곳에서 다른 하나가 시작되듯이 그런- 어떤 연속적인 연결점들을 통해 수평적 도면(圖面) 위에서 상호보완성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에로 이리저리 옮겨다녀야만 하는데, 각 도면은 그 자체의 고유한 전망 안에서 완전한 것이다. ‘어둔 밤’은 ‘가르멜의 산길’이 끝나기 전에 시작되고, ‘영혼의 노래’의 상당한 부분은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이 아직도 다루는 같은 부분을 펼쳐나간다. 각 저서들의 독립성(獨立性)과 독자성(獨自性)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권의 저서들 사이에는 내적(內的) 질서가 존재한다. 이 질서는 저자 요한 성인께서 아주 좋아하셨던 것이다. 이 저서들 안에는 지속적인 연관성이 있다: ‘가르멜의 산길’은 ‘어둔 밤’을 참조하고, ‘어둔 밤’은 ‘가르멜의 산길을, ’영혼의 노래‘는 ’사랑의 산 불꽃‘을, ’사랑의 산 불꽃‘은 ’영혼의 노래‘와 ’어둔 밤‘을 자주 참조한다. 체험과 조직적인 사고(思考)로부터 유래된 어떤 동일한 충동이 이 네 권의 저서 모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점들을 보자면,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 사이에, 또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 사이에, 요한 성인께서 친히 확인해주시는 두 가지 연결점이 있다. 첫째 연결점은 사실 연속적인 것은 아니고, ‘능동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인데, 이 둘은 어떤 동일한 정화(淨化)에 이르기 위해서 둘다 필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설사 ‘수동적 밤’이 ‘능동적 밤’이 끝나기 전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이들 저서들이 하나가 다른 하나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다.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은 거의 연속적인 연관성(聯關性)을 유지하고 있다. 즉 ‘사랑의 산 불꽃’은 ‘영혼의 노래’가 끝나는 거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이 네 작품들 전체의 잘 어울어진 성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 -가장 어렵고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 이는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이라는 한 덩어리와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이라는 또다른 덩어리가 어디에서 연결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영혼의 노래’가 시작되는 점이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과 연관지어 볼 때 도대체 어디쯤에 위치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영혼의 노래’의 처음 몇몇 노래의 부분은 ‘초심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초심자’란 ‘가르멜의 산길’에서 말하는 ‘초심자’와 같은 영적 단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혼의 노래’에 대한 개관(槪觀)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12
성인의 저서 네 권 각각에 대해서 그 각 저서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배경이 어떤 것이며 또 각 저서의 특유한 주제와 이 네 권 저서들의 공통적인 주제를 펼쳐나가는 방식에 이 독특한 배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예를 들자면, ‘영혼의 노래’는 비록 같은 엄격함으로 ‘포기’에 대해 다루고 있기는 하나, ‘가르멜의 산길’과는 다른 어조(語調)를 사용하고 있다. ‘가르멜의 산길’은 하느님과의 일치에로 향해진 소명과 인간 전존재(全存在)의 무조건적인 ‘내어드림’을 다룬다. ‘어둔 밤’은 인간의 내면에서 또 인간 자신이 분명히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삶’으로써 실천되는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다룬다. ‘영혼의 노래’는 사랑의 삶으로써 실천되는 온전한 실존(實存)을 다룬다. ‘사랑의 산 불꽃’은 사랑의 충만함과 ‘영광스럽게 됨’의 시작을 다룬다.
독서의 순서
예로부터 십자가의 요한 성인 전집이 출판될 때마다, 편집자들은 성인의 작품들을 합당하게 배열하려고 애써왔다.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그 기준들은 연대순(年代順)· 교의적 내용· 교육적 의도(意圖) 등이었다. 연대순 배열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 그리고 ‘영혼의 노래’는 사실 동시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맨먼저 마무리된 작품이 ‘영혼의 노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많은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작품들의 교의적 내용들을 고려해서, ‘가르멜의 산길’을 전집 첫 부분에 놓았는데, 이 작품은 초심자들에 대해서 더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어떤 편집자들은, 교육적인 의도에서, 독자들의 성인과의 첫 접촉에서 ‘가르멜의 산길’의 엄격함을 피할 수 있도록 ‘소품들’이나 ‘영혼의 노래’를 앞에 놓기를 원하기도 했다.
이번 판(版)에서는, 우리는 앞서 언급한 방식들 중에서 첫 번째 방식으로 작품들의 순서를 잡았다. 이는 연대순(年代順)으로도 적합하고, 또 교육적인 요청에도 부합되고, 또 교의적인 논리전개를 따른 것이다.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성인의 ‘소품들’은 그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개성(個性)과 그분의 작품들의 다양한 모습들 -시인(詩人)으로서, 신비가(神秘家)로서, 고행자(苦行者)로서, 또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여러 작품들을 다 고려할 때에, 영적 진보의 단계들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뽑아서 주제별로 읽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혹은 어떤 서로 다른 문제점들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들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13
시(詩)와 그에 대한 해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저서를 읽기에는, 적합한 독서의 방법이란 반복‧순환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시(詩)들을 한 번 읽는 것은, 합당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아주 쓸모있는 일이다. 합당한 분위기란, 시적(詩的)인 분위기, 혹은 -혹 필요하다면- 신비적인 분위기를 의미하는데, 신비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럽다는 의미, 초월적 존재에 관한 의미14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 분명하지 못한 것이고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예견된 그런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분위기에 이미 들어선 다음에 독자는 시(詩)의 해설에 접근하게 된다. 이 해설은 시(詩)의 한 절 한 절에 첨부된 것이다. 그러나, 교의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해설은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고, 시(詩)의 해당 구절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심오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시(詩)가 가지는 기능은 단순히 그 해설 부분에 해당되는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것 뿐이다.”15 해설 부분을 다 읽은 후에 다시 시(詩)를 읽으면, 독자는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의미들을 더 깊이 알아듣게 될 것이다.
4. 일치의 길
성인의 체험을 직접 반영하고 다른 네 권의 저서들에 바탕을 제공하는 성인의 시(詩)들 전부는, 어떤 억제할 수 없는 삶의 활기(活氣)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 ‘어둠캄캄한 밤중에 사랑에 타 할딱이며 ··· 나왔노라’ (밤), ‘그대 뒤쫓아 외치며 나왔더니···’ (노래), ‘사랑의 산 불꽃이여’ (불꽃). 최초의 이 율동적 흐름은 당신 작품 전체에 걸쳐 점점 강하게 나타난다. 하느님께서는 때로는 드러나게 또 때로는 비밀스럽게 당신 능력으로 힘차게 활동하시고, 인간은 자신의 열망과 능력의 극한(極限)에까지 움직여지게 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세계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인격적이고 생동적이다. 그분의 표현은 어떤 ‘완성된 삶’의 ‘묘사’로서 나타난다. 그분의 작품 안에는 그 전체 여정(旅程)을 달려나가는 주인공인 한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나아감’에 맞추어서 성인은 -하느님의 선물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또 어디에서 그것을 얻어만날 수 있고 도대체 영혼이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르침을 주신다. 여기서는 어떤 주제들 -말하자면 활동하는 하느님의 은총인 그 불타는 사랑이나, 악마와 파괴라는 모습을 지닌 죄(罪) 그 자체인 욕(慾)들 따위-보다는, 살아있는 인격들 -말하자면 하느님, 그리스도, 인간, 그리고 살아있는 현실들 따위-를 다루신다. 이 내적(內的)인 움직임은 신비박사이신 성인의 작품에 특유한 맛을 제공한다. 이것은 신학적 논술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영성(靈性)이라는 것에 대해 단순히 묘사만 하는 그런 책들과 비슷하지도 않다.
성인께서는 역동성(力動性)과 조직성(組織性), 사상(思想)과 감수성(感受性)을 특유하게 섞어놓으셨다. 성인의 작품들은 시적(詩的)이고 예민한 감수성이 흘러넘치면서도, 그 구조의 엄밀함에 있어서나 내용의 심오함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는 작품들이다. 당신 작품들 안에서의 움직임에 대한 묘사는 외견상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임의적인 것은 아니다. 성인께서는 영혼이 달려나갈 그 여정(旅程) 전체를 다 훑어보시고 그 마지막 결과까지를 다 확인하신 후에 시(詩)와 그 해설을 쓰셨다. 그리고 각각의 새로운 상황들 안에서 이미 지나온 이전 단계들을 평가하셨다. 예를 들자면, 당신 자신께서도 ‘어둔 밤’의 시(詩)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도달한 이후에 노래한 것임을 잘 알고 계셨다. (밤 서문). 각각의 특별한 주제들에 대한 설명 안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전체’에 대해서 성인은 조직적인 시각(視覺)을 가지고 계셨다. 말하자면, ‘가르멜의 산길’ 안에서 정화(淨化)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일치’에 대한 개념들을 미리 내다보셨고, ‘사랑의 산 불꽃’ 안에서 ‘일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어둔 밤’의 개념들과 체험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계셨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이미 언급했고 또 앞으로도 언급하게 될 그 ‘참조’ -동일한 책 자체에 대한 참조-가 당신의 산문들 안에 그렇게 많이 반복되는 것이다.
‘삶’과 ‘조직’이라는 서로 다른 것을 미묘하게 혼합하시면서, 성인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범주(範疇)를 얻어내려고 애쓰셨다: 첫째로, 성인은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한 길을 강요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다. “하느님께서는 각 영혼을 그의 고유한 길을 통해서 이끄신다. 그래서 그 실행방법에 있어서 다른 길과 절반쯤 일치되는 한 길을 찾아내기도 대단히 어렵다.” (불꽃 3,59). 둘째로, 각 단계들을 묘사하실 때에는 성인께서는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모든 영혼들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각 영혼들이 자신에게 일치되는 어떤 것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그분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이다. (노래 14-15,2). 또 어떤 단계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적은 것만을 말씀하셨고, 독자들이 각자 자신의 고유한 방식들을 덧붙일 수 있도록 내버려두셨다. (노래 서문 2).
하느님과의 일치
이 길은 하느님과의 사랑의 일치로 특징지워져 있고, 그 사랑의 일치가 이 길을 걷는 영혼들에게 처음부터 힘을 준다. 매서운 요구와 함께 언제나 이 ‘사랑의 일치’에 대한 표현 혹은 이와 상응하는 어떤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 사랑의 일치야말로 이 길에서의 모든 움직임들의 목표이고 중심축(中心軸)이고 원동력이다. 또한 이것은 체험에 있어서나 그 조직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은 이 일치의 주변을 맴돌게 되고, 모든 것은 이 일치를 통해서 설명된다.
하느님과의 일치, 성삼위(聖三位)와 하나가 된다는 이 이념은 신약성서 안에서, 특별히 복음사가 성 요한 안에서 발견된다. 신비박사께서는 요한복음 17장 ‘일치의 기도’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셨고,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시면서 자주 반복해 말씀하셨다. 이 일치의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敎父)들과 신학자들도 언급한 바 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에 이르러서 새로워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인께서 이 일치의 기도를 그리스도교적 생활 전체의 중심으로 -그 마지막 부분까지, 또 그 삶의 신비적이고 가장 충만한 실현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그런 전체의 중심으로- 이 기도를 변화시키시면서, 이 가르침과 체험을 강조하셨다는 점이다. (노래 39).
일치를 목표이자 영적 여정(旅程)의 종착점으로 그렇게 강조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혼동의 가능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인데, 이 ‘혼동’이란 말하자면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이 ‘목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어떤 종착점으로, 그러니까 그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냥 단순히 기다림의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사실은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 ‘일치’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전체의 목표인 것이다. 이는 마치 우정과도 같은 것인데, 우정은 사랑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목표가 되는 것이다. 우정은 우정 그 자체를 준비하면서 혹은 그 우정 자체에로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우정으로서 실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우정을 키워나가면서 마침내 진정한 우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의 일치는 그 일치를 실천해나가는 전체 과정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일치의 ‘완전한 실현’ 혹은 ‘사랑의 동등함’이라는 것은 가장 높이 올려진 어느 한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노래 38).
이 일치의 의미와 내용은 대단히 깊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의 작품들의 모든 내용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단순한 한 마디 말 안에 응축된 것이 때문이다. 몇 마디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인격적으로 통교(通交)하시고 인간을 변모시키시고 인간을 당신의 거룩한 생명 안으로 이끌어들이시는 분은 삼위일체(三位一體)이신 하느님이시다. ‘사랑의 산 불꽃’의 다음 말씀은 부분적인 해명으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셔서 그 사람 안에 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 14,23). 이는 곧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살게 하시면서 이루어질 그런 일이었다.” (불꽃 서문 2).
이는 윤리적이고 심리학적인 모든 측면들을 다 함축하는 것이다. (노래 28). 또한 이것은 인간의 능력들과 인간 존재 그 자체의 모든 활동들과 작용들을 내재화(內在化)시키고 정화(淨化)시키는 어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산길 2,5). 우리가 ‘일치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그 안에 내포(內包)된 중요한 내용 때문에, 동시에 ‘변모(變貌)의 과정’· ‘정화(淨化)의 과정’· ‘내재화(內在化)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치’라는 말은 종종 그 말 자체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표현 안에서는 ‘일치’라는 것이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일치’는 성인의 작품 전체 안에서, 개개 작품들의 개별적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작품들의 구성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체험의 핵심이다. 어떤 때에는 하느님께서 초월적인 분으로 나타나시고, 또 어떤 때에는 더 우리에게 가까우신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께서 중심이시고, 그분께서 주된 동인(動因)이시다. 또한 인간적인 일들에 있어서 역시, -믿음이나 포기에 대한 경우조차도- 우세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닮음’을 완성시키고 일치를 실현시키는 종착점이다. 동시에 사랑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 길의 출발점에서부터 사랑은 이미 존재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사상(思想)을 종합하는 일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의 사상이 왜곡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살라망까(Salamanca)에서 훌륭하게 학업을 마치신 그분의 지성적(知性的) 요인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목표를 응시함에 있어서나 수단들을 선별함에 있어서나 ‘사랑’의 탁월함을 재강조해야 한다.”16 ‘욕(慾)들의 분산(分散)’에 반대하는 성인의 끊임없는 투쟁은, 그분께서 바로 그 ‘욕들의 분산’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가장 해로운 적수(敵手)를 보셨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대신덕적(對神德的) 삶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 제시하시는 그 구조 속에서 사랑의 힘은, 그분의 말씀들이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랑으로부터 싹터나와 살아숨쉬는 역동적인 여러 요소들의 총합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적 실존 전체는, 그 길이에 있어서나 넓이에 있어서나 온전히 모든 부분이 이 ‘일치’로 흠뻑 스며져 있고, 그 자체가 대신덕적(對神德的) 삶으로 변화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가르침 안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종합하는 범주(範疇)가 바로 이것이다. 가능한 한 이것을 빨리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가지 요소가 대신덕적(對神德的) 삶을 구성하는데,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사랑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일치; 이것은 모든 것의 목적이자 이유이다. 2) 믿음을 통해서, 또 사랑과 희망을 통해서; 이것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수단들인데, 다른 모든 수단 방법들은 다 이것들에 종속되는 것이다. 3) 인격의 총체 안에서; 말하자면 이는 인간의 심리상태나 존재 자체나 그의 역사적 환경 따위 모든 것을 다 내포하는 것이다. 4) 넉넉한 자아포기(自我抛棄)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자아포기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요소들의 의미와 그 깊이를 다 상세히 펼쳐놓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중요성과 상호의존성은 성인의 작품들 중 어느 하나라도 읽은 독자에게는 이미 명백한 것이다. 첫 번째 요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 단락에서 이미 지적했다: 모든 것은 ‘일치’에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직접적인 일치’에로 향해 집중된다. 이 ‘일치’는 본성의 선물도 아니고 이미 주어진 어떤 것도 아니다. 우리가 실현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수단들을 요구하는데, 이 수단들은 ‘일치’를 실현시킬 때에 어떤 강렬한 포기라는 결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역설(逆說)의 연속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신비박사이신 요한 성인에 의해 대단히 단순하고 일관성있는 어떤 구조 안에 이미 통합되어 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마치 영적(靈的)인 기질(氣質)처럼, 하느님과의 일치를 다루는 그분의 방법에 있어서 ‘직접적인 성향(性向)’을 드러내보이신다. 어떤 경우에는 성인의 이런 성향은 당신 자신으로 하여금 마지막 목표에로 직접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물들이나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늘 그러는 것은 아니다. 성인의 이런 ‘직접적인 성향’은, 당신 가르침의 구조 안에서 수단들과 그것들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것들을 투명하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심으로써, 충분히 보상되어 있다.
‘수단’의 개념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육화(肉化)된 구원경륜(救援經綸)’에 어울리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啓示)하시기 위해 이용하기 원하셨던 저 모든 현실들· 인간들· 사건들이 바로 ‘수단’들이다. 그 결과로서, 그 모든 것들은 또한 하느님과의 통교를 위해 인간에게도 쓸모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모든 수단들은 부분적으로는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진보(進步)에 따라 인간에게 내맡겨진 것들이다.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의 역사나 그의 삶의 어떤 단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수단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 그 때에는 이미 그 수단들은 수단이기를 그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그 사람 자신도 그만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때가 바로 선택의 시기이다. 그 수단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은 여러 번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말하자면 그 수단들은 절대화(絶對化)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든 간에 한 목적을 위한 수단들일 뿐인 것이다. 즉 모든 것은 두 인격적 존재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좋고 필요한 것인 것처럼···, 수단일 뿐인 것을 수단 이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만큼이나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는 것이다.” (산길 3,15,2).
‘가르멜의 산길’ 서문(序文)에서 구체적으로 그 수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 그 ‘일치’ 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사랑· 희망 등 수단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바로 이런 수단들이 어떻게 포기(抛棄)를 이끌어내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될 것이다.17
기본적인 도식(圖式)
일치와 대신덕적 삶은, 오르내림과 외견상 뒷걸음질로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가득찬 느리고 점진적인 어떤 실현과정에 내맡겨져 있다. ‘찾음’의 길 -혹은 등반의 길, 밤의 길, 일치의 길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길-은 쓸모없고 부담스러운 그런 한가함이 아니다. 그 길은 자유(自由)를 훈련하기 위해 은총에 의해 또 교회와 역사에 의해 잘 다듬어진 그런 필요한 시간이다. 성인께서는 -당신의 그 ‘직접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건너뜀이나 조급함을 바라지는 않으신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사실은 ‘영(靈)의 수동적 밤’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다. (밤 2,7,2). 인간의 변모(變貌)라는 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은총과 본성이 가진 어떤 규칙에 따라 상당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산길 2,17; 노래 23,6).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경륜(經綸)에 의해 이끌어진다. 구약성서 안에서 하느님은 신약성서를 준비하셨다. 많은 말씀들과 계시(啓示)들을 통해서, 당신 아드님이신 유일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계시(啓示)를 준비하셨던 것이다. (산길 2,22). 옛날에는 다양한 계시(啓示)들을 무시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런 다양한 계시들을 바랄 수 없었다. 바로 이런 같은 사실이 각 영혼의 역사 안에서도 필요하다. 하느님께서는 영(靈)의 본질과 단순성(單純性)을 향해 감각적인 은혜들로써 영혼을 이끄신다. 그리고 추리력을 통해 단순한 지식에로, 열정들을 통해 사랑의 체험에로 영혼을 이끄신다. ‘뒷걸음질’은 ‘조급함’ 만큼이나 나쁜 것이다. (산길 2,13,1).
이 길의 도식(圖式)은 길고 연속적인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이 길을 중요하고도 아주 특징적인 여러 단계들 안에 훌륭하게 요약하셨다. 이는 의식적인 단순화(單純化) 작업이었고, 성인께서도 이 단계들이 우리가 거의 감지(感知)할 수 없는 연속적인 나아감 안에서 토막토막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또한 하느님께서 이 과정을 당신 뜻대로 바꾸기도 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셨다. (산길 2,17). 그러나 어쨌든 이 도식(圖式)은 우리가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각 단계들은 충만한 현실을 -하느님의 선물들, 인간의 응답, 합당한 수단들, 그리고 방해물들 따위의 모든 현실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들을 내포하고 있다.
1) 출발점, 성삼위(聖三位) 안에서의 삶: 기초적인 단계이자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의 서곡(序曲). 여기에는 창조· 역사· 구원· 성세(聖洗) 등이 포함된다.
2) 감각 안에서의 생활: 인간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사물들에 대해 감각의 차원에서 판단하면서 살아간다. 거기에 인간의 충동과 나약성이 존재한다. 이는 첫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교육과 내재화(內在化)가 요구된다.
3) 대신덕적(對神德的) 교육: 믿음과 사랑과 희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총체적 연관성 안에서의 신앙인에 대한 재교육. 여기서는 이미 영혼이 지배력을 갖는다.
4) 수동적 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단계 중에서 두드러진 부분. 이 부분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 자체의 쇄신을 끝까지 이끌어감. 깜깜한 속에서이긴 하지만 인간은 고귀한 은총과 대신덕적(對神德的) 충실성을 지켜나간다.
5) 사랑의 변모(變貌): 그리스도교적 성성(聖性)의 다양한 차원들 -대신덕적 차원, 윤리적 차원, 심리학적 차원, 신비적 차원- 안에서, 완전한 일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6) 완전한 사랑: 훈련을 통해서 ‘일치’의 사랑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삶에로 흡수되고 미래의 영광을 미리 앞당겨 누림으로써 한층 더 완전한 것이 된다.
아마 이 단계들을 더 세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단계의 밤들, 혹은 밤의 여러 단계들이 사실 존재한다. 영적 혼인의 완전한 일치는 어느 의미에서는 소위 ‘영적 약혼’이라는 것 안에까지 앞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원하는 때에 현실화(現實化)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역동적인 단계들 -즉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드러짐이다.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의 도식(圖式) 안에서, 이 ‘밤’들은 초보자들과 숙련자들의 처음 두 단계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 시기들은 결정적인 변모(變貌)의 시기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영혼을 한숨 돌리게 하는 짧은 중단기(中斷期)들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모의 시기란 첫째 밤과 둘째 밤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영성생활의 계획 안에서 이 요소가 거의 강조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자주 한탄하신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도전하신다: 즉, 이 포기(抛棄)의 길을 통해 나아간다면 단 한 달만에, 여러 해 동안 습관을 들여온 그들의 기도나 수행(修行)들을 통해서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신다. (산길 1,8,4; 산길 2,7,5-8).
5. 신비가(神秘家)‧ 신학자(神學者)
지금까지 살펴본 이 종합은, 영성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모아들여 그 모든 요소들을 ‘일치의 길’이라는 모습으로 제시한다. 이 단순한 범주(範疇)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수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계시(啓示)의 출발점들, 인간적이고 신비적인 체험들, 신학적인 설명들, 또 판단과 행위의 규범들 등 수많은 요소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성인의 말씀들의 의미를 인정하고 그분의 가르침들의 깊이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어떤 등급(等級)을 적용해야 한다.
비록 요구되는 그만큼의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벌써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혼란의 주된 원인은, 신비가(神秘家)이시고 영성지도자이시며 신학자(神學者)· 시인(詩人)이셨던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경우에 적용된 기본적인 범주(範疇)들이 잘못 진술되었던 점에 있다. 몇몇 저자들은 이 많은 범주들 중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식의 억지 양자택일(兩者擇一)을 해보고 싶어하기도 했다. 예를 들자면, 마리뗑 (J. Maritain)은 ‘관상(觀想)의 전문가’이라는 명칭을 보급시켰는데,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신학적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그분을 뛰어난 영성지도자로 만들어버렸다. 성인께 대해 그런 선언이 있었던 적은 없다. 신비박사이신 요한 성인의 독특한 점은, 한 사람, 같은 한 작품 안에, 종종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 많은 가치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18
크리소고노 (Crisógono) 신부는 진실을 파악하기에 더 합당한 도식을 그린다. 한 작품 혹은 한 저자(著者) 안에서 영성적이고 신비적인 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세 가지 틀을 구별하는데, 이 세 가지 틀이란 곧 체험적인 틀, 교의적(敎義的)인 틀, 그리고 학문적인 틀이다. 체험적인 틀이란, 하느님과의 통교 안에 보고 느낀 것을 언급하고 묘사하는 데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만일 그 체험이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고 그 저자(著者)가 충실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잘 묘사된 가치있는 한 작품을 가지게 된다. 교의적인 틀이란, 다른 사람의 체험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저자 혹은 그의 작품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는 그 체험들을 그 자체로써 혹은 어떤 원칙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그 체험들을 깊이 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적인 틀이란, 그 체험의 주체와 직접 그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 가르침의 주체가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 주어지는 것이다. “충분히 만족할 만한 유일한 것은 학문적인 해결이다. 이것은 사고(思考)의 질서정연함이라는 장점(長點)들에 의해 완전하게 된 체험적인 해결의 모든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당신 체험의 풍요로움과 다양함에 있어서나 당신 사고(思考)의 조직적인 힘에 있어서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 탁월한 분이시다.19
그런 모든 칭호들은 십자가의 요한 성인 안에서 생겨나고 그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능하게 하면서 함께 전개되어온 여러 측면들을 다 모아들인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이런 경우가 신학사(神學史)에 있어서나 영성사(靈性史)에 있어서 단 한 번 뿐인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들을 보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신비가(神秘家)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 이외에도, 성인께서 한 인간으로서 대단히 깊은 신비적인 삶을 영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들은 충분히 많다. 또한 성인께서 비슷한 체험들을 가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경청하셨고 그들을 도우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언들도 많다. 성녀 데레사와의 관계와 성녀께서 그분에 대해 말씀하셨던 찬사(讚辭)들은 믿을 만한 증거로서 충분하다. 성인의 작품들 안에서 서문(序文)들을 통한 간접적인 고백과 작품들의 전반적인 어조(語調)는 성인께서 위대한 신비가(神秘家)이셨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성인께서 작품들을 쓰셨던 주된 목적은, 신비적인 체험의 내용들을 전달하시는 것, 다시 말하자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계시의 내용들이 생생하게 그분께 나타났던 그런 독특한 방식을 전달하시는 것이었다. 시(詩)들은 성인의 메시지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들인데, 이는 당신께서 참여하셨던 그 신적(神的)인 현실에 대해 노래하고 또 이야기하려 하는 그런 것들이다. 해설들은 시(詩)들을 밝혀주고 따라서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그 목표를 최전면(最前面)에 유지해준다. 성인의 작품들의 본연의 내용은 신비적인 것이다.
‘신비체험’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미 이해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비체험이란 ‘성령(聖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인식(認識)과 사랑을 통한 내재적(內在的)이고 초월적(超越的)인 하느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인수(因數)가 작용한다. 첫째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하느님 자신과 계시(啓示)의 신비(神秘)들이다. 둘째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체험이다. 이는 주체에 의해 사랑으로써 받아들여짐을 뜻한다. 셋째는 성령(聖靈)의 작용이다. 이 성령의 작용이 인간이 그 체험을 받아들이고 그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인간 주체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이런 완전한 의미에서의 ‘신비주의’(神秘主義)는 신학자(神學者)로서 또 영성지도자로서의 그분의 조건에 전혀 아무런 해(害)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인 내용들로써 그런 분들을 비추어주고 풍요롭게 한다. 신비주의는 신학적인 반성에도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특별히 비추어진, 하느님과 그분의 활동과 인격 안에서의 은총의 삶의 신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理解)를 즐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성사(聖事)들과 주제묵상(主題黙想)은 단순히 개념적인 신학(神學)에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투명성(透明性)을 가진 것이 된다. 신비적인 지혜는 인간 주체가 믿음의 진리들 안으로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그에게 생기를 준다. 또한 실존(實存) 안에서, 한 마디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진정한 신학(神學)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간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같은 점들이 사목적인 측면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래서 ‘길’을 가르쳐주고 ‘수단’들을 평가해주는 데에 있어서 더 나은 조건들을 갖추게 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 안에 ‘충고’의 말씀들이나 행위를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담은 페이지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분의 현저하게 신비가적(神秘家的)인 성격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성인께서 가르치신 내용들과 그분의 체험들과, 또 하느님께서 통교해주신 것과 그 하느님께 대한 응답으로써 성인께서 실천하셨던 영성적 활동들이 참된 것들임을 보증하기 위한 이차적인 척도(尺度)들이다. 신비가(神秘家)이자 저술가(著述家)인 한 사람 안에서 더 높이 평가되는 조건들 중의 하나는, 체험들에 대한 묘사 이외에도, 그 체험들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한 어떤 기준(基準)들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비신학자(神秘神學者)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 ‘영성지도자’라는 칭호를 드리고 싶지는 않다. 이 칭호는 성인께서 당신 삶 안에서 또 당신 작품들 안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 이 칭호의 우둔함은 마리뗑(J. Maritain)과 그를 따르던 몇몇 저자(著者)들의 빗나간 해석으로 더욱 심화(深化)되었다. 그들은 다른 두 가지 칭호에 대립해서 이 칭호를 지지했는데,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신비적인 체험들을 전달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또 성인께서는 어떤 신학(神學)을 만들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당신의 실천적인 목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렇게 성인의 위상은, 단순히 영적 삶의 방식에 대한 어떤 규범들을 주시는 정도로 축소되어버린 그런 영성지도자로 격하되어 있었다.
신비신학자(神秘神學者)란, 이와는 달리, 하느님과 그분의 신비(神秘)를 자신이 이미 체험했고 새롭게 그런 체험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길에서 동반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 대한 도움이란 그들에게 어떤 실천적인 규범들을 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도움은 하느님의 신비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친교(親交)의 신비(神秘)가 인간에게 새로운 체험의 내용과 양상을 변화시키도록 하면서, 그 하느님의 신비들을 제시하는 그런 데에 있는 것이다. 신비신학자의 기술은 자신의 체험을 전달할 줄 아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비신학자의 진정한 기술은, 자신의 체험 덕분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찾는 이에게 자유롭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無償의 인격적인 하느님의 신비’를 전달할 줄 아는 데에 있는 것이다.20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당신의 거의 전(全)생애에 걸쳐서 양성책임자이셨고 신비신학자이셨다. 그런 환경 안에서 그분의 작품들이 태어났다. 성인께서는 수련장· 신학원장 겸 학생지도신부· 수도원장, 그리고 가르멜수녀들과 많은 신자들에게도 지도자이셨고 상담역(相談役)이셨다. 데레사적 가르멜의 카리스마처럼 그렇게 뛰어나게 신비적인 어떤 카리스마에 있어서는, 그 카리스마를 실현시키고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양성책임자의 직책이었다. 그리고, 일련의 섭리적(攝理的) 요인들이 성인을 그런 자리에 계시게 했는데, 이 요인들이란 말하자면 성녀 데레사와 장상들의 뜻과, 성인을 이런 직무에로 이끌었던 성인 자신의 재능과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은밀하게 성인을 다른 직무나 직책들로부터 떼어내게 만들었던 성인 자신의 어떤 한계들 등이었다.
양성책임자로서는 성인께서는 특별한 자질을 갖추고 계셨다. 소리높여 질책하는 그런 일들로부터는 거리가 먼 분이셨던 성인은, 개인적인 대화에 있어서는 지칠 줄 모르시는 그런 분이셨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당신의 동료 수도자들과 수녀들과의 친밀한 대화에 있어서는 경탄할 만한 대화상대이셨다.”21
그분은 대화주제들을 흥미롭게 만들 줄 아셨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줄도 아셨고,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줄도 아셨다. 그분은 당신 자신의 체험을 주의깊게 전달하셨고, 당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당신과의 대화상대가 된 사람의 고유한 체험을 일깨워주셨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권위를 갖추고 계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런 직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불과 몇 년만에 그분은 엔까르나씨온(Encarnación) 수녀원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한 수녀가 그분께 질문했다. “요한 신부님, 이 수녀들에게 무슨 일을 하셔서 이 수녀들이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드십니까?” 성인께서 대답하셨다. “일은 모두 하느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수녀들이 저를 좋아하도록 만드시지요.”22 한 인간으로서 또 저술가(著述家)로서 성인은, 당신의 특별나지 않은 배경과 때로는 엄격한 당신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가까이 알게 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셨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신비신학자’와 ‘양성책임자’라는 칭호는 성인의 작품이 가지는 특징들 중 하나를 충실히 표현한다. 그분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라기보다는 진정한 양성자(養成者)이셨다. 그분은 신비를 충실하게 드러내려고, 또 그 신비를 인격 자체에 더욱 접근시키려고, 그래서 한 인간의 삶을 온전히 변모시키려고 애쓰셨다. 이와는 반대로, 단순한 ‘지식전달자’는 어떤 주제들과 문제들을 제시하고 지적(知的)인 예리함과 호기심을 요구하지만, 인격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지는 못한다. 진정한 양성자는 지칠 줄 모르고 본질적인 실재(實在)들에로 자주 되돌아간다. 성인은 항상 하느님께 대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겉보기에 통속적인 표현들로 보이지만, 그런 증언들은 요한 성인의 일상적 삶 안에 신비의 내용이 얼마나 깊이 침투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신비가(神秘家) 성인께 있어서는,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참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한 방식이었다.
성인의 작품들 안에서는, 신비신학적인 의도가 끊임없이 움직인다. 첫째로, 그 의도는 소재(素材)들의 선택에 작용한다. 당신께서 글을 쓰실 수 있었을 수많은 체험들과 이념들 중에서, 성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에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혹은 다른 사람들이 혼자서 알아듣기에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신 그런 문제들을 선택하셨다. 원칙들을 좀더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또 그 조직에 어떤 유연성(柔軟性)을 주시기 위해서 성인은 그것들을 조정하셨다. ‘가르멜의 산길’ 2권 22장 같은, 사적(私的) 계시(啓示)에 반대하시는 그렇게 근본적이고 철저한 장(章)조차도, 마지막에는 예기치 않은 부드러움으로 끝난다. 저자(著者)께서는, 비록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쓰셨지만, 그런 시현(示現)들을 체험한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던 이유를 설명하신다: 즉, 각 영혼을 그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또 하느님께서 그를 이끌어주시는 그 방식대로 도와야 하기 때문이다.
신비신학자는 신비가(神秘家)나 신학자(神學者)와의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정반대로, 신비신학자란 신비가(神秘家)나 신학자(神學者)가 얻어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결실이다. 성녀 데레사께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을 동료 수녀들의 양성자로 혹은 영적 지도자로 선택하셨을 때, 어떤 영성적인 실천주의자를 찾으셨던 것은 아니다. 영적인 지도자란, 성녀에게 있어서는 체험이 풍부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신학자이며 ‘주님의 길’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질을 갖춘 분을 성녀는 원하셨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런 분을 찾으셨던 것이다.
신학자(神學者)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신학자(神學者)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시다. 성인은 심오한 깊이와 놀랄 만한 일관성을 가지고 하느님께 대해서,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은총의 삶에 대해서, 거룩해짐에 대해서, 또 구세주이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대신덕(對神德)들에 대해서, 죄(罪)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총체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당신 자신이 신비가(神秘家)이시라는 사실이, 믿음과 사랑의 그 생기(生氣)를 논리정연하고 조직적인 사상(思想)과 연계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당신은 구원의 역사 전체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시각(視覺)을 가지고 계셨는데, 비록 모든 단계들을 다 같은 정도로 전개시키지는 않으셨지만, 말하자면, ‘로망스’들 안에서 다루어진 삼위일체 하느님의 삶· 예정· 창조· 강생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의 노래’에서 다루어진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삶 안에로 점차적으로 되돌아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들에 대한 조직적인 시각(視覺)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다.
그분께서 신학자(神學者)이신가 아니신가 하는 질문은 잘못 제기된 것이다. 저술가(著述家)들이 따라온 기준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기술적인 어법(語法)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학설(學說)이 가진 한정된 내용 혹은 어떤 도식(圖式)이다. 성인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분은 시적(詩的)이고 성서적(聖書的)이고 상징적(象徵的)인 어법(語法)을 더 좋아하셨고, 학설의 어떤 전문성을 따르기보다는 신적(神的)이고 인간적(人間的)인 현실들을 직접 분석하셨다. 잘못 적용된 기준은 그 자체 때문에 일을 망치게 마련이다. 이런 사실은 그 결과에서 잘 드러나는 법이다. 영성(靈性)에 있어서의 위대한 신학자(神學者)들이란, 이런 기준에 따르자면, 17세기의 편집자들, 즉 성 토마스의 요한 (Juan de santo Tomás)· 삼위일체의 필립보 (Felipe de la Trinidad)· 성령의 요셉 (José del Espíritu Santo) 등, 체험도 없고 지적(知的)인 창의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정말 누가 진정한 신학자(神學者)인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다른 기준들을 사용한다. ‘신학자’(神學者)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즉, 사람들을 구원에로 인도하기 위한 인간의 마음과 역사 안에서의 하느님의 신비나,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 인간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들 등, 이런 신적(神的)인 현실을 탐구할 능력을 갖춘 신앙인이 바로 신학자(神學者)이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현실에 접근해서 그 현실 안에 깊이 파고들고 그 현실을 드러내주는 것, 그런 일을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어떤 도식들을 통해서 -그게 시(詩)든 산문이든, 이야기하는 것이든 노래하는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신비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줄 수만 있다면-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학자(神學者)를, 기술적인 용어들이나 어떤 문구(文句)들을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 아닌, 일종의 창조자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단순히 ‘신학자’시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페인어권 안에서 우리가 얻어만날 수 있었던 ‘가장 활기있고 가장 독창적인 신학자’이시다. 앞서 언급한 그런 현실들을 고려할 때, 사상의 독창성과 그 활력에 있어서 그분을 능가할 만한 신학자는 다시 없으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요한 성인은 어떤 주제들을 다루시는 게 아니고 현실 그 자체에로 직접 접근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나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자기통교(自己通交)의 신비들을 더 깊이 파고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 성인은 항상 가장 어렵고 아무도 탐구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로 뛰어드셨다. 그분의 작품 전체는 일종의 ‘대담한 행동’ 그 자체였다. ‘가르멜의 산길’에서는, 여러 가지 쉬운 것들은 다 제쳐두시고 본질적이고 확실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일을 성인께서 떠맡으셨다. (산길 서문 8). ‘어둔 밤’에서는, 감각의 밤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영(靈)의 밤을 더 많이 다루기 위해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고, 영의 밤에 대해서는 말이나 글이 별로 없고 그 체험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밤 1,8,2). ‘영혼의 노래’에서는, 기도에 대한 어떤 점들을 해설하시는데,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것들은 제쳐두시고 가장 이례적(異例的)인 것들을 특별히 다루신다. (노래 서문 3). ‘사랑의 산 불꽃’의 경우는, 그런 작품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대담함’인 것이다.
6. 어법(語法)과 문체(文體)
우리는 이미 성인의 작품들의 성격과 그 안에 담긴 의도들, 또 그 작품들의 개괄적인 영성적 내용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법’(語法)이라는 문제다. 준비가 없는 어떤 독자에게는, 성인의 표현들은 애매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비유적이고, 진리를 밝혀내기보다는 감춰버리는 듯이 보인다.
어법(語法)이란 표현의 수단이고 의사소통의 수단이지, 방해물이 아니다. 기록된 성인의 말씀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성인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현실들과의 생생한 접촉을 가질 수 있다.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력과 호소력은 놀랄 만한 것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거룩한 박사이신 요한 성인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작품들의 어떤 판(版)을 대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기록들을 우리가 지성(知性)으로써 얼마나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입문(入門)을 통해서 이미 어슴푸레 가지고 있는 그분의 교의(敎義)에 대한 이해로써 만족해하는가 여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약간의 반성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대단히 비판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독자는 성인의 그 매력적이면서도 수수께끼같은 작품들을 직접 읽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어법(語法)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흔히 그 말이나 형식을 통해 마치 표현의 방식들인 양 이해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어법(語法)에는 신비가(神秘家) 성인께서 가지신 그 체험 자체도 내포되어 있고, 그 체험에 대해 그분께서 가지셨던 이해(理解)도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그 체험 자체에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양식(樣式)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그 체험을 어떤 형상들과 관념들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인께서 쏟으셨던 그분의 내면적인 노력 전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인께서 인식하신 그 현실의 모든 문제점들과, 그분께서 인식하셨고 또 이해하고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인격의 주체적인 모든 활동들이, 어법(語法)이라는 것을 통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들을 감안한다면, 그분의 어법(語法)이 비교적 덜 단순했다는 점에 대해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다양하고 시급한 과제들 안에서 몸부림치셨다. 알아들을 수 있는 무엇을 말씀해주셔야 했고, 당신께서 전달하시는 그 총체적인 진리에 상응하는 무엇을, 당신께서 그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떻게 체험하셨는지까지 설명하시면서 그 무엇을 말씀해주셔야 했다. 아마도 그 진리에 대해 더 충실하게 밝혀주는 그런 표현들은 독자에게는 더 알아듣기 힘든 표현들이었을 것이고, 독자가 이해하고 맛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은 당신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독특한 현실을 아주 조금밖에 혹은 전혀 보존하지 못한 그런 표현들이었을 것이다. 이는 모든 것을 종합하고 타결점을 찾으시려는 성인의 지속적인 노력이었다. 모든 신비가(神秘家)들은 어법(語法)이라는 병(病)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런 점에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셨던 신비박사 요한 성인께도 이 문제는 역시 심각하고 한결같은 걱정거리였다.
성인께서 무엇을 표현하시기 위해 어떤 형태를 정하시면서 하셨던 그 선택들은, 자유스럽고 별다른 느낌도 없이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 선택들은 신비의 내용에 대한 그분의 충실성 때문에 그분께 강요된 까다롭고 고통스러운 선택들이었다. 다른 많은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 작가가 자신이 표현할 줄 아는 어떤 한 가지 형태 -그것이 시(詩)든 산문이든, 신심적인 표현이든 신학적인 용어들이든, 성서적인 양식을 빌리든 아니면 자신의 고유한 창작에 의존하든, 어떤 한 가지 형태-에 손을 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이미 능숙하게 이 모든 형태들을 다루고 계셨고, 또한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당신 뜻대로 선택하실 수도 있었다. 비슷한 상황들 안에서 성인께서 내리시는 선택은 특별한 의미와 깊이를 가지고 있다. 성인은 상징적인 표현들과 시적(詩的)인 표현들을 전체의 바탕으로 택하셨고, 개념적이고 신심적인 어법(語法)을 특별한 설명들을 위해 택하셨던 것이다.
당신께서 사용하신 용어들 안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고, 그 각각의 정확한 의미는 당신 작품을 처음 읽을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우연히 사용된 단어들 전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그런 단어들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관상’(觀想, contemplación)이라는 단어는, 영성에 대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교양’ 정도만을 가진 독자(讀者)에게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이다. ‘부정(否定, negación)’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일상적으로 가지는 것과는 다른 색조를 가지고 있다. ‘욕(慾)들’이라는 말은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심리학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한 모든 단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나가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독자(讀者) 자신이 성인의 작품 본문과 그 문맥과 친근해지면서 스스로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 서문들과 적절한 각주들을 통해서 그런 독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서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형태들만 언급할 것인데,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성적 가르침의 진수(眞髓)를 남겨주셨다.23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체험
성인의 어법(語法)의 흐름을 처음부터 따라가자면, 우리는 ‘체험’에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 어법(語法)은 인지(認知)된 어떤 현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표현에 자신의 어떤 고유한 성격과 양상들을 첨가시킨다. 신비적인 체험과 신비의 내용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친밀한 만남을 통해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통교하시는 그 무엇은, 말로는 절대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고, -마치 하느님께 대해서 존재하시는 그대로의 그분께 대한 무엇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 안에서 영혼을 변모시키시는 그런 감탄할 만한 영광으로 당신을 영혼에게 통교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노래 26,4).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이 특징은,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통교해주시는 그 ‘하느님의 위대함’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그 위대함에 대해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주체적인 체험마저도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적 체험이라는 것에 비추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하느님의 특성을 굳이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뛰어난 재능을 갖춘 어떤 사람과 가질 수 있는 깊은 친교 따위의 모든 것들은 어떤 개념들이나 묘사들로 수렴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격’ 그 자체의 많은 요인들과 그런 인격과의 ‘친교’라는 것의 많은 요인들이 이미 어떤 관념이나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신비가(神秘家)들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얻어낼 수 있는 많은 이득 중의 하나는, 그 작품들이 그에게 ‘진정하고 초월적인 신비의 의미’를 찾아준다는 점이다. 신심서적이나 신학서적들을 읽을 때에는, 독자(讀者)는 그 안에 나타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을 알아보게 하는 어떤 ‘관념’을 얻을 수 있다. 말하자면, 하느님· 그리스도· 사랑· 구원· 용서· 거룩한 삶 따위를 독자가 나름대로 알아듣게 된다. 신비가(神秘家)들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면, 그 신비가(神秘家)들이 독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실상(實像)을 깨우치게 해주고 그들 자신의 순박함으로 독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준다. 신비 자체가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비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살아있고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다.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이 특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사랑의 산 불꽃’ 마지막 부분 (불꽃 4,17)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용어(用語)의 사용을 완전히 거절해버린다는 점인데, 성령(聖靈)을 들이마시는 이 은총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더 이상 한 마디도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둘째는, 용어(用語)를 상대화(相對化)시켜버린다는 점인데, 어떤 체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나 혹은 그런 체험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독자가 그 말의 표현과 실상(實像)을 동일시(同一視)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 체험은 말로 표현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랑의 산 불꽃’ 서문에서 이런 면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즉, 성인께서는 거기서 ‘이제 나는 무엇인가를 말할 예정인데, 내 표현이 실상(實像)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과 내 표현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실상(實像)은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무엇과 살아있는 무엇이 서로 다른 그만큼이나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감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나가겠다’고 하시는 것이다.
많은 작가(作家)들이 신비가(神秘家)의 작품들 안에서 이상스러운 모순된 점들을 발견해낸다. 모순된 점이란 한편으로는 ‘말로 표현될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체험이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말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모순이 있다. 그러나, 이 모순되는 점들은 아주 단순한 어떤 연관성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말로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침묵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신비가(神秘家)는 그 ‘말로 표현될 수 없음’을 느끼고, 자신이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 ‘말로 표현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말로 표현될 수 없음’은 ‘표현’에 연관된 것이다. 이 ‘말로 표현될 수 없음’의 정확한 의미는 이중적이다: 첫째는 체험의 내용들을 합당하게 표현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내용들 중 무엇을 그 내용에 합당하지 않게나마 표현해야만 한다는 가슴아픈 어려움이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어느 것도 ‘표현’을 배제(排除)하지는 않는다. 이는 마치 하느님의 ‘불가해성(不可解性)’이라는 것이 완전한 무지(無知) 안에서보다는 부분적이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어떤 인식(認識) 안에서 인정될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혼의 노래’ 서문은, 영혼이 달려가야 할 그 길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완벽하게, 현실에 합당하게, 신비가(神秘家) 자신의 체험 그 자체에서부터 독자(讀者)가 이를 소화해내는 단계까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제공한다.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체험, 합당한 설명을 하려는 모든 의도에 대한 거절, 적당하지는 못한 방법이지만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징과 시(詩)에 호소하는 것, 산문(散文)으로 옮겨씀, 신학(神學)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통찰하기 위해 독자(讀者)에게 요구되는 노력 등이 거기서 다루어진다.24
상징 (象徵, símbolo)과 시(詩)
신비박사이신 성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상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들이 많다. 우선 그분의 중요한 저서(著書) 네 권의 제목들이 상징적이다: 산길도, 밤도, 신부(新婦)의 노래들도, 불꽃도 다 마찬가지다. 이어서, 그분의 시(詩)들 역시 상징적인데, 이는 당신의 모든 작품들과 그것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들의 종합이다. 서문(序文)들은 ‘상징’이 표현에 있어서의 신중한 선택의 결과이고 무슨 장식적인 기능을 가진 게 아님을 강조한다.
상징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주어진다: 첫째는 피조물에 대한 감각적이고 영적인 뛰어난 지각(知覺), 둘째는 신적(神的) 현실에 대한 강렬한 지각(知覺)과 체험, 셋째는 이 두 가지 사이의 밀접한 연결(連結)인데, 이 세 번째 요소야말로 첫째 요소가 둘째 요소를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요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시적(詩的) 상징들이 가지는 풍요로움의 비밀은, 그것이 존재 자체와 사물들에 대한 심오한 존재론적 시각(視覺)을 통해 물질적 세계의 존재들을 영적 세계의 존재들과 연계시키는 신비스러운 유비(類比)를 찾아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성인의 그 깊이 감동된 영혼에 의해 민감하게 감지(感知)된 이 모든 유비(類比)들의 이치는 존재 자체의 중심 안에, 즉 하느님 안에 있다.”25
바루지(Baruzi) 는 상징에 대해서 거의 이론(理論)이라고 할 만한 정의(定義)를 내어놓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독창성의 양상들을 나타내는 데에 유용한 것이다. 상징은 체험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고, 체험의 모상(模像)인데, 이는 체험과 동시에 태어나고 체험의 전체 여정(旅程) 안에서 그 체험을 동반하게 된다. 상징은 체험과 보편화(普遍化)하는 어떤 깊은 직관 안에 포함된 현실을 반영하는데, 이는 단편들의 상세한 비교는 배제(排除)하는 것이다. 그는 ‘유비’ (類比, alegoría)와 대조해서 이 ‘상징’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유비(類比)란 체험보다는 후에 나타나는 어떤 교육적인 수단이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사고력(思考力)이 실재적 차원과 개념적 차원 사이에 어떤 특별한 유사성(類似性)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것이다.26
신비박사 요한 성인의 작품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들이 있다. 신비적인 면에서 또 문학적인 면에서 최고의 상징은 ‘어둔 밤’이다. 이는 그 ‘어둔 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효력 때문이고, 그 안에 내포된 수많은 부분들 때문이고, 그 깊은 단일성(單一性) 때문이고, 또한 그 밤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것과의 유사성(類似性) 때문이다. 더 많이 알려진 또다른 상징은 -이것 역시 성인께서 집요하게 사용하신 것이지만- ‘영적 혼인’ 혹은 ‘영적 약혼’이라는 상징인데, 이것은 그 안에서 혼인 혹은 약혼이 이루어지는 인간적 사랑의 모든 단계들을 다 이끌어들인다. 마지막으로, ‘불꽃’이라는 상징은 밤의 단계적 조명과 사랑의 열정들을 완성시키게 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요한 성인의 신비적 세계에 어떤 색조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밤’은 초월성을, ‘약혼’은 사랑의 친교를, ‘불꽃’은 변모(變貌)와 생명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징의 자연스런 표출은 시(詩)이고, 신비가(神秘家) 요한 성인 역시 바로 이런 이유에서 시인(詩人)이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신비적 시인(詩人)’ 혹은 ‘신비가(神秘家)이시고 동시에 시인(詩人)’이시다.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참으로 시적(詩的)이고 상징적(象徵的)인 어법(語法) 안에 쏟아넣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시(詩)가 가지는 그 독특한 적합성(適合性)은 시(詩) 그 자체의 고유한 본성(本性)에서, 또 시(詩)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 가르침과의 유사성(類似性)에서 오는 것이다. 시(詩)는 총괄적인 어법(語法)이다. 시(詩)는 인간적 지각(知覺)의 다양한 요소들 -이성(理性)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로 뭉쳐져 있는 직감, 사랑, 감정, 사상 등-을 다 통합한다. 시(詩)는 자연스런 동화(同化)의 방식으로, 무상(無償)의 영감(靈感)을 통해서 움직인다.
성인은, 당신 작품을 읽을 독자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靈的) 현실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認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假定)하고,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신다. 아마도 두루엘로(Duruelo)의 이웃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실 때는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기본적인 교리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살아있는 인식(認識)에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상징적 표현이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성인께서 생각하셨다. 영적 세계의 살아있는 요소들을 마치 무슨 주제나 문제점들처럼 다루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덮어씌우는 그 질식시킬 것만 같은 껍질을 성인께서는 치워버리신다.
성인 자신과 그분의 작품을 해석하는 다른 학자들이 시(詩)의 해설보다는 시(詩) 자체가 체험에 훨씬 더 가깝고 우월한 것임을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비적 체험’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임을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시(詩) 안에도 시(詩)에 대한 해설 안에도 없는 그런 ‘신비적인 밤’은 오로지 실제 체험 안에만 있었다. 시(詩)와 그 해설은 각각 별개의 다른 것이고 둘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체험에 비한다면 단순히 어떤 근사치(近似値) 같은 모조품(模造品)일 뿐이다.”27
시(詩)의 해설
성인께서는 이 해설들이 신비적인 서정시(敍情詩)의 풍요로움을 잠식(蠶食)해버릴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이 해설들을 다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쓰셨다. 그러나, 이 해설들 역시 관심과 독창성을 가지고 쓰셨다. 성인은 독자들을 그들을 훨씬 넘어서는 무엇에로 초대하신다. 성인께서 당신의 체험 그 자체를 두 번째로 옮겨담으시면서 그 체험 자체의 활력과 향기가 사라져버림을 불만스러워하셨을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성인께서 다른 학자들에 의해 편집된 당신 작품을 대하시면서 표현하실 법한 불신(不信)에 현혹되어, 어떤 저자들은 해설들에 대해 -체험에 대한 어떤 ‘고의적(故意的)인 훼손’을 대하듯이- 혹평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기도 했었다. 이것은 독자(讀者) 편에서는 생각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신비가(神秘家)께서는 항상 당신의 독창적인 체험을 앞에 두고 계시고, 그 체험을 당신 작품들의 계속적인 여러 판(版)들과 대조하실 수 있다. 독자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주어지는 해설이란 마치 시(詩)와 체험의 비밀에로 들어가기 위한 경로(經路)와도 같은 것이다. 해설 덕분으로 우리는 그분의 시(詩)를 직접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저자(著者)의 해설들이 제공하는 그 무엇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 직접 해설하신 것이 아닌- ‘밤’의 노래들에 대한 진술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요약하자면, ‘해설’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첫째는, 시(詩)와 그것에 바탕이 되는 체험의 내용에 대해서 토막토막 주어지는 분할적인 진술과 비슷한 것이라는 의미에서이고, 둘째는, 신비적인 체험과 영성생활과 그것들을 완전하게 하는 요소들과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부연해주는 설명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논술(論述) 혹은 논문(論文)과도 비슷한 것이라는 의미에서이다. ‘해설’들은 시(詩)의 서정적 표현들이 어떤 깊은 한 순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체험 전체를 포괄하는 그 넓이와 길이 전부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바로 그 해설들 덕분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분석가(分析家)로서 사상가(思想家)로서 또 신학자(神學者)로서 드러나실 수 있었던 것이다.
성인의 큰 작품들 하나하나에 있어서 그 문제제기나 진술의 성격은 각각 다르다. 성인께서는 가능성들의 광범위한 영역을 마음대로 활용하셨고,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당신께 적합한 방식으로 혹은 그 주제들이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활용하셨다. ‘가르멜의 산길’은 논술(論述)이다. 이것은 해설이 아니고, 해설일 수도 없는 것이다. ‘어둔 밤’은 중간중간에 논술의 단락들이 삽입된, 상징에 붙여진 해설이다. ‘영혼의 노래’는 그 노래에 대한 연관성과 규칙성을 가진 진술이다. ‘사랑의 산 불꽃’은 여담(餘談)의 형태로 체계적인 단편들이 삽입된, 시(詩)에 대한 연장(延長)이고 진술이다.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는 뒤에서 해당 작품을 다루면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자.
문학양식
일반적으로 말해 문학양식은 그 단일성(單一性)과 다양성(多樣性)에 의해 구별된다.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의 단일성(單一性)이란 당신께서 당신 작품의 어느 페이지에서든 분명하게 하신 용어사용과 강조점들의 단일성이다. 다양성(多樣性)이란 성인께서 주제들에 따라 그 색조와 리듬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그 다양성을 말한다. 성인께서는 단어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고 계셨고, 생각과 느낌의 변화에 따라 단어를 바꾸셨다.
‘가르멜의 산길’에 있어서의 지적(知的) 구성의 양식과 그 논술 방식은 분할(分割)과 그에 따른 각 부분에 긴 이론을 붙이시는 방식이다. ‘어둔 밤’에 있어서의 생생하고 현실적인 묘사는 어슴푸레한 친밀함의 색조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영혼의 노래’는 움직임이고 강렬한 색깔들이고, 신속한 ‘지나감’이다. ‘사랑의 산 불꽃’을 위해서는 성인께서 불타는 듯한 훌륭한 양식을 유보(留保)해두셨다. 서로 대조되는 많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고 당신 자신에 대해 충실한 무엇이 그 안에 있다. 더 상세히 살펴보면, 그분의 산문(散文)들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르멜의 산길’과 ‘어둔 밤’은 다시 교정하실 필요가 있었다. 반복된 것들, 지나치게 많은 것들, 불필요한 인용들, 그런가 하면 실천되지 않은 채로 끝나버린 약속들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대단히 잘 전개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그냥 잊혀져버린 혹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그런 균형잡히지 않은 구분들도 있다.
한 단어를 오로지 현실과의 친교를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성인의 집필에는 진실함의 표지(標識)가 들어있다. 온갖 미사여구(美辭麗句)들과는 달리, 엄밀히 요구되는 것들 이외의 지나치게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는 과장들을 싫어하셨던 성인께서는, 잘 조화되고 유려하고 의미심장한 어떤 표현을 만들어내셨다. 가식적(假飾的)인 것은 그분께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한 수녀의 체험들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을 때 -그 수녀는 그런 체험들을 기록으로 남겼었는데-, 성인께서는 그 수녀를 불리하게 하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주셨다: “여기 나타나는 문체(文體)와 어법(語法)은,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그 영(靈)께로부터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靈)께서는, 여기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젠체함이나 과장이 없는 더 단순한 양식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28
“기교(技巧) 면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던 이 탁월한 가르침 안에 나타난 독창적이고 심오한 성인의 사상은, 두루엘로(Duruelo)의 창립자의 비상한 언어능력과 그분께서 다루시는 내용들이 가진 그 힘 자체로 인해, 그분의 그 힘차고 정확하고 대단히 인간적인 어법(語法) 안에서 잘 표현되고 그분의 생각들을 아름답게 꾸미기에 이르렀다. 그분의 문체는 어떤 학파와도 비슷하지 않고 어떤 다른 저자와도 비슷하지 않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문체(文體)들을 다듬고 광내고 아름답게 꾸미는 분이셨다기보다는 문체(文體)를 만들어내신 분이셨다.” “그분은 문학자(文學者)이기보다는 저술가(著述家)시다.”29
7. 다시 읽기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양식으로 그 내용들을 좀 연장시키시면서 성인께서 당신 작품을 읽을 독자들과의 대화로써 쓰신 것들이다. 처음 대상이 되었던 그 독자들의 범위는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성인께서 살아계시던 동안에는 당신 작품들 중 어느 하나도 출판되지 않았었지만, 많은 사본들이 유포되었다. 성인께서 돌아가신 후 겨우 30년이 지났을 때, 벌써 출판이 시작되었고 번역도 시작되었다.
성인의 작품 출판은 매우 느리게 또 어렵게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반대와 항거(抗拒)에 부딪혔었다. 처음 몇 해 동안은 수도회의 몇몇 장상들의 항거에 부딪혀야 했고 이단심문소(Inquisición)에 고발당해야 했었다. 정적주의(靜寂主義, quietismo)30라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몇몇 신학자들과 전례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고, 교회에 퍼져나가는 새로운 강생주의적(降生主義的, encarnacionista) 사고방식으로 인해 성인의 사상이 도외시될 위험성도 겪고 있다. 성인은 반대를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께 대한 갖가지 공격들로 인해서, 믿음과 인간성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더 강화되고 더 개방된 그분의 활동이 나타났다.
성인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한 인간으로서나 저술가로서 ‘진짜’이시다. 그분은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슨 달콤한 말로 당신 독자들을 속이지 않으신다. 당신 저서의 첫 페이지에서부터, 성인께서는 조금도 말씀을 돌림이 없이 당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신다: “여기서는 대단히 도덕적인 무엇을 다루지도 않을 것이고, 무슨 달콤하고 유쾌한 것을 통해 하느님께로 나아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즐거운 무엇을 다루지도 않을 것이다. 오로지 본질적이고 확실한 교의(敎義)를 다루게 될 것인데, 이는 여기서 서술되는 그 영(靈)의 발가벗음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인 것이다.” (산길 서문 8). 본질적이고 확실한 가르침이라는 것, 바로 여기에 그 가르침의 시들지 않는 생명력의 비밀이 있다. 성인께서는 하느님· 인간· 실존 등 위대한 현실들이 가지는 의미의 밑바탕까지 사람들을 이끌어가실 결심으로, 그런 현실들을 건드리신다. 그리고 그 일을 비상한 어떤 언어의 표현 안에서 이루어내신다. 이 소중한 가치 앞에서, 어떤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양식있는 독자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상황들과는 그렇게나 다른 상황들 안에서 그분의 작품들을 읽으려고 함으로써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그분은 가르멜회원이셨고, 가르멜회원들을 위해서 또 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글을 쓰셨던 분이시다. 지금은 온갖 사람들이 다 그분의 글을 읽는다. 그분의 작품들이 가지는 전망 안에서 세 가지 면이 구별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누구에게 바치신 글이었는지, 그 글이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독자들은 누구였는지가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로, 누구에게 바쳐진 글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그분의 내적 의도에서 보아야 하는데, 그분의 글은 가르멜회의 수사들과 수녀들에게와 또 그 같은 환경에 깊이 묻혀 살았던 뻬냘로사의 안나 (Ana de Peñalosa) 부인에게 바쳐진 것이었다. 둘째로, 대상이 된 사람들은 더 많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환경이 어떠했든 간에-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영혼들을 지도할지를 모르는 지도자들 등이었다. 셋째로, 가능한 독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저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후에 나타나는 결과들로 판단될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이 지성(知性)으로써 읽혀진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들이 유익한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번번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였다.
이제 영성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것은 저자(著者)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성인께서는 하느님의 친교의 신비에 대해서 이미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들,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길을 통해 진리를 찾을 준비를 하려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셨다. 문학적인 관심 혹은 심리학적인 관심 등을 통한 부분적인 분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역시 성인의 영성적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스승
겉모습들이나 때로는 엄격한 그 표현양식에도 불구하고, 요한 성인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고, 삶에 있어서도 영적 지식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셨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신 곳은 인격적 삶의 비밀 안에서이다. 이는 우리로서는 정확히 입증할 방법이 없는 부분이다.31 여기서는 사고(思考)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역사적인 검증이 가능한 널리 알려져온 점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데, 말하자면 체험에 대한 새로운 논거(論據)라든지, 분석, 분류, 신학적인 재고(再考), 그 지평의 열림 등이다. 일반적으로 본 유형에 대한 몇 가지와 특정 주제에 관련된 다른 몇 가지를 제시해보겠다.
1) 성인께서는 체험적인 요소와 신학(神學)· 철학(哲學)의 원리(原理)들 사이에서의 그 균형잡힌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를 통해 신비적 가르침 안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셨다. 그분 이전에는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의 독립성(獨立性)을 가지고 따로 걸어왔었다.
2) 신비적 친교의 체험과 신비적 현상들을 구별하셨다. 신비적 현상들을 평가하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냉혹한 판단을 받으실 수도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의 인간적 자세를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일반화된 가치들의 어떤 단계 혹은 계층들을 설정하셨다.
3) 역동적(力動的)인 의미에서 ‘성삼위(聖三位)께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살아감’에 대해서는 ‘영혼의 노래’와 ‘사랑의 산 불꽃’ 안에서 대담하고 권위있는 설명이 주어진다. 그리스도교적 성성(聖性)과 일치는 위격적인 명칭을 가지는데, 이는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4) 인간에 대한 철저한 인식(認識)은, 성인께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또 그 위대함에 대해서 인식하신 것인데,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가지는 그 신화(神化)된 조건에 대해서나 악습(惡習)과 욕(慾)의 노예로서의 상황에 대해서 성인만큼 강하게 말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인간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극단(極端) 사이에서, 성인은 인간이 변모되어나가는 모든 양상을 묘사하셨다.
5) 대신덕(對神德)의 차원에 있어서는, 성인께서는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다. 불행히도 최근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이 공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아마 이것이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 영성(靈性)에 남겨주신 가장 훌륭한 부분일 것인데, 이는 그 대신덕(對神德)들이 가지는 기능들과 성인께서 그 대신덕들에 대해 해주시는 분석, 그리고 성인의 문제제기의 독창성 때문이다. 최근 수세기 동안에 ‘믿음의 신학자’로서 그분께 비교될 만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6) 어두운 ‘밤’은 갖가지 모습들을 가지는 그 전체가 성인에 의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솜씨로 묘사되고 분석되고 평가되었다. 실제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신비박사이신 성인께서 그 체험과 주제들에 대해 서술하셨던 그 내용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아니, 사실은 그 이상이다. 우리는 아직도 그 같은 ‘밤’이 적용되는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들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어려움들이란, 성인의 작품에 대한 독서가 그를 가슴아프게 하고 성인의 작품에 대한 이해가 그를 조바심나게하는 그런 선의(善意)의 독자가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말한다. 성인의 작품을 읽지도 않았고 읽을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잡는 트집은 다른 문제이다. 이 어려움들 중의 상당한 부분은 저자(著者)의 표현양식들과 한계점들이다. 한계점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성인께서 자유롭게 또 의식적으로 짊어지시는 것들이고, 둘째는 성인의 문화나 체험이나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이며, 셋째는 그분을 그릇되게 비난하는 그런 점들이다.
성인께서 자유롭게 또 의식적으로 짊어지시는 것들 중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서는, 그분의 상징적이고 시적(詩的)인 어법(語法)을 들 수 있겠는데, 이것은 사실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독자에게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다.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한 어려움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당신께서 독자들에게 주시는 지침(指針)들의 엄격함과, 무엇보다 영성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점들 -말하자면 기도의 방법이나 전례생활· 사도직이나 형제적 사랑 등-에 대해 당신께서 침묵하신다는 점이다. 영성생활에 있어서의 이런 중요한 점들은 사실 당신 자신께서 실천하고 사셨던 것들이지만, 성인께서는 당신 저서들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성인께서는 대신덕적(對神德的) 삶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무엇에 더 마음을 쓰시는데, 사실 이것이 영성생활에 필요한 그런 모든 수단들을 배양해주는 바탕이 된다.
성인께서 사셨던 그 시대로부터, 당신 삶의 특수한 방식으로부터, 혹은 그분의 개인적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한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비록 그 신비적 현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비적 현상들을 성인께서 부각시키신 점, 어떤 내적(內的) 상태들을 아주 상세히 분석하신다는 점, 역사(歷史)나 공동체의 가치 등에는 별로 관심을 쏟지 않으셨다는 점 등이다. 성인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부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인간적 체험에 있어서는 비교적 더 풍요로운 그분의 생애의 기록 즉 전기(傳記)를 먼저 잘 읽고 이해한 후에 그분의 작품 전체를 읽는 것이다. 그 외의 수단으로서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종교적 환경을 잘 보여주는 ‘개관’(槪觀) 부분들을 잘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일련의 근거없는 고발들이 있는데, 이는 대신덕적(對神德的) 성격을 가진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나 그분의 작품들의 구조에 대해서나 또 그분의 어법(語法)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다. 이런 고발들이 지적하는 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에 대한 부정, 현실에 대한 과소평가, 엘리트(elite) 의식(意識), 심리주의 (心理主義, psicologismo), 개인주의 등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당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시고 무슨 설명을 하지도 않으신다. 각자가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하도록 내버려두신다. 역사(歷史)가 그분에 대한 보증을 맡아한다. 그분께 대한 비평가(批評家)들이나 그들의 작품은 역사 안에서 잊혀져버리는 반면에, 이 위대한 스승의 작품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살아있는 것이다.
독서의 방법
요한 성인께서는 당신의 작품들을 읽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다. 그 점에 대해서 성인께서는 당신의 지도를 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설명하셨다. ‘서문’(序文)들 안에서, 또다른 기회들을 통해서, 성인께서는 당신께서 모르시는 모든 독자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다:
1) 그 첫 번째 규범은, 어떤 영(靈)의 공감(共感)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사랑의 산 불꽃’의 서문(序文)에 나타나는 고백은 이 사실을 훌륭하게 드러내보인다. 성인께서는 체험(體驗)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해설’을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빛들과 새로운 열정들을 바라셨다. “왜냐하면, 친밀한 영(靈)을 가지고서가 아니면 영(靈) 안에서조차도 잘못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노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성인께서는 어떤 친밀함 혹은 공감(共感)을 요구하신다: “그런 ‘닮음’들은, 그 자체에로 이끌어주는 사랑의 영(靈)의 단순성(單純性)과 지성(知性)으로 읽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성(理性)에 맡겨진 말씀이라고 보이기보다는 엉터리로 보이는 법이다.” (노래 서문 1). 체험이 증명해주는 바에 따르면, ‘교양은 있고 영(靈)은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교양은 없어도 영(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를 더 잘 알아듣는다.
2) 두 번째 법칙은, 지성적(知性的) 추리(推理)의 절제라는 점이다. 성인께서는 ‘가르멜의 산길’의 한 장(章)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하신다. (산길 2,29). 그러나, 더 완전한 설명은 1587년 11월 22일자로 베아스(Beas)의 가르멜수녀들에게 보내신 두 번째 편지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알고자 하는 노력도 그만큼 많지만, 그런 것은 영(靈)의 생명에 활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꺼버리는 데나 쓰이는 것이다. “만일 부족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글을 쓰거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흔히 지나치게 많은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것은 침묵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영(靈)의 힘을 분산시키고 침묵하고 일하는 것은 그 영(靈)의 힘을 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3) 방법론의 세 번째 원칙으로는, 독자(讀者)의 창의력(創意力)을 들 수 있다. 독자에게 이미 동화(同化)된 무엇을 줄 수 있는 저자(著者)는 없다. 요한 성인은 당신 작품을 읽는 독자가 살아있고 은총과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셨다. 그런 독자에게 성인께서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물들을 밝혀주시려 애쓰셨던 것이고, 그런 하느님의 선물들을 만들어내려 하신 것이 아니었다. ‘설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실재’(實在)에 종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께서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나 성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나 혹은 각자가 자신의 삶의 구성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건드리지 않으셨던 것이다. 성인께서는 그런 활동들을 암시하셨다. 만일 독자가 전혀 아무런 체험도 활기도 가지지 못한 상태라면, 이런 결핍된 상태를 보충해줄 수 있는 ‘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4) 다음으로 요구되는 방법은 성인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는 당신의 존재와 사상을 상호보완적인 다수의 작품들 안에 쏟아놓으셨다. 그리고 그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가르침을 조금씩 조금씩 주신다. 따라서, -독자가 자신의 삶의 각 순간에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성인 작품의 어느 한 부분만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전체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성인의 작품들 안에는 하느님께 대한, 또 은총· 일치· 죄(罪)· 사랑 등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독자가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성인께서는 이런 것들을 ‘영혼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혹은 ‘사랑의 산 불꽃’ 안에서 설명하신다. 실용적인 몇몇 부분들만을 읽는 것은 곧 심각한 오류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5) 또한 성인의 작품들은 지혜롭게 읽어야 한다. 어떤 체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나 체험이나 삶이 배여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비슷한 ‘체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읽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읽기’란,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어떤 상황으로부터’ 과거의 그 강한 체험을 읽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급’을 우리는 신약성서나 현대교회가 가진 ‘유사(類似)하지만 다른’ 체험들을 가지고 읽는다. 환경들· 상황들· 문화들이 달라졌지만, 새로운 지평(地平)을 향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은 그 동일한 체험인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둔 밤, 믿음 안에서 뵙는 하느님, 욕(慾)들로 의해 실추(失墜)되어버린 인간 등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영적(靈的)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성인의 작품들을 최소한이나마 어떤 체험적인 동요(動搖)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다. 성인의 작품들을 단순히 대면하거나 단순히 그 말마디를 분석하는 것으로서는 성인의 작품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명을 얻어내지 못한다.
6) 마지막으로, 성인의 작품은 실존적인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세계는, 그분의 의도나 그분의 체험만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의 실재(實在)까지도 계속 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당신의 설명을 더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신비박사이신 성인께서는 중심적인 실재(實在)들을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따로따로 표현하시는데, 말하자면 ‘가르멜의 산길’에서는 부정(否定)을, ‘어둔 밤’에서는 어두움을, ‘영혼의 노래’에서는 사랑의 일치를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그 실재(實在)들을 추상화(抽象化)하시고, 보편적인 어떤 적용을 위해서 그것들을 마치 ‘자립적(自立的)인 무엇’처럼 만드신다. 그러나, ‘밤’도 ‘사랑의 일치’도 어떤 고립된 내면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구체적인 실존(實存)의 일상사(日常事)들 안에서, 그의 모든 과제들과 노력들, 사소한 일들,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온갖 하찮은 일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인께서는 수많은 일거리들,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들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에 둘러싸여서 당신의 그 감탄할 만한 신비적 삶을 영위하셨다.
오늘의 인류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꼭 맞추어진 듯한 이 관상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인의 뛰어나심은 바로 그분의 실제적인 삶, 내적(內的)이고 외적(外的)인 그 삶으로부터 더 잘 드러나는 것이다.
페데리꼬 루이쓰 (Federico Ruiz) 신부, O.C.D.
각주 1
이 첨부된 서문들 안에서는, 성인의 작품을 읽고 그분의 글을 이해하는 데에 불가결한 본질적인 자료들만을 제시할 것이다. 그 이상의 분석이나 문제점 파악에까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이 책의 끝부분에 첨부된 ‘주제별 참고문헌목록’에서나, 혹은 본인의 보다 더 광범위한 연구서 (Federico Ruiz Salvador, Introducción a S..
각주 2
순교자들의 엘리세오 (Eliseo de los Mártires) 신부, 영(靈)에 대한 의견들 (dictámenes de espíritu). 이 증언은 이 책 (전집 제 5판)의 끝부분에 들어있다.
각주 3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육체적인 면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한 연구는 M. Florissone의 Jean de la Croix. Iconographie général (Bruges, 1975, 411pp.)이다. 성인의 심리학적이고 도덕적인 생애묘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약문들이 있다: Silverio de Santa Teresa의 Historia del Ca..
각주 4
십자가의 요한 성인을 결정적으로 특징짓는 일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평가들과 비판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오로지 대신덕적(對神德的)인 평가들과 비판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각주 5
J. Baruzi, Saint Jean de la Croix et le problème de l'expérience mystique, París, 1931, pp.229-231. [譯者 註] 쟝 바루지 (Jean Baruzi: 1881-1953) 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 대한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 프랑스 ..
각주 6
[譯者 註] Jiménez de Cisneros: Toledo의 대주교(大主敎)이자 추기경(樞機卿)이었음.
각주 7
그 세기의 종교적 환경에 대해서는, 몇몇 학자들이 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연구서들과 참고문헌목록으로 충분하기를 바란다: AA. VV. (多數人 共著)의 Espagne: L'âge d'or (Dict. Spirit., 4, 1122-1178)과 A. Huerga의 글 La vida cristiana en los siglos XV-XVI (AA. VV., Hi..
각주 8
이 구분은 사인쓰 로드리게쓰 (Sainz Rodríguez) 신부의 저서 Introducción a la literatura mística española (Madrid, 1927)의 217페이지 이하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전 단계의 시기들 안에서도 -비록 그렇게 뛰어난 분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뛰어난 분들이 계셨던 만큼, 이 구분은 다소간 변경되어야 할..
각주 9
성인은 옛 가르멜의 영성적 유산(遺産)을 받아들이셨고 데레사적 카리스마의 새로운 창의력을 거기에 심으셨다. 말씀이나 저술(著述)을 통한 그분의 가르침은 개혁가르멜회의 수사들‧ 수녀들과의 활기찬 내적(內的) 대화 안에서 더욱 심화(深化)되었다.
각주 10
명백한 인용문들과 함축적인 인용문들에 대해서는 Simeón de la S. F.의 글 Fuentes doctrinales y literarias de Juan de la Cruz (Monte Carmelo, 69호, 1981년, pp.103-109)를 참조하라. 이 글은 단지 그 안에 밝혀진 인용문들에 대한 수치 때문에 여기서 소개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
각주 11
Eulogio Pacho, Juan de la Cruz y sus escritos, Madrid, 1969, pp.21-22. 이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의 구성과 그 역사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저서이다.
각주 12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책으로서는 G. Morel의 저서 Le sens de l'existence selon saint Jean de la Croix (I, París, 1960, pp.143-181)을 참조하라.
각주 13
독서의 순서에 대해서는, 이를 지도해줄 만한 도식(圖式)이 몇 가지 있다. 다음의 저서들을 참조하라: Lucien-Marie de St. Joseph, Un guide de lecture pur saint Jean de la Criox, Vie Spirituelle, 101 (1959), pp.414-423; G. Morel, Le sens de l'ex..
각주 14
[譯者 註] trascendente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막연하게 ‘초월적 존재’라고 번역했다. 참고로 밝힌다면, trascendente와 trascendental 두 가지 개념은 Kant의 철학적 개념들인데,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Kant는 이 두 개념을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했다. trascendente는 초월적인 존재 자..
각주 15
J. L. Aranguren의 저서 Introducción a las Obras de San Juan de la Cruz (Ed. Vergara, Barcelona, 1965)의 37페이지를 참조하라.
각주 16
십자가의 성 요한 전집 (불어판) 중에서 Lucien-Marie 신부에 의해 쓰여진 ‘가르멜의 산길’ 서문을 참조하라: Oeuvres Complètes, Ed. Desclée de Brouwer, 4a ed., París, 1967, p.38.
각주 17
Revista de Espiritualidad 잡지 35호 (1976년)의 356-376페이지에 있는 본인 (Federico Ruiz)의 글 San Juan de la Cruz, realidad y mito를 참조하라.
각주 18
다양한 의견들이 본인 (Federico Ruiz)의 저서 Introducción a San Juan de la Cruz의 282-292 페이지에 수집‧ 평가되어 있다.
각주 19
Crisógono de J. S. 신부의 저서 San Juan de la Cruz: el hombre, el doctor, el poeta (Barcelona, 1935) 중에서 56페이지 이하를 참조하라.
각주 20
‘신비신학’(神秘神學)이란 영성(靈性)에 있어서, 또 십자가의 요한 성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라: M. Aguilar Schreiber, Mistagogia. Comunicazione e vita spirituale, (Ephemerides Carmeliticae, 28 (1977), pp.3- ..
각주 21
Silverio de S. T. 신부의 저서 Historia del Carmen Descalzo 5권 394페이지를 참조하라. 성인께서 대화를 얼마나 쉽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증인은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그분께 간청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단히 만족스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나는 그분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랐는데, 그분은 내게 ..
각주 22
BMC, 14, p.301를 참조하라. 성인의 교육방식과 성인의 가르침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하라: José Vicente Rodríguez, Magisterio oral de San Juan de la Cruz (Revista de Espiritualidad, 33 (1974), pp.109-124); José Vicente Rodríg..
각주 23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 안에 나타난 일반적인 상징들과 특별한 상징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서들이 있고, 특히 ‘어둔 밤’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 이 책의 끝부분에 첨부된 주제별 참고문헌목록을 참조하라.
각주 24
이 문제와 ‘서문’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Eulogio de la V. C. 신부의 글 El 'prólogo' y la herme- néutica del 'Cántico Espiritual' (Monte Carmelo, 66 (1958), pp.1-108)을 참조하라.
각주 25
F. Urbina, La persona humana en San Juan de la Cruz, Madrid, 1956, p.18.
각주 26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상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본인 (Federico Ruiz)의 글 El símbolo de la noche oscura (Revista de Espiritualidad, 44 (1985), 91페이지 이하)를 참조하라.
각주 27
J. L. Aranguren, San Juan de la Cruz, Madrid, 1973, p.106.
각주 28
이 판단은 Censura y parecer···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어떤 신비적 글에 대한 성인의 간단한 판단이다.
각주 29
Silverio de S. T., BMC, 10, pp.166,167,168.
각주 30
[譯者 註] 17세기 말경에 미겔 몰리노스 (Miguel Molinos)에 의해 시작된 이단적인 신비사상으로, 인간완성에 있어서의 인간 자신의 완전한 수동성(受動性)을 주장했던 사상이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에 의해 단죄되었다.
각주 31
“영혼들의 세계 안에서 성인께서 나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이 부분은 검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다. 영(靈)의 이 정교한 세계들 안에서, 하느님의 내적(內的)이고 살아있는 계시(啓示)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계들의 조화로운 현존(現存)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안에 숨어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
이 첨부된 서문들 안에서는, 성인의 작품을 읽고 그분의 글을 이해하는 데에 불가결한 본질적인 자료들만을 제시할 것이다. 그 이상의 분석이나 문제점 파악에까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독자들은, 이 책의 끝부분에 첨부된 ‘주제별 참고문헌목록’에서나, 혹은 본인의 보다 더 광범위한 연구서 (Federico Ruiz Salvador, Introducción a San Juan de la Cruz, BAC, Madrid, 1968)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순교자들의 엘리세오 (Eliseo de los Mártires) 신부, 영(靈)에 대한 의견들 (dictámenes de espíritu). 이 증언은 이 책 (전집 제 5판)의 끝부분에 들어있다. [본문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육체적인 면에 대해서 가장 광범위한 연구는 M. Florissone의 Jean de la Croix. Iconographie général (Bruges, 1975, 411pp.)이다. 성인의 심리학적이고 도덕적인 생애묘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약문들이 있다: Silverio de Santa Teresa의 Historia del Carmen Descalzo의 5장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성격’ (pp.382-410), Crisógono de J. S.의 Vida‧‧‧의 21장 ‘십자가의 성 요한에 대한 묘사’ 부분, E. Allison Peers의 San Juan de la Cruz, espíritu de llama (Madrid, 1950)의 ‘성격’ 부분 (pp.89-101)을 참조하라. 필적학(筆跡學) 분야에서는 두 가지 연구가 있다: Bruno de J. M. 신부에 의해 출판된 S. Bressard의 L'Espagne mystique (París, 1946)의 33-34페이지, J. M. Moretti의 Los santos a través de su escritura (Madrid, 1964)의 244-245페이지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을 결정적으로 특징짓는 일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평가들과 비판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오로지 대신덕적(對神德的)인 평가들과 비판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본문으로]
J. Baruzi, Saint Jean de la Croix et le problème de l'expérience mystique, París, 1931, pp.229-231. [譯者 註] 쟝 바루지 (Jean Baruzi: 1881-1953) 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 대한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 프랑스 철학자임. 그의 저서 ‘Saint Jean de la Croix et le problème de l'expérience mystique'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이었음. [본문으로]
[譯者 註] Jiménez de Cisneros: Toledo의 대주교(大主敎)이자 추기경(樞機卿)이었음. [본문으로]
그 세기의 종교적 환경에 대해서는, 몇몇 학자들이 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연구서들과 참고문헌목록으로 충분하기를 바란다: AA. VV. (多數人 共著)의 Espagne: L'âge d'or (Dict. Spirit., 4, 1122-1178)과 A. Huerga의 글 La vida cristiana en los siglos XV-XVI (AA. VV., Historia de la Espiritualidad, II, Barcelona, 1969, pp.3-139; 특히 pp.75-131의 España mística 부분), 그리고 J. Caro Baroja의 Las formas complejas de la vida religiosa: Religión, sociedad y carácter de España de los siglos XVI y XVII (Madrid, 1978)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이 구분은 사인쓰 로드리게쓰 (Sainz Rodríguez) 신부의 저서 Introducción a la literatura mística española (Madrid, 1927)의 217페이지 이하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전 단계의 시기들 안에서도 -비록 그렇게 뛰어난 분들은 아니지만- 실제로 뛰어난 분들이 계셨던 만큼, 이 구분은 다소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성인은 옛 가르멜의 영성적 유산(遺産)을 받아들이셨고 데레사적 카리스마의 새로운 창의력을 거기에 심으셨다. 말씀이나 저술(著述)을 통한 그분의 가르침은 개혁가르멜회의 수사들‧ 수녀들과의 활기찬 내적(內的) 대화 안에서 더욱 심화(深化)되었다. [본문으로]
명백한 인용문들과 함축적인 인용문들에 대해서는 Simeón de la S. F.의 글 Fuentes doctrinales y literarias de Juan de la Cruz (Monte Carmelo, 69호, 1981년, pp.103-109)를 참조하라. 이 글은 단지 그 안에 밝혀진 인용문들에 대한 수치 때문에 여기서 소개한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교의적(敎義的) 깊이나 성서적 원천에로 돌아가는 그분의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J. Vilnet, E. Pacho 등에 의한 다른 훌륭한 연구서들이 있다: 이 책 끝부분에 첨부된 주제별 참고문헌목록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Eulogio Pacho, Juan de la Cruz y sus escritos, Madrid, 1969, pp.21-22. 이는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의 구성과 그 역사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저서이다. [본문으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책으로서는 G. Morel의 저서 Le sens de l'existence selon saint Jean de la Croix (I, París, 1960, pp.143-181)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독서의 순서에 대해서는, 이를 지도해줄 만한 도식(圖式)이 몇 가지 있다. 다음의 저서들을 참조하라: Lucien-Marie de St. Joseph, Un guide de lecture pur saint Jean de la Criox, Vie Spirituelle, 101 (1959), pp.414-423; G. Morel, Le sens de l'existence, I, pp.182-183. [본문으로]
[譯者 註] trascendente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막연하게 ‘초월적 존재’라고 번역했다. 참고로 밝힌다면, trascendente와 trascendental 두 가지 개념은 Kant의 철학적 개념들인데, 우리말로 정확한 번역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Kant는 이 두 개념을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했다. trascendente는 초월적인 존재 자체, 즉 하느님과 연관된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이에 반해서 trascendental은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세계 안에 투영된 것, 말하자면 진리(眞理)‧ 선(善) 등등의 이데아(Idea)와 연관된 의미를 가진 말이다. [본문으로]
J. L. Aranguren의 저서 Introducción a las Obras de San Juan de la Cruz (Ed. Vergara, Barcelona, 1965)의 37페이지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십자가의 성 요한 전집 (불어판) 중에서 Lucien-Marie 신부에 의해 쓰여진 ‘가르멜의 산길’ 서문을 참조하라: Oeuvres Complètes, Ed. Desclée de Brouwer, 4a ed., París, 1967, p.38. [본문으로]
Revista de Espiritualidad 잡지 35호 (1976년)의 356-376페이지에 있는 본인 (Federico Ruiz)의 글 San Juan de la Cruz, realidad y mito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본인 (Federico Ruiz)의 저서 Introducción a San Juan de la Cruz의 282-292 페이지에 수집‧ 평가되어 있다. [본문으로]
Crisógono de J. S. 신부의 저서 San Juan de la Cruz: el hombre, el doctor, el poeta (Barcelona, 1935) 중에서 56페이지 이하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신비신학’(神秘神學)이란 영성(靈性)에 있어서, 또 십자가의 요한 성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들 중의 하나이다.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하라: M. Aguilar Schreiber, Mistagogia. Comunicazione e vita spirituale, (Ephemerides Carmeliticae, 28 (1977), pp.3- 58); Federico Ruiz, Caminos del Espíritu, 4a ed., Madrid, 1991, pp.43-45. [본문으로]
Silverio de S. T. 신부의 저서 Historia del Carmen Descalzo 5권 394페이지를 참조하라. 성인께서 대화를 얼마나 쉽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 증인은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그분께 간청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단히 만족스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나는 그분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랐는데, 그분은 내게 우리 주님께 대해서 밤낮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당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것처럼 당신께서도 전에도 지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BMC, 14, p.378). [譯者 註] BMC는 Biblioteca Mística Carmelitana (v.10-25, 1929-1994)의 약자(略字)임. [본문으로]
BMC, 14, p.301를 참조하라. 성인의 교육방식과 성인의 가르침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하라: José Vicente Rodríguez, Magisterio oral de San Juan de la Cruz (Revista de Espiritualidad, 33 (1974), pp.109-124); José Vicente Rodríguez, ¿San Juan de la Cruz, talante de diálogo? (Revista de Espiritualidad, 35 (1976), pp.491-533). [본문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 안에 나타난 일반적인 상징들과 특별한 상징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서들이 있고, 특히 ‘어둔 밤’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 이 책의 끝부분에 첨부된 주제별 참고문헌목록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이 문제와 ‘서문’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Eulogio de la V. C. 신부의 글 El 'prólogo' y la herme- néutica del 'Cántico Espiritual' (Monte Carmelo, 66 (1958), pp.1-108)을 참조하라. [본문으로]
F. Urbina, La persona humana en San Juan de la Cruz, Madrid, 1956, p.18. [본문으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상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는 본인 (Federico Ruiz)의 글 El símbolo de la noche oscura (Revista de Espiritualidad, 44 (1985), 91페이지 이하)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J. L. Aranguren, San Juan de la Cruz, Madrid, 1973, p.106. [본문으로]
이 판단은 Censura y parecer···이라는 제목이 붙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어떤 신비적 글에 대한 성인의 간단한 판단이다. [본문으로]
Silverio de S. T., BMC, 10, pp.166,167,168. [본문으로]
[譯者 註] 17세기 말경에 미겔 몰리노스 (Miguel Molinos)에 의해 시작된 이단적인 신비사상으로, 인간완성에 있어서의 인간 자신의 완전한 수동성(受動性)을 주장했던 사상이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에 의해 단죄되었다. [본문으로]
“영혼들의 세계 안에서 성인께서 나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이 부분은 검증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다. 영(靈)의 이 정교한 세계들 안에서, 하느님의 내적(內的)이고 살아있는 계시(啓示)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계들의 조화로운 현존(現存)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안에 숨어계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초자연적 사랑의 어떤 신비로운 체험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이 알아듣기 힘든 체험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 부분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거의 모든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채 감춰진 것이고, 동서양(東西洋)의 모든 인간들 안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의 작품들은 더 뛰어난 영혼들이 더 선호(選好)하는 양식(糧食)들 중의 하나이다.” B. Jiménez Duque, En torno a San Juan de la Cruz, Barcelona, 1960, p.90. [본문으로]
|
|
혹 글을 퍼오실 때는 경로 (url)까지 함께 퍼와서 올려 주세요 |
|
자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이단 자료는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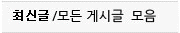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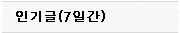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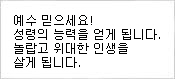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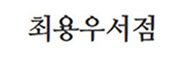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