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문기사에 나오는 할머니들

△영화마을입구에서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까세요) (사진:최용우)
영화마을
금곡마을 들어가 오른쪽 첫 초가집에 `우리들의 할머니'가 사신다. 한 지붕 밑에, 한 사람처럼 얽혀 살아온 두 명의 할머니. 등이 몹시 굽었고 귀가 어두운 `늙은 할머니'와 호호백발에 말을 척척 받아넘기는 이 집 대변인 `젊은 할머니'다. 윤묘순(90)씨와 김정숙(75)씨. 외지 사람들은 시어머니·며느리로 지레짐작한다.
가부장적 전통을 받들어 `일부종사'하며 한평생 살아온 한 남자의 두 아내다. “바깥양반? 은제 돌아간지는 시지도 못여. 30년이 넘어부럿응게. 그때부터 저 할망구하구 지겹게두 살아왔지라.” 김씨가 마당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윤씨를 은근한 눈길로 가리킨다.
아들 선호풍습이 두 여자를 함께 살게 했다. 윤씨는 열일곱에, 김씨는 열아홉에 이곳으로 시집왔다. “웬 남정네가 와선 아부지 술 잔뜩 멕이더니만, 이리로 시집을 보내버리더랑게.” 김씨는 딸만 셋이던 집에 재취로 들어와 아들을 낳았다.
“아, 사이좋게 살았응게 늙바닥까지 와부럿지라. 누가 먼저 죽을랑가 경쟁하고 있는디, 뭣 싸울기 있겄어.”
굽은 허리로 요강을 비우는 `첫째'를 `둘째'가 부르신다. 밥상 차려놓고 큰 소리로 부르신다. “아 놔두고 싸게 밥좀 드씨요잉.” 한 할머니는 잇몸으로 오물오물, 마루에 걸터앉아, 다른 할머니가 차려준 점심을 드신다.
두 할머니는 서로 보살피며 기대며 다시 비단결같은 봄을 맞았다. 텃밭에 “참깨 들깨 콩 심궈먹으며” 산다. 윗집 사는, 환갑 넘긴 막내 사위 부부와 함께 `금슬 좋게' 늙어간다. “두분 좀더 붙어 앉으실래요. 사진 좀 찍게” 하자, “아 관둬부러어, 징그러버링게” 하면서도 `젊은 할머니'는 배시시 웃으며 다가앉는다. <한겨레신문 이병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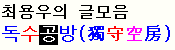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