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1강원일보 동화 당선작]
라무의 종이 비행기 -이순진

나는 책입니다. 권정생 작가님이 쓰신 몽실 언니지요. 몽실 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드라마까지 만들어진 유명한 책입니다. 하지만 2007년 개정 2판 68번째로 태어난 저는요, 비운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현서 방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현서에게 단 한 번도 읽히지 않은 채, 하루하루 헌 책이 돼 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자에 갇혀 어딘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설마, 신문이 말하던 재활용 공장은 아니겠지?”
낡은 동화책의 말에, 함께 갇혀 있던 책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휴, 이 바보들. 산악인 아저씨가 그랬잖아. 우리는 히말라야 셰르파족 마을 도서관에 기증될 책들이라고.”
오는 내내 잘난 척을 하던 영문판 백과사전이 말했습니다.
“히말라야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지. 우리가 갈 셰르파족은 산을 오르는 산악인들의 짐을 옮기고 길안내를 하는 종족이야. 셰르파족에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 대부분 산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거든. 아니면 손가락, 발가락이 없거나. 어때 끔찍하지?”
“히말라야? 도서관이라고?”
내가 끼어들자, 백과사전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가만, 야! 너는 영어로 된 책이 아니잖아!”
며칠 전, 현서 어머니가 영문판 해리포터 시리즈에 손을 내밀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해리포터 사이에 끼어 있던 나는 그대로 상자 안에 갇히게 된 거였구요.
“영어책이 아니면 어때? 나는 유명한 책이라고. 흥!”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서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읽을 게 틀림없으니까요.
드디어 상자가 열렸습니다. 볼이 발그스름한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얘들아, 이 책들은 한국 분들이 보내 준 선물이야.”
“와아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 한글 책도 있었네.” 아저씨가 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몽실 언니잖아. 이곳 아이들은 읽지 못할 텐데 어쩌지. 음…….”
“어, 이 그림이랑 라무랑 닮았어요!”
한 남자아이가 나를 보더니, 단발머리 여자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단발머리 여자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 정말 몽실이랑 라무랑 닮았네. 히말라야에도 몽실이가 있었어. 하하하.”
“와하하하!”
산악인 아저씨도 웃고, 아이들도 모두 웃었습니다. 라무라는 여자아이는 얼굴이 더욱 새빨개졌습니다.
첫날부터 나는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나를 보겠다며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하마터면 내 귀한 몸이 두 동강이 날 뻔도 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나를 대충 넘겨보기만 했습니다.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많으면 뭐 해. 어차피 읽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책인 걸.”
요즘 들어 자주 빌려나갔던 백과사전이 말했습니다.
“내가 왜 쓸모가 없어? 나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책이라고.”
“그건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여기는 한글을 모른다고. 아이들은 호기심에 너를 빌려갔던 것뿐이라고.”
“…….”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과사전의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도서관을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섭게 덜컹거리던 창문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째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친 모양입니다. 창밖으로 눈 쌓인 거대한 산봉우리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게 뭘까.”
고갯마루에 펄럭이는 화려한 깃발이 눈에 띄었습니다.
“룽다, 바람의 말이라고 하지.” 백과사전이 말했습니다.
“바람의 말?”
“이곳 사람들은 저 깃발에 소망을 적어. 바람이 그 소망을 세상에 전한다고 믿고 있거든.”
“바람의 말…….”
누군가가 나를 뽑아들었습니다. 깊고 까만 눈에 발그스름한 볼, 바가지 머리를 한 몽실이, 아니 라무였습니다. 오늘따라 라무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라무는 주위를 살피더니, 나를 재빨리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도 도둑이야! 라무가 나를 훔쳤어요!”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무는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선생님한테로 갔습니다.
“라무는 책을 참 많이 읽는구나. 음……. 아버님이 이번에 떠난 한국 원정대의 사다(포터의 리더)라고 했지? 걱정이 많겠구나. 아직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서…….”
“네에…….” 라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무야, 신이 지켜주시니까 아버님은 무사하실 거야.”
선생님이 라무의 들썩이는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라무는 도서관에서 나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야야, 야 이 책도둑아! 나를 당장 도서관에 데려다 놓으란 말이야!'
얼마나 달렸을까요. 덜컹거리던 가방이 잠잠해졌습니다. 라무가 가방에서 나를 꺼냈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어.”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못된 애였구나.'
라무가 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까치발을 서자 나는 하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내 몸을 휘감았습니다. 하늘이 온통 새파랗습니다. 나부끼는 색색의 깃발 사이로, 우뚝 솟은 새하얀 산봉우리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요.
`잠깐, 라무는 나쁜 아이라고!'
라무가 나를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도 라무의 얼굴을 빤히 노려보았습니다. 갑자기 라무의 눈망울이 흐려졌습니다.
“너는 어떤 이야기일까? 아마 나처럼 동생을 업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꺼칠한 손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라무는 내 얼굴에 그려진 몽실이와 난남이를 손끝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거친 바람은 부드럽게, 찬바람은 따뜻하게, 흰눈은 하얀 꽃송이로…….”
나는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덜컹덜컹. 가방 속에서 몽당연필과 지우개가 자꾸 내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라무는 다시 쉬지 않고 달리는 모양입니다.
나는 정말이지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현서에게 한 번도 읽히지 않고 헌 책이 돼 버렸잖아요. 지금은 나를 읽지도 못하는 이상한 나라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제일 절망적인 것은 책도둑의 침대 밑에 꽁꽁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깜짝이야.' 라무가 침대 밑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꺼내 소매로 내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밍마야, 이리와. 언니가 책 읽어줄게.”
`뭐? 책을, 아니 나를 읽어준다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닐곱 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무는 밍마를 옆에 앉혀놓고 나를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라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밍마야, 잘 봐. 이건 언니고 여기 업혀 있는 아기는 바로 너야.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가족 이야기야.”
드디어 첫 장이 넘겨졌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라무가 나를 읽을 수 있을까요?
“네팔의 히말라야 남체 마을에 라무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라무의 아버지는 고산등반을 돕는 용감한 포터였습니다. 원정대의 일을 도왔지만, 라무의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모든 봉우리를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건 몽실 언니 이야기가 아니잖아.'
벅차올랐던 가슴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무는 엉터리로 나를 지어내는 거였습니다.
“언니, 밍마는 언제 나와?”
“으응, 다음 장에 나올 거야.”
라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엉터리로 지어냈습니다.
“라무의 아버지는…….”
“아니, 밍마 아버지이.”
“그래. 밍마 아버지는 한국 원정대의 일을 도와 산으로 떠났습니다. 며칠째 거센 눈보라가 계속되었습니다.”
미지근한 것 한 방울이 내 위로 떨어졌습니다.
“언니, 울어?”
“바보야, 울긴 누가 울어. 아빠는 무사하셔. 한눈 팔지 말고 잘 들으란 말이야. 라무와 밍마의 아버지는 원정대와 함께 눈구덩이 속에서 눈보라를 피했습니다. 눈보라가 그치자, 라무와 밍마의 아버지는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라무와 밍마는 달려 나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두 공주님, 아빠 없는 동안 말썽 안 피우고 엄마 말 잘 들었지?” “밍마가 이불에 오줌을 세 번이나 싼 것만 빼면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밍마의 이마에 꿀밤을 콩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라무와 밍마를 아주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라무와 밍마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라무야, 밍마야, 원정대가 돌아왔단다!”
밖에서 라무의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라무와 밍마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몸은 반으로 펼쳐진 채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21장 아버지의 죽음.' 라무가 넘겨보던 장이었습니다.
나는 며칠째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으니 자꾸 잠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어, 라무야!”
나는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라무가 나에게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신께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흰 산이 아버지를 데려간 거야.” 라무의 눈물이 자꾸 내 몸에 젖어들었습니다.
`아아, 내가 왜 이러지. 몸이 너무 뜨거워.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몸속 여기저기에서 `가슴이 아팠다'라는 문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아픔', `눈물', `기쁨' 감정을 나타내는 글자들까지 두근거렸습니다.
“몽실아, 어서 가자. 방문을 꼭꼭 닫아걸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이를 재촉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첫 장을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라무가 나를 읽을 수 없다면, 내가 라무에게 나를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라무야, 이야기가 슬프더라도 더 이상 울지는 마.'
나는 내 몸의 글자들을 다시 읽어나갔습니다.
“최 선생님은 누구나 자기의 길은 자기가 잘 알아서 걸어가라 했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걸어간다는 게 무어가 무언지 모르겠구나. 좀 더 크면 알게 될까?”
“으응, 알 수 있을 거 같아.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
라무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무는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 바람의 말…… 소망을 적어 하늘에 보낸다…….”
도서관에서 보았던 룽다라는 화려한 깃발이 떠올랐습니다.
`권정생 작가님, 죄송해요. 2007년 개정 2판 68번째로 태어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안에 있는 글자들을 찾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하는 게 책이지만, 어차피 나는 보여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몽실이는 편지를 썼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세요. 저는 슬프고 고단한 날이 계속되어도 아주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몽실이는 편지로 비행기를 곱게 접었다.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몽실이는 힘껏 비행기를 날렸다.”
나는 지금 백여 개의 종이비행기가 되어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가깝다는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내 몸 하나하나에는 라무의 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몽실이처럼 아주 씩씩하게 살아갈 거라고, 엄마와 밍마를 잘 돌보겠다고.
“아버지에게 내 편지 꼭 전해줘!”
펄럭이는 룽다 사이로, 힘차게 손을 흔드는 라무가 보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비운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라무의 특별한 종이비행기니까요.
따뜻한 바람이 부드럽게 내 몸을 감쌌습니다. 하얀 꽃송이로 뒤덮인 산봉우리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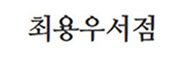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