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꽃씨와 도둑>은 최용우 개인 책방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최용우가 읽은 책의 기록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최용우 책방 구경하기 클릭! |
책을 클릭하면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완택목사님의 <민들레교회이야기>에 연재되었던 내용을 매주 열심히 타이핑해서 올려 나누어 보았던 글인데, 어느날 보니 책으로 엮여 나왔네요. 2-3편의 글믈 맛보기로 올립니다....
====================================================
物과 나눈 이야기들
1.부채
수덕사(修德寺) 법광(法光) 스님이 선물로 준 부채가 말을 걸어온다.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었듯이 너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라."
"한낱 부채인 주제에 네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지. 다시 말해보아라. 네가 스스로 나에게 선물이 되었는가?"
"그건 아니다, 법광(法光)이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이때 다른 음성 하나가 부채와 나 사이 틈을 타고 들어왔다.
"그 말도 잘못된 말이다. 그것은 눈에 뵈는 현상(現象)을 말한 것일 뿐, 진상(眞相)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상(眞相)인가?
"법광(法光)의 모습을 한 내가 부채의 모습을 한 나를 관옥(관玉)의 모습을 한 나에게 선물한 것이다."
"그런즉 내가 나에게 나를 선물한 것이란 말인가?"
"정확한 표현!"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삼체개공(三體皆空)의 원리가 그것 아닌가?"
"맞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나에게 선물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받음, 그것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왜 있어야 하는가?"
"선물을 주고 받음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명사(名詞)가 아니라 동사(動詞)다"
"그렇다면, 갑이 을의 부채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그것도 갑의 모습을 한 내가 을의 모습을 한 나에게서 부채의 모습을 한 나를 빼앗아 찢어버린 것인가?"
"그렇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인가?"
"그렇다"
"그건 궤변이다."
"옳다."
".........?"
"논리(論理)라는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신비(神泌)가 여기 있다. 그림자가 그림자로 존재하려면 먼저 빛이 있어야 한다. 그림자는 빛의 다른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사랑 아닌 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명심해 두어라, 이 세상에는 사랑의 표현 아닌것이 존재할 수 없음을... 모든 것이, 내가 나에게 드러내는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 일찍이 천상천하에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하지 않았더냐?"
"........."
"........."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채가 부채로 되기 위하여 무엇을 했더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선물이 되려고 무엇을 했더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부채가 되어아"
"제가 어떻게 하면 부채로 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미 부채다"
2. 정관평의 돌
작년이었던가? 영광(靈光)에 있는 원불교 영산성지(靈山聖地)에 갔다가 정관평 둑에서 주먹만한 잡석(雜石) 하나를 주워왔다. 지금 내가 앉아서 이 글을 쓰고있는 집의 상량일(上樑日)이 "大正 七年 七月..."이니 대종사가 방언공사를 시작한 바로 그해(1918)다.
나는 이 돌을 기도실 한 구석에 두고, 80년 전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은 곳에서 20대(代) 스승의 말 한마디에 묵묵히 복종하여 오로지 등짐으로 돌을 져 날랐을 도인(道人)들의 모습을 자주 상기(相起)코자 하였다.
어느날, 이 잡석(雜石)과 짧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네가 정관평 둑을 떠나 멀리 이곳까지 와서 어두운 방에 갖힌 지 오래니 전에 있던 자리가 그립지 아니하냐?"
"........."
"외롭지 아니하냐?"
"외롭지 않다. 여기에도 곁에 촛대가 있고 향로도 있고 또 요즘에는 노래기도 심심찮게 돌아다니니 외로울 까닭이 없다."
"그래도 처음부터 함께 있던 동무들을 떠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함께 있던 동무들이라니?"
"정관평의 다른 돌들 말이다."
"아니다. 처음부터 나는 혼자 있었다. 그러니 자네가 나를 정관평 들에서 주워오기 전이나 주워온 뒤나, 나에게는 달라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네가 외로워 보이는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자네 생각일 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더욱이 나는 돌이다."
"........."
"돌이니까 외로워 할 자격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나는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외로운 인간'이란 없는 것이다. 있다면 스스로 외롭다느 착각에 빠져있는 인간 또는 외로워 보이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
"외로움이란 실재(實在)가 아니라 관념(觀念)이다. 관념에서 오는 착각이다. 자네들이 말하는 '외로운 사람'이란 자기가 외롭다는 착각에 갖혀있는 사람이다. 외롭다는 말은 혼자 떨어져 있다는 말인데 신(神)은 만물을 지을 때 아무리 작은 것도 그것만 따로 떼어내어 짓지 않았다. 보라. '이웃'이 없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가?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허공에 날개를 띄운다. 특히 인간에게는 여섯개나 되는 문(門)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 여섯 경계(六境)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눈-色, 귀-聲, 코-香, 혀-味, 살갗-觸, 생각-法), 스스로 문을 닫아놓고서 나는 외롭다, 나는어둡다고 말하는 것이야 어쩔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연한 엄살이요 무지(無知)에 뿌리 내린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안경
기차에서 책을 보다가 문득 손에 들고 있는 안경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관용(寬容)에 대한 네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해줄 수 있겠느냐?"
"........."
"사람이 어떻게 하면 관용(寬容)을 베풀 수 있을까?"
"........."
"........."
묵묵부답. 한참 졸다가 깨어나 다시 물어 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 없다. 그렇다면 그만두지! 대화를 포기하고 예산역이 가깝다는 방송에 일어날 채비를 하는데..."
"나처럼 하면 되겠지."
".........?"
"나는 아무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
"다만, 나를 통해 자네가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따름이지. 하기는 그것도 내가 따로 '하는 일'은 아니다."
"그것이 너의 관용인가?"
"자네가 나를 통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만큼의 관용이겠지."
"그렇다면 그것은 네가 베푸는 관용은 아니쟎는가?"
"맞는 말이다."
"나는 관용에 대한 너의 생각을 물었다."
"방금 대답하지 않았나?"
"........."
"자네가 스스로 무엇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 자네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자네에게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가 있는 한, 바로 그 '나'(ego)가 문턱이 되어 관용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용은 백에서 아흔 아홉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에서 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아득한 창공(蒼空)을 보아라. 세상에 저보다 큰 관용이 어디 있겠는가? 창공(蒼空)은 공(空)이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 관용을 베풀려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없이 큰 관용을 영원히 베풀고 있는 것이다. 안경이 하늘처럼 투명하지 않다면, 그래서 본연(本然)의 맑고 깨끗함을 잃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이상 안경이 아니고 따라서 관용하고 그만큼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관용(寬容)이란, 내가 베푸는 무엇이 아니라 '나'를 맑게 비우는 것이다. 이게 관용에 대한 나,안경의 생각이다"
기차에서 내리기 직전, 나는 서둘러 안경알을 닦았다. 안경이 스스로 안경을 닭지 못한다는 사실이 위안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4. 휴대용 머리빗
대흥호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휴대용 머리 빗. 아내가 떠맡기다시피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준 물건이다. 대개 늘 그랬듯이 내가 먼저 말을 건넨다.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휴대용 머리빗이다."
"그건 나의 겉모습일 뿐이다."
"너의 속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다."
".........?"
"누군가 어떤 이유로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이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곧이 나를 정의(定義)한다면, 빗의 모양을 한 인간의 마음이다. 어찌 나만이 그렇겠는가?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침내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빗의 모양을 한 사랑인 것이다."
"........."
"그건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사랑의 주체이기 전에 사랑의 결실이다. 네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네가 태어난 것이다. 네 부모 또한 그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다. 모든 인간이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자식들이다. 이 땅에 생명이 있든 없든 존재하는 것은 모두 사랑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는자들도 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히틀러를 보라. 그는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지 않았나?"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다."
"뭐라고?"
"그가 얼마나 게르만 민족을 사랑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사랑이었다."
"잘못된 사랑도 사랑이지."
"그렇다면 세상에 사랑의 표현 아닌 것이 없쟎은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너 자신을 사랑이신 그분게 맡겨라"
"어뗗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이신 그분께 맡기는 것인가?"
"나처럼 하면 된다. 나는 내 몸을 몽땅 너에게 맡겼다. 나는 온전히 네것이다. 너는 나를 부러뜨릴수도 있고 잃어버릴수도 있고 잘 간직하여 머리 빗을 때마다 사용할수도 있다. 네가 나를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치 않는다. 그것이 내가 사랑의 결실답게 너를 사랑하는 길이다. 너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내것이다."
"너를 가진 너는 어디있는가?"
"........."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물에서 그를 보지 못한다면 너는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를 업신여기고 때리고 욕하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너를 몽땅 내어줄 수 있는가? 저 옛날 나자렛의 한 젊은 목수가 그랬듯이."
"........."
"네가 사랑이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 한 결코 그렇게 못할 것이다."
최완택목사님의 <민들레교회이야기>에 연재되었던 내용을 매주 열심히 타이핑해서 올려 나누어 보았던 글인데, 어느날 보니 책으로 엮여 나왔네요. 2-3편의 글믈 맛보기로 올립니다....
====================================================
物과 나눈 이야기들
1.부채
수덕사(修德寺) 법광(法光) 스님이 선물로 준 부채가 말을 걸어온다.
"내가 너에게 선물이 되었듯이 너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라."
"한낱 부채인 주제에 네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지. 다시 말해보아라. 네가 스스로 나에게 선물이 되었는가?"
"그건 아니다, 법광(法光)이 나를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이때 다른 음성 하나가 부채와 나 사이 틈을 타고 들어왔다.
"그 말도 잘못된 말이다. 그것은 눈에 뵈는 현상(現象)을 말한 것일 뿐, 진상(眞相)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상(眞相)인가?
"법광(法光)의 모습을 한 내가 부채의 모습을 한 나를 관옥(관玉)의 모습을 한 나에게 선물한 것이다."
"그런즉 내가 나에게 나를 선물한 것이란 말인가?"
"정확한 표현!"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삼체개공(三體皆空)의 원리가 그것 아닌가?"
"맞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나에게 선물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받음, 그것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왜 있어야 하는가?"
"선물을 주고 받음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표현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명사(名詞)가 아니라 동사(動詞)다"
"그렇다면, 갑이 을의 부채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그것도 갑의 모습을 한 내가 을의 모습을 한 나에게서 부채의 모습을 한 나를 빼앗아 찢어버린 것인가?"
"그렇다!"
"그것도 사랑의 표현인가?"
"그렇다"
"그건 궤변이다."
"옳다."
".........?"
"논리(論理)라는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신비(神泌)가 여기 있다. 그림자가 그림자로 존재하려면 먼저 빛이 있어야 한다. 그림자는 빛의 다른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사랑 아닌 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다. 명심해 두어라, 이 세상에는 사랑의 표현 아닌것이 존재할 수 없음을... 모든 것이, 내가 나에게 드러내는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 일찍이 천상천하에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하지 않았더냐?"
"........."
"........."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채가 부채로 되기 위하여 무엇을 했더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선물이 되려고 무엇을 했더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부채가 되어아"
"제가 어떻게 하면 부채로 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이미 부채다"
2. 정관평의 돌
작년이었던가? 영광(靈光)에 있는 원불교 영산성지(靈山聖地)에 갔다가 정관평 둑에서 주먹만한 잡석(雜石) 하나를 주워왔다. 지금 내가 앉아서 이 글을 쓰고있는 집의 상량일(上樑日)이 "大正 七年 七月..."이니 대종사가 방언공사를 시작한 바로 그해(1918)다.
나는 이 돌을 기도실 한 구석에 두고, 80년 전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은 곳에서 20대(代) 스승의 말 한마디에 묵묵히 복종하여 오로지 등짐으로 돌을 져 날랐을 도인(道人)들의 모습을 자주 상기(相起)코자 하였다.
어느날, 이 잡석(雜石)과 짧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네가 정관평 둑을 떠나 멀리 이곳까지 와서 어두운 방에 갖힌 지 오래니 전에 있던 자리가 그립지 아니하냐?"
"........."
"외롭지 아니하냐?"
"외롭지 않다. 여기에도 곁에 촛대가 있고 향로도 있고 또 요즘에는 노래기도 심심찮게 돌아다니니 외로울 까닭이 없다."
"그래도 처음부터 함께 있던 동무들을 떠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함께 있던 동무들이라니?"
"정관평의 다른 돌들 말이다."
"아니다. 처음부터 나는 혼자 있었다. 그러니 자네가 나를 정관평 들에서 주워오기 전이나 주워온 뒤나, 나에게는 달라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네가 외로워 보이는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자네 생각일 뿐,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더욱이 나는 돌이다."
"........."
"돌이니까 외로워 할 자격도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나는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사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다. '외로운 인간'이란 없는 것이다. 있다면 스스로 외롭다느 착각에 빠져있는 인간 또는 외로워 보이는 인간이 있을 뿐이다."
"........?"
"외로움이란 실재(實在)가 아니라 관념(觀念)이다. 관념에서 오는 착각이다. 자네들이 말하는 '외로운 사람'이란 자기가 외롭다는 착각에 갖혀있는 사람이다. 외롭다는 말은 혼자 떨어져 있다는 말인데 신(神)은 만물을 지을 때 아무리 작은 것도 그것만 따로 떼어내어 짓지 않았다. 보라. '이웃'이 없는 존재가 세상에 있는가?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허공에 날개를 띄운다. 특히 인간에게는 여섯개나 되는 문(門)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 여섯 경계(六境)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눈-色, 귀-聲, 코-香, 혀-味, 살갗-觸, 생각-法), 스스로 문을 닫아놓고서 나는 외롭다, 나는어둡다고 말하는 것이야 어쩔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연한 엄살이요 무지(無知)에 뿌리 내린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3.안경
기차에서 책을 보다가 문득 손에 들고 있는 안경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관용(寬容)에 대한 네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해줄 수 있겠느냐?"
"........."
"사람이 어떻게 하면 관용(寬容)을 베풀 수 있을까?"
"........."
"........."
묵묵부답. 한참 졸다가 깨어나 다시 물어 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 없다. 그렇다면 그만두지! 대화를 포기하고 예산역이 가깝다는 방송에 일어날 채비를 하는데..."
"나처럼 하면 되겠지."
".........?"
"나는 아무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
"다만, 나를 통해 자네가 사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따름이지. 하기는 그것도 내가 따로 '하는 일'은 아니다."
"그것이 너의 관용인가?"
"자네가 나를 통해서 사물을 받아들이는 만큼의 관용이겠지."
"그렇다면 그것은 네가 베푸는 관용은 아니쟎는가?"
"맞는 말이다."
"나는 관용에 대한 너의 생각을 물었다."
"방금 대답하지 않았나?"
"........."
"자네가 스스로 무엇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 그만큼 자네는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자네에게 무엇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나'가 있는 한, 바로 그 '나'(ego)가 문턱이 되어 관용의 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용은 백에서 아흔 아홉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열에서 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
"아득한 창공(蒼空)을 보아라. 세상에 저보다 큰 관용이 어디 있겠는가? 창공(蒼空)은 공(空)이기 때문에, 무엇을 향해 관용을 베풀려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없이 큰 관용을 영원히 베풀고 있는 것이다. 안경이 하늘처럼 투명하지 않다면, 그래서 본연(本然)의 맑고 깨끗함을 잃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이상 안경이 아니고 따라서 관용하고 그만큼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관용(寬容)이란, 내가 베푸는 무엇이 아니라 '나'를 맑게 비우는 것이다. 이게 관용에 대한 나,안경의 생각이다"
기차에서 내리기 직전, 나는 서둘러 안경알을 닦았다. 안경이 스스로 안경을 닭지 못한다는 사실이 위안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4. 휴대용 머리빗
대흥호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휴대용 머리 빗. 아내가 떠맡기다시피 억지로 주머니에 넣어준 물건이다. 대개 늘 그랬듯이 내가 먼저 말을 건넨다.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휴대용 머리빗이다."
"그건 나의 겉모습일 뿐이다."
"너의 속모습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다."
".........?"
"누군가 어떤 이유로 나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겠다는 그 마음이 이런 모양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곧이 나를 정의(定義)한다면, 빗의 모양을 한 인간의 마음이다. 어찌 나만이 그렇겠는가?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침내 사랑이다. 그러므로 나는 빗의 모양을 한 사랑인 것이다."
"........."
"그건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사랑의 주체이기 전에 사랑의 결실이다. 네 부모의 사랑의 결실로 네가 태어난 것이다. 네 부모 또한 그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다. 모든 인간이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자식들이다. 이 땅에 생명이 있든 없든 존재하는 것은 모두 사랑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사랑하지 않는자들도 있다"
"아니, 그런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히틀러를 보라. 그는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지 않았나?"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었다."
"뭐라고?"
"그가 얼마나 게르만 민족을 사랑했는지 모른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사랑이었다."
"잘못된 사랑도 사랑이지."
"그렇다면 세상에 사랑의 표현 아닌 것이 없쟎은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너 자신을 사랑이신 그분게 맡겨라"
"어뗗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이신 그분께 맡기는 것인가?"
"나처럼 하면 된다. 나는 내 몸을 몽땅 너에게 맡겼다. 나는 온전히 네것이다. 너는 나를 부러뜨릴수도 있고 잃어버릴수도 있고 잘 간직하여 머리 빗을 때마다 사용할수도 있다. 네가 나를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치 않는다. 그것이 내가 사랑의 결실답게 너를 사랑하는 길이다. 너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내것이다."
"너를 가진 너는 어디있는가?"
"........."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물에서 그를 보지 못한다면 너는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너를 업신여기고 때리고 욕하고 마침내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에게 너를 몽땅 내어줄 수 있는가? 저 옛날 나자렛의 한 젊은 목수가 그랬듯이."
"........."
"네가 사랑이신 그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않는 한 결코 그렇게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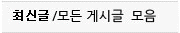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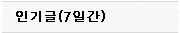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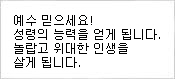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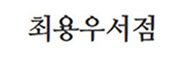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