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흔아홉 우리 할머니 -이은강
1.
휙, 바람처럼 사라져간 그림자.
개?
남포 심지에 불을 붙이던 동녘의 손가락이 그대로 멈춘다.
대문까지 달려나와 주위를 살펴보지만 이미 그림자는 흔적도 없다. 어느새 어스름이 발목을 휘감을 뿐.
아직도 시선은 대문 밖에 둔 채로 동녘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성냥을 부욱 그었다.
'대문 앞 외등이라도 켜둘걸.'
그러나 마음뿐 차마 스위치엔 손도 대지 못한다.
2.
밤이 되어 불을 켜면 할머니는 무릎에 고개를 묻고 소리치셨다.
'불빛이 눈을 찌르는구나.'
식구들이 안절부절 스위치를 내리면 또 역정을 내셨다.
'왜 이리 앞이 캄캄하단 말이냐?'
그 때 동녘이 광속의 남포등을 생각해 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기웃둥 앉아있는 베틀 맞은편의 빗살 모양 나무 창 아래 먼지를 보오얗게 쓰고 나란히 걸려있는 남포등 세 개. 호리병 몸통에 비스듬히 갓을 쓴 채 붙박이처럼 매달려있던 그것들이 하나는 할머니 방에 또 하나는 대문간에, 이제와서 밤을 밝힐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반닫이 위에 조심스레 남포등을 올려놓고 난 동녘은 안타깝게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는 살짝 침을 바른 오른 손바닥으로 곧추 세운 왼쪽 무릎을 연신 문지르신다. 모시를 삼고 계시단다. 허공을 그어 올곧게 갈라낸 모시풀을 무릎에 문질러 이어내고 또 이어내고…
할머니는 새댁 때부터 솜씨좋은 길쌈꾼이셨단다. 그러나 동녘은 길쌈은 고사하고 모시풀조차 본 적이 없으니 그건 벌써 아득한 옛날 일이 되었나 보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근심스레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조차 까맣게 잊으시고는 벌써 수 십년 전 지난 일을 바로 지금인 듯 생생히 손놀림하시며 중얼중얼 입안엣 소리를 되뇌이신다.
'어디서 밤길을 헤매시나 우리 큰 아드님. 모시 광주리는 넘쳐나는데 왜 아직 안 오 시나.'
한 광주리, 두 광주리, 할머니의 헛손질은 계속되고 외진 산마을 겨울밤은 까무룩히 깊어만 간다.
할머니의 큰 아드님, 그러니까 내 큰아버지가 되실 그 분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그 분이 끌려가셨다는 전쟁터는 대체 어디쯤이었을까? 전쟁은 정말 있기는 있었던 것일까?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나 보았던 총성 가득한 전쟁터…. 동녘은 도무지 실감이 안난다.
3.
어둠 속 깊은 하늘, 그나마 아직은 실낱같은 달이 걸렸다.
'끄으응, 컹. 끄으응, 컹.'
무언가 고통에 겨워 길게 끄는 신음 뒤에 마지못해 내뱉는 짧막한 짖음.
'왔다!'
내복바람으로 쏜살같이 뛰어 나온 동녘은 그러나 닭장 앞에 우뚝 섰다.
'쉿. 할머님 깨실라.'
가로막는 어머니의 팔 때문이 아니다.
환하게 켜진 알전구. 그 아래 덫에 걸려 엎드린 누렁개의 모습 때문도 아니다. 녀석은 오히려 발목에 걸린 덫 따위는 문제도 아니라는 듯 사납게 몸뚱이를 버둥거린다.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녀석의 목덜미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쇠꼬치. 어디서 누구에게 꽂힌 것일까? 목덜미를 뚫고 나간 갈고리같은 쇠꼬치가 모이통에 걸려 녀석을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있다.
불빛보다 더 강하게 눈속을 파고드는 쇠꼬치의 날카로움에 동녘은 한동안 눈을 감아 버렸다.
"동녘아, 내가 목덜미를 잡았으니 엄마와 함께 덫을 빼내라."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그제야 정신을 차린 동녘이 아버지 곁에 허리를 굽히고 누렁이를 다시 내려다 본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 위로 듬성듬성 빠지고 엉켜버린 지저분한 누런 털. 쇠꼬치가 뚫고 나간 뒷목덜미 털은 아예 흙빛이 되어 눌어붙었고 그나마 휘어져내린 배부분만 풀솜같은 털에 덮여 제 모습을 하고 있다.
"아빠, 제가 발목을 잡고 있을테니 그 쇠꼬치나 먼저 빼내 주세요".
하지만 난처하게 고개를 저으시는 아버지.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숨통까지 건드릴지도 몰라. 이건 바로 개백정이 누렁이의 숨통을 겨냥했던 쇠꼬치거든."
할 수 없이 동녘이 버둥거리는 녀석의 발목을 잡은 사이, 어머니가 재빨리 덫을 풀어내셨다.
그 때다.
"비켜!"
아버지의 짧은 외침이 터져나옴과 동시에 누렁이는 닭장 문쪽으로 몸을 홱 돌리며 으르렁 맹수처럼 송곳니를 드러냈다. 놀란 닭들이 푸드덕거리고 아버지는 등으로 동녘과 어머니를 막아섰다.
"괜찮다, 괜찮아. 먹어."
아버지는 사료그릇을 밀어주며 나지막히 누렁이를 어르신다.
그러나 누렁이는 사납게 곤두세운 잔등의 털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은 채 뒷걸음을 치며 아버지를 노려본다.
"얼마나 배를 곯았으면 개가 닭 모이통을 다 뒤질까. 자, 이리 와 먹어. 널 해치지 않는다니까."
이번에는 어머니가 좀 더 가까이 사료그릇을 밀어주었지만 누렁이는 아예 저만큼 어둠 속으로 훌쩍 몸을 날려 버렸다.
"보신탕 집으로 팔려갔던 누렁이가 용케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모양인데 이젠 사나운 들짐승이 다 되었구나."
누렁이가 사라져간 캄캄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오래도록 혀를 차셨다.
4.
닭장 앞에 내다 놓은 먹이통에다가 동녘은 오늘도 뜨거운 누른 밥을 쏟아 붇는다. 지금은 이렇듯 김이 펄펄 나지만 어느 결에 누렁이가 다녀간 새벽녘이면 밥 찌꺼기 사이마다 서걱서걱 얼음살이 박혀있다.
'짜아식, 이왕이면 따뜻할 때 와서 먹고 가지.'
하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다. 금방이라도 대어들 듯, 혹은 달아나버리려 잔뜩 경계의 빛을 품고 있던 누렁이의 눈빛을 생각하면.
'배고픔이 덜해지면 차츰 온순해질지도 몰라. 누렁이는 원래 아무나 잘 따르는 순한 개라잖아. 사나움이 가실 때까지 목덜미의 상처를 잘 견뎌내야 할텐데.'
한발짝 건너도 분간이 안되는 캄캄한 그믐밤. 누렁이는 지금 어디쯤에서 우리 집을 보고 있을까?
'누렁아, 이 불빛이 보이니?'
동녘은 까치발을 하고 대문 기둥에 매단 남포등의 심지를 올린다. 작년 그믐밤만 해도 동구 밖까지 환하도록 온 집안의 불을 켜두셨던 아흔 아홉 우리 할머니, 그러나 지금 할머니의 병환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5.
비록 시늉이나마 몇 날 며칠 차곡차곡 삼아 이은 모시올, 그걸 다시 쉰 자씩 마당 가득 날고 또 풀 매며 감은 도투마리(베를 짤 때 날을 감는 틀). 양 손으로 힘겹게 도투마리를 받쳐든 할머니는 소리없이 팔꿈치로 광문을 미신다.
매캐한 냄새. 베틀 위에 소복히 올라앉은 먼지를 털어내고 도투마리를 얹는 할머니의 손길이 마냥 익숙하시다.
철커덕 척 철커덕 척. 어둠 속에 눈을 감고 앉아 있어도 할머니의 몸놀림은 거침이 없다. 한 자 두 자 모시천이 늘어날수록 살을 벨 듯 팽팽하게 당겨지는 가슴 속 기다림의 줄.
'어디를 헤매시나 우리 큰 아드님. 이 밤이 새기 전에 돌아 오시게.'
부지런히 북을 넣고 바디를 내리치던 할머니가 문득 손을 놓고 밖으로 귀를 기울이신다.
"거 누구요?"
문 밖을 내다보던 할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 베틀에서 내려서며 맞은 편 담벼락의 남포등을 내리신다.
'밖이 저리 캄캄한 걸 보면 오늘이 바로 그믐밤이야. 섣달 그믐밤에 무슨 길쌈을 한다 고. 이런 정신머리 없기는. 그믐밤에 불 밝히는 일을 한 두 해 해 왔나. 빨리 등불이 나 내걸어야겠다.'
두리번거리며 성냥을 찾던 할머니의 입가에 호물호물 웃음이 번진다.
'기특도 해라 내 강아지 우리 동녘이. 어느새 문간에다 등불을 다 밝혀놓고….'
대문간에 내걸린 남포 심지에서 불을 옮겨붙이는 할머니 발치로 크응 킁 누렁이가 다가든다.
"누구신가 했더니. 어서 들어오시게."
부랴부랴 등불을 밝혀든 할머니는 광문을 활짝 여셨다. 그리고는 베틀 아래 우묵한 자리에 거적을 깔고 보송보송 마른 짚단을 한아름 펼쳐 놓은 후 누렁이를 눕히신다.
"어디를 이토록 헤매다니셨나? 험하기도 하지. 이런 몸을 해갖고 예까지 찾아오시느 라 얼마나 힘이 드셨어? 자네는 그믐밤에 찾아온 우리 집의 귀한 손님이야. 걱정 말고 누워 몸을 푸시게. 그렇지, 그렇지."
목덜미를 사알살 쓸어주는 할머니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누렁이는 활처럼 휜 등을 쭈욱 뻗었다.
6.
'그새 또 누렁이가 다녀갔을까?'
눈을 부비며 마당으로 한 발을 내딛던 동녘은 '아!' 입을 벌린다.
'눈이잖아?'
주위가 온통 하얀데 지금도 사뿐사뿐 눈이 내려 쌓인다. 괜스레 가슴을 설레며 동녘은 대문으로 나간다.
'어, 그런데 누가 광문 앞에도 등불을 걸었지?'
꽃잎처럼 날리는 눈발을 비껴 맞으며 가물가물 새벽 등불이 타고 있다. 그러고보니 광문도 비끗이 열린 채다.
'정말 이상도 하다. 베틀 위에 소복히 앉아있던 해묵은 먼지는 또 다 어디로 갔을 까? 오늘따라 반들반들 윤이 나는 저 바디를 좀 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베틀 주위를 오락거리던 동녘은 그만 베틀 아래 무릎을 꿇고 만다.
'누렁이가?'
동녘은 가슴을 두근대며 두 눈을 크게 뜬다.
한 마리, 두 마리… 다섯 마리.
짚단 위에 길게 누운 누렁이 배 밑에서 고물고물 새끼들이 젖을 빤다. 두 눈을 꼬옥 감은 채 머리를 맞대고 힘차게 젖을 빠는 요 앙증맞은 모습이라니.
이제 막 새벽잠에 빠졌을까? 누렁이는 편안히 고개를 뻗은 채 고른 숨을 쉬고 있다.
'쇠꼬치는?'
동녘은 조심스레 누렁이의 목덜미를 살펴본다. 누가 언제 뽑아 냈을까? 상처 자리엔 눈처럼 새하얀 목화솜이 꼭꼭 박혀있다.
'도대체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정말 알 수가 없다. *
[동아일보신춘문예 당선 동화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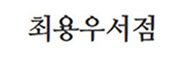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