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당선작
고즈넉한 산사에서 꽃 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산사의 꽃은 질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떨어진답니다.
스님의 염불소리 듣고 지낸 인연이겠지요. 그곳 여기 산사에 동백꽃이 집니다. 발그스름 두 볼을 가진 소년이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가슴이
´쿵´ 내려앉듯 동백꽃이 ´뚝´ 떨어집니다.
동백꽃이 질 때는 목탁소리가 납니다. 동백꽃! 그 어여쁨의 절정에서 꽃은 꽃잎이 아니라 꽃송이가 그대로 낙화하는데 그 모습에서 ´또르락 똑 똑´ 마치 목탁소리가 울려나오는 것 같습니다.
봄은 어느새 깊은 산골짝 절집 마당까지 찾아와 봄꽃들을 피워 놓았습니다. 고개 돌려 잠시 다른 꽃들을 구경하는 사이 노란 병아리 색깔의 산수유 꽃은 꿈결처럼 져버리고 매화꽃 이파리 하얀 꽃비로 내리더니 이젠 때론 인생살이 애닯아 짓는 한숨처럼 동백꽃이 집니다.
동백꽃이 지던 날 동자승은 처음으로 가슴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석이가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랫마을 살던 석이는 일곱 살 까까머리 동자승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석이는 엄마 아빠가 일 나가시면 늘 산길을 따라 백팔 계단을 종종종 올라서 동자승에게 놀러오곤 했었습니다. 이사가던 날에 석이가 마지막으로 절에 왔었습니다.
˝형아, 나 이사 간다.˝
˝.˝
˝아! 형 이거 가져.˝
석이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 동자승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에 들고 보면 무지개가 보이는 구슬이었습니다. 석이가 무척이나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동자승은 자신의 염주를 주었습니다.
˝형아, 안녕.˝
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아까도 그렇게 올라왔을 백팔 계단을 종종종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하는 먼 곳이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 집 마당에서 뛰어 노는 석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젠 동자승은 어떤 놀이를 해도 혼자 해야 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노스님 눈을 피해 오뎅을 사 먹으러 아랫마을에 갈 수도 없습니다.
동자승은 자꾸만 ´형아´ 하며 석이가 저만치에서 뛰어올 것 같습니다. 언제처럼 자신의 뒤로 슬쩍 다가와 노스님 흉내내며 ´개똥참외야´ 하고 동자승을 부르며 골려줄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데, 정말 상관없는데 이런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사가는 석이가 동자승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뚝. 뚝. 뚝. 동백꽃이 떨어집니다. 마치 눈물 같습니다. 일제히 쏟아 붓는 울음이 아닌 인내할 줄 아는 느리고 조용한 울음입니다. 그렇게 동자승의 얼굴에도 동백꽃이 집니다.
그날 저녁 동자승은 석이와 이별했는데 기억에도 없는 엄마를 부르며 울다 노스님 등에 업혀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눈가에는 마알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 눈물을 떨구어 주었습니다.
동자승이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부네. 산들바람이.˝
근데 동자승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는 산들바람, 사람들은 그냥 나를 바람이라 부르죠.
하늘을 보니 초저녁 일찍 나온 별님 하나가 꾸벅꾸벅 졸다 초생달 끝에 찔려 반짝반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노스님과 동자승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노스님은 하나도 안 아플 거라고 하고 동자승은 무지 아플 거라고 합니다. 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간 재미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구요? 동자승이 앞니가 흔들려서 뽑아야 하는데 동자승이 잔뜩 겁을 먹고 있거든요. 노스님은 이에 아랑곳 않고 동자승의 앞니에 실을 질끈 묶어버렸습니다.
동자승은 눈을 꼬옥 감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한쪽 눈만 뜨고 노스님의 동정을 살핍니다. 그런데 노스님은 반대편 실을 문고리에 묶어 놓고는 잠시 기다리라며 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동자승은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리고는 못 참겠다는 듯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바싹 대고 또 다시 노스님의 동정을 살핍니다.
˝어험˝
댓돌 위에 뒷짐 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던 노스님이 헛기침을 하십니다. 동자승은 얼른 자리로 돌아와 점잖은 척 앉아 있습니다.
사방이 고요합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한 동자승의 침 삼키는 소리만 조심스레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립니다.
순간 동자승의 앞니와 문고리 사이에 연결된 실이 더욱 팽팽해지면서 동자승의 머리가 앞으로 쏠리더니 이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동자승은 멀뚱멀뚱 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밖에선 노스님이 웃고 계십니다.
˝거 봐 하나도 안 아프지.˝
노스님은 어느새 빠져 실에 대롱대롱 매달린 동자승의 앞니를 들어 보입니다.
˝아-앙-˝
동자승은 빠져버린 자신의 앞니를 보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헌 이 줄께. 새 이 다오.˝
동자승은 노스님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앞니를 까치가 물어가라고 던져주고 새 이가 나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푸드득 까치 한 마리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동자승의 앞니를 물어가려고 하나 봅니다. 동자승은 까치를 보더니 활짝 웃어 보입니다. 앞니 빠진 동자승의 웃음이 하얀 목련꽃을 닮았습니다.
나는 동자승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이런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앞니 빠진 금강새 우물 앞에 가지 마라. 붕어새끼 놀란다...˝
동자승이 과연 내 노랫소리를 들었을까요.
´으랏샤´. 나른한 오후 동자승은 쭉 기지개를 폅니다. 동방의 자락 사이로 동자승의 참외배꼽이 빠끔 고개 내밀었다 부끄러운 듯 금세 숨어버립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에 툇마루에 앉아있던 동자승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처마 밖으로 뻗어봅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 이내 일어나 이번에는 머리만 쏘옥 처마 밖으로 빼고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에이 또 속았네.˝
동자승은 자신의 머리를 콕 쥐어박고는 다시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해장죽이 있는 숲을 바라봅니다.
˝개똥참외야, 비오나 보다 빨래 걷어라.˝
방 안에서는 문풍지를 뚫고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가 아니라 댓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예요. 노스님도 속았지요.˝
동자승은 그만 웃음이 쿡 터져 나오려는 자신의 입을 얼른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후유´ 하고 숨을 고릅니다. 동자승은 노스님도 자신처럼 속았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가 봅니다. 입가에 아직 소리없는 웃음이 하나 가득 매달려있습니다.
바다를 마음에 지니고 있어 이름이 해장죽인 대나무는 정작 산에 사는 산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의 절반은 언제나 바다를 향해 있지요. 내가 해장죽 옆을 지나치면 해장죽은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휘파람소리, 파도소리를 지어냅니다.
그 소리들은 내가 지나는 속도에 따라 틀려져 그때마다 소나기소리, 물소리, 휘파람소리, 파도소리로 조금씩 달리 들리는 거죠.
해장죽은 저 멀리 바다에게 그리운 마음을 실어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의 노래가 나에게 실려 바다가 있는 곳까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댓잎들을 서로 부딪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노랫소리는 언제나 산을 넘지 못하고 메아리가 되어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빗소리를 닮은 해장죽의 노래에 애꿎게 동자승만 빨래를 걷으러 뛰어가다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생기곤 할 뿐입니다.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그리운 것은 산 뒤에 있나 봅니다.
배불뚝이 항아리의 녹색 물은 노스님이 위아래로 젓는 고무래를 따라 연녹색에서 청색으로 청색은 다시 가지색으로 변합니다. 항아리엔 가짓빛 꽃거품이 일기 시작합니다.
동자승은 노스님 곁에 턱을 괴고 앉아 제법 진지하게 노스님과 항아리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땀이 방울방울 맺혔던 노스님의 엄숙하기 그지없던 얼굴엔 어느새 서서히 미소가 퍼집니다. 노스님의 미소에 동자승의 얼굴에도 생글생글 웃음이 번집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노스님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나봅니다. 조막만한 손으로 콩콩콩 허리를 펴며 노스님을 도왔던 동자승의 수고도 이번에는 헛일이 안 되나 봅니다.
노스님은 지금 모시 무명 삼베 같은 천에 전통염색의 하나인 쪽물을 들이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노스님의 쪽물 들이기 위한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쪽의 씨를 뿌려 5월에 옮겨 심고 색소를 가장 많이 지니는 6, 7월 꽃이 필 때쯤 쪽을 베어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고 돌을 얹은 후 흐르는 냇물을 길어다 채웁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노스님은 그 쪽을 건져내고 굴껍질이나 조개껍질을 구워 만든 석회를 뿌리고 지금의 젓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항아리의 가짓빛 꽃거품은 흥에 겨워 너울넘실 춤까지 춥니다.
˝노스님 이젠 다 되었나요.˝
동자승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여쭤보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았지. 이제 하루가 지나 밑에 가라앉은 색소 앙금만 모아 쪽대나 콩대 태운 것으로 만든 잿물과 섞지. 이때부터 고무래로 저으면서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아니면 그 이상 쪽물이 일어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진한 배추색으로 변하면 비로소 염색을 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동자승은 정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떡거렸습니다.
˝그럼 쪽빛은 어떤 색이에요.˝
동자승의 이번 질문에는 노스님 아무말 없이 검지손가락으로 위쪽을 가리킵니다.
동자승은 노스님의 검지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위로 보냅니다. 노스님의 검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거기에는 파란하늘만 아무말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알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노스님은 그런 동자승을 미소로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쪽빛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닮은 색이지.˝
˝가을 하늘.˝
동자승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자승의 눈에 파란 하늘이 담뿍 담겨졌습니다.
자연은 계절의 옷을 바꿔 입을 때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순리에 따라 때 되었다 싶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요.
파릇파릇하던 싱그러운 유록의 봄은 여름이 가져가고 짙푸른 산천에 소낙비 소리가 잦아질 때쯤 여름은 한발짝 물러나 가을을 준비합니다.
산사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산사는 가을 속에 있을 겁니다.
똑. 똑. 똑. 처마 밑에 졸고 있던 구절초꽃 위로 낙숫물이 떨어집니다. 화들짝 놀라 잠이 깬 구절초는 겸연쩍은 듯 ´오메, 가을이 왔네.´ 하며 활짝 웃어 보입니다.
동자승은 느티나무 아래 있습니다. 자신의 두 팔로는 다 안을 수도 없는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가슴 가득 두 팔로 안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어느새 기도가 됩니다.
˝힘 내세요. 예전처럼 씩씩해져서 예쁜 잎을 보여주세요. 부처님, 할아버지 나무가 빨리 낫게 해주 세요.˝
느티나무는 봄 여름 가을을 겨울나무로 서 있습니다. 파란 싹도 틔우지 않고 그래서 잎을 무성하게 키우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는 가끔 산새가 찾아와 앉았다 갈 뿐 참으로 쓸쓸해 보입니다.
오랜 세월 정말 늠름하고 씩씩했는데 지금은 많이 아픈가 봅니다. 아니 노스님의 말씀처럼 힘이 들어 잠시 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느티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나는 매일같이 느티나무를 위해 기도하는 동자승의 기도를 대웅전 부처님의 귓가로 실어갔습니다.
˝. 부처님, 할아버지나무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기도도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동자승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메, 저 단풍 좀 봐라. 참말로 곱다아.´
가을햇살에 수줍은 웃음을 짓던 단풍나무 풍경소리에 훔짓 놀라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린 듯 더욱 볼을 붉힙니다. 햇살 좋은 오후 그렇게 가을은 붉은 홍시처럼 잘 익어갑니다.
˝많이 먹어.˝
동자승은 된장국에 만 밥을 강아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줍니다. 강아지는 오는 이 막는 일 없고 가는 이 붙잡을 일 없는 절집에 자연스레 찾아든 새 식구입니다.
˝너도 많이 먹어.˝
동자승은 고개 돌려 멀찌감치 떨어진 헌식대에 올려진 사과를 먹으러 온 청설모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어느새 밥을 다 먹고 난 강아지는 헌식대 앞으로 다가가며 청설모를 보고 ´멍멍멍´ 짖어대고 있습니다. 청설모가 놀라 숲 속 소나무 뒤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안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 친구잖아.˝
제법 어른스럽게 타이르는 동자승에게 강아지는 미안한 듯 꼬리를 흔들며 동자승의 손등을 혀로 핥습니다.
˝와-˝
동자승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 맑은 눈망울로 느티나무를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느티나무 가지마다 쪽빛의 천이 길게 걸려 있습니다. 마치 느티나무가 푸르름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노스님, 노스님 저것 좀 보세요.˝
동자승의 소리에 노스님은 방문을 열어보시고는 한마디 하십니다.
˝허, 참 밤새 느티나무가 잎을 피웠나 보구나.˝
노스님의 말속에는 겸연쩍음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노스님이 왜 그러는지 압니다. 노스님은 동자승이 잠든 저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느티나무에 쪽빛 천들을 가지마다 걸어 놓으셨습니다.
매일 느티나무를 위해 기도하는 동자승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어렵게 살려낸 쪽빛을 동자승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쪽빛의 천들 사이를 오가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나의 춤사위에 쪽빛의 천들도 춤을 춥니다. 그 춤사위는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어느 것이 진짜 하늘빛이고 어느 것이 천에 물들인 쪽빛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된 춤사위가 계속될 뿐입니다.
산도 산사도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일찍 찾아오는 산 속에는 모두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아궁이 옆에는 강아지가 잠들어 있습니다. 노스님도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동자승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 사이로 나온 동자승의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동자승이 씩 웃습니다. 아마도 꿈을 꾸고 있나 봅니다.
이사간 석이의 꿈인지 아니면 잎이 무성하게 자란 느티나무의 꿈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리움만으로 그릴 수 있는 엄마 아빠의 꿈인지 잠든 동자승의 얼굴에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동자승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행복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꽃 지는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산사의 꽃은 질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떨어진답니다.
스님의 염불소리 듣고 지낸 인연이겠지요. 그곳 여기 산사에 동백꽃이 집니다. 발그스름 두 볼을 가진 소년이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가슴이
´쿵´ 내려앉듯 동백꽃이 ´뚝´ 떨어집니다.
동백꽃이 질 때는 목탁소리가 납니다. 동백꽃! 그 어여쁨의 절정에서 꽃은 꽃잎이 아니라 꽃송이가 그대로 낙화하는데 그 모습에서 ´또르락 똑 똑´ 마치 목탁소리가 울려나오는 것 같습니다.
봄은 어느새 깊은 산골짝 절집 마당까지 찾아와 봄꽃들을 피워 놓았습니다. 고개 돌려 잠시 다른 꽃들을 구경하는 사이 노란 병아리 색깔의 산수유 꽃은 꿈결처럼 져버리고 매화꽃 이파리 하얀 꽃비로 내리더니 이젠 때론 인생살이 애닯아 짓는 한숨처럼 동백꽃이 집니다.
동백꽃이 지던 날 동자승은 처음으로 가슴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석이가 이사를 간 것입니다.
아랫마을 살던 석이는 일곱 살 까까머리 동자승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석이는 엄마 아빠가 일 나가시면 늘 산길을 따라 백팔 계단을 종종종 올라서 동자승에게 놀러오곤 했었습니다. 이사가던 날에 석이가 마지막으로 절에 왔었습니다.
˝형아, 나 이사 간다.˝
˝.˝
˝아! 형 이거 가져.˝
석이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 동자승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에 들고 보면 무지개가 보이는 구슬이었습니다. 석이가 무척이나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동자승은 자신의 염주를 주었습니다.
˝형아, 안녕.˝
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아까도 그렇게 올라왔을 백팔 계단을 종종종 내려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하는 먼 곳이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 집 마당에서 뛰어 노는 석이의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젠 동자승은 어떤 놀이를 해도 혼자 해야 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노스님 눈을 피해 오뎅을 사 먹으러 아랫마을에 갈 수도 없습니다.
동자승은 자꾸만 ´형아´ 하며 석이가 저만치에서 뛰어올 것 같습니다. 언제처럼 자신의 뒤로 슬쩍 다가와 노스님 흉내내며 ´개똥참외야´ 하고 동자승을 부르며 골려줄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는데, 정말 상관없는데 이런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사가는 석이가 동자승은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뚝. 뚝. 뚝. 동백꽃이 떨어집니다. 마치 눈물 같습니다. 일제히 쏟아 붓는 울음이 아닌 인내할 줄 아는 느리고 조용한 울음입니다. 그렇게 동자승의 얼굴에도 동백꽃이 집니다.
그날 저녁 동자승은 석이와 이별했는데 기억에도 없는 엄마를 부르며 울다 노스님 등에 업혀 잠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눈가에는 마알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 눈물을 떨구어 주었습니다.
동자승이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바람이 부네. 산들바람이.˝
근데 동자승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는 산들바람, 사람들은 그냥 나를 바람이라 부르죠.
하늘을 보니 초저녁 일찍 나온 별님 하나가 꾸벅꾸벅 졸다 초생달 끝에 찔려 반짝반짝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노스님과 동자승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노스님은 하나도 안 아플 거라고 하고 동자승은 무지 아플 거라고 합니다. 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간 재미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구요? 동자승이 앞니가 흔들려서 뽑아야 하는데 동자승이 잔뜩 겁을 먹고 있거든요. 노스님은 이에 아랑곳 않고 동자승의 앞니에 실을 질끈 묶어버렸습니다.
동자승은 눈을 꼬옥 감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한쪽 눈만 뜨고 노스님의 동정을 살핍니다. 그런데 노스님은 반대편 실을 문고리에 묶어 놓고는 잠시 기다리라며 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동자승은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리고는 못 참겠다는 듯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바싹 대고 또 다시 노스님의 동정을 살핍니다.
˝어험˝
댓돌 위에 뒷짐 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던 노스님이 헛기침을 하십니다. 동자승은 얼른 자리로 돌아와 점잖은 척 앉아 있습니다.
사방이 고요합니다. 왠지 모르게 긴장한 동자승의 침 삼키는 소리만 조심스레 들릴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립니다.
순간 동자승의 앞니와 문고리 사이에 연결된 실이 더욱 팽팽해지면서 동자승의 머리가 앞으로 쏠리더니 이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동자승은 멀뚱멀뚱 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밖에선 노스님이 웃고 계십니다.
˝거 봐 하나도 안 아프지.˝
노스님은 어느새 빠져 실에 대롱대롱 매달린 동자승의 앞니를 들어 보입니다.
˝아-앙-˝
동자승은 빠져버린 자신의 앞니를 보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헌 이 줄께. 새 이 다오.˝
동자승은 노스님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앞니를 까치가 물어가라고 던져주고 새 이가 나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푸드득 까치 한 마리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동자승의 앞니를 물어가려고 하나 봅니다. 동자승은 까치를 보더니 활짝 웃어 보입니다. 앞니 빠진 동자승의 웃음이 하얀 목련꽃을 닮았습니다.
나는 동자승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이런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앞니 빠진 금강새 우물 앞에 가지 마라. 붕어새끼 놀란다...˝
동자승이 과연 내 노랫소리를 들었을까요.
´으랏샤´. 나른한 오후 동자승은 쭉 기지개를 폅니다. 동방의 자락 사이로 동자승의 참외배꼽이 빠끔 고개 내밀었다 부끄러운 듯 금세 숨어버립니다.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에 툇마루에 앉아있던 동자승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손을 처마 밖으로 뻗어봅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 이내 일어나 이번에는 머리만 쏘옥 처마 밖으로 빼고는 하늘을 쳐다봅니다.
˝에이 또 속았네.˝
동자승은 자신의 머리를 콕 쥐어박고는 다시 툇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해장죽이 있는 숲을 바라봅니다.
˝개똥참외야, 비오나 보다 빨래 걷어라.˝
방 안에서는 문풍지를 뚫고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빗소리가 아니라 댓잎이 바람에 부딪히는 소리예요. 노스님도 속았지요.˝
동자승은 그만 웃음이 쿡 터져 나오려는 자신의 입을 얼른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후유´ 하고 숨을 고릅니다. 동자승은 노스님도 자신처럼 속았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가 봅니다. 입가에 아직 소리없는 웃음이 하나 가득 매달려있습니다.
바다를 마음에 지니고 있어 이름이 해장죽인 대나무는 정작 산에 사는 산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의 절반은 언제나 바다를 향해 있지요. 내가 해장죽 옆을 지나치면 해장죽은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휘파람소리, 파도소리를 지어냅니다.
그 소리들은 내가 지나는 속도에 따라 틀려져 그때마다 소나기소리, 물소리, 휘파람소리, 파도소리로 조금씩 달리 들리는 거죠.
해장죽은 저 멀리 바다에게 그리운 마음을 실어 노래를 부릅니다. 자신의 노래가 나에게 실려 바다가 있는 곳까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댓잎들을 서로 부딪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노랫소리는 언제나 산을 넘지 못하고 메아리가 되어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빗소리를 닮은 해장죽의 노래에 애꿎게 동자승만 빨래를 걷으러 뛰어가다 다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생기곤 할 뿐입니다.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그리운 것은 산 뒤에 있나 봅니다.
배불뚝이 항아리의 녹색 물은 노스님이 위아래로 젓는 고무래를 따라 연녹색에서 청색으로 청색은 다시 가지색으로 변합니다. 항아리엔 가짓빛 꽃거품이 일기 시작합니다.
동자승은 노스님 곁에 턱을 괴고 앉아 제법 진지하게 노스님과 항아리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땀이 방울방울 맺혔던 노스님의 엄숙하기 그지없던 얼굴엔 어느새 서서히 미소가 퍼집니다. 노스님의 미소에 동자승의 얼굴에도 생글생글 웃음이 번집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노스님이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나봅니다. 조막만한 손으로 콩콩콩 허리를 펴며 노스님을 도왔던 동자승의 수고도 이번에는 헛일이 안 되나 봅니다.
노스님은 지금 모시 무명 삼베 같은 천에 전통염색의 하나인 쪽물을 들이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노스님의 쪽물 들이기 위한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쪽의 씨를 뿌려 5월에 옮겨 심고 색소를 가장 많이 지니는 6, 7월 꽃이 필 때쯤 쪽을 베어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고 돌을 얹은 후 흐르는 냇물을 길어다 채웁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 노스님은 그 쪽을 건져내고 굴껍질이나 조개껍질을 구워 만든 석회를 뿌리고 지금의 젓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항아리의 가짓빛 꽃거품은 흥에 겨워 너울넘실 춤까지 춥니다.
˝노스님 이젠 다 되었나요.˝
동자승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여쭤보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았지. 이제 하루가 지나 밑에 가라앉은 색소 앙금만 모아 쪽대나 콩대 태운 것으로 만든 잿물과 섞지. 이때부터 고무래로 저으면서 일주일이고 한달이고 아니면 그 이상 쪽물이 일어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야. 진한 배추색으로 변하면 비로소 염색을 할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동자승은 정말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떡거렸습니다.
˝그럼 쪽빛은 어떤 색이에요.˝
동자승의 이번 질문에는 노스님 아무말 없이 검지손가락으로 위쪽을 가리킵니다.
동자승은 노스님의 검지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위로 보냅니다. 노스님의 검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거기에는 파란하늘만 아무말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자승은 알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갸우뚱거립니다. 노스님은 그런 동자승을 미소로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쪽빛은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닮은 색이지.˝
˝가을 하늘.˝
동자승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자승의 눈에 파란 하늘이 담뿍 담겨졌습니다.
자연은 계절의 옷을 바꿔 입을 때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순리에 따라 때 되었다 싶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요.
파릇파릇하던 싱그러운 유록의 봄은 여름이 가져가고 짙푸른 산천에 소낙비 소리가 잦아질 때쯤 여름은 한발짝 물러나 가을을 준비합니다.
산사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산사는 가을 속에 있을 겁니다.
똑. 똑. 똑. 처마 밑에 졸고 있던 구절초꽃 위로 낙숫물이 떨어집니다. 화들짝 놀라 잠이 깬 구절초는 겸연쩍은 듯 ´오메, 가을이 왔네.´ 하며 활짝 웃어 보입니다.
동자승은 느티나무 아래 있습니다. 자신의 두 팔로는 다 안을 수도 없는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가슴 가득 두 팔로 안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은 어느새 기도가 됩니다.
˝힘 내세요. 예전처럼 씩씩해져서 예쁜 잎을 보여주세요. 부처님, 할아버지 나무가 빨리 낫게 해주 세요.˝
느티나무는 봄 여름 가을을 겨울나무로 서 있습니다. 파란 싹도 틔우지 않고 그래서 잎을 무성하게 키우지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에는 가끔 산새가 찾아와 앉았다 갈 뿐 참으로 쓸쓸해 보입니다.
오랜 세월 정말 늠름하고 씩씩했는데 지금은 많이 아픈가 봅니다. 아니 노스님의 말씀처럼 힘이 들어 잠시 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느티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나는 매일같이 느티나무를 위해 기도하는 동자승의 기도를 대웅전 부처님의 귓가로 실어갔습니다.
˝. 부처님, 할아버지나무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의 기도도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동자승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메, 저 단풍 좀 봐라. 참말로 곱다아.´
가을햇살에 수줍은 웃음을 짓던 단풍나무 풍경소리에 훔짓 놀라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린 듯 더욱 볼을 붉힙니다. 햇살 좋은 오후 그렇게 가을은 붉은 홍시처럼 잘 익어갑니다.
˝많이 먹어.˝
동자승은 된장국에 만 밥을 강아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맛있게 먹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줍니다. 강아지는 오는 이 막는 일 없고 가는 이 붙잡을 일 없는 절집에 자연스레 찾아든 새 식구입니다.
˝너도 많이 먹어.˝
동자승은 고개 돌려 멀찌감치 떨어진 헌식대에 올려진 사과를 먹으러 온 청설모에게도 인사를 잊지 않습니다.
어느새 밥을 다 먹고 난 강아지는 헌식대 앞으로 다가가며 청설모를 보고 ´멍멍멍´ 짖어대고 있습니다. 청설모가 놀라 숲 속 소나무 뒤로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안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 친구잖아.˝
제법 어른스럽게 타이르는 동자승에게 강아지는 미안한 듯 꼬리를 흔들며 동자승의 손등을 혀로 핥습니다.
˝와-˝
동자승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그대로 서서 그 맑은 눈망울로 느티나무를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느티나무 가지마다 쪽빛의 천이 길게 걸려 있습니다. 마치 느티나무가 푸르름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노스님, 노스님 저것 좀 보세요.˝
동자승의 소리에 노스님은 방문을 열어보시고는 한마디 하십니다.
˝허, 참 밤새 느티나무가 잎을 피웠나 보구나.˝
노스님의 말속에는 겸연쩍음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노스님이 왜 그러는지 압니다. 노스님은 동자승이 잠든 저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느티나무에 쪽빛 천들을 가지마다 걸어 놓으셨습니다.
매일 느티나무를 위해 기도하는 동자승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어렵게 살려낸 쪽빛을 동자승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쪽빛의 천들 사이를 오가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나의 춤사위에 쪽빛의 천들도 춤을 춥니다. 그 춤사위는 하늘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어느 것이 진짜 하늘빛이고 어느 것이 천에 물들인 쪽빛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된 춤사위가 계속될 뿐입니다.
산도 산사도 잠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일찍 찾아오는 산 속에는 모두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아궁이 옆에는 강아지가 잠들어 있습니다. 노스님도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동자승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불 사이로 나온 동자승의 발가락이 꼼지락꼼지락 거립니다. 동자승이 씩 웃습니다. 아마도 꿈을 꾸고 있나 봅니다.
이사간 석이의 꿈인지 아니면 잎이 무성하게 자란 느티나무의 꿈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리움만으로 그릴 수 있는 엄마 아빠의 꿈인지 잠든 동자승의 얼굴에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동자승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행복한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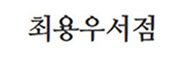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