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
백두대간 맥 잇고 제주의 애환 품고
한국 사람은 산의 겨레, 산의 종족(山族)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산에 가질 않으면 몸이 근질거리고, 산에 다녀오면 개운해 일도 잘 풀린다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갤럽이 2010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간다는 등산 인구가 무려 18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엄청난 숫자다.
우리는 어디서나 산을 볼 수 있었고, 집 뒤에 있는 작은 동산도, 마을 앞으로 보이는 둔덕(똥뫼라 불렀다)도 산으로 보았다. 산에 대한 폭넓은 공간적 인식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하다. 서양에서는 해발 600m 이상의 고지가 되어야 산으로 친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바다에 떠 있는 섬도 산으로 보여 해산(海山)이라 했다. 이 정도면 산이 눈에 씌었다고도 할 만하다.
한라산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해산이다. 이중환은 <택리지>(1751)의 ‘해산’ 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제주의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도 한다. 산 위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크게 일어난다.” 한라산은 신선의 산인 삼신산의 하나이고, 산꼭대기에 백록담이 있는데 기이하고 신령스럽기가 그지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나 산을 볼 수 있었고, 집 뒤에 있는 작은 동산도, 마을 앞으로 보이는 둔덕(똥뫼라 불렀다)도 산으로 보았다. 산에 대한 폭넓은 공간적 인식은 세계적으로도 특이하다. 서양에서는 해발 600m 이상의 고지가 되어야 산으로 친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바다에 떠 있는 섬도 산으로 보여 해산(海山)이라 했다. 이 정도면 산이 눈에 씌었다고도 할 만하다.
한라산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해산이다. 이중환은 <택리지>(1751)의 ‘해산’ 편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제주의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도 한다. 산 위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크게 일어난다.” 한라산은 신선의 산인 삼신산의 하나이고, 산꼭대기에 백록담이 있는데 기이하고 신령스럽기가 그지없다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라산 백록담의 장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아래 큰 사진). 위 그림은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조선산도’(1903)로 백두산에서 시작해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산맥의 흐름을 표현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제주도
제주사람들에게 어디까지가 한라산인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사실 한국과 같은 지형에서 어디부터가 산인지 구분하기는 참 애매하고 어렵다. 한라산은 주위에 수많은 작은 오름을 거느리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세 가지로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 국제 기준인 해발 600m 이상. 대체로 현재의 국립공원 범위에 해당한다. 둘째, 중산간지대의 생활터전을 포함한 해발 200m 이상 지역. 셋째, 해안까지를 모두 포함한 제주도 전체. 믿기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 번째가 한라산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한라산은 제주도이고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라는 말을 곧잘 써왔다. 제주도는 그 전체가 한라산, 해산인 것이다.
예전 제주사람들은 한라산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을까? 누가 봐도 한라산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외떨어진 섬에 솟은 독산(獨山)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두산에 연원을 두었다. 이것이 바로 백두의 맥이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 한라산까지 이어졌다는 백두산 내맥설(來脈說)이다. 이수광은 <지봉유설>(1614)에서 “백두대간의 맥이 바다로 이어져 주위의 섬이 된다”는 남사고의 말을 긍정하면서 제주의 한라산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중환은 구체적으로 한라산의 맥을 진안 마이산에 연원을 두면서, 무등산에서 뻗어 내린 월출산에서 바다로 이어져 한라산에 닿는다고 했다.
제주사람들에게 어디까지가 한라산인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사실 한국과 같은 지형에서 어디부터가 산인지 구분하기는 참 애매하고 어렵다. 한라산은 주위에 수많은 작은 오름을 거느리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다. 세 가지로 대답이 가능하다. 첫째, 국제 기준인 해발 600m 이상. 대체로 현재의 국립공원 범위에 해당한다. 둘째, 중산간지대의 생활터전을 포함한 해발 200m 이상 지역. 셋째, 해안까지를 모두 포함한 제주도 전체. 믿기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 번째가 한라산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한라산은 제주도이고 제주도는 곧 한라산”이라는 말을 곧잘 써왔다. 제주도는 그 전체가 한라산, 해산인 것이다.
예전 제주사람들은 한라산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을까? 누가 봐도 한라산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외떨어진 섬에 솟은 독산(獨山)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두산에 연원을 두었다. 이것이 바로 백두의 맥이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 한라산까지 이어졌다는 백두산 내맥설(來脈說)이다. 이수광은 <지봉유설>(1614)에서 “백두대간의 맥이 바다로 이어져 주위의 섬이 된다”는 남사고의 말을 긍정하면서 제주의 한라산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중환은 구체적으로 한라산의 맥을 진안 마이산에 연원을 두면서, 무등산에서 뻗어 내린 월출산에서 바다로 이어져 한라산에 닿는다고 했다.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어진 백두대간
한라산의 백두산 내맥설은 조선후기 명산 문화의 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국토 산하에 대한 자긍심과 자주의식이 생겨나고 18세기 초반에는 백두산을 경계로 청나라와 국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백두산이 국토의 조종산(祖宗山)이라는 정치적·영토적 의의가 강조되었다. 그것이 백두산 조종론이다. 그래서 국토의 남쪽 끝에 우뚝 솟은 한라산도 백두산의 자손으로서 백두의 맥에서 기원하였다는 영역 의식이 생겨났다. 이것이 당시 사회적으로 성행했던 풍수 사상의 산줄기 인식과 결부되고, 또 <산경표>와 같은 국토의 산줄기에 대한 지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모든 산은 (심지어 섬마저도) 백두산의 맥에서 이어졌다는 담론이 퍼졌다.
‘인걸은 지령(地靈)’이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에게 인물은 땅의 정기를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논두렁 정기라도 받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도 있다. 하기야 초등학교 교가는 대부분이 “○○산 정기 받아∼”라고 하지 않던가? 제주도의 교가는 한라산 정기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리라. 이처럼 산과 우리는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놀라운 것은 선조들이 한반도의 산줄기 족보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선후기의 저술 <산경표>이다.
몇 해 전 중국·일본의 산악문화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에도 <산경표>와 같은 산족보 형식의 책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뜻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중국도 산줄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심은 마찬가지라서 지방에는 일부 산줄기의 연결 관계를 지리지 등에 적고 있지만, <산경표>와 같이 전국적인 산줄기 체계를 족보형식으로 서술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일본은 아예 산의 맥 개념이 없단다. 그렇다! 일본에 가보면 우리와 산이 다른 것을 안다. 일본에서 산은 산이고 들은 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비산비야(非山非野)라고 하지 않던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산, 그것이 한국의 산이다. 우리 산 지형의 특징이자 정체성이다.

산신 의식 담겨진 설문대할망 신화
한국 사람이 산의 겨레임을 증거하는 또 다른 메타포는 피붙이로 인격화된 산의 신화에도 있다. 한라산의 설문대할망이 그 주인공이다. 지리산의 노구할미와 천왕성모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에게 산은 모계적 뿌리의 혈통으로서의 할머니신이고 어머니신이었다. 설문대할망은 누구인가? 그녀는 몸이 엄청나게 커서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에 닿았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360여개의 오름들이 있는데 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조금씩 새어 흘러서 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날라다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었다는 신화적 존재다.
산신은 예부터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친숙한 신이었다. 나라에서 명산에 산신제를 모셨고, 고을마다 마을마다 산신을 섬겼다. 겨레의 시조인 단군도 산신이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후 아사달 산신이 되었다고 했다. 한국의 자연 신앙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신은 천신도 해신도 아닌 산신이다. 더구나 우리의 산신은 인격화된 산신이다. 호랑이를 거느린 할아버지 산신이 연상되지만, 유교적 가부장 사회 이전에는 원래 할머니 산신이었다. 일본만 해도 인격화된 산신이 아니다. 산 자체가 신으로 신앙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신화에서 천왕의 조상신은 아마테라스(天照大神)라는 태양신이다. 우리와 같지 않다.
친족 혈통으로 표현된 산 신화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 왜 한라산신의 아이콘은 할머니이고 지리산신은 어머니였을까? 자연 설화를 주민이 자연과 관계 맺으면서 빚어진 상징 이미지의 산물로 해석할 때,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미지는 사뭇 다르다. 할머니는 나를 있게 한 모계적 근원이고 간접적으로 돌보는 자라면, 어머니는 나를 직접적으로 낳고 기르는 존재이다. 한라산과 지리산의 경관 이미지가 그렇다. 제주사람들에게 한라산은 늘 거기에 있으면서 생명과 존재의 근거가 되는 상징 경관이다. 지리산과 달리 그 속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여 어미 품속의 자식처럼 생육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화산지형의 한라산지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인구와 마을이 극히 적다. 그래서 어머니산이 아니라 할머니산이다.
조선 양대 전란 이후 ‘나라의 명산’ 격상
한라산은 우리네 할머니가 그렇듯이 온갖 삶의 신산을 겪고 난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켜보는 산이다. 제주사람들의 숱한 애환을 가슴에 묻고 침묵으로 엎드려 있는 그런 산이다. 제주 4·3 민중항쟁에서 검은 오름, 불근 오름 등 한라산지 곳곳은 봉기의 무대이자 거점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초토화작전이라는 무지막지한 이름 아래 3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중산간 대부분의 마을들은 불타 폐허가 되었다. 그래서 제주 바다는 검다. 바닷물 속에 식은 용암이 제주도의 검은 현대사와 겹쳐져 비친다.
요즘 한라산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한 듯하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에다가 금년에는 세계농업유산의 브랜드까지 획득함으로써 한라산이 국내적인 명산에서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것이다.
정작 한라산이 국가의 명산 반열로 든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1418년(태종 18)에 와서야 전라도 나주 금성산의 예에 준하여 산제를 지내게 했다는 말이 왕조실록에 나온다. 한라산을 사전(祀典)에 등재하고 본격적으로 제사한 때는 1703년(숙종 29)이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한라산은 바다 건너 먼 지방에 있는 산일 따름이었다.
조선 후기에 와서 한라산은 나라의 명산으로 격상되었다. 그 무렵 한라산이 삼신산의 하나로 알려지면서 위상이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정치적인 배경도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변방에 대한 영토·영역 의식이 높아졌고 제주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한라산의 역사는 제주도의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산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다. 그것이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적 특징이다.
<최원석 | 경상대 HK교수>
한라산의 백두산 내맥설은 조선후기 명산 문화의 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국토 산하에 대한 자긍심과 자주의식이 생겨나고 18세기 초반에는 백두산을 경계로 청나라와 국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백두산이 국토의 조종산(祖宗山)이라는 정치적·영토적 의의가 강조되었다. 그것이 백두산 조종론이다. 그래서 국토의 남쪽 끝에 우뚝 솟은 한라산도 백두산의 자손으로서 백두의 맥에서 기원하였다는 영역 의식이 생겨났다. 이것이 당시 사회적으로 성행했던 풍수 사상의 산줄기 인식과 결부되고, 또 <산경표>와 같은 국토의 산줄기에 대한 지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모든 산은 (심지어 섬마저도) 백두산의 맥에서 이어졌다는 담론이 퍼졌다.
‘인걸은 지령(地靈)’이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에게 인물은 땅의 정기를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논두렁 정기라도 받아야 면장을 한다’는 속담도 있다. 하기야 초등학교 교가는 대부분이 “○○산 정기 받아∼”라고 하지 않던가? 제주도의 교가는 한라산 정기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리라. 이처럼 산과 우리는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 놀라운 것은 선조들이 한반도의 산줄기 족보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선후기의 저술 <산경표>이다.
몇 해 전 중국·일본의 산악문화 연구자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중국과 일본에도 <산경표>와 같은 산족보 형식의 책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뜻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중국도 산줄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심은 마찬가지라서 지방에는 일부 산줄기의 연결 관계를 지리지 등에 적고 있지만, <산경표>와 같이 전국적인 산줄기 체계를 족보형식으로 서술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일본은 아예 산의 맥 개념이 없단다. 그렇다! 일본에 가보면 우리와 산이 다른 것을 안다. 일본에서 산은 산이고 들은 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비산비야(非山非野)라고 하지 않던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산, 그것이 한국의 산이다. 우리 산 지형의 특징이자 정체성이다.

한라산 중산간지대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이다. 제주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해안에서 백록담에 이르는 제주도 전체가 한라산이라고 여겨왔다. 제주 | 정지윤 기자
산신 의식 담겨진 설문대할망 신화
한국 사람이 산의 겨레임을 증거하는 또 다른 메타포는 피붙이로 인격화된 산의 신화에도 있다. 한라산의 설문대할망이 그 주인공이다. 지리산의 노구할미와 천왕성모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에게 산은 모계적 뿌리의 혈통으로서의 할머니신이고 어머니신이었다. 설문대할망은 누구인가? 그녀는 몸이 엄청나게 커서 한라산을 베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에 닿았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360여개의 오름들이 있는데 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조금씩 새어 흘러서 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날라다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었다는 신화적 존재다.
산신은 예부터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친숙한 신이었다. 나라에서 명산에 산신제를 모셨고, 고을마다 마을마다 산신을 섬겼다. 겨레의 시조인 단군도 산신이다. <삼국유사>에서 단군은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후 아사달 산신이 되었다고 했다. 한국의 자연 신앙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신은 천신도 해신도 아닌 산신이다. 더구나 우리의 산신은 인격화된 산신이다. 호랑이를 거느린 할아버지 산신이 연상되지만, 유교적 가부장 사회 이전에는 원래 할머니 산신이었다. 일본만 해도 인격화된 산신이 아니다. 산 자체가 신으로 신앙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신화에서 천왕의 조상신은 아마테라스(天照大神)라는 태양신이다. 우리와 같지 않다.
친족 혈통으로 표현된 산 신화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 왜 한라산신의 아이콘은 할머니이고 지리산신은 어머니였을까? 자연 설화를 주민이 자연과 관계 맺으면서 빚어진 상징 이미지의 산물로 해석할 때,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미지는 사뭇 다르다. 할머니는 나를 있게 한 모계적 근원이고 간접적으로 돌보는 자라면, 어머니는 나를 직접적으로 낳고 기르는 존재이다. 한라산과 지리산의 경관 이미지가 그렇다. 제주사람들에게 한라산은 늘 거기에 있으면서 생명과 존재의 근거가 되는 상징 경관이다. 지리산과 달리 그 속에 생활 터전을 마련하여 어미 품속의 자식처럼 생육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화산지형의 한라산지에서는 물이 부족하고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인구와 마을이 극히 적다. 그래서 어머니산이 아니라 할머니산이다.
조선 양대 전란 이후 ‘나라의 명산’ 격상
한라산은 우리네 할머니가 그렇듯이 온갖 삶의 신산을 겪고 난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켜보는 산이다. 제주사람들의 숱한 애환을 가슴에 묻고 침묵으로 엎드려 있는 그런 산이다. 제주 4·3 민중항쟁에서 검은 오름, 불근 오름 등 한라산지 곳곳은 봉기의 무대이자 거점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초토화작전이라는 무지막지한 이름 아래 3만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중산간 대부분의 마을들은 불타 폐허가 되었다. 그래서 제주 바다는 검다. 바닷물 속에 식은 용암이 제주도의 검은 현대사와 겹쳐져 비친다.
요즘 한라산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한 듯하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에다가 금년에는 세계농업유산의 브랜드까지 획득함으로써 한라산이 국내적인 명산에서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호재를 만난 것이다.
정작 한라산이 국가의 명산 반열로 든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1418년(태종 18)에 와서야 전라도 나주 금성산의 예에 준하여 산제를 지내게 했다는 말이 왕조실록에 나온다. 한라산을 사전(祀典)에 등재하고 본격적으로 제사한 때는 1703년(숙종 29)이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한라산은 바다 건너 먼 지방에 있는 산일 따름이었다.
조선 후기에 와서 한라산은 나라의 명산으로 격상되었다. 그 무렵 한라산이 삼신산의 하나로 알려지면서 위상이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정치적인 배경도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후 변방에 대한 영토·영역 의식이 높아졌고 제주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한라산의 역사는 제주도의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산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다. 그것이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적 특징이다.
<최원석 | 경상대 HK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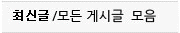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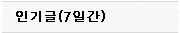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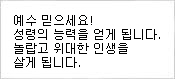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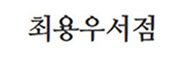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