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책 뒤안길] 북파이중간첩 구광렬 소설 <각하,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목회독서교육 김학현 목사............... 조회 수 394 추천 수 0 2016.07.01 23:57:49| 출처 : | 김학현 목사 http://omn.kr/k8pa |
|---|
박정희 시대가 낳은 유령들, 어디서 무엇할까
[책 뒤안길] 북파 이중간첩 다룬 구광렬 소설 <각하,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세상에 비밀은 없다. 이 말처럼 식상한 말도 없다.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비밀'은 나름대로 웅숭깊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사는 나라엔 유다르게 비밀이 많다. 1급 비밀, 2급 비밀 등 비밀에다 급수를 매겨 어떤 이는 접근해도 되고 어떤 이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비밀에서도 갑과 을이 엄연히 존재한다. 갑은 다 알지만 을은 깜깜하다. 그러다 '그때'(비밀이 해제되는 날)가 이르면 1급이던 비밀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뒤늦게 이슈화 되곤 한다.
한진해운 전 회장 최은영씨의 주식 매도도 그만 아는 비밀에 근거하였다 해서 검찰이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일반인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회사의 비밀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미리 조처를 취한다. 정치 분야에 갑을관계의 비밀이 가장 많지 않을까.
북파 이중간첩이 있었다
군홧발로 나라를 다스리던 장군들의 시대가 있었다. 그땐 정권에 반대하는 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라는 말이 참 잘도 들어맞던 시대다. 나중에 드러난 사건들도 있지만 지금도 오리무중인 사건이 허다하다.
그 시대를 오지게 살아낸 나도 몇몇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의 암울했던 옛 시대의 아픔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땐 '간첩' '무장공비' 이런 단어들과도 참 친했다. 친하고 싶어 친한 게 아니고 진위여부를 떠나, 이쪽 정권이 만든 혹은 저쪽 정권이 만든 '그네들'(간첩, 무장공비)이 수두룩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각하,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는 '그네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그런데 그냥 무장공비가 아니라 역침투 무장공비다. 이쪽으로 온 무장공비를 전향시켜 저쪽으로 보낸 이야기다. 이런 '이중간첩'은 영화에서 자주 만난다. <007 시리즈>에서 보면 이쪽 사람인지 저쪽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어 더 흥미미진진하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역침투 무장공비가 있었다는 건 국민들은 모르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영화 <실미도>(2003, 강우석)를 통해 북파간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실은 내겐 우리가 간첩을 훈련시켜 북파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간첩 침투는 '북괴'나 하는 짓이라 믿으며 살았으니까. 하물며 역 북파간첩이라니. 하지만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시간이 흐르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1968년 김신조 사건은 누구나 아는 사건('121사건'이라 부른다)이다. 북의 무장공비가 떼거리로 몰려와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이다. 그때 남파된 무장공비 중에 사로잡힌 김신조는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그냥 국민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
1960년대 '김두표 중령 살해사건'이 일어난 후 박정희는 은밀히 '北 응징보복작전'을 수행했다. 방첩부대를 시켜 북의 대남침투에 보복하기 위해 대북침투공작을 준비했다. 2008년 10월 8일 기무사령부 문건이 비밀에서 해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김신조 사건은 그런 남북의 주고 받기식 응징의 결과물이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구광렬 작가는 이 사실을 안 후 전향공비들을 훈련시켜 함께 대북침투를 했던 지휘관을 수차례 인터뷰한 내용으로 이 소설의 얼개를 엮었다. 전향공비들의 대북침투공작이라는 낯설고 충격적인 소재를 사실적 필체로 담담히 그려낸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드는 상황 전개가 흥미를 더하는지도 모른다.
좀 자유롭던 때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기도 했다. 신냉전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의 정권 하에서는 주적논란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마 그런 논란을 누가 일으킨다면 금방 빨갱이, 종북으로 매도될 게 뻔하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이다. 하지만 냉혹한 납북 대치의 이 나라에서는 남은 북이라고 말한다. 북은 남이라고 말한다.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보복침투훈련을 받고 남에서 북으로 다시 침투한 무장공비에게는 그게 참 헛갈리는 철학적 논제다.
'北 응징보복작전'에 투입된 북에서 온 무장공비들은 비무장지대에 침투돼 저쪽을 주시한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각기 다른 곳을 본다. 작가는 그들의 시야를 통해 그들의 고뇌를 말한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인민군의 복기를 본다. 그들은 다만 관광객, 구경꾼으로 그쪽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봐야 한다.
평범한 국민으로 산 우리네는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그네들의 정체성 혼란. 그 혼란을 통해 본 남과 북의 현실은 그들이 사라진(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40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혼돈' 그자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작가는 "어차피 형제끼리의 전쟁에는 배반이란 없다"며 에둘러 그들의 정체성 혼란이 당연하다고 위로한다.
아무도 밝히지 않고,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 전향공비들의 생사는 작가의 소설 속에서 침투작전 당시의 '현재'로만 남아있다. '각하,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란 책이름이 말해 주듯 그렇게 아주 조용히. 그네들은 박정희 시대가 낳은 유령이다. 어디에서라도 남도 북도 아닌 자신의 삶에 눈을 주고 살고 있다면 좋겠다.
죽은 듯이 살고 있는 이들을 무시한 채, 여전히 이 나라는 허리에 철조망을 장식한 채 으르렁 거리고 있다. 제삼, 제사의 또 다른 의미의 무장공비들을 양산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아픔은 끝없는 도발과 응징의 보복으로 점철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반도에 드리운 복수의 그림자는 언제나 걷힐까. 유령으로 사는 그네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밀에서도 갑과 을이 엄연히 존재한다. 갑은 다 알지만 을은 깜깜하다. 그러다 '그때'(비밀이 해제되는 날)가 이르면 1급이던 비밀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뒤늦게 이슈화 되곤 한다.
한진해운 전 회장 최은영씨의 주식 매도도 그만 아는 비밀에 근거하였다 해서 검찰이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일반인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회사의 비밀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미리 조처를 취한다. 정치 분야에 갑을관계의 비밀이 가장 많지 않을까.
북파 이중간첩이 있었다
군홧발로 나라를 다스리던 장군들의 시대가 있었다. 그땐 정권에 반대하는 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라는 말이 참 잘도 들어맞던 시대다. 나중에 드러난 사건들도 있지만 지금도 오리무중인 사건이 허다하다.
그 시대를 오지게 살아낸 나도 몇몇 사건은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의 암울했던 옛 시대의 아픔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땐 '간첩' '무장공비' 이런 단어들과도 참 친했다. 친하고 싶어 친한 게 아니고 진위여부를 떠나, 이쪽 정권이 만든 혹은 저쪽 정권이 만든 '그네들'(간첩, 무장공비)이 수두룩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각하,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는 '그네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그런데 그냥 무장공비가 아니라 역침투 무장공비다. 이쪽으로 온 무장공비를 전향시켜 저쪽으로 보낸 이야기다. 이런 '이중간첩'은 영화에서 자주 만난다. <007 시리즈>에서 보면 이쪽 사람인지 저쪽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어 더 흥미미진진하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역침투 무장공비가 있었다는 건 국민들은 모르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영화 <실미도>(2003, 강우석)를 통해 북파간첩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실은 내겐 우리가 간첩을 훈련시켜 북파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 간첩 침투는 '북괴'나 하는 짓이라 믿으며 살았으니까. 하물며 역 북파간첩이라니. 하지만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고 시간이 흐르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1968년 김신조 사건은 누구나 아는 사건('121사건'이라 부른다)이다. 북의 무장공비가 떼거리로 몰려와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이다. 그때 남파된 무장공비 중에 사로잡힌 김신조는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라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그냥 국민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
1960년대 '김두표 중령 살해사건'이 일어난 후 박정희는 은밀히 '北 응징보복작전'을 수행했다. 방첩부대를 시켜 북의 대남침투에 보복하기 위해 대북침투공작을 준비했다. 2008년 10월 8일 기무사령부 문건이 비밀에서 해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김신조 사건은 그런 남북의 주고 받기식 응징의 결과물이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
구광렬 작가는 이 사실을 안 후 전향공비들을 훈련시켜 함께 대북침투를 했던 지휘관을 수차례 인터뷰한 내용으로 이 소설의 얼개를 엮었다. 전향공비들의 대북침투공작이라는 낯설고 충격적인 소재를 사실적 필체로 담담히 그려낸다. 어떤 면에서 보면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드는 상황 전개가 흥미를 더하는지도 모른다.
좀 자유롭던 때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기도 했다. 신냉전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지금의 정권 하에서는 주적논란조차 일어나지 않고 있다. 아마 그런 논란을 누가 일으킨다면 금방 빨갱이, 종북으로 매도될 게 뻔하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이다. 하지만 냉혹한 납북 대치의 이 나라에서는 남은 북이라고 말한다. 북은 남이라고 말한다.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보복침투훈련을 받고 남에서 북으로 다시 침투한 무장공비에게는 그게 참 헛갈리는 철학적 논제다.
"삶이 연극이라 해도 참으로 괴이한 배역. 최초로 북침을 하게 될 대한민국의 국군 역. 두 달 전만 해도 북에서 남으로 향했던 총부리. 그 총부리를 남에서 북으로 돌려야만 했다. 난 누구 편인가. 아니 난 누구인가. 그 돌려질 방향만큼 그들의 가슴은 소용돌이쳤다."- 본문 72-73쪽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던 이들이 이쪽에서 저쪽을 본다. 현석은 관광객이 전망대에서 아래 경치를 바라보듯 했으며, 태형은 꼼꼼히 계곡과 강물줄기를 흝고 있었다. 평래는 묵묵히 전방만을 주시했으며, 기태는 산 너머. 아니 까마득하니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다 초점을 뒀다."- 본문 144-145쪽
'北 응징보복작전'에 투입된 북에서 온 무장공비들은 비무장지대에 침투돼 저쪽을 주시한다. 그런데 그들의 눈은 각기 다른 곳을 본다. 작가는 그들의 시야를 통해 그들의 고뇌를 말한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인민군의 복기를 본다. 그들은 다만 관광객, 구경꾼으로 그쪽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봐야 한다.
평범한 국민으로 산 우리네는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그네들의 정체성 혼란. 그 혼란을 통해 본 남과 북의 현실은 그들이 사라진(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40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혼돈' 그자체로 존재한다. 그래서 작가는 "어차피 형제끼리의 전쟁에는 배반이란 없다"며 에둘러 그들의 정체성 혼란이 당연하다고 위로한다.
아무도 밝히지 않고,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 전향공비들의 생사는 작가의 소설 속에서 침투작전 당시의 '현재'로만 남아있다. '각하, 죽은 듯이 살겠습니다'란 책이름이 말해 주듯 그렇게 아주 조용히. 그네들은 박정희 시대가 낳은 유령이다. 어디에서라도 남도 북도 아닌 자신의 삶에 눈을 주고 살고 있다면 좋겠다.
죽은 듯이 살고 있는 이들을 무시한 채, 여전히 이 나라는 허리에 철조망을 장식한 채 으르렁 거리고 있다. 제삼, 제사의 또 다른 의미의 무장공비들을 양산하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아픔은 끝없는 도발과 응징의 보복으로 점철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한반도에 드리운 복수의 그림자는 언제나 걷힐까. 유령으로 사는 그네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뒤안길은 뒤쪽으로 나 있는 오롯한 오솔길입니다.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의 오솔길을 걷고 싶습니다. 함께 걸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
|
혹 글을 퍼오실 때는 경로 (url)까지 함께 퍼와서 올려 주세요 |
|
자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이단 자료는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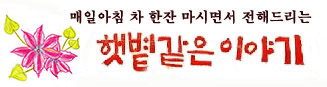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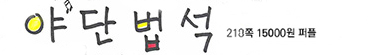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