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경혈은 침을 놓고 뜸을 뜨는 자리, 즉 경락선상의 요충지라 할 수 있으며 수혈(穴), 공혈,(孔穴) 혈위(穴位)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경혈의 배열순서>
역사적으로 볼 때 수혈을 정리한 방식은 침구서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허준과 허임은 왕유일(987?∼1067)의 ‘동인수혈침구도경’(보통 ‘동인경’으로 약칭)은 경혈 공부에 주된 텍스트로 삼았다. 이 책은 조선 전 시기를 통해 경혈을 연구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허준과 허임 역시 이 책을 위주로 경혈들을 정리하고 있다.
경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경혈의 위치, 침 놓는 깊이, 뜸의 장수, 침을 꽂아 놓는 시간, 금기나 부작용, 일부 주치하는 병증 언급, 오수혈의 경우 혈성(穴性), 경혈의 이명 등이다.
허임이 ‘침구경험방’에서 언급하고 있는 총 수혈수는 150개혈(쌍혈:127개, 단혈:23개)인데, 이는 ‘갑을경’이 349혈, ‘동인경’이 354혈, ‘동의보감’에서 156혈을 수록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은 경혈을 제외하고 일부만 선택하여 간결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침구경험방’에서 중요하게 여겨 뽑아 정리한 경혈들을 열거해본다.
1. 수태음폐경
소상(少商), 어제(魚際), 태연(太淵), 경거(經渠), 열결(列缺), 공최(孔最), 척택(尺澤), 중부(中府) ― 8개의 경혈 정리
2. 수양명대장경
상양(商陽), 이간(二間), 삼간(三間), 합곡(合谷), 양계(陽谿), 곡지(曲池), 견우(肩), 영향 (迎香) ― 8개의 경혈 정리
3. 족양명위경
여태(兌), 함곡(陷谷), 충양(衝陽), 해계(解谿), 삼리(三里), 기충(氣衝), 천추(天樞), 대영 (大迎), 두유(頭維) ― 10개의 경혈
4. 족태음비경
은백(隱白), 대도(大都), 태백(太白), 공손(公孫), 상구(商丘), 삼음교(三陰交), 음릉천(陰陵泉), 혈해(血海) ― 8개의 경혈
5. 수소음심경
소충(少衝), 소부(少府), 신문(神門), 통리(通里), 영도(靈道), 소해(少海) ― 6개의 경혈 정리
6. 수태양소장경
소택(少澤), 전곡(前谷), 후계(後谿), 완골(腕骨), 양곡(陽谷), 소해(小海), 천창(天窓), 청궁(聽宮) ―8개의 경혈 정리
7. 족태양방광경
지음(至陰), 통곡(通谷), 속골(束骨), 경골(京骨), 신맥(申), 곤륜(崑崙), 위중(委中), 의희(), 고황수(膏兪), 상료(上), 차료(次), 중료(中), 하료(下), 대여(大), 풍문 (風門), 폐수(肺兪), 심수(心兪), 격수(膈兪), 간수(肝兪), 담수(膽兪), 비수(脾兪), 위수(胃兪), 삼초수(三焦兪), 신수(腎兪), 대장수(大腸兪), 소장수(小腸兪), 방광수(膀胱兪), 곡차 (曲差), 찬죽(竹), 정명(睛明) ― 30개의 경혈 정리
8. 족소음신경
용천(涌泉), 연곡(然谷), 태계(太谿), 조해(照海), 부류(復溜), 음곡(陰谷) ― 6개의 경혈 정리
9. 수궐음심포경
중충(中衝), 노궁(勞宮), 대릉(大陵), 내관(內關), 간사(間使), 곡택(曲澤) ―6개의 경혈정리
10. 수소양삼초경
관충(關衝), 액문(液門), 중저(中渚), 양지(陽池), 외관(外關), 지구(支溝), 천정(天井), 예풍(風), 사죽공(絲竹空), 이문(耳門) ― 10개의 경혈 정리
11. 족소양담경
규음(竅陰), 협계(俠谿), 임읍(臨泣), 구허(丘墟), 현종(懸鍾), 양보(陽輔), 양릉천(陽陵泉), 환도(環跳), 경문(京門), 일월(日月), 견정(肩井), 풍지(風池), 목창(目窓), 본신 (本神), 객주인(客主人), 청회(聽會), 동자료(瞳子), 풍시(風市), 당양(當陽) ― 19개의 경혈 정리
12. 족궐음간경
대돈(大敦), 행간(行間), 태충(太衝), 중봉(中封), 곡천(曲泉), 장문(章門), 기문(期門) ― 7 개의 경혈 정리
13. 독맥
소료(素), 수구(水溝), 신정(神庭), 상성(上星), 백회(百會), 풍부(風府), 아문(門), 대추(大椎), 신도(神道), 요수(腰兪) ― 10개의 경혈 정리
14. 임맥
승장(承漿), 전중(亶中), 구미(鳩尾), 거궐(巨闕), 중완(中脘), 수분(水分), 신궐(神闕), 음교(陰交), 기해(氣海), 석문(石門), 관원(關元), 중극(中極), 곡골(曲骨) ― 13개의 경혈 정리
※이상에 소개된 경락·경혈은 <별첨자료 A>(220~229페이지)에 그림과 함께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새로운 경혈을 찾아서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은 별혈(別穴)의 보고다. 별혈은 경외기혈(經外奇穴)의 다른 이름인데, 기존 경락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경혈들을 말하는 것이다.
허준은 별혈의 기준에 대해, ‘동인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방서에 산재하는 수혈’이라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40개의 별혈을 수록하고 있고, ‘침구경험방’에서는 이를 더 보충하여 58개에 이르는 별혈을 수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별혈을 집록하고 있는 것은 타 침구서에서는 흔치 않은 일로 신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허임은 이들 별혈을 머리(9혈), 등과 어깨(11혈), 상지(15혈), 흉복부(8혈), 하지(14혈)의 순으로 부위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다음은 ‘침구경험방’에 수록되어 있는 별혈들이다.
신총(神聰)4혈, 당양(當陽)2혈, 태양(太陽)2혈, 명당(明堂)1혈, 미충(眉衝)2혈, 비준(鼻準)1혈, 이첨(耳尖)2혈, 취천(聚泉)1혈, 해천(海泉)1혈, 아시혈(阿是穴), 숭골(崇骨)1혈, 백로(百勞)2혈, 정궁(精宮)2혈, 갑봉(胛縫)2혈, 환강(環岡)2혈, 요안(腰眼)2혈, 하요(下腰)1혈, 회기(回氣)1혈, 낭저(囊底)1혈, 난문(門)2혈, 장요(腸)2혈, 견주(肩柱)2혈, 주첨(尖)2혈, 용현(龍玄)2혈, 여세(呂細)2혈, 중천(中泉)2혈, 이백(二白)4혈, 중괴(中魁)2혈, 오호(五虎)4 혈, 대도(大都)2혈, 상도(上都)2혈, 중도(中都)2혈, 하도(下都)2혈, 사봉(四縫)좌우16혈, 십선(十宣)10혈, 대공골(大空骨)2혈, 소공골(小空骨)2혈, 방정(旁廷)2혈, 통관(通關)2혈, 직골(直骨)2혈, 음도(陰都)2혈, 기문(氣門)2혈, 포문(胞門)1혈, 자호(子戶)1혈, 자궁(子宮)2혈, 학정(鶴頂)2혈, 슬안(膝眼)2혈, 풍시(風市)2혈, 영충(營衝)2혈, 누음(漏陰)2혈, 교의(交儀)2혈, 음양(陰陽)2혈, 음독(陰獨)8혈, 족내과첨(足內尖)2혈, 족외과첨(足外尖)2혈, 독음(獨陰)2혈, 내대충(內大衝)2혈, 갑근(甲根)4혈
허임은 실제 치료에 있어서도 이들 별혈을 적극 활용하였다. 실제 치료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외기혈은 20여혈에 이르며, 특히 독음혈은 그가 여러 병증에 애용한 혈이었다. 이러한 의욕적인 경외기혈의 활용은 기존 정경혈(正經穴)을 이용한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는 허임의 창의적인 치료정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침구경험방’치료문에서 병증별로 선혈하고 있는 별혈을 모아본 것인데 이는 허임 자신이 직접 임상에 사용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근육·관절통은 눌러서 아픈 곳에 침뜸을 놓는다
아시혈(阿是穴)이란 눌러 보았을 때 아픈 곳을 혈자리로 삼는 것을 말하며, 바로 그 자리에 침을 놓거나 뜸을 떠서 병을 치료하게 된다. ‘아시’라는 말은 ‘아야! 거기가 맞아’라는 뜻이다. 이 용어는 손사막이 처음으로 정의하였는데, ‘영추·경근(經筋)’편의 “아픈 곳을 혈자리로 한다(以痛爲輸)”는 개념이 바탕이 되었다. 후세에는 이를 천응혈(天應穴)이라고도 하였다.
허임은 아시혈에 대해 “해당처를 말한다”고 하며 별혈에 넣었다. 그는 아시혈을 사용하는 치료법을 일러 ‘수통수침법(隨痛隨鍼法)’, 즉 아픈 곳을 따라 침을 놓는 방법이라 칭하면서, 실제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가 아시혈을 많이 사용한 병증을 보면 주로 목이 뻣뻣한 증, 손과 팔의 근이 뒤틀리며 시고 아픈데, 낙상이나 타박상, 팔꿈치, 손목이 시면서 아픈 증상 등 오늘날로 치면 근육·관절 관련 통증에 다용하였다.
또한 아시혈점을 탐색하는 요령에 대해 “의사가 왼손 엄지로 근(筋)이 뭉쳐 통증이 있는 부위를 꽉 눌러 움직이지 않게 하고, 침으로 근이 뭉친 곳을 관자(貫刺)하여 근이 상한 곳에 침봉이 이르면 시고 아픈 것을 참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천응혈이다. 통증에 따라 침을 놓으면 신효를 본다”라고 설명한다.
아시혈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치법은 최근 서의학에서 근막통증증후군, 섬유근통 등의 병증에 방아쇠점(Trigger Point), 압통점(Tender Point)의 개념을 이용한 국소치료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볼 때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있는 일이다.
이외에 오수혈(五穴)이란 게 있다. 오수혈이란 12경맥에 속해 있는 각 경맥의 혈자리 중에 팔꿈치와 무릎 관절 이하에 위치하는 정(井), 형(滎), 수(), 경(經), 합(合) 다섯 개의 혈자리를 말한다. 오행이론에 따라 다섯가지 성질을 갖게 되는데, 침구임상에 매우 중요한 경혈들로 허임 역시 빈번히 사용하였다.
‘내경’에서는 “경맥의 기가 나오는 곳(出)이 정혈이고, 머무는 곳(溜)이 형혈이고, 주입되는 곳(注)이 수혈이고, 흐르는 곳(行)이 경혈이고, 흘러들어가는 곳(入)이 합혈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맥기의 흐름을 물이 발원지에서 시작하여(정), 가늘게 조금씩 흐르고(형),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얕은 데서 깊은 곳으로 흘러 점차 왕성하게 흐르고(수), 큰 강을 이루어 물이 창통하게 되어(경),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합) 것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이다.
‘난경·68난’에는 오수혈이 다스리는 병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혈은 명치끝이 더부룩한 것을 치료한다(主心下滿).
형혈은 몸의 열을 치료한다(主身熱).
수혈은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主體重節痛).
경혈은 천식과 기침, 추웠다 더웠다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主喘咳寒熱).
합혈은 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설사하는 증상을 치료한다(主逆氣而泄).
">침뜸을 금하는 혈자리와 주의점
고대의 금침혈은 후세로 가면서 깊이 찌르면 안 되는 혈자리도 포함하게 됨에 따라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 혈자리들은 주로 중요한 장기나 동맥 근처에 위치하여 침의 깊이나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침도구가 발전하고 해부 지식도 명확해져 옛날에는 금침혈로 여기던 혈에도 침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금구혈도 마찬가지다.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 두 책 모두‘의학입문’에서 인용한 금침혈 34혈과 금구혈 49혈을 똑같이 수록하고 있다.
<침을 금하는 혈자리>
신정, 뇌호, 신회, 옥침, 낙각, 승영, 노식, 각손, 승읍, 신도, 영대, 운문, 견정, 전중, 결분, 상관, 구미, 오리, 청영, 합곡, 신궐, 횡골, 기충, 기문, 승근, 수분, 회음, 석문, 인영, 유중, 연곡, 복토, 삼음교, 삼양락
<뜸을 금하는 혈자리>
아문, 풍부, 천주, 승광, 임읍, 두유, 찬죽, 정명, 소료, 화료, 영향, 관료, 하관, 인영, 천용, 천부, 주영, 연액, 유중, 구미, 복애, 견정, 양지, 중충, 소상, 어제, 경거, 양관, 척중, 은백, 누곡, 조구, 독비, 음시, 복토, 비관, 심맥, 위중, 은문, 심수, 승읍, 승부, 계맥, 이문, 석문, 뇌호, 사죽공, 지오회, 백환수
다음은 ‘침구경험방’에서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혈자리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경거∼ 뜸을 뜨면 정신을 상한다.
척택∼ 침을 깊이 놓지 마라.
합곡∼ 임신부에게는 금침한다.
삼음교∼ 임신부에게 시술하면 태를 상할 수 있다.
소해∼ 두통에는 뜸을 뜨지 마라.
폐수, 간수, 신수∼ 각 장기에 찌르면 각각 3, 5, 6일에 죽는다.
견정∼ 깊이 찌르지 마라.
한편 침뜸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훈침(暈鍼)과 훈구(暈灸)가 있다. 훈침은 침을 맞고 어지러운 증상이 생기는 것으로 때론 가슴이 울렁거리고, 숨이 차며, 안색이 창백해지고, 메스껍고, 토하고 싶으며, 사지가 싸늘해지기도 한다.
훈침은 침을 처음 맞는 사람에게 많은데 너무 긴장해서 침을 맞거나, 침 맞는 자세가 나쁠 때, 침자극이 너무 과도할 때, 허약한 체질, 심한 피로, 배가 고플 때, 땀을 많이 흘린 후, 설사 후, 출혈 후에 주로 발생한다. 훈침이 발생하면 즉시 침을 빼고 환자를 편안하게 눕혀 허리띠를 풀어 주고 쉬게 하면서 따뜻한 물 등을 준다.
침뜸에 꺼려야 할 것
너무 피곤할 때, 너무 배고플 때, 너무 배부를 때, 술을 마신 후, 몹시 놀란 후, 성낸 후, 갈증이 많이 날 때는 침을 놓지 않는다.
뜸에 금할 것 ∼닭·돼지고기, 술과 밀가루, 성생활, 바람을 접촉하지 말고, 노를 발하지 말 것. 만약 삼가 조섭하지 않으면, 비록 귀신이라 해도 낫게 할 수 없다.
잘못된 혈자리 바로잡기
‘침구경험방’에는 다른 침구서에는 없는 ‘와혈(訛穴)’이라는 독특한 항목을 책머리에 싣고 있다. 여기서는 경혈의 위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정확한 취혈을 할 수 있도록 교정해주고 있다. 많은 혈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소상, 합곡, 신문, 견정, 절골, 삼리 등 6개의 경혈을 예로 들고 있다.
소상(少商) ― ‘동인경’에서는 엄지 안쪽의 손톱 모서리에서 부춧잎 간격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춧잎에도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속의(俗醫)는 손톱에서 실낱 간격만큼만 띄운다. 바른 취혈은 손톱 모서리에서 3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제1절횡문두와 서로 일직선이 되는 곳이다.
합곡(合谷) ― 합곡혈이 양명경 소속이라고 식지에 치우쳐 취혈하지 말고, 엄지와 식지 사이의 움푹한 곳을 취혈해야 한다.
신문(神門) ― 음경(陰經)과 양경(陽經)을 잘 분간해야 한다. 손목 바깥쪽에 있는 뾰족한 뼈 끝(銳骨端)의 태양소장경을 잘못 취혈하면 안 된다.
견정(肩井) ― 어깨 위에 있는 움푹한 곳의 대골(大骨) 앞 1촌반을 세 손가락(2,3,4지)으로 눌렀을 때 중지가 짚어지는 곳이 견정이다. 속의는 어깨 위의 대골 끝자락(大骨端)을 세 손가락으로 눌러 견갑 위에 있는 차골(叉骨) 사이 움푹한 곳에 잘못 취혈한다.
절골(絶骨) ― 절롱골(絶壟骨) 위를 취혈하지 말고, 절롱골 앞의 골육 사이를 취혈해야 한다.
삼리(三里) ― 슬개하 3촌 행골(骨)의 바깥 골변으로부터 옆으로 1촌을 재 해당하는 양 근육 중간의 움푹한 곳을 손으로 눌렀을 때, 발등 위의 태충맥이 뛰지 않는 곳을 취혈해야 효험이 있다.
<몇몇 경혈의 바람직한 취혈 자세>
곡지 ― 두 손을 가슴에서 마주잡고 취혈
견우 ― 팔을 위로 들고 취혈
음릉천, 음곡, 곡천 ― 무릎을 굽히고 취혈
소해 ― 팔꿈치를 굽히고 머리로 향하도록 취혈
소해, 천정 ― 팔꿈치를 굽히고 취혈
액문 ― 주먹을 쥐고 취혈
환도 ― (옆으로 누워) 밑에 놓인 다리는 펴고, 위에 놓인 다리는 굽히고 취혈
청회 ― 입을 벌리고 취혈
중봉 ― 발을 쭉 뻗어서 취혈
아문 ― 머리를 위로 우러러서 취혈
신도 ― 몸을 굽혀서 취혈
전중 ― 위를 보고 누워서 취혈
침의 종류
‘영추·구침십이원편’에는 참침, 원침, 시침, 봉침, 피침, 원리침, 호침, 장침, 대침 등 아홉 종류의 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침은 그 길이, 굵기, 모양에 따라 각기 그 쓰임새가 다르므로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구침(九鍼)의 종류와 용도>
참침∼길이는 1.6촌. 침 끝이 크고 예리하다. 주로 양기를 사한다.
원침∼길이는 1.6촌. 침끝이 달걀 모양이다. 분육(分肉) 사이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시침∼길이는 3.5촌. 침 끝을 기장이나 조처럼 둥글게 한 것이다. 맥을 눌러 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여 기가 이르도록 하는데 사용한다.
봉침∼길이는 1.6촌. 침 날이 세모꼴이다. 오늘날 삼릉침에 해당한다. 고질병을 치료하는데 주로 쓰인다.
피침∼길이는 4촌이고 너비는 2촌. 끝이 칼날 같다. 많이 곪은 것을 째는 데 쓴다.
원리침∼길이는 1.6촌. 굵기는 소의 꼬리털 같고, 둥글고 예리하며 침 날의 가운데는 약간 굵다. 갑자기 생긴 사기를 없앤다.
호침∼길이는 3.6촌. 끝은 모기나 등에 입같이 날카로우며 천천히 놓고 오래 꽂아 둔다. 통비를 치료한다.
장침∼길이는 7촌. 침 끝이 예리하다. 오래된 비증을 치료한다.
대침∼길이는 4촌. 끝은 못과 같으며 침 날은 약간 둥글다. 장기의 물을 빼는 데 쓴다.
허임은 ‘침구경험방’에서 여러 가지 침을 실제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구침 중에 나오는 것이며, 일부 다른 침의 이름도 보인다. 다음에 그 예를 들어 본다.
<허임이 활용한 침의 종류와 해당 병증>
①삼릉침(三稜鍼)∼두면부의 제양열기(諸陽熱氣)를 사할 때, 두면풍단(風), 배와 옆구리 및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찌르는 듯 아파서 참을 수 없을 때, 뱃속의 적취 기운이 상하로 다닐 때, 풍단(風丹) 및 화단독(火丹毒)등 주로 사혈을 시행할 때 사용함.
②원리침∼팔다리의 근이 뒤틀려 절뚝일 때, 손·발가락 마디가 삔 데, 맥이 미세하거나 혹은 안 나타나는 사람의 경우는 원리침으로 족소음경의 부류혈을 심자한다. 주로 심자할 때 사용.
③원침∼변독(便毒)에 원침으로 그 핵을 관자하고 뜸을 뜬다.
④사릉철침(四陵鐵鍼)∼창출을 뚫는데 사용. 인체에 사용한 언급은 없음.
⑤대침∼배종을 잘못 치료하여 열농하게 된 데, 열농의 붉게 번진 가장자리 등 농을 터뜨릴 때 사용함.
⑥세침(細鍼)∼난산의 경우 세침으로 태아의 수심과 족심을 찌른다.
⑦화침(火鍼)∼‘내경’에서 말하는 번침법(燔鍼法)으로 침을 불에 달궈서 시술하는 방법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뜸뜨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용한다고 하였다.
허임은 다음과 같은 정신질환에 주로 화침을 이용하였다.
―귀사(鬼邪)는 13귀혈(十三 鬼穴)에 화침을 이용, 괴질(怪疾)은 신맥, 상성, 곡지혈을 화침으로 7정()함, 저주(咀呪)하는 증상에도 화침을 사용.
침뜸에도 보사(補瀉)가 있다
‘내경’에서 말한 “남으면 사하고, 부족하면 보한다(有餘者瀉之, 不足者補之)”라는 말은 침뜸보사에 대원칙이다. 침뜸이 병을 치료하는 것도 음양의 허와 실이라는 병리상태를 보사수법을 통해 조정하고 평형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침의 보사법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보사법의 유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식보사법
염전(捻轉)보사법 ― 침을 무지와 식지로 교체하면서 돌려주는 조작에 따른 보사. 무지가 앞으로 식지가 뒤로 가면 보법. 무지가 뒤로 가고 식지가 앞으로 가면 사법.
영수(迎隨)보사법 ― 침을 놓는 방향에 따른 보사. 침끝을 경맥 순행 방향으로 하면 보법. 순행 반대 방향으로 하면 사법.
호흡(呼吸)보사법 ― 침감이 이르게 한 후, 환자의 호흡에 따른 보사. 환자가 숨을 내 쉴 때 침을 꽂고 숨을 들이쉴 때 빼면 보법. 반대로 숨을 들이쉴 때 꽂고 내쉴 때 빼면 사법.
개합(開闔)보사법 ― 침을 뺀 후 침구멍을 막는 것에 따름 보사. 출침시 신속히 침구멍을 막으면 보법. 침구멍을 막지 않거나 침을 흔들어 구멍을 크게 하면 사법.
서질(徐疾)보사법 ― 침을 꽂고 빼는 속도에 따른 보사법. 빨리 꽂고 천천히 빼면 사법, 천천히 꽂고 빨리 빼면 보법.
2.복식보사법
‘내경’의 보사법 ― 단식보사법을 배합하거나, 손동작(누르고, 돌리고, 밀고)을 배합하는 방법.
소산화법, 투천량법, 양중은음법, 음중은양법, 청룡파미법, 백호요두법 등
3. 배혈보사법
배혈보사법(配穴補瀉法)이란 손의 기술을 이용하는 수법(手法)보사와는 달리 혈자리 선택을 통해 보사를 하는 방법이다. 이는 혈자리마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침구경험방’에서는 역대 의서에 나오는 몇 가지 경우를 인용하고 있지만 규칙화된 체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 예를 들어본다.
눈알이 아프면서 눈물은 안 날 때 ― 중완, 내정을 모두 오래 유침했다가 즉시 사한다.
피를 뱉어 속이 손상된 데 ― 어제사, 척택보 (갑을→천금→자생→신응)
인후는 붓지 않았어도 열이 막고 있어 무엇을 마시면 코로 다시 나올 때 ― 합곡, 연곡을 함께 오래 유침하고 즉시 사한다.
심열이 있어 잠을 못 이룰 때 ― 해계사, 용천보
심장이 아프면서 얼굴이 파랗게 되어 죽으려고 할 때 ― 척택침, 지구사
식갈(食渴) ― 삼초수, 위수, 태연, 열결을 침으로 사한다.
허해서 나는 땀(虛汗) ― 합곡보, 부류보, 하삼리보
두통 및 눈병으로 눈이 빨갛게 된 증 ― 모두 사법을 쓴다.
신체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할(不仁) 때 ― 먼저 경골을 취하고, 후에 중봉, 절골을 모두 침으로 사한다.
허한 사람의 구토 ― 기해보
태아가 위로 심장을 핍박하여 답답한 데 ― 보합곡 사삼음교
젖이 안 나올 때 ― 소택보
4. ‘침구경험방’의 침보사법
허임은 서문에서 “보사의 방법을 밝히 드러내는 것(發明補瀉之法)”이 책을 저술하는 한 이유라고 말할 정도로 보사법에 관심을 보인다. 그의 침자보사법은 독창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이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가 어떤 보사방법을 사용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5분 깊이를 찔러야 할 혈자리라면 2분을 찔러 넣고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2분을 넣고 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1분을 넣는다. 환자로 하여금 숨을 들이쉬게 하면서 침을 뽑고, 곧바로 손으로 침구멍을 눌러 진기(眞氣)를 보존한다. 이것이 보법이다.”
“5분 깊이를 찔러야 할 혈자리라면 5분을 찔러 넣고 잠시 멈추었다가, 2분을 뽑고 다시 잠시 멈추었다가, 2분을 뽑고 다시 잠시 멈추었다가, 환자로 하여금 숨을 내쉬게 하면서 침을 뽑아 사기(邪氣)를 이끌어, 맞으면서 빼낸다. 이것이 사법이다.”
이를 정리하면 허임의 침보사법은, 침을 3단계에 걸쳐 넣고 빼는(進退) 보사법에다가 호흡보사법, 개합보사법을 함께 쓰고 있다. 즉 보법은 3단계에 걸쳐 침을 밀어 넣고, 사법은 3단계에 걸쳐 침을 빼주어, 각각 진기(眞氣)를 보존하고, 사기(邪氣)를 끌어내는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거기에다 침을 뺄 때 환자의 호흡을 보할 때는 들이쉬게(吸) 하고, 사할 때는 내쉬도록(呼) 하는 호흡보사법을 같이 쓴다. 아울러 보법에서는 침을 뺄 때 침구멍을 눌러주는 개합보사법도 같이 쓴다.
뜸 바로 뜨는 법
①뜸뜨는 적당한 시간
이른 아침과 오후는 곡기(穀氣)가 허핍한 때이므로 반드시 한 낮에 시행한다.
②뜸뜨는 장수의 결정
뜸뜨는 숫자를 장(壯)이라고 쓰는 것은 뜸봉 한 개의 힘이 어른 한 사람의 힘과 같다고 본 데서 나온 말이다.
사지(四肢)는 단지 풍사(風邪)만 없애면 되므로 7장∼7×7장하면 그친다.
배와 등은 500장:배꼽 아래가 오래 냉한데, 산가(疝), 기가 뭉친 데(氣塊), 복량(伏梁), 적기(積氣)와 같은 증상엔 뜸을 많이 떠야 한다.
거궐, 구미는 비록 흉복의 혈자리지만 7×7장을 넘지 않는다. 만약 쑥을 크게 해서 많이 뜨면 사람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심력이 없게 만든다.
머리와 정수리의 경혈에 뜸을 많이 뜨면 정신을 잃게 된다.
팔뚝과 다리의 혈(臂脚穴)은 침을 많이 놓으면 혈맥이 고갈되어 사지가 가늘게 여위어 무력해지고 정신을 잃는다..
혈자리에는 얕고 깊은 데가 있어, 얕은 경혈에 뜸을 많이 뜨면 반드시 근력을 상하게 되므로 3장, 5장, 7장에서 그친다.
③쑥의 작용에 대하여
허임은 쑥의 성질에 대해 “열이 있을 때 뜸을 뜨면 그 열을 발산시키고, 찰 때 뜸을 뜨면 그 찬 것을 온화하게 해준다. 또한 약물이 들어가면 상행하고, 뜸을 뜨면 하행한다”고 말한다.
④뜸을 뜬 후의 관리법
뜸을 뜬 후 생기는 상처를 구창(灸瘡)이라 한다. ‘자생경’에서는 뜸을 뜬 후 뜸자리가 헐어야 병이 낫는다고 보았고, 심지어 고름이 나야 효과가 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뜸의 양이 많거나 자극이 세면 상처가 남을 뿐 아니라 덧날 수가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물집이 잡힌 정도는 터지지 않으면 자연히 흡수된다. 그러나 구창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면 박하, 복숭아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등을 달인 물로 씻어준다.
⑤ 뜸의 보사법
뜸의 보법 ― 뜸쑥이 살에까지 타들어가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린다.
뜸의 사법 ― 뜸쑥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살에 이르기 전에 쓸어버린다.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한 뜸법
뜸법 중 쑥을 직접 피부 위에 놓고 뜸을 뜨는 것을 ‘직접구’라 하고, 피부 위에 놓지 않고 여러 가지 약물을 놓고 그 위에 뜨는 방법을 ‘간접구’라 한다.
①마늘뜸법
〈적응증〉 많이 아픈 종독, 아프지는 않고 마목한데, 마늘을 놓고 그 위에 뜸을 뜨면 울체된 독을 끌어내주는 효능이 있다.
〈방법〉 마늘을 3분 정도 두께로 썰어 종두 위에 놓고, 쑥으로 뜸을 뜬다. 다섯 번을 뜨고 마늘 조각을 간다. 창(瘡)이 십여개 연속하여 나 있으면 한 군데를 선택하여 마늘을 이겨서 찧은 것을 환처에 펴고, 쑥을 놓고 뜸을 뜬다. 만약 종기의 색이 희고 농이 들지 않은 사람은 날과 기간을 불문하고 뜸을 많이 뜬다.
②부자뜸법
〈적응증〉 뇌루(腦瘻)와 종기(諸癰腫)가 견고한 경우에 쑥을 부자 위에 붙이고 뜸을 뜬다.
〈방법〉 부자를 바둑알 두께로 종기 위에 바로 붙이고 약간의 침으로 부자를 적신 후 쑥을 부자 위에 놓고 뜸을 떠 열이 스미게 한다. 부자가 마르려고 하면, 다시 침으로 적시고 뜸을 떠 쑥기운이 스미게 한다. 부자가 마르면 바로 바꾸어 준다.
③진흙뜸법
〈적응증〉 종기가 등과 양 견갑간에 생겨 혹 아프거나 가려운데, 처음엔 좁쌀만 하지만 소홀히 하면 10일이 못 되어 죽는다.
〈방법〉 깨끗한 황토와 물을 이겨서 두께는 2분으로 하고 가로세로 1촌반 정도 크기로 떡을 만들어 종기 위에 붙이고, 쑥을 크게 하여 흙떡 위에 놓고 뜸을 뜨되 한 번 뜰 때마다 바꿔준다. 만일 종기가 좁쌀만할 때는 뜸을 7장 뜨면 낫지만 종기가 엽전 크기 정도면 큰 쑥을 밤낮 그치지 말고 나을 때까지 한다.
④소금뜸법
곽란에 소금을 배꼽에 채우고 2×7장 뜸을 뜬다.
산기(疝氣)가 위로 치밀 때 ― 밀가루를 물에 개 떡을 빚어 배꼽에 놓고 볶은 소금으로 두툼하게 5분을 채우고 뜸쑥을 크게 하여 약간 따뜻해질 때까지 100∼500 장 뜸을 뜬다. 매년 봄 가을로 뜸을 뜬 후 9일을 연이어 밀실에 거하면서 출입과 주·색, 냉물을 삼가면 신효가 있다.
간접뜸법에는 이 외에도 생강, 약전국(두시), 유황, 상지 등의 여러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부항 뜨는 법
부항법은 항아리나 죽관, 컵 등의 부항단지를 피부 표면에 대고 흡력을 발생시켜 피부가 빨려 올라오게 하는 치료방법인데, 이는 혈맥을 확장시켜 국부의 증상을 개선하고 인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다. 오늘날은 부항컵을 붙이고 공기를 빼내는 방법을 주로 쓰지만, 옛날에는 열을 이용하여 부항단지 내의 공기가 부풀게 한 후 피부에 대 공기온도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압력을 많이 이용하였다.
‘침구경험방’에 언급되고 있는 ‘부항구’란 뜸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쑥을 태워서 생긴 음압으로 부항을 붙이는 화관법(火罐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허임은 단순부항법보다는, 부항을 댈 부위에 먼저 삼릉침으로 찌른 후 부항을 붙여 피를 빼내는 자락부항법(刺絡撥罐法)을 많이 활용하였다. 그가 이 방법에 대해 한 설명을 보자.
“몸체가 긴 부항을 쓰되 부항구는 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능히 독을 빨아낼 수 있다. 아픈 곳마다 삼릉침으로 4∼5차례 찔러 부항입구 안에 대고 부항구를 7차 하되 아픈 곳 마다 침을 놓고 부항구를 한다. 여러 차례 효과를 보았다.”
특히 요배통을 비롯한 통증치료에 자주 이용하였다.
나쁜 피를 빼는 법
침을 찔러 피를 빼내주는 방법인데, 일명 사혈법(瀉血法) 또는 방혈법(放血法)이라고도 한다. 의학사적으로는 유완소(1110∼1200)나 장종정(1156∼1228) 등이 열성질환에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는 출혈이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침구경험방’에서도 여러 병증에 이 침법을 처방하는데, 허임 역시 주로 열이 있는 병증에 사용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는 출혈을 많이 하면 안되지만, 그래도 출혈해야 할 경우에는 시행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출혈법을 사용한 예들이다.
두면부에 열이 극렬하여 내려가지 않은 사람 ― 명주끈으로 목을 살짝 묶어 태양과 당양의 혈락이 돋아나게 하고 삼릉침으로 그 혈락을 관자하여 피를 빼준다.
머리와 눈이 옹종(頭目癰腫)하고 흉협이 지만(支滿)한데 ― 팔꿈치 안쪽의 혈락 및 함곡혈에 출혈을 많이 시키면 곧 낫는다.
두면부에 풍단(風)이 발작하여 붉게 부어 불이 붙은 듯할 때 ― 삼릉침으로 난자하여 나쁜 피를 많이 빼내주면 얼마 안 가서 좋아진다.
풍목광란(風目爛) ― 태양, 당양, 척택에 모두 침을 놓아 피를 빼내주면 신효가 있다.
갑자기 심흉통이 있으면서 땀이 날 때 ― 간사, 신문, 열결, 대돈을 찔러 출혈시킨다.
풍단(風丹) 및 화단독(火丹毒)에 ― 삼릉침으로 난자하여 나쁜 피를 많이 빼낸다. 다음 날에도 붉은 기운이 있는 곳은 피를 빼내준다.
용창(龍瘡)에 ― 용천, 위중을 찔러 출혈하면 곧 효과가 있다.
열병에 열이 심하며, 두통이 있고 물을 찾는데 ― 척택혈 상하의 푸른 혈관(靑絡血)을 관자하여 출혈시키면 신효가 있다.
하마온(蝦瘟)에 ― 삼릉침으로 당양과 태양의 혈락을 관자하여 나쁜 피를 많이 빼내주고, 척택과 위중의 혈락을 침자하여 피를 조금 빼준다.
침과 뜸은 함께 쓸 수 없는가?
“침은 몇 푼 놓고, 뜸은 몇 장 뜬다고 하였는데, 침을 놓고 이어 뜸을 뜨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 ‘영추’에서는 “침을 놓을 때는 침만 놓고, 뜸을 뜰 때는 뜸만 떠야 한다. 침을 놓고 나서는 뜸을 뜨지 말고, 뜸을 뜬 다음에는 침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대답으로 침과 뜸을 한 혈자리에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신응경’ ‘의학강목’ ‘의학입문’ 등의 책도 이를 지지한다. 다만 ‘신응경’에서는 배에 있는 혈자리의 경우는 침을 놓고 뜸을 떠서 그 침혈을 고정시킨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침과 뜸을 한 혈자리에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두 치료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기력의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다소 이견이 있다. 또한 ‘그러면 다른 혈자리에는 동시 시술이 가능한가?’라는 물음도 가능하다.
허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직접적인 대답은 없다. 그러나 ‘침구경험방’ 음산문(陰疝門)의 예를 보면, “산기(疝氣)가 위로 치밀어 심복에 급통이 있으면서 숨까지 막힐 때, …갑근혈에 침 1푼 놓고 뜸 3장 뜬다”고 하여, 침과 뜸의 동시 시술에 대해 상당히 융통성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절과 날씨와 시간에 따른 침뜸치료
역대 의서에서는 천지 자연의 기운에 합일하는 것을 중시하여, 계절과 날씨 또는 년·월·일·시에 따라 때에 맞게 침을 놓아야 한다는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1.계절에 따른 침 깊이의 차이
‘난경’에서는 봄과 여름에는 침을 얕게 놓고, 가을과 겨울에는 깊이 놓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양기(陽氣)가 봄과 여름에는 겉에 있고, 가을과 겨울에는 깊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날씨와 달 모양의 변화에 따른 침치료
‘내경’에서는 날씨가 차면 침을 놓지 말고, 따뜻하면 의심하지 말고 침을 놓으며, 달이 둥그레지기 시작할 때에는 사(瀉)하지 말고, 달이 다 둥그레졌을 때에는 보(補)하지 말며, 달이 다 줄어들었을 때에는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3.침뜸치료에 좋은 날(吉日)과 하지 말아야 할 날(忌日)
침이나 뜸을 놓을 때 좋은 날을 택해서 하고, 나쁜 날은 피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여러 침구서에는 인신(人神)이 때에 따라 각 부를 순행하는데, 그 인신이 머무는 부위에는 침뜸을 금하여 인신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동의보감’과 ‘침구경험방’에서는 태을신(太乙神)이 8절기를 나도는 날수를 따지는 도표와 구궁도의 그림 및 날과 달에 따른 인신의 소재, 침뜸의 길일과 기일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왕조실록을 보면, “오늘은 천의일(天醫日)로 침가들이 가장 길일로 여기는 날이다” “내일은 상현일(上弦日)이어서 침가에서 꺼리는 날이다” “길일 하루 전날에 혈단자 (穴單子)를 입계하는 것이 예이다”라는 등의 언급을 빈번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왕실에서 침뜸치료를 하는데 이러한 시간적 금기사항을 많이 따졌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급한 병일 때에는 여기에 구애되지 말고 속히 치료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천금방’이래로 ‘자생경’등에서 볼 수 있는데, 허임 역시 사리에 깊이 통달한 사람은 이러한 인신금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본문 해설을 마치며
이상 허임의 ‘침구경험방’과 허준의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17세기 조선의 침뜸의학을 대충 살펴보았다. 이들은 이 땅에 침뜸이라는 치료수단의 맥을 이어준 충실한 주자들이었다.
이들을 통해 조선의 침뜸의학은 의미있게 발전했다. 중국의 침뜸의학 서적을 도입하여 간행하고 교육하던 조선초기의 상황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이를 소화한 바탕 위에 자체적인 경험을 접목하여 조선 고유의 침구의서를 간행하게 됐다.
이 땅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침뜸이라는 치료수단을 가지고 질병에 맞서 왔다. 그러기에 “침을 맞는다, 뜸을 뜬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자연스럽다. 그것은 백성으로부터 군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것이었다. 이렇듯 우리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침뜸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과 신뢰의 이면에는 조선중기 양 허씨의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당대의 의학적 대응은 일정한 한계와 제약을 지닌다. 17세기 조선침뜸의학의 역사도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있지만 지난 시대의 침뜸의학과 그것이 시행되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애정을 가지고 보려고 하였다.
21세기를 맞은 오늘날 침뜸의학은 바야흐로 동양의 치료술을 넘어 세계인의 것이 되어가고 있다. 경락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여러 가지 신침요법의 개발, 해부 및 생리학의 발전에 힘입은 경혈학의 체계화 등 현대의 침뜸의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고, 침뜸진료실 현장 또한 많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전통 침뜸의학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찬동할 수 없지만, 진지한 성찰이 결여된 피상적 이해 또한 경계한다. 전통 침뜸의학의 충실한 계승과 변용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침뜸의학은 민간과 친숙하다. 누구나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보니 올바른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한 ‘술(術)’로 함부로 다루어지는 폐해도 보인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간과 질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숙련된 테크닉이 겸비된 침뜸의학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무극보양뜸 혈자리 >
? 남자 : 백회, 곡지, 족삼리, 폐유, 고황, 중완, 기해, 관원
? 여자 : 백회, 곡지, 족삼리, 폐유, 고황, 중완, 중극, 수도
3. 무극보양뜸 뜸자리 잡기
무극보양뜸의 8개의 뜸자리를 어떻게 잡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반복해서 잡아보면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음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4. 폐유-고황
① 폐유 :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등 뒤 목 밑을 보면 툭 튀어나온 뼈를 잡는다. 이 뼈가 바로 제7번 경추이다.
② 7번 경추 아래로 이어진 뼈가 흉추이므로 순서를 세어가 제 3번 흉추 아래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잡는다. 이 자리가 신주(身株)라는 혈자리이다.
③ 폐유는 이 신주와 견갑골(날개 뼈)모서리 사이의 중간이다.
④ 고황 : 신주에서 한 칸 아래 내려간 제 4번 흉추 극돌기 아래에서 양옆으로 갑골 모서리에서 잡는다.
< 효능 >
① 폐유 : 폐유에 뜸을 하면 잘 낫는 질환들은 감기,기관지염,천식,폐결핵,폐렴,소화불량,해수,피부질환등입니다.
②고황 : 고황에 뜸을 하면 잘 낫는 질환들은 폐질환, 신경쇠약, 몽정, 유정, 도한, 소화불량, 식욕부진, 깊어진 병 등입니다.
-> 그래서 폐유와 함께 고황에 뜸을 뜨게 되면 무병장수 할 수 있습니다.
5. 곡지
① 팔굽 안쪽의 가로무늬줄을 찾는다.
② 손등이 위로 올라오게 한 상태로 팔을 곧게 핀다.
③ 팔의 중간의 가장 솟아 오른 부분에서 가로선을 긋는다. ①의 가로무늬줄의 연장선과 ②의 세로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곡지다.
< 효능 >
성인병예방, 반신불수, 두통, 피부병, 상박신경통, 강장작용에 좋습니다.
6. 백회
① 양쪽 귓구멍에서 머리 위로 가상선을 긋는다.
② 다시 코끝에서 머리 정중앙선을 긋는다.
③ ①의 가상선과 ②의 정중앙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백회이다.
< 효능 >
백회는 백가지 맥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온몸의 양기를 고르게 하는 중요한 혈자리임과 동시에 양기의 최고점입니다.
백회에 뜸을 하면 뇌출혈, 뇌일혈, 뇌빈혈, 어지럼증, 치매예방, 중풍, 두통, 건망증, 코막힘, 탈항, 혈아항진, 귀울림, 신경쇠약, 불면증은 물론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수험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차멀미, 탈모, 비듬, 백발방지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7. 족삼리
① 무릎의 동그란 뼈 밑을 만져 2개의 움푹 들어간 곳을 찾는다. 안쪽의 움푹 들어간 곳이 내슬안이고 바깥쪽 움푹 들어간 곳이 외슬안 혹은 독비라고 한다.
② 다리를 바로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우뚝 솟은 정강이뼈를 따라 무릎을 향해 위로 올라가다보면 중간쯤에서 막히는 부분이 나온다. 여기가 경골조면이라고 한다.
③ ①의 독비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선과 2의 경골조면에서 옆으로 그은 수평선을 연결한 지점이 바로 족삼리이다.
별 > 건강한 어린이에게는 족삼리에 뜸을 하지 않는다.
별 > 통상적으로 족삼리는 독비에서 3촌 내려 온 곳이다.
< 효능 >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리 아래쪽은 점점 약해지고 위는 상대적으로 기(氣)가 남아돌아 열이 나게 됩니다.
족삼리는 최고의 '성인용 무병장수혈'로서 뜸을 하게 되면 상기된 기(氣)가 아래로 끌어내려져 다리 힘은 강해지게 됩니다.
족삼리에 뜸을 하면 신경통, 고혈압, 사지권태, 소화불량, 위경련, 변비, 빈혈, 반신불수 등에 좋습니다.
8. 남자 : 관원, 기해
① 아랫배에 음모가 나 있는 부분의 뼈를 찾는다. 이 뼈가 치골결합 또는 불두덩이뼈라고 한다.
② 치골결합(불두덩뼈)의 중앙과 배꼽의 중앙을 연결해서 5등분 한다
③ 배꼽 아래로 한 칸 반을 내려 간 곳이 기해이다.
④ 배꾭 아래로 3칸 내려간 곳이 관원이다.
< 효능 >
남자는 정력이 좋아야 매사에 의욕이 있고 튼튼하며 여자는 자궁이 튼튼해야 건강합니다.
① 관원 : 관원은 일명 단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곳에 뜸을 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칠팔십 노인도 회춘이 된다고 합니다. 꺼져가는 선천의 기운 즉 생명의 뿌리인 정력을 다시 살려 일으키게 됩니다. 관원에 뜸을 하면 조루, 양기부족, 유정, 발기부전, 탈항, 오줌싸개, 복막염 등에 좋습니다.
② 기해 : 기해는 원기의 바다라고 합니다. 기해에 뜸을 하면 생식기 질환, 장질환, 신장질환, 자양강장 등에 좋습니다.
9. 여자 : 중극, 수도
① 아랫배에 음모가 나 있는 부분의 뼈를 찾는다. 이 뼈가 치골결합 또는 불두덩뼈라고 한다.
② 치골결합(불두덩뼈)의 중앙과 배꼽의 중앙을 연결해서 5등분한다.
③ 치골결합위로 한칸 올라간 곳이 중극이다
④ 젖꼭지에서 내려 그은 선과 관원을 이은 선을 2등분한 점이 수도이다.
< 효능 >
여자는 월경이 좋고 자궁이 튼튼하면 병이 없습니다.
① 중극 : 중극 자리 아래에는 방광과 소장이 있어서 소장과 방광병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월경불순이나 자궁염증, 냉대하와 요실금, 요빈삭에도 효과적이며 여성의 생식기 이상은 중극으로 거의 해결됩니다. 중극에 뜸을 하면 여성의 모든 생식기질환, 방광질환, 자궁질환, 신장질환, 복막염, 자궁물혹 등에 좋습니다.
② 수도 : 수도는 불 수(水),길 도(道)로 월경이나 소변 등의 액체가 흐르는 길을 말합니다. 월경불순, 냉 염증을 없애주는 자리입니다. 수도에 뜸을 하면 월경곤란, 변비, 방광염, 소변불통, 자궁염, 불임증, 신염, 부종, 탈장 등에 좋습니다.
9. 중완
① 양쪽 옆구리에서 만져지는 갈비뼈를 잡고 가슴으로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배의 중간지점에서 만나는 곳에 이른다. 이곳을 기골이라고 부른다.
② 이 기골과 배꼽의 정중앙을 연결한다.
③ ②의 연장선을 2등분한 정중앙이 바로 중완이다
< 효능 >
흔히 말하길 양기가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기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 양기란 기운을 만들어 내는 신진작용입니다. 잘 받아들이고 잘 내보내야 전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중완을 뜸을 하면 고혈압, 위궤양, 소화불량, 복통, 구토, 급성위염, 위출혈, 식욕부진, 변비, 설사 등에 좋습니다.
주요 뜸혈자리 설명
■ 상지의 주요혈자리

△ 합곡혈
엄지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압통이 강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머리와 얼굴쪽의 모든질환, 편두통, 치통, 안면마비, 비염, 안구충혈, 소화불량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각종 폐질환에도 사용됩니다.

△ 양계혈
합곡혈의 약간위에 위치하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눌렀을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며
두통, 치통, 손목관절염에 사용되는 혈입니다.
△ 곡지혈
팔꿈치를 굽힐 때 생기는 주름의 끝에서 안쪽으로 1cm 들어간 곳입니다.
두통, 고혈압, 피부병, 두드러기, 화농성 염증, 반신불구, 심장마비 등에서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수삼리혈
곡지 아래로 2치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고혈압, 반신불구, 중풍, 감기 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주료,천정,곡지
주료는 팔을 굽혔을 때 곡지 밖으로 1치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천정은 팔을 굽혔을 때 맨바깥쪽 부위 눌렀을 때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입니다.
곡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굽혔을 때 안쪽으로 1cm 들어간 곳입니다.
이들 세혈자리는 손가락마디가 붓고 통증이 오는 모든 관절염, 팔의 통증에 사용됩니다.
■ 하지의 주요혈자리

△ 족삼리혈
피로회복, 저항력증진, 무병장수의 필수혈입니다. 그밖에 중풍, 좌골신경통, 신경쇠약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삼음교혈
뼈마디 안쪽으로 압통이 느껴지는 부위입니다.
부인과질환의 특효혈로 월경불순, 냉대하, 불임증, 자궁내막염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또한 발이 찬 사람, 남성생식기 질환 등에도 사용됩니다.
△ 태충혈
엄지와 둘째발가락 사이의 혈로 간질환에 응용되며 두통, 어지럼증, 인후통 등에도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복부의 주요혈자리

△ 중완혈
배꼽 위로 4치상에 위치하며 흉늑각과 배꼽 정중앙을 위치점으로 잡습니다.
중완은 위장병 질환의 주요혈자리이며 식욕부진, 구토, 애역, 복창, 설사, 위궤양, 위하수 등에 사용합니다.
△ 천추혈
배꼽에서 좌/우 양방향으로 약5c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천추혈은 천기(天氣)와 지기(地氣)가 교차하는 중요부위여서 천추라 했으니
특히 대장질환, 변비, 복통, 장염 등에 사용되는 주요 혈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중 변비, 생리불순, 냉대하 등에도 천추혈에 뜸합니다.
△ 중극혈
배꼽과 음모가 있는 치골부 위를 일직선으로 그어 5등분 했을 때 치골에서 1/5되는 부위로 관원혈에서 1치 아래에 위치합니다.
방광 계통의 질환에 사용되는 혈자리로 소변빈삭, 소변불통, 요실금, 요도염, 전립선 비대 등에 사용됩니다.
△ 관원혈
배꼽아래 3치, 곡골위 2치상에 위치하며 관원혈을 자극하게 되면 음경내의 조직을 강화하므로
정력혈자리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신장질환, 설사, 월경부조, 유뇨, 복통, 이질, 폐경 등에도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신궐혈
배꼽 또는 제중이라고도 하며 직접구와 침은 금하며 간접구만 가능한 혈자리입니다.
급성장염, 만성장염, 만성이질, 장결핵, 수종, 허탈, 사지궐냉 등에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무극보양뜸은 인체의 8개 경혈 12자리(여성은 13자리)에 쌀알 반 톨 만한 크기 [반미립대(半米粒大)]로 매일 한 자리에 3~5장씩 뜸을 뜨는 건강법으로 누구나 어떤 질병에라도 쓸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술법으로 병이 있어도 병이 없어도 모두 무극보양뜸을 뜰 수 있습니다.
2. 무극보양뜸의 혈자리
- 백회, 곡지, 족삼리, 중완, 폐유, 고황, 기해, 관원 (단 여성은 기해와 관원 대신에 수도와 중극에 뜸을 뜬다)
3. 뜸이란
- 뜸을 잘 건조시켜 만든 쑥을 살갗 위에 직접 놓고 태워 60~70도의 가벼운 화상을 입혀 우리 몸의 기혈 통로인 경락과 경혈을 자극시키고 '뜸 부위에서 생기는 특수한 물질이 체내로 흡수되면서 작용하여 건강을 회복'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뜸은 살갗 위에 직접 놓고 뜨는 것이 진짜 뜸’ 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뜸은 단지 경혈을 자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뜸이란 피부에 작은 화상을 입혀 그 결과로 생기는 가열단백체 때문에 치료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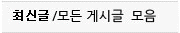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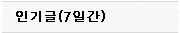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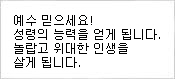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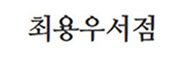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