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꽃씨와 도둑>은 최용우 개인 책방의 이름입니다. 이곳은 최용우가 읽은 책의 기록을 남기는 공간입니다. 최용우 책방 구경하기 클릭! |
|
이 책은 내가 자주 가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 <뉴스엔죠이>와 <오마이뉴스>에 쓴 박철목사님의 산문을 모아엮은 책이다. 이미 인터넷에서 다 읽은 내용이라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깔끔한 편집과 종이가 주는 따스함이 넘치는 좋은 책이다. 모니터상에서 읽는 글과 종이위에 인쇄된 글을 읽는 맛이 다르다. 모니터가 주는 느낌은 가볍고 상쾌한 반면 종이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뭔가 근사해 보인다.^^ |
|
|
|
<서평>박철 산문집 「시골목사의 느릿느릿 이야기」
시인이자 목사인 박철이 산문집을 펴냈다. 바로 「시골목사의 느릿느릿 이야기」이다. 이 책을 펴면 그 속에서 '느린 이야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혹은 도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들의 삶의 바쁜 템포와는 뭔가 맞지가 않는 듯해서 약간은 엇박자가 지는 듯하지만, 차근히 읽어보면 가슴에 결코 가볍지 않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들이 빼곡히 들어있다. 박철의 글은 무엇보다 담백하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글재주를 부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시인이 쓴 글이라기보다는 글재주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쓴 일기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그 담담하고 순박한 문체 속에서 진정한 감동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는 한없이 여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과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준다. 첫 페이지를 펼칠 때는 약간 답답한 느낌들이 들지도 모른다. “바쁜 오늘날 무슨 철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그러나 차차 읽어가다 보면 그의 글들에 담겨있는 진실의 힘이 독자들로 하여금 그의 글의 순박함에 기꺼이 젖어들도록 만든다. 이 책에는 박철 시인의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많은 자전적인 문집들이 있지만 이토록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글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보여주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수많은 상처들로 얼룩져있다. 가난한 시골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삶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동안 그가 입었을 수많은 정신적 외상들이 뚜렷이 드러나 보인다. 그의 마음에는 그런 상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모두 내어보인다. 자신이 그 모든 상처들을 완전히 극복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30년보다도 훨씬 전, 강원도 논미리에서 상고머리를 한 소년은 보리개떡을 하나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설빔으로 차려입고서 세배를 드리러 몰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보리개떡을 들고 서 있는 소년은 누가 자기와 좀 놀아주었으면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그런 정신적인 외상들을 극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과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겨져 있다. 힘들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글들은 대개 아름다움으로 채색하거나, 슬픔으로 윤색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는 시종 그저 담담하게 그의 삶을 적어나간다. 그것은 어린시절의 그 아픔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잘 승화시킨 것이다. 그랬기에 그는 막 가난에 대한 극복담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난에 대한 예찬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아직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가난을 나누고 살면서 느끼는 일들에 대해 담담하게 적고 있을 뿐이다. "나는 아내와 결혼 한 후 서너 벌의 양복을 샀다. 이것저것 얻어온 옷도 있다. 아마 더 이상 돈을 주고 옷을 살 경우는 없을 듯 하다. 이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옷으로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산다. 시인의 섬세한 감성을 지닌 그가 적어내는 삶의 모습은 뜻밖에도 무척 담담하다. 그러나 그 담담한 글을 통해 농촌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한번도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온다. 그의 글에서는 요즘의 도회에서 좀처럼 맛보기 힘든 진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듬뿍 묻어 나온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미련곰퉁이같은 느릿느릿한 삶이 조용하게 웅변하는 주제이다. 그의 글은 단순히 가난에 대한 이색적인 이야기 거리도, 눈물샘을 자극하는 최루성의 감상적인 글도 아니다. 가난 속에서 자라났지만 가난에 매몰되지 않고 가난을 객관화 한 후, 다시 가난 속으로 찾아들어가서 스스로 다시 그 가난한 삶을 실천하는 삶의 솔직한 스케치이고 고백이다. 그는 과장하거나 감동을 유도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글을 적을 뿐이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나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삶이 주는 감동이고, 진솔한 글이 주는 만만치 않은 힘인가 보다. "당황하고 있는 나에게 아이들 차례로 줄을 지어 다가와 예쁘게 리본장식을 한 들꽃을 하나씩 하나씩 내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들에서 볼 수 있는 개망초, 맨드라미, 매밀꽃, 들국화… 등 흔한 들꽃이었다. 그때서야 감이 잡히는데 오늘이 바로 내 생일이 아니었던가. 아내 말고는 아무도 내 생일 기억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아니 생일을 기억한다는 것도 사치다 싶을 정도로 가난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그의 글은 그런 전원적인 삶의 소박함과 아름다움만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애써 삭이고 있는 그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녹아있고, 또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녹아있다. 그의 글을 곱씹어 읽으면서 그가 어떻게 열정과 분노를 삭여서 일상적인 삶에 녹여가고 있는지를 알아 가는 과정은 조용한 감동이다. 또한 그가 말하는 느릿느릿한 삶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천천히 깨달아가는 맛은,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지만 그의 글을 통해서 잘 알 것만 같은 ‘보리개떡’만큼이나 소박하고 고소하다. 사진작가 최광훈은 박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박철의 글과 사진은 따뜻하다. 그의 글은 질그릇처럼 투박하나 깊은 울림을 준다. 사람을 보거나 사물을 대하는 눈이 예사롭지 않다. 그는 자연의 교감을 통해 이미 깊은 영성의 세계에 도달한 듯 하다. 그의 글에서는 연한 들국화 향기가 난다. 또 그의 사진은 한겨울 화롯불에 군밤을 구워먹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푸근하고 인간적이다." 시인 박철과 함께 농민운동을 해온 송병구 목사는 인간 박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보다 그 따듯함과 인간다움을 상찬해 마지않는 눈빛. 호통 치는 인간. 분노가 거세된 그런 세상에서 아직 섬세한 긴장을 놓지 않은 가슴. 세대의식과 시대정신 속에서 역사의 징검다리를 놓으려는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우리 가운데 더불어 살고 있는 박철 목사는 가난하면서 넉넉한 웃음을 잃지 않은 뜨거운 왕소금 같은, 아마 그런 사람이다." 겨울. 바람이 밤을 새워서 우짖는 날. 추위에 몸을 움츠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만나서 대화를 터볼만한 책이다. 친구같이 편안한 어투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고운 글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히 담겨 있다. |
|
김광진 smang@hitel.n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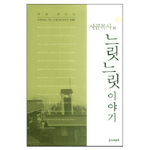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