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두막 일기330-11.26】 별난 음식점
분식점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별난 식당이 우리동네에 하나 있다. 약간 나이 드신 사장님 전형적인 충청도 할머니라 손님이 식당에 들어가도 본체만체. 사장님이 주방에서 몸을 뒤로 젖혀 고개만 돌리고 손님이 왔나 확인하고 “뭐 드실껴?” 한마디 하고는 그냥 음식 만드는 일을 계속하기에 괜히 뻘쭘해서 손님인 내가 다가가 날씨가 어쩌구 저쩌구 말을 걸면서 아양(?)을 떨었었다.
아내와 함께 그 식당에 갔다. 주인 할머니의 보는둥 마는둥을 본 아내는 나와 달리 그런 태도에 단호하게 응징을 한다. 얄짤없다. “흥! 여보, 다른데 갑시다.” 그냥 그 별난 식당에서 나왔다.
건물 벽에 ‘손님을 반겨주는 현수막’을 걸어놓은 식당이 문득 생각나서 찾아갔다. 음식 맛은 평범했지만 여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서 “다음에 또 올께요”라고 인사하고 왔다. ⓒ최용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끝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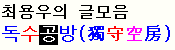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