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릴리의 아침 225】종이욕심
자식들이 공부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버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엿장수) 어디서 헌 종이를 몽땅 구해와 구멍을 뚫어 묶어서 '공책'이라고 써서 주시고 도무지 새 공책 사 주실 생각을 안 하셨다. 국민학교 2학년때 학교 가는 골목길에 '신신문구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까?) 아버지와 우연히 그 문구점에 갈 일이 있었다. 나도 친구들처럼 새 공책을 쓰고 싶었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 공책을 한 줌 움켜잡고 아버지에게 "나도 새 공책에 글씨를 쓰고 싶다"며 사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로 반항을 했다! (어떻게 되긴.. 안주글만치 맞고, 남자는 평생에 세 번 마음으로 운다는데 한번을 그때 울고 말았다)
그 한 때문이었는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노트나 종이를 그득하게 쌓아 놓는 것이 좋다. 쓰고 안 쓰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냥 종이가 가지런히 쌓여있는 모습만 보면 엔돌핀이 막 샘솟는 것 같다. 사무실에도 여기저기 종이가 쌓여있고, 집에도 종이가 높이 쌓여 있다.
그런데 그 아비에 그 딸이라고 좋은이가 언제부터인지 '종이욕심'을 내기 시작한다. 아내는 버리는 것이 더 많다고 투덜거리지만, 나는 어렸을 때 그 가슴에 맺힌 한 때문에 좋은이가 원하는 대로 종이를 사준다. 엄마에게 양면색종이를 사달라고 떼를 쓰다 혼쭐난 좋은이가 아빠에게 살금살금 다가와 귓속말로 말한다.
"아빠, 다음에 문방구에서 양면 색종이 사주세요"
나도 좋은이 귀에 대고 살짝 말한다.
"그으래~ 알았어. 아빠가 사줄게.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아이 좋아~" 2002.12.11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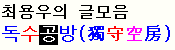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