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흙집일기 65】부지깽이 타령
아무렇게나 생긴 네놈
부엌칼로 잔가지 치고 적당히 잘라
정지 구석에 세워 두었더니
사시절 아궁이 앞에 쪼그릴 적마다
네놈은 엄니 손에 들려 불기둥 속을
겁도 없이 잘도 드나드는구나
햅쌀 앉힌 아궁이 장작 지피는 날엔
신바람 나 이리저리 불가마 뱀혀로 드나들고
퍼어런 햇보리 쌀 앉히는 날은
아궁이에 보리짚 하나 가득 물고
매캐한 연기도 마다하지 않은 채
성한 곳 없이 제 몸 그을리며 울던 네놈
흐트러진 머리칼 쓸어 올리며
징용 간 당신 오시려나
불지피다 허리 펴고 울던 엄니
저문 동구 밖 내다볼 적에도
네놈은 그 손에 들려 있었지
어둡고 차가운 정지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던 엄니 엄니 곁에서
한세월 길다란 몸 다 사르고
당신 곁 떠날 적에 그 뜻 따르려
온몸 던져 불사르던 네놈은 이제
죽은 것이냐 산 것이냐
아파트 창 너머 먼 하늘보고 선 엄니
그 뒷짐에 네놈은 간 곳 없고
허연 가을 머리칼만 억새바람에 지는구나. (송문헌 詩)
아궁이에 불을 때면서 아무 막대기나 손에 잡히는 대로 부지깽이로 사용했더니 금새 짧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찾아보니 전에 선반으로 사용했던 쇠막대기가 있어 쇠부지깽이를 만들었습니다.
타지 않아서 짧아지지는 않는데 금새 쇠에 열이 올라 뜨거워서 이 또한 사용하기에 옹삭하네요. 머, 나무 부지깽이와 쇠 부지깽이를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서로 달라도 많이 다른 두 부지깽이가 그런대로 잘 어울리네요. 2006.3.1 ⓒ최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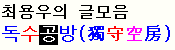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