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각종 매체에 실린 최용우의 글을 한 곳에 모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글이 실린 매체를 찾을 수 없어서 올리지 못한 글도 많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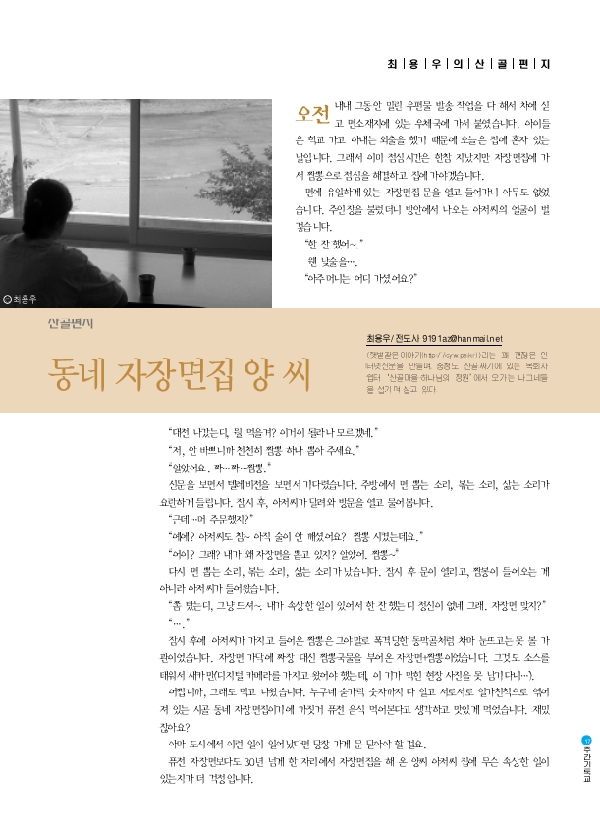

주간 기독교 2006.1.15일자
동네 자장면집 양 씨
오전 내내 그동안 밀린 우편물 발송 작업을 다 해서 차에 싣고 면소재지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고 아내는 외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 혼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미 점심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자장면집에 가서 짬뽕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면에 유일하게 있는 자장면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장을 불렀더니 방안에서 나오는 아저씨의 얼굴이 벌겋습니다.
“한 잔 했어~.”
웬 낮술을….
“아주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대전 나갔는디, 뭘 먹을겨? 이거이 될라나 모르겠네.”
“저, 안 바쁘니까 천천히 짬뽕 하나 뽑아 주세요.”
“알았어요. 짜…짜…짬뽕.”
신문을 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주방에서 면 뽑는 소리, 볶는 소리, 삶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잠시 후, 아저씨가 달려와 방문을 열고 물어봅니다.
“근데…머 주문했지?”
“예에? 아저씨도 참~ 아직 술이 안 깨셨어요? 짬뽕 시켰는데요.”
“어이? 그래? 내가 왜 자장면을 뽑고 있지? 알았어. 짬뽕~”
다시 면 뽑는 소리, 볶는 소리, 삶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짬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쫌 탔는디, 그냥 드셔~.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한 잔 했는디 정신이 없네 그래. 자장면 맞지?”
“….”
잠시 후에 아저씨가 가지고 들어온 짬뽕은 그야말로 폭격당한 동막골처럼 차마 눈뜨고는 못 볼 가관이었습니다. 자장면 가닥에 짜장 대신 짬뽕국물을 부어온 자장면+짬뽕이었습니다. 그것도 소스를 태워서 새카만(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이 기가 막힌 현장 사진을 못 남기다니…).
어쩝니까, 그래도 먹고 나왔습니다. 누구네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서로서로 일가친척으로 엮어져 있는 시골 동네 자장면집이기에 까짓거 퓨전 음식 먹어본다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밌잖아요?
아마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장 가게 문 닫아야 할 걸요.
퓨전 자장면보다도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자장면집을 해 온 양씨 아저씨 집에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가 더 걱정입니다.
최용우/전도사
<햇볕같은이야기(http://cyw.pe.kr)>라는 꽤 괜찮은 인터넷신문을 만들며, 충청도 산골짜기에 있는 목회자 쉼터 ‘산골마을-하나님의 정원’에서 오가는 나그네들을 섬기며 살고 있다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