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
최근 10~20년 사이에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치품’보다 더 빠르게 자취를 감춘 단어도 달리 찾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국어사전이 “분수에 지나치거나 생활의 필요 정도에 넘치는 물품”으로 정의한 이 물건들의 종류나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물건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뛰어나거나 이름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이라는 뜻의 ‘명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10여년 전 ‘신귀족주의’를 표방하고 발행된 잡지를 처음 보았을 때, 상당한 위화감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이 잡지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강남의 부유층만을 독자로 한정한다는 취지를 공공연히 밝혔는데, 발행사가 공언한 대로 이 잡지의 광고면을 장식한 상품들은 싸도 수백만원, 비싸면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물건들이었다. 평범한 서민이라면 꿈에서도 가져 볼 엄두를 내지 못할 상품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가져 줄 ‘귀족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어쩔 수 없는 일말의 분노와 일말의 자괴감이 일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잡지와 이런 광고에서 이런 감정을 표출하면 촌스럽다는 조롱을 받는다. 은행이든 카페든 시간을 때워야 하는 장소들에는 어김없이 이런 잡지들이 비치되어 잠시의 ‘무료한 시간’을 파고든다. 광고면 속의 화려하고 정교하며 값비싼 상품들은 그저 심심해서 잡지를 집어 들었을 뿐인 우연한 독자들에게 속삭인다. 나를 가지라고. 이런 것 하나쯤 가져도 괜찮다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하나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굳이 유교의 ‘청빈주의’나 프로테스탄트의 ‘절검주의’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이제껏 사치를 죄의 일종으로 분류해 왔다.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 무리들 속에서 자신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욕망이 공동체의 통일성과 유대감을 해치는 정도로까지 표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개체의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고 유지해 온 인간적 가치관이었다. 사치품이 명품으로 이름을 바꾼 최근의 현상은, 이 오래된 가치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의 표현일 뿐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활 물자의 절대적 결핍 상태에서 해방된 국가들에서, 자본은 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 핵심은 개인적 욕망의 실현에 드리워진 죄의 그늘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미덕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기울였고, 결국 성공했다. 지금은 능력껏 벌어 마음껏 소비하는 데에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시대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개인적 욕망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달려옴에 따라 공동체를 지탱해 왔던 배려, 공감, 절제 등의 감성, 즉 ‘양심’이 사라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우리 사회가 기실은 인간과 짐승으로 나뉘어 있더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 참사로 인해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두려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미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 그들의 말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티끌만한 동정심이나 연대감도 찾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대형 교회 목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등 ‘성공한’ 사람이자 이 사회의 ‘지도층’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시대이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동안 무한정 풀어왔던 ‘욕망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그저 명품으로 제 몸을 감싸고 명품 스펙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는 문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미래의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치스러운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전우용 | 역사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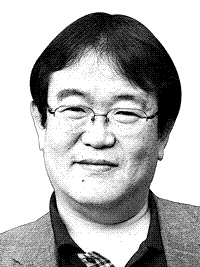 |
하지만 이제 이런 잡지와 이런 광고에서 이런 감정을 표출하면 촌스럽다는 조롱을 받는다. 은행이든 카페든 시간을 때워야 하는 장소들에는 어김없이 이런 잡지들이 비치되어 잠시의 ‘무료한 시간’을 파고든다. 광고면 속의 화려하고 정교하며 값비싼 상품들은 그저 심심해서 잡지를 집어 들었을 뿐인 우연한 독자들에게 속삭인다. 나를 가지라고. 이런 것 하나쯤 가져도 괜찮다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 하나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굳이 유교의 ‘청빈주의’나 프로테스탄트의 ‘절검주의’가 아니더라도, 인류는 이제껏 사치를 죄의 일종으로 분류해 왔다.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망, 무리들 속에서 자신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욕망이 공동체의 통일성과 유대감을 해치는 정도로까지 표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개체의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인류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고 유지해 온 인간적 가치관이었다. 사치품이 명품으로 이름을 바꾼 최근의 현상은, 이 오래된 가치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의 표현일 뿐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생활 물자의 절대적 결핍 상태에서 해방된 국가들에서, 자본은 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의 소비 욕망을 자극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 핵심은 개인적 욕망의 실현에 드리워진 죄의 그늘을 걷어내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미덕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힘을 기울였고, 결국 성공했다. 지금은 능력껏 벌어 마음껏 소비하는 데에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시대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개인적 욕망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달려옴에 따라 공동체를 지탱해 왔던 배려, 공감, 절제 등의 감성, 즉 ‘양심’이 사라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우리 사회가 기실은 인간과 짐승으로 나뉘어 있더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 참사로 인해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 두려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이미 인간의 말이 아니었다. 그들의 말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티끌만한 동정심이나 연대감도 찾을 수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대형 교회 목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등 ‘성공한’ 사람이자 이 사회의 ‘지도층’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다른 시대이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동안 무한정 풀어왔던 ‘욕망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이, 그저 명품으로 제 몸을 감싸고 명품 스펙을 쌓는 데에만 몰두하는 문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미래의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치스러운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전우용 | 역사학자>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