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네 사람들의 정담이 오고가는 대청마루입니다. 무슨 글이든 좋아요. |
.........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자 한 분과 저녁을 같이했습니다. 그는 월급도 반 토막 났고 많은 사원들이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는 저의 푸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듣기에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마치 지은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뜨악해 하는 필자에게 그는 이런 사족을 붙였습니다.
“외환위기는 경제관료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지만 학자와 언론인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존경과 상대적 대우를 받은 집단입니다. 국민들은 이들이 국가라는 ‘범선’의 망루지기라고 여겼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폭풍우를 감지하고 경계령을 내려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국가파산이 가까운데도 종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우받은 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설사 직장을 잃고, 자리에서 쫓겨난다 해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라고 말입니다. 대접 받을 줄 알았지 그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저에게도 아픈 일침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가장은 실직 당하고 가정과 기업,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는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반성과 회한, 자책이 잇따랐고 ‘삶의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외침들이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때의 그 장면들이 오늘 되풀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파고는 조금씩 천천히 우리를 덮쳤지만 지금은 불과 2~3시간 만에 우리를 침몰시켰습니다. 또 주로 가장을 비롯한 어른들에게 닥친 비극이 외환위기라면, 이번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몰살당했습니다. 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접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극을 불러온 주역들입니다. 정치인, 학자, 언론인. 이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리더로서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이들 중 한 집단이라도 세월호 참사의 발발과 구조, 수습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곳이 있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가라는 게 정말 필요하기나 한 것인지 회의하게 합니다. 거기에 특별법 제정은 언제 이뤄질지 하 세월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유족들은 뙤약볕 내리쬐는 거리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명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의 총책으로 내세운 문창극이라는 언론인 겸 교수는 어떤 말로, 어떤 망발로 우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보수언론들이 써내려간 기사와 칼럼, 그리고 사설들이라니….
여기에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박 대통령의 지명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든 김명수 후보자의 수십년 교수인생 앞에서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입니까.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의 인생살이 역시 오십보 백보 아닌가요. 이들은 모두 학자, 언론인 출신입니다. 새삼, 지난 17년간 우리 사회가 어떤 길을 걷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의 발가벗은 맨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들이 들립니다. 꼭 17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제2의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겪지 않는다는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료들과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 국가의 리더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망루지기가 되지 못한다는 절망을 확인한 지금, 희망은 결국 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 그중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합니다. 그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와 혁명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TV에서 눈을 떼고, 스틱을 콕콕 찍고 올라가는 산행을 잠시 멈춥시다. 그리고 조용히 조용히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렇다고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배병문 대중문화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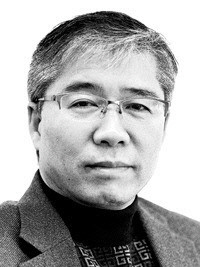 |
잘 아시다시피 외환위기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가장은 실직 당하고 가정과 기업,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는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반성과 회한, 자책이 잇따랐고 ‘삶의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외침들이 사회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때의 그 장면들이 오늘 되풀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파고는 조금씩 천천히 우리를 덮쳤지만 지금은 불과 2~3시간 만에 우리를 침몰시켰습니다. 또 주로 가장을 비롯한 어른들에게 닥친 비극이 외환위기라면, 이번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몰살당했습니다. 게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접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극을 불러온 주역들입니다. 정치인, 학자, 언론인. 이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의 리더로서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이들 중 한 집단이라도 세월호 참사의 발발과 구조, 수습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곳이 있는지를.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행태는 국가라는 게 정말 필요하기나 한 것인지 회의하게 합니다. 거기에 특별법 제정은 언제 이뤄질지 하 세월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유족들은 뙤약볕 내리쬐는 거리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명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의 총책으로 내세운 문창극이라는 언론인 겸 교수는 어떤 말로, 어떤 망발로 우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보수언론들이 써내려간 기사와 칼럼, 그리고 사설들이라니….
여기에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박 대통령의 지명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든 김명수 후보자의 수십년 교수인생 앞에서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입니까.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의 인생살이 역시 오십보 백보 아닌가요. 이들은 모두 학자, 언론인 출신입니다. 새삼, 지난 17년간 우리 사회가 어떤 길을 걷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의 발가벗은 맨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들이 들립니다. 꼭 17년 전 그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제2의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겪지 않는다는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관료들과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 국가의 리더들이 더 이상 우리의 망루지기가 되지 못한다는 절망을 확인한 지금, 희망은 결국 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 그중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합니다. 그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화와 혁명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손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TV에서 눈을 떼고, 스틱을 콕콕 찍고 올라가는 산행을 잠시 멈춥시다. 그리고 조용히 조용히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렇다고 그냥 바라만 봐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배병문 대중문화부장>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