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을 항해하면서 발견한 다시 읽고 싶은 글을 스크랩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 전에 봐 두었던 글을 다시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랩할만한 글을 갈무리합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글이 게시가 안됩니다.) |
| 출처 : | http://bbs.catholic.or.kr/peter/bbs/anonymous/read.asp?maingroup=1&gubun=300&seq=89&table=gnanonymous&id=1318&menunum=-100 |
|---|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 재 룡
가톨릭대
2-528-9701-13pp. 231-288
머리말
중세 최대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불후의 걸작《신학대전》은 그 이 름이 암시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세속 학문들의 기초 위에서 체제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신학의 웅장한(architectonic) 집대성이다. 이 대작에서는 자칫 대립적인 충돌로 이끌릴 수도 있는 이성과 신앙이 어느 하나도 희생됨이 없이 조화롭게 하나로 어울리고 있 다.
성 토마스는 자신의 필생의 역작《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하여 고대와 중세로 이어진 서구 사상계의 플라톤적-그리스도교적 전통과 당시 비로소 접근 가능하게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그리고 동시에 도전적으로 다가온 아랍 사상을 놀랄만한 방식으로 섭렵하여 종합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신학대전》은 일찍이 역사 속에서 씌어졌던 가장 야심만만하고,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위대한 신학 서적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죽던 기원전 384년부 터 데카르트의《방법서설》이 출판되는 기원 1637년 사이에 씌어진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지성적 금자탑”이다. 그리고 성 토마스는“일찍이 역사 속에 생존했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이다(Kreeft.13).
그러기에 가톨릭 교회는 이 대작을 교회의 공식 가르침의 튼튼한 토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철학 및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젊은 학생들에게 이 책을 깊이 탐구하여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을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서 추천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엄청난 분량 때문에(보통의 책 크기로 출판한다면 어림잡아 10,000 페이지쯤 될 것이다!), 그리고 중세 라틴어로 씌어진 까다롭고 딱딱한 철학 및 신학 용어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당대에 유행하던 스콜라 학적 서술 방식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톨릭 중세에 대한 일반적인 경멸과 무시의 경향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토마스의 사상과 그의《신학대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황무지 상태와 흡사한 지경이다.
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껏 토마스의 인물됨과, 성장 배경, 당시의 사상적 분위기,《신학대전》의 기본 구조와 동기,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나는 몇몇 주재를 살펴보는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우리는 큰 욕심을 버리고, 먼저 간단히 성 토마스의 생애와 학문적 활동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다음으로《신학대전》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논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기본 구조와 골자를 간추려 보고자 한다.
1. 토마스의 생애/시대적 배경/활동
1.1.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장 과정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 1224/5-1274)는 나폴리 지역의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5세) 부모의 뜻에 따라 몬테카시노의 분도수도원에‘봉헌’되어 교육을 받았 다. 가족들은 그가 품위있는 분도회 수도원장이 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가족의 지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거기서는 문법, 읽기, 쓰기, 산수, 음악 등의 기본 교육 외에도 수도원의 전례와 기도들을 몸에 익혔다. 15세 경 토마스는 나폴리 대학(1224년 프리드리히 2세 황제 설립)에 보내져 인문학을 공부하게 된다. 당시 인문학은 7개 교양 과목과 철학을 의미했는데, 이곳 나폴리 대학에서는 특이하게(저 교양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유럽의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일찍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었다. 나폴리 대학 과정을 다 마쳤으나, 그는 그곳의 교수로 남지 않았다.
1244년(19/20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고, 가족들이 그의 도미니코회(탁발수도회) 입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총장은 그를 파리로 보내 공부를 계속시키려 하였으나, 가족들이 그를 납치해서 1년 가까이 감금해 두었다 그러나 결국은 어머니 테오도라의 승락으로 풀려나 파리로 보내지게 된다. 그리고 파리에서 1년간의 법정 수련 기간을 포함해서 3년간 도미니코회 수도원 일반 강사의 지도 아래 기도와 연구에 몰두하다가, 1248년 독일 최초의 쾰른 대학이 알베르투스 막뉴스에 의해 창설되는 것과 동시에 쾰른으로 옮겨가 스승 알베르투스의 지도를 받으며 지냈다. 이 시기에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연구와 기도에 전념했다. 그래서 동료들은 그를“벙어리 황소”(bovem mutum)라고 불렀고, 어느날 스승 알베르투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를‘벙어리 황소’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는 학문에서 커다란 황소 울음소리를 낼 것이고 전 세계가 그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그에 게 ‘빠른 강독자’(cursor biblicus=오늘날의 조교) 역할을 맡겼다. 그것은 교수의 강의에 앞서 공식 교재인 성서의 기본 주제들을 학생들에게 미리 준비시켜 주는 역할이었다.
1252년 아직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투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파리 대학 신학부 박사 과정에 등록하여, 4년 동안 당시 관행으로 되어 있던 롬바르두스(P. Lombardus, 1095-1160)가 1142-1158년 사이에 편찬한)《명제집》을 강독하게 된다. 그리고 거의《신학 대전》분량에 맞먹는 그 최종 결실인《명제집 주해》는 후대에 체계적으로 풍부하게 펼쳐질 성 토마스의 깊은 통찰들을 가득 담고 있는 귀중한 문헌이다.《명제집》이란 삼위일체, 천지창조와 피조물, 그리스도와 덕행, 성사와 종말 등을 골자로 삼고 있는 사도신경(Credo) 에 대한 교부들의 풍부한 해설들을 논리적 순서로 재구성한 작품으로서 당시 신학 교육의 필수 교과서였다. 토마스의 강의는 후대의 저술들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간결하고 명료하며 정확했다.”
롬바르두스는 자신의 4권으로 구성된《명제집》을 ‘모든 가름침은 사물(res)에 관한 것이거나 표징(signum)에 관한 것’ 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 따라 삼위일체(1권), 창조(2 권), 그리스도와 덕행(3권)을 거의 단일 논술로 취급하고, 마지막으로 표징들인 7성사(4권)을 취급한다. 그러나 토마스는《명제집 주해서》를 각각 두 권씩 두 부분으로 나눈다. 즉 첫 두 권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신으로부터의 발원(發源, exitus)이 취급되고, 나머지 두 권에서는 모든 것의 신께로의 귀환(歸還, reditus)이 취급된다. 신플라톤주의의 기본 사상인 이 발원-귀환의 구도는 이후의 성 토마스의 사상 전체를 일관하는 기본 도식이 된다.
이 시기에 또한 순수 철학적 논술이라고 할 만한 두 작품 즉《존재자와 본질》(De ente et essentia)과《자연의 원리들》(De principiis naturae)이 집필되었다. 유명한 이 소책자들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집필된 독창적인 작품들이다. 이 기간은 재속 교수들이 탁발수도회를 거슬러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어쨌든 토마스는 4년만에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신학 박사로 임명되었 다(1256년).
이후 3년간 파리에서 보낸 교수 생활은, 당시의 관행에 따라 성서 강독(legere), 토론 (disputare), 설교(praedicare)를 중심으로 전개되게 된다. 스콜라학 방법 전체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성서이다. 강독은 나머지 활동 전체의 토대요, 지주이다. 토론은 한 건물의 벽에 비유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진리도 먼저 토론이라는 이빨에 의하여 분쇄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포착되거나 열정적으로 설교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기능을 수단으로 삼는 설교는 말하자면 지붕이요, 신앙인들을 악습의 엄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피신처이다(피에트로 칸토레:+1197).
이 시기에 수행된 토론집 《진리론》(quaestiones disputatae de veritate)은 총 253개의 항목들로 세분되는 29개의 문제들을 담고 있다. 그 밖에 《자유 토론집》이라는 것이 있는 데, 이것은 대림절과 사순절을 기해 자유로운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가진 결과를 모은 것이다.
그리고 1258년 파리에서 《이교도대전》(=철학대전)(Summa contra Gentiles)을 시작해서 1264년 오르비에토에서 완성했다. 이 작품은 이성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는 신에 관한 진리를 제1권에서부터 제3권까지 다루고, 제4권에서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신에 관한 진리를 다루고 있다. 첫 세 권에서는 이성을 통한 신 인식(1권), 신으로부터의 만물의 발원(2권), 만물의 신을 향한 귀환(3권)이라는 고전적인 신플라톤주의의 주제가 전개된다.
선교사들이 마주쳐야 하는 이방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아랍 철학자 아비첸나의 저작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세 권에서는 이 두 저자들에 대한 인용이 빈번하다. 특히 신으로부터의 만물의 유출을 다루고 있는 제2권에서는 회교도와 직접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교와 회교 사이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의 권능(6-14장), 무로부터의 창조(15-38장), 피조물들 사이의 구분(39-45장), 영적실체들(46-55장), 영-육 결합체 인간 (56-72장), 수동 지성과 능동 지성(73-78장), 인간 영혼(79-90장), 분리된 실체 분석(91-101 장). 제3권에서는 만물의 신으로의 귀환이 검토된다. 신이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돌보시는지에 대한 긴 논술에서 토마스는 신이 가장 비천한 것에서부터 가장 고상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기 때문에, 만물 그리고 각 개체들이 그들의 최종 목표에로 귀환함을 세부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4권에서는 인간 이성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으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구원에 필수적인 삼위일체(1-26장), 육화(27-55장), 성사들(56-78장), 육신 부활과 최후 심판(79-97장)이 탐구되고 있다.
토마스는 이 주제들 가운데 상당수를 《신학대전》에서 휠씬 더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신학대전》에서는 초심자들을 위한 신학의 전반적인 소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교도대전》에서 토마스는 그리스도인이 회교도나 유대인 또는 이단자들과 대립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취급하는 호교론적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초심자들에게는 그 자체로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엄선된 한두 개의 논거로 넉넉할 수 있었지만, 스페인과 북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에게는 이교도 철학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오류들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그리스도교가 참되다는 것을 비신앙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기 위해서 상당량의 논거가 필요했고, 가끔은 변증법적 유형의 논거도 필요했다.
1.2. 시대적 배경
13세기는, 고대철학의 기원전 4-5세기와 견줄 수 있을 만한 중세철학의 황금기이다. 그러나 이 황금기는 저절로 또는 갑자기 찾아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12세기 서구 세계가 맞닥뜨리게 된 사상적-사회적 중대 위기와 대결하여 극복하는 가운데 성취된 인간 지성의 승리였다. 13세기에 중세 스콜라 철학이 황금기를 맞을 수 있게 해준 요인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학문 연구의 장으로서의 ‘대학’(universitas)의 형성과 발전이었다. 대학은 오랜 중세 암흑기(5-9세기)를 청산하고 ‘칼로링거 르네상스’ 를 이룩한 샤를르 대제(768-814) 시절부터 운영되어 오던 수도원 학교(studium)에서부터 발전된 것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온전한 사상(Corpus Aristotelicum)의 서구 유입이었다. 노울즈는 그것을 ‘철학적 혁명’ 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파리 대학 철학부의 자율성 주장으로 이끌었고, 당시 주도적인 신학자들과의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세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라는 두 탁발수도회의 파리 진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서구 유입은 사실 아랍철학자들 덕분이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더불어 아랍 철학자들의 사상도 함께 번역되면서 서구에 소개되게 되었는데, 특히 파리 대학 철학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연구의 중심이었다. 파리 대학 철학부는 1255년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들을 대학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랍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특히 아베로에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대한 이들의 과장되고 그릇된 주장들은 교회의 정통 가르침과 대립되어 교회 지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파리 대학의 철학부와 신학부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켰다.
당시 아랍 철학자들의 영향하에 위력을 떨치기 시작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새로운 철학을 그리스도교 사상과 양립할 수 없는 위험한 이교도의 이론으로 적대시하던 대다수의 스콜라 학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알베르투스, 막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어도 ‘이세상’ 을 해명하는데 대단히 훌륭한 방법론과 뛰어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인정했다.
이제 성 토마스의 과제는 세가지다. 1) 그는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자연주의적 측면을 과장하여 그릇되게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설하고 있던 소위 ‘라틴 아베로이즘’ 을 거슬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통 가르침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자체를 통해 입증하여야 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파리에서 교육과《신학대전》제Ⅱ부 집필이라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작품들 주해 작업에 착수한다. 이 주해서들은 그랍만의 표현을 빌리면《신학대전》을 위한 “철학적 작업실”(laboratorium philosophicum)인 셈이었다.《신학대전》이 젊은 신학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작품들에 대한 주해서들은 파리 대학 철학부의 젊은 철학 교수들을 위한 것이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위험한 이교도의 자연주의로 매도하고 있던 당시의 전통주의자들(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과 프란치스코 회원들)을 거슬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인간의 자연적인 순수 이성만을 사용하여 경험 세계를 훌륭하게 설명해 낸 학문임을 입증하여야 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탁발수도회를 거슬러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던 ‘재속 사제들’(secular priests)을 거슬러 자기 수도회의 정당성을 옹호해야만 했다.
1.3. 성 토마스의 교수 활동
성 토마스는 파리 대학 신학교 교수였다. 신학부에는 6년간 철학학사(baccalaureus) 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등록할 수 있었다. 이 신학부의 교과 과정은 8년으로 되어 있었고, 마지막 학년에도 성서와 교부들의 핵심적 가르침을 모아 놓은 롬바르두스의《명제집》을 강독해야만 했다. 이 강독을 훌륭히 수행하게 되면 신학의 ‘스승’(magister) 자격을 얻게된다. 오늘날로 하자면 박사 학위에 해당된다. 성 토마스는 1252년부터 1256년까지 파리에서《명제집》을 강독한다.
신학부 교수 활동은 무엇보다도 ‘강독’(lectio)이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중 세 대학 교육의 기초였다. 다만 오늘날과 다른 것은, 교재를 교수가 재량껏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학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권위있는 교재’를 따라야 했다. 규정된 교재란 바로 성서였다. 일반적으로 이 성서 강독은 ‘주해’(commentarium) 형식을 취했다.
교수의 두 번째 주요 활동은 년 중 여러 차례 ‘토론회’(disputatio)를 여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게 된 학문 방법이었다. 교수에 의해 설정된 문제에 관한 ‘토론’은 대학 정규 훈련의 일부로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째 날에는, 우선 문제(quaestio)가 ‘예/아니오’(sic et non)/ (Abaelardus)로 대답될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 했다. 학사 가운데 한 명이 찬반 양측의 논거들에 대답하도록 되어 있었다. 둘째 날에는, 교수 자신이 학생들에게 토론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펼치며 체계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했다. 이런 문제들과 그 답변들을 연결시켜 기록한 것이 바로《토론 문제집》 (Quaestiones disputatae)이었다. 이런 교육 방식은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 정교한 논변 기술의 체계를 진작시킬 수 밖에 없었다. 성 토마스는 ‘진리에 대해서’(de veritate), ‘창조에 있어서의 신의 권능에 대해서’(de potentia), ‘영적 피조물에 대해서’(de spiritualibus creaturis), ‘영혼에 대해서’(de anima) 정규 토론회를 열었다. 그 밖에도 부정 기적으로 여러 가지 절박한 쟁점들에 대해서 토론했다.
성 토마스의 주저인《신학대전》은 스콜라 학자들의 ‘토론 방식을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 토마스가 기회있는 대로 파리에서 벌였던《토론 문제집》들은 바로《신학대전》의 ‘주해서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중세 대학의 두 개의 기본적 교육 방법인 ‘강독’과 ‘토론’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논리적이고-어의학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바로 13세기의 철학적이고 신학저인 논술들 전반을 특징짓게 된다. 가끔 중세철학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는 ‘스콜라 학’(Scholasticism)은 바로 이런 학교(schola)에서 사용되던 탐구 방법론 및 사고 방식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드러내주는 단적인 표현이다.
성 토마스의 학문적 태도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특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 그는 필생에 걸쳐서 무엇보다도 ‘진리’(veritas)만을 사랑하고 추적했다. “철학 탐구의 목표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알자는 것이 아니라, 실재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자는 것이다” (《원인론 주해》). 2) 그리고 그는 결코 상식과 일상 경험을 무시하지 않았다. 3) 그 의 문체와 진술은 한결같이 명료성과 간결함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작품들 속에서 철학 저술의 이상인 명료성(claritas)과 깊이(profunditas)를 조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4) 그는 교회의 스승(Doctor Ecclesiae)이다. 트렌토 공의회(Concilium tridentinum, 1545-1563)는 회기중 제단 위에 성서와 나란히《신학대전》을 놓아 존경을 표시하며 가르 침과 영감을 청했고, 현대의 레오 13세는 모든 가톨릭 신학자와 철학자들에게 ‘모든 가르침 가운데 가장 건전하고 탁월한 성 토마스의 주옥같은 가르침을 복원하라’(《영원한 아버 지》, 1879)고 호소했다.
성 토마스는 중세의 최고 정점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공하는 철학적 원리들을 도구로 삼아, 신앙과 이성, 자연과 초자연, 계시와 철학을 뚜렷이 구분하면서도 훌륭하게 조화 (harmonia)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이 커다란 약점으로 결(缺)하고 있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조류들의 대립과 충돌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종합(synthesis)을 이루어냈다.
성 토마스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철학의 분과들 즉 연역 학문들의 ‘형식 논리학’,‘일반 형이상학’과 주요 존재론적 개념들, 이원론이나 일원론에 떨어지지 않는 건전한 ‘인간학’, 신의 실존과 속성들을 다루는 ‘자연 신학’, 의지와 도덕 법칙을 정초하는 ‘윤리학’ 등이 결정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되었다.
2. 신학대전의 집필 동기와 구조
2.1. 집필동기
성 토마스는《신학대전》집필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다.《신학대전》의 저술 연대에 관해, 대다수의 학자들은, 제Ⅰ부는 로마와 비테르보(?)에서 1266년부터 1268년 11월 사이에 씌어졌다는 데 동의한다. 또다시Ⅱ부 1편(prima secundae)과 Ⅱ부 2편(secunda secundae)으로 나뉘는 제Ⅱ부는 (비록Ⅱ부 1편의 첫 몇몇 문제들은 아마도 아직 이탈리아 시절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토마스의 두 번째 파리 체류(1269-72) 전 기간 동안에 작성된 것이다. 제Ⅲ부의 거의 전부는 토마스가 거의 모든 저술 작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1273년 12월 6일 이전에 나폴리에서 씌어졌다. 그때까지 토마스는‘고해성사’ 논술의 중반 부분인 제Ⅲ부 90문 4항까지 이르렀었다. 현재의 판본에 함께 수록되고 있는 ‘보충무’총 99문은 그의 충실한 조수 레지날도(Reginaldo Piperno)가 성 토마스의《명제집 주해》(특히 Ⅳ권)로 부터 해당 부분들을 옮겨다 편집해 놓은 것이다.
성 토마스는 초창기 파리 대학 젊은 교수 시절부터, 젊은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과서 또는 안내서를 절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일반적으로 교재로 사용되고 있던 롬바르두스의 《명제집》(Libri sententiarum)은 교육의 성공 여부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올바른 질서’ (ordo disciplinae)를 결(결)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2세기까지는 기껏해야 ‘발췌록’(Florilegia) 형식이거나 또는 12세기에 유행하게 되는 ‘명제집’(Libri sententiarum) 형식이 주도적인 저술 형식이었으나, 이제 13세기에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체계적 학문’이라는 이상을 신학에 도입하여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개진하려는 ‘대전’(Summa) 형식이 지배하게 된다.
‘대전’(Summa) 또는‘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은 13세기 스콜라 학자들의 일반 적인 저술 형식이었다. 즉 당대의 내노라 하는 학자라면 대부분 ‘대전’ 또는‘신학대전’이라는 형식의 저술을 집필했다.
성 토마스의 눈에는 당시 통용되던 교재들이 부적절했고, 널리 활용되고 있던 롬바르두스의 《명제집》만 하더라도 삼
위일체(Ⅰ권)을 유일신의 속성들 탐구(Ⅳ권)보다 먼저 탐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Ⅲ권에서 덕행들을 다루고 Ⅳ권에서 일부 악습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로마의 산타 사비나 학원에서 벎은 도미니코 회원들 교육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 (1265-1269), 아마 처음에는《명제
집》을 새롭게 주해하려는 시도를 벌였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곧 불만을 느끼고, 1266년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에 착수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신학대전》(Summa Theololgiae)이다, 성 토마스는 동시대의 문학 형식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분석론 후편》(Analytica posteriora) 의 순서 즉 ‘논리적-학문적 순서’를 따랐다.
성 토마스는 필생의 역작인《신학대전》을 통해 자신이 맡고 있던 젊은 학생들 즉 ‘신학 입문자들’(sacri doctrinae novitii)을 위해 선배와 동료 신학자들의 관행을 거슬러 과감히 지엽적이고 번잡한 세부 문제들을 생략하고 하느님과 세계와 인간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그 본질적인 요체로 환원시켜 제시하고자 하였다.
성 토마스의 기본 구상은《신학대전》의 짧은 “머리말”(Prooemium)에 잘 나타나 있다. “가톨릭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이미 신앙을 방아들인 기성 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앙 입문자들을 사도 바오로의 다음과 같은 권고에 따라 가르쳐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이와 같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1고린 3,1-2).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의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에 관한 모든 것을 신앙 입문자 교육에 가장 알맞도록 진술하자’는 것이다” (《신학대전》,“머리말”).
그러므로 그의 의도는 “그리스도교의 주요 가르침을 초심자 교육에 알맞도록 제시”하는 것 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초심자 교육의 장애 요소들을 지적하면서, 그것들은 이 새로운 구상 속에서 극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상 신학 초심자들은 여러 교수들이 저술한 작품들 속에서 방향을 상실하고 쩔절매게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문제들, 항(項)들, 논거들을 쓸데없이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배워야할 내용들이 ‘적절한 교육 순서’(ordo disciplinae)에 따라 제시되지 않고, 책 저술에 요구되는 순서나 ‘토론’의 기회에 제시되게 되는 순서에 따라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됨으로 해서 학생들의 정신 속에 지겨움과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하느님의 도움에 의지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비슷한 부적절함들로부터 벗어나 신학이 간직하고 있는 모든 보화들을 향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균형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토마스의 판단으로는 당시 유통되고 있던 신학 저술들은 초심자들에게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 너무도 장황하고 세밀하기 때문이고, 2)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3) 체계성이 없는 탓으로 너무도 반복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결합들의 보다 명백한 표본은 바로 1142년부터 1158년 사이에 집필되어 당시 신학 교재로 활용되고 있던 롬바르두스(P. Lombardus, 1095-1160)의《명제집》이었다. 그러나 ‘성서’ 자체까지도 논리적 순서를 결(缺)하고 있으니, 그것은 신의 작품을 선포하기 위한 작품이지, 처음으로 신학 연구에 입문하는 초심자들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진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성서가 교부들의 가르 침(주로 ‘성서주해’들)과 함께 신앙의 토대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신학의 초심자들을 올바로 양성하려면, 이 ‘학문’들을 절제하면서 ‘신학’ 전체의 체계적인 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롬바르두스의《명제집》과 그 모든 요약본들, 그리고 12-13세기의 ‘summa’들과 논술들은 모두 ‘사도신경’(Credo)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식에 따라 신앙의 진리를 재편성해 보려는 시도들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토마스의 눈에는, 이것들은 너무도 ‘비학문적’인 작품들이었다. 그는 삼위일체(Ⅰ권)가 유일신의 속성들 탐구(Ⅳ 권)보다 먼저 탐구되었다는 것, 그리고Ⅲ 권에서 덕행들을 다루고 Ⅳ 권에서 일부 악습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매우 못마땅해 했다.
2.2. 신학대전의 구조
토마스는《신학대전》에서 매우 엄밀한 ‘논리적-학문적 순서’(ordo logicus scientificus)를 따랐다. 이것은 사도신경이나 동시대의 명제집들, 대전(summa)들, 요약본들이 따르던 순서를 단호하게 배격하지는 않으면서도,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분석론 후편》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데 기인한다.《신학대전》을 구성하는 3개 부분은 두 개의 웅장한 (신의) 전망에 상응한다: ‘모든 사물의 신으로부터의 발원’(發源)(exitus a Deo)과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의 최종 목적인 신께로의 귀환’(歸還)(reditus and Deum). ‘발원-귀환’은《명제집 주해》의 기본 구도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듯이, 토마스에 따르면 실은 알렉산더 할레스와 토마스 자신에 의해 완성된 구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마스는《신학대 전》을 3개 부분으로 나누면서, 제Ⅰ부(prima pars)에서는 삼위일체와 ‘모든 피조물의 신으로부터의 발원’을 다루고, 제Ⅱ부(secunda pars)에서는 ‘이성적 피조물들의 신을 향한 활동들’을 검토하고, 제Ⅲ부(tertia pars)에서는 ‘인간의 길이 된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인간의 신께로의 귀환’을 다룬다(《신학대전》),Ⅰ부.2문, ‘머리글’).
《신학대전》은 총 512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의 제자에 의해 보충된 99문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611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작품이다. 각 문제(quaestio)들은 다시 여러 개의 세부 문제인 항목(articulum)들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은 한결같이 고정된 틀 안에서 전개된다. 항목 자체가 ‘예/아니오’(sic et non) 방식으로 대답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Ⅰ부 2문 3항은 “신은 실존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질문은 아래와 같은 4개의 고정된 부분으로 나뉘어져 탐구된다.
1) ‘그렇지 않은 것 같다’(videtur quod non):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대답을 지지하는 논거들이 소개된다(Ⅰ부 2문 3항에서는 당시 잘 알려져 있던 ‘악으로부터의 논거’가 제시된다).
2)‘반대로 ’(sed contra): 부정적인 대답에 반대되는 논거나 권위있는 명제들이 소개된다 (Ⅰ부 2문 3항에서는 출애굽기 3,14의 ‘나는 존재하는 바로 그분’을 제시한다).
3) ‘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없다’(repondo dicendum quod): 교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논거(Ⅰ부 2문 3항에서는 유명한 ‘다섯 가지 길’(quinquae viae)을 제시하고 있다).
4) 답변(solutio): 초두에 제시되었던 반론들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한다.
여기서 1)과 2)는 주로 역사적이고 권위에 의거하고 있지만, 3)과 4)는 거의 전적으로 합리적인 철학적 논술이다.
성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본 작업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체계에는 부족되고 있는 ‘발원과 귀환’(exitus et reditus)이라는 플라톤 또는 신-플 라톤주의의 도식을 원용했다. 성 토마스는 이미 초기 대작인《명제집주해》와《이교도대 전》에서 이 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발원(發源, exitus)이란 신-플라톤주의가 말하는 자연주의적이고 범신론적인 ‘유출’ (流出, emanatio)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플라톤주의에 의하면, 만물의 궁극적인 근거이자 원리는 비인격적인 일자(一者, to hen)인데, 여기서부터 기계적이고 필연적으로 우주 만물과 그 지배 원리들이 흘러 나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 토마스는 그리스도교 진리를 받아들여 사는 신앙인이었기에 이런 자연주의적이고 기계주의적인 설명에 동조할 수 없었다.
신학은 신에 관한 학문이기에, 모든 것은 그 기원이나 최종 목적에 있어서 ‘신과의 연관 속에서’(sub rationr Dei) 연구되어야 했다. 우주 만물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결국 신에게로 돌아감으로써 완성되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고도의 일관성 속에서 제자리잡고, 인식되고, 판단될 수 있게 되었다.
《신학대전》의 기본 구상과 그것이 담고 있는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리 (原理, principium)인 신으로부터의 발원(發源)(Ⅰ부)과 목적(目的, finis)인 신에게로의 귀환 (Ⅱ부), 그리고 이 귀환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Ⅲ부는 우리의 ‘길’(道, via)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 다룬다. Ⅲ부에서는 ‘역사’(歷史, historia)가 주도적인 요인이 된다(Ⅰ,2.‘머리글’).
《신학대전》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Ⅰ부에서는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대상과 방법을 정립한 다음, 신의 실존 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속성들, 그분의 활동, 삼위일체 등을 논하고, 이어 피조물들의 창조, 그 가운데 천사들의 위치, 인간과 그 능력을 차례로 논한 다음 신의 섭리와 우주 지배로 제Ⅰ부를 마감한다.
제Ⅱ 부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1편(Ⅰ-Ⅱ)에서는 인간 행위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 따라 증명한 다음, 인간 행위의 본성과 열정을 살피고, 덕과 악습, 법과 은총을 차례로 논하고 있다. 제Ⅱ편(Ⅱ-Ⅱ)에서는 신앙인의 기본 덕인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먼저 논하고 나서, 인간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타당한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의 덕을 차례로 논술한 다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은사, charisma)를 다루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있다.
제Ⅲ부에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육화(肉化, Incarnatio) 사건을 제일 먼저 다룬 다음,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다루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수단으로 남겨주신 7가지 성사(聖事, sacramentum)들을 차례로 취급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 토마스는 (세례성사, 성체성사에 이어) 세 번째로 고해성사를 다루던 중에 갑자기 논술을 중단하여 이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겨 놓았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나중에 그의 충실한 조수이던 레지날도(Reginaldo Piperno)가 나머지 성사들(고해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혼인성 사)과 세상 종말에 관한 논술을 위해서 작품 구성이 유사한 스승의 초기 대작인《명제집 주해》의 해당 부분을 옮겨다 놓음으로써 부족 부분을 메꿨다. 이 부분은 ‘보충부’(Supplementum)이라고 불리운다.
3. 제Ⅰ부의 주요 내용
3.1. 신학입문
<신학입문>:《신학대전》을 시작하고 있는 제Ⅰ부 1문은 ‘신학’의 종합적 입문이다. 엄밀히 말하자면《신학대전》전체의 ‘입문’을 쓰고 있다기보다는, 모든 신앙인을 특징짓고 모든 신학자가 탐구하는 ‘신학의 재료’에 관한 입문이다. 이 제1문은 얼핏 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오래도록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토마스는 확실히 초심자를 위한 이런 교본이 논란과 오해의 대상이 도리라고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어떤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타당한 ‘입문’을 쓰려면, 거기서 저자는 적어도 3가지 요점을 밝혀야 한다: 1) 그 학문의 실존 문제(an sit), 2) 그 본성 또는 정의(quid sit), 3) 그리고 그 양식 또는 방법(de modo). 토마스는 바로《신학대전》제Ⅰ부 1 문에서 이 세 가지 요점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여기서 토마스는 신학의 실존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탐구한다. 필요성이란 명백히 그 실존(an sit)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항들에서 토마스는 종(種) 또는 정의(定議, quid sit)를 구성하는 ‘근류’ (근류, genus proximum)와 ‘종차’(種差, differentia specialis)를 찾아내 적절한 ‘정의’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분석론 후편》에 제시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류(類, genus)를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제1문의 마지막 3개항에서 토마스는 신학의 양태들과 내밀한 방법(de modo)을 지적하고 있다. 이 ‘방법’은 신학자 개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적 방법론과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그 실존과 본성이 이미 규정된 것을 전제로) 이제 신학 속에 내재하고 있는 ‘양태론’에 관련된다.
<신학의 실존>: 신학의 실존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1항) 토마스는, 기존의 모든 철학들 외에도 아직 또 다른 유형의 학문이 남아있는지를 묻고, 두 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인간은 여하한 이성의 한계를 넘어 가는 어떤 초자연적 목적에도 운명지워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그리로 방향지울 수 있기 위해서는 필시 이 목적을 “신의 게시 를 통해”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모든 철학을 넘어가는 것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다만 신의 계시를 통해 얻을 수박에 없다. 둘째,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적 진리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계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겨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도 오랜 탐구를 거쳐서 수 많은 오류에 떨어져 가면서,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신학이 있어야 한다.
<신학의 본성>: 이 학문의 본성에 관해서, 토마스는 광범위한 류(‘학문’)에서부터 종차 (‘신에 관한’)를 담고 있는 학문(지혜)으로 전개해 간다. ‘신학이 하나의 학문(學問, scientia)인지’를 묻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데(2항),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신학의 학문적 방법론’(이것은 곧 이어서 취급될 것이다)이 아니라, 제1항에서 그 실존이 입증된 신학의 본성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 ‘학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적으로 “원인들을 통한 인식”(cognitio per causas)이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는 ‘근거’들이 있는가? 토마스는 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예컨대, 기하학처럼 하나의 자율학문이라기보다는 어느 면에서 천문학이 수학에 종속되듯이 그렇게 신과 ‘천상 지복 자 들’이 누리고 있는 지식에 종속되어 있는 학문이다. 말하자면, 신과 ‘성인들’이 직접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근거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앙에 내밀하기도 하고 또 외면적이기도 하다. 예컨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사실 등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 가지게 되는 지식의 내밀한 근거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바로‘학문적 지식’인 것이다.
<단일성>: 만일 신학이 하나의 학문이라면, 그것이 단지 하나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지(3항), 사변적인지 아니면 실천적인지(4항), 다른 학문들에 비해 상위의 학문인지, 하위의 학문인지(5항), ‘지혜’(sapientia)라고 불리울 만한지(6항) 등을 밝혀내야만 한다. 신학의 고유한 성격은 바로 인간이 이승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인 그 ‘지혜’의 성격에 있다. 이 학문을 특징짓는 지혜의 특성은 ‘신에 관해서’ 즉 신을 그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서 주어진다(7항). 형이상학과 윤리학 같은 다른 형태의 지혜들은 신에 관한 사변적이고 실천적인 학문들에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오직 신학만이 계시되는 한에 있어서의 신 자신과 상관된다. 다시 말해, 신학은 신에 대한 지식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영광을 향해 방향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이고 성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이다. 이승에서 이 지혜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학의 방법>: 제1문의 마지막 3개 항들은 신학의 방법을 취급하고 있다. 토마스는 그것이 ‘논증의 방식을 통해 전개’되는 것인지(8항), 비유적 표현법이 불가피한 지(9항), 또 성서는 신학이 제시하는 방식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10항)를 묻는다. 주석가들은 제8항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한다. 왜냐하면 신학이 하나의 학문이라면, 당연히 (내밀하든지 혹은 외면적이든지 간에) 논증 형식을 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의 항을 어떻게 평가해야할 지 난감하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신학보다는 오히려 성서에 더 적합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셰뉘(M.D. Chenu)는 토마스가 이 항들을 논하는 것은 어떤 전통에 따르고 있는 것인데, 그 전통적 방식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라졌을 것이 라고 주장한다. 실상 제8항에 변증법적 성격을 논하고 있는 만큼, 이 두 개의 항은 계시 진리를 특징짓는 세밀한 양식들을 다루고 있다. 신학이 그 자체로 고유한 논증 방식과 비유적 언어,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신학의 본성에 속한다. 신학은 신앙의 구조나 신학 체계 또는 성서의 자구(字句) 및 설교 등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신학은 신앙으 로 받아들인 계시된 신적 진리의 내용으로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성서와 교부들의 저술들을 낳고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되는 진리다. 그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 (euangelion)이다.
정당하게도 반 아케렌(van Ackeren)은 신학이 본질적으로 활동적이어야 함을 지적한다. 본질적으로 그 속에서 신이 ‘스승’이고 우리는 그의 ‘학생’인 하나의 교육 과정(docere doctrina)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와 신학자들은 이 학문(가르침)을 연구하고, 그것을 전통 속에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설교가들은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에) 그것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
3.2. 신 실존 증명
이미 말한대로, 제1문은《신학대전》에 관한 입문이 아니다. 거기서 토마스는 자신이 전개하고 있는 체계적 논술 과정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본격적인 “입문”은 새로운 주제들을 시작할 때마다 그때그때 짧게 첨부하고 있는 ‘머리글’들에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제2문의 도입부에서는《신학대전》전체의 3부 구성을 말한 다음, 제Ⅰ부의 세부 구분을 밝히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문제는 ‘신의 시존’(an sit)에 관한 문제이다.
<자명성>: 그러나 신의 실존을 입증하려고 들기 전에, 먼저 신의 실존 사실이 ‘자명한 지’ 여부를 알 필요가 있다. 만일 신의 실존이 자명한 것이라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항). 그러나 신의 실존이 자명하지 않다면, 우리가 신의 실존을 증명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증명을 시도한다는 것은 무익할 것이다(2 항). 마지막으로, 신의 실존이 자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면, 그때 비로서 그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3항).
첫 번째 질문을 조사하면서, 토마스는 “자명성”(evidens)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지적한다: 1) ‘그 자체로(in se)는 자명한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non quoad nos) 것, 2) 그 자체로도 또 우리에게도(quoad nos)자명한 것, 이 두 번째의 경우를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술어가 주어에 필연적으로 내속(內屬)한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속 관계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모든 정의들과 인간 이성이 거기에 기초하게 되는 모든 제1원리들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예컨대,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라든가 ‘2+2=4’의 경우처럼, 그 구성 요소들의 의미들을 알기만 하면 자연히 알려지지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실제로 실존하는 것의 감각적 지각(per se nota sensibus)에서 명백하다. 그러나 술어가 효과적으로 주어에 속하게 되는 다른 진술들도 있다. 예컨대, ‘신은 실존한다’는 진술은, 우리에게는 자명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로는 자명하다. 만일 우리가 신을 ‘얼굴을 맞대고’(Ⅰ 고린 13,12) 볼 수 있었더라면, 그의 실존이 그의 본성과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명백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복된 순간까지는 신의 실존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진리가 아니고, 따라서 증명되어야 할 진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존재론적 논증>: 이 자리(답변 2)와 다른 곳에서, 토마스는 안셀무스(St. Anselmus, 1033-1109)의 소위 ‘존제론적 논증’(argumentum ontologicum)을 검토하고 기각시킨다. 안셀무스의 시도는 신의 실존을 증명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상 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떤 것’의 실존에 대한 증명이다. 신앙인에게는, 삼위일체이고 필연적 존재자인 신의 실존은 바로 더 이상 큰 것을 개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따라서 신은 사고 속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실존한다. 사실 많은 역사가, 신학자,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안셀무스의 증명은 신의 실존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증명이나 증명 시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이미 자명한 진리에 대한 단순한 주장이라고 말한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안셀무스의 견해는 일리가 있다. 계시의 신은 필시 실재 속에 실존한다. 그러나 비신앙인에게는, 신에 대한 이런 식의 정의는 필연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받아들일 만한 것도 아니다. 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런 신이 (그 정의를 개념하는) 정신 바깥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연역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안셀무스가 입증하고자 했던 것의 역사적 진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토마스가 안셀무스의 논거를 결코 신 실존 증명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토마스는 언제나 그 논거를 신의 실존이 그 자체로 명백한가(ansit per se nota)라는 맥락 속에서만 논의하고 있다. Proslogion(대화록)의 일반적 맥락 속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점에서 토마스가 옳았던 것 같다) 안셀무스는 자연 신학의 체계적 논술을 하지 않고 다만 집중적으로 ‘관상 수도 자들’에게 주는 논거들을 다루고 있다. 즉 그가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계시된 것은 필시 참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렇게 해서, 신은 ‘더 이상 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평가 절하되고 있다). 이 근본적 진리로부터 삼위일체의 필연성, 육화의 필연성 약속된 지복직관의 필연성 등이 연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신 실존의 자명성 문제를 부정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토마스는 신의 실존이 증명될 수 있는지를 묻는 데로 나아간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의 실존은 모든 증명을 넘어가는 신앙의 문제다. 2) 우리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고 다만 ‘무엇이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떤 필연적 증명을 위해서는 필시 어떤 정의(定議)가 필요할 것이다. 3) 신의 실존을 증명해야 한다면, 그 결과들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무한한 신과 그의 유한한 결과들 사이에는 진정한 비교점이 없다 (만일 그렇다면, 전제와는 전혀 무관한 어떤 결론을 끌어내게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완전성은 세계 창조 때부터의 그 분의 업적들을 잘 고려해 볼 때 명백하다”(로마 1,2).
<증명>: 답변에서 토마스는 “증명”(demonstratio)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는 ‘원인’을 앎으로써(propter quid) 증명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들을 통한 증명 방식(quia)이다. 신의 실존은 절대로 ‘원인을 통해서’는 입증될 수 없다. 신은 원인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신의 실존은 다만 (우리에게 아주 자명한) 결과들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어떤 결과의 실존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결과를 설명하는, 그래서 그 결과가 실존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신의 실존은 비록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자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자명한 결과들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
토마스는 덧붙이기를(답변 1), 신에 관한 어떤 진리들은 사도 바오로가 말하고 있듯이 ‘자연 이성’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이 진리들은 엄밀히 말해, ‘신앙 조목’들이 아니라 신앙의 ‘현관’(praeambula fidei)과도 같은 것이다. 신의 실존이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성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과를 통한 논증에서, 결과는 증명의 ‘소전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를 때 의도하는 것에 대한 순수 ‘개념적’(nominale)인 정의가 필요하다(답변 2). 결과들이 원인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가질 수 없고, 다만 그 원인의 실존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비록 그분의 본성을 결코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신의 실존만큼은 증명할 수 있다(답변 3).
<신 실존 증명>: 마침내 토마스는 신의 실존에 관해 중대한 질문을 제기한다(3항). 그가 취급하고 있는 문제들은 매우 분명하고 또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다. 신이 실존한다면, 어찌하여 세상에는 ‘악’이 있는 것일까? 왜 하고 많은 존재자들이 있는 것일까? 우주 속에 실존하는 모든 것은 자연적 원인들과 인간의 자유 의지로 해명될 수 있다. 따라서 신의 실존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한편, 신이 스스로 말하고 있다: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출애 3,14:“Ego sum qui sum”).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자리에서 토마스는 신의 실존이 ‘다섯 가지 길’(quinquae viae) 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고 말한다.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증명들은 다른 것으로부터 구분되고, 따라서 하나 하나가 독자적으로 증명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그 ‘길’들을 통해 참된 신의 실존에 이를 수 있다고 토마스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 증명이 비신앙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여부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논증의 논리 속에는 감정들이 끼어들기가 쉽기 때문이다. 각각의 증명이 형식상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기는 하지만, 각각 결과(=우주)의 한 특수한 측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모두 유사하다. 모든 결과는 그것이 총체적으로 해명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 해명 즉 신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제1 증명>: 토마스가 ‘가장 명백한 길’이라고 부르고 있는 제1증명은, 우주의 ‘생성’ 또는 운동의 사실에서 출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증명하고 있듯이, 운동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움직여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어떤 열의 원천이 필요하고, 물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위자가 필요한 것이다. 변화란 모두 다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운동들의 원인을 캐묻는 데 있어서 무한히 소급해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할 경우 ‘최초의 원동자’(原動者)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운동이나 변화도 해명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움직여지지 않은 어떤 제1원동자(第一原動者, primum movens)의 실존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원동자는 바로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제2 증명>: 우주 전체에서 온통 명백한 ‘능동인(能動因)의 사실’에서 출발한다. 실상 그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자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보다 앞서 선재(先在)했어야 할 터인데, 그것은 부조리하다. 또 그 원인 추적을 무한대로 소급해 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최초의 원인’은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주의 ‘인과 성’ 개념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기 자기 자신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능동인들 저 너머에는 필시 원인을 가지지 않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 의존하는) 어떤 제1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 제1원인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른다.
<제3 증명>: 우리는 우주 속에서 사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즉 가멸적이고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생성소멸’(生成消滅)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언젠가 아무것도 없었던 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야 할 것이다. 어떤 있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면 아무 것도 존재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실존하려면, 거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필연적 존재자들은 그 필연성을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혹은 남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기의 필연성을 남으로부터 받은 그런 존재자들이 무한대로 있을 수는 없다. 만일 그랬더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자체 필연적인 그리고 다른 모든 존재자들이 거기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있음에 틀림 없다. 바로 이 ‘그 자체로 필연적인 존재자’를 모든 이들은 ‘신’이라고 부른다.
<제4 증명>: 우주 전체에서 우리는 실존, 생명, 진리, 미 등 ‘완전성의 여러 등급’을 발견한다. 그러나 완전성의 등급에 대해 말하는 것은, 각각의 실재는 (모든 것이 그것의 본성 에 의존하게 되는) 어떤 절대적 존재의 어떤 몫을 크고 작게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참여함으로써’(per participationem) 실존한다면, 이것은 ‘그 본성상 그러 한’ 어떤 것에 의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결국 생명 자체인 어느 한 실재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무한히 소급해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여함으로써’ 실존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그 본질상’ 실존하는 어떤 존재를 요구한다. 그 자체로 완전한 자를 사람들은 ‘신’이라고 부른다.
<제5 증명>: 우주 속에서 우리는 지성이 없는 자연 사물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finis) 을 향해 고도로 지성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본다. 이 사실은 그것들이 언제나 또는 규칙적으로 더욱 더 목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며 행동한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이것은 우연일 수는 없고 따라서 ‘계획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성을 지니지 않은 사물들이 목적을 바라보고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에 속한다. 따라서 그것들은 화살이 궁수에 의해 조준될 때처럼, 다른 어떤 지성적 존재에 의해 그렇게 인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각기 고유한 목적에로 질서지워 놓은 어떤 지성이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이 지성을 ‘신’이라고 부른다.
‘세상에 현존하는 악’에 관한 첫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에서, 토마스는, 신에게는 무한한 선(善)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선을 끌어내기 위해), 악을 허용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Enchiridion, 11장),“신은 최고선이므로, 그의 작품 속에 어떠한 형태의 악도 허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악을 허용했다면, 그것은 전능하고 선한 신은 악에서도 선을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이다.” ‘자연과 인간 의지의 지속성’에 대한 두 번째 반론에 대한 대답으로, 토마스는 제5 증명을 함축적 으로 원용해서 답변한다; 자연의 모든 작품들은 어떤 지성을 전제로 한다. 자연은 미리 질서지워져 있는 그 목적을 알지도 못하고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성과 의지의 기능들은 인간의 자유에 속하지만 또 자연에도 속한다. 게다가 지성적, 의지적 기능들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하다. 따라서 불변적이고 완전한 어떤 상급 지성을 요구한다.
3.3. 신의 속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의 실존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후험적(a posteriori) 논증 방식을 택하였으나, 신의 속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선험적(a priori) 논증 방식이라고 부름직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그분이 어떠한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직관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신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일차적으로 부정적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소위 ‘부정적 방식’(via negativa)이다. 그래서 토마스는 제3문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것의 실존이 확증되면, 다음에 검토되어야 할 것은 그것의 존재 방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이 무엇이 아닌지 만을 아는 데 그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주로 부정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신이 어떤 종류의 존재가 아니냐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여러 특성들, 가령, 합성, 변화 및 기타의 것들을 배제해 나감으로써 알 수 있다.” 이 ‘부정의 길’은 토마스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플라톤 전통, 특히 위-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 전통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예컨대, 신은 유일하고 무한하며 영원하다. “우리의 경험 안에 들어오는 사물은 합성적이고 유한하고 시간적이다. 신의 절대적인 단일성, 무한성, 영원성에 관한 우리의 관념은 (이러한 경험에 대한) 부정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된다” (10문 1항).
그러나 ‘지혜’나 ‘선하심’과 같은 속성들은 긍정적(via positiva)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과 신에게 적용되는 것은 일의적(一義的, univocum)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의적(多義的, aequivocum)인 것도 아니며, 오직 유비적(類比的, analogicum)이다. “우리가 신에 관해서 술어로 삼는 명사에 관해서는 생각할 점이 두 가지 있다. 그 하나는 표시된 완전성 자체를 생각하는 것인데, 선, 생명과 같은 것들이다. 다른 하나는 표시 방식을 생각하는 것이다. 전자는 본래적으로 신에게 적합한 것이며, 피조물에게보다는 오히려 신에게 더 고유하게 적합한 술어이다. 그러나 그 표시 방법은 본래적으로 신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래적으로 피조물에 속하는 표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13문 3항).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조물에게서 경험되는 개념들을 순화시키려고 애쓰는 것 뿐이며, 이것은 부정의 길과 긍적의 길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유비적인 방법이다. 신의 본성에 관한 여러 명제들은 인위적으로 아무렇게나 형성된 것이 아니라, 경험 세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에게 완전하게 있는 모든 완전성들을 피조물이 불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신에게 가장 적합한 이름은 모세에게 계시된 ‘존재’(Ego sum Quisum)(출애 3,19)이다. 신에게 있어서는 본질과 존재 사이에 아무런 구별도 없다. 신은 존재 그 자체이다. 여기서 토마스는 그의 철학적 개념 전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정식화하고 있다: “오직 신에 게 있어서 만 본질(本質, quod est)과 존재(存在, esse)가 동일하다”(3문 4항). 피조물의 경우에는 존재와 본질이 실재적으로(realiter) 구별된다. 그들은 존재(=신)에 참여하고 있기 때 문이다. 자신의 형이상학의 이 근본적인 원리에 기초해서 토마스는 유일신, 창조, 피조물의 신학을 구성한다.
3.4. 창조
토마스에게 있어서는 자연의 활동들에 대한 분석만 가지고는 존재(存在, esse)의 출현을 설 명할 수가 없다. 각 개별 존재자(存在者, ens)들은 단편적으로는 현실태이고 또 단편적으로는 가능태이기 때문이다. 모든 물질적 존재자는 질료(質料, materia)와 형상(形相, forma)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존재자는 다른 존재자에 대해, 자기 존재의 활동 원리인 자기의 형상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것도 오직 단편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잇는 능력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자연 속의 모든 작위자는 어떤 존재자를 그 자체로 산출할 수는 없고, 다만 자기 자신처럼 이미 기존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산출할 수 있을 뿐이다. 존재자 총체의 존재 여부는 오직 그 자체 순수 현실(actus purus)이면서도 다른 존재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전능한 존재자에 달려 있다.
피조물의 존재는 전능(全能), 전지(全知), 전선(全善)하신 신에게 그의 존재를 온통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피조물들은 신의 능력 덕분에 존재하게 되었고 보존되며, 그분이 눈길을 돌리시면 즉시로 허무로 돌아간다.
1)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은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nihilo)를 의미한다.(45문). 여기서 말하는 무(無)는 어떤 재료가 아니다. 그리스인들은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ex nihilo nihil fit)고 믿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 속에 함축되어 있는 잠재력 (potentia) 때문에 생겨나는 온갖 생성 변화들로부터 연역된 공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잠재력(potentia)도 지니고 있지 않은 순수 현실인 신은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다. 창조 이전의 비존재(non-esse)와 창조 이후의 존재(esse)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 요소도 없다.
2)토마스의 창조 개념은 유한한 것이 모두 매순간마다 신에게 그 존재를 의존한다는 것이다. 창조란 어떤 존재자를 절대적인 무로부터 끌어낼 ‘무한한 권능’을 요구한다. 비존재와 존재 사이의 차이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신만이 본래적인 의미의 존재이고 다른 것들은 그분의 존재를 나누어 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신만이 진정한 의미의 창조를 할 수 있다.
3) 창조했다는 것은 시간의 첫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즉 세계의 첫 순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지는 것이다(46문).
토마스는, 당시 대단한 인기를 누리며 그리스도교 교리를 위협하던 아베로스주의자들과 더불어 과감하게 “어떤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과 그것이 일찍이 비존재의 상태에 있었던 일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긍정해도(철학적으로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주장한다(《세계 영원 성론》). 이것은 신-플라톤 학파의 필연적 유출 이론을 반대해서, 신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창조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신 안에 존재하는 창조 활동은 영원하며 신의 본성과 동일하지만, 그 활동의 외적인 결과 즉 세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관념적으로 시간의 첫 순간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진리는 신비의 영역인데, 오직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신-플라톤주의자들에 따르면, 모든 실재는 그 최종 원천이 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유출된다. 아퀴나스는 일자(一者, to hen)로부터의 만물의 필연적 유출(流出, emanatio)을 가르치는 신플라톤 계열의 범신주의(汎神住義, pantheism)를 거슬러, 신과 피조물의 세계는 근본적으 로 다르며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그 존재를 존재 자체이신 신에게 빚지고 있다는 유대-그리 스도교적 교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3.5. 인간
인간 영혼은 무(無)로부터 신에 의해 창조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정자(精子, sperma)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일까?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형상인 것은 사실이지만, 비물질적인 사고와 의지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연적 형상들과는 다르다. 그것은 다른 자연적 형상들이 그 질료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떤 신체적 기관이 온통 영적이고 비물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설이다. 그 어느 것도 고유의 능력 이상으로 작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적 영혼은 온전히 영적이기 때문에, 육체에 의존하지 않고 또 육체와 따로 떨어져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정액의 어떤 기능에 의해 산출된 것일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의 영혼이 태아(胎兒, foetus) 밖에서 창조되고 나중에 가서야 태아와 결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플라톤과 그의 제자들은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에 선재(先 在, praeexistere)하고 있다가 불행하게도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인간이 영-육 결합체임을 부인하고 다만‘육체의 봉사를 받는 영혼’으로 개념한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이 몸을 사용하느냐 저 몸을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나 토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종(種, species)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한 인격을 구성하려면 육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자와 난자의 타고난 잠재력들이 잘 배합되는 순간부터 영혼이 태아 속에서 창조된다. 신이 영혼을 ‘직접’ 신체 속에 창조하면, 영혼은 즉시로 태아의 생명을 특징짓는 모든 기능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다. 따라서 각 사람의 영혼은 플라톤이 주장했던 것과는 반대로 유일하고, 그것이 결합되게 되는 질료로부터 자기 고유의 개성을 받게 된다. 그러나 토마스는 하나의 생명체에 다수의 영혼들이 있다는 동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에 반대하여, 인간의 영혼이 일단 창조되면 그 유기체는 총체적으로 하나의 인격이 되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토마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지성적 영혼은 피조물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실체적 형상(實體的 形相, forma substantialis)이자 동시에 비물질적 인 ‘이 어떤 것’(hoc aliquid)이다. 영혼은 질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에 비물질 적이고 또 그 때문에 비-소멸적이다. 즉 불멸한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는 영혼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격이라고 할 수 없다. 인격(人格, persona) 이라고 말은 육체와 영혼 모두를 포함한 인간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퀴나스는 이승에서는 모든 자연적인 인식이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과 그 최고의 활동은 질료의 능력을 초월한다는 것을 다 같이 확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영혼의 고등 능력들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육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육체에 결합되어 있는 동안은 자연적 인식에 관해서 감각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는 모든 인식의 출발점은 감각이라고 가르친다. 이승에서 인간은 감각상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인간의 영혼의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성격은 육체적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정신적 활동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인간의 영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의 해체의 의해 함께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인간의 영혼은 본성적으로 불사이다. 영혼은 본성적으로 육체의 실체적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죽은 다음에도 영속하는 영혼은, 다시 육체와 결합되기 전에 는 어딘가 불완전한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영혼은 다시 육체와 결합되어야 완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영혼의 불사성(不死成)이 언젠가 육체의 부활할 것을 요구한다(75문).
4. 제2부의 주요 내용
파리에서의 4년 동안 토마스는 비서들의 도움을 받으며, 대단한 속도와 보기 드문 근면성을 가지고 작업해 나아갔다. 그는 수면과 음식을 최소한도만 취하면서 그의 모든 에너지를 저술, 강의, 기도에 바쳤다. 토마스가 1269년부터 1273년 사이에 이루어낸 업적은 참으로 전무 후무한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머리 속에 떠오르는 것을 ‘저술’하고 ‘구술’했을뿐 아니라 또한 많은 시간을 고금의 사상가들의 작품을 ‘독서’하는데 투자했다.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토마스가 이 제2차 파리 체류 기간동안 집필한 작품들을 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의 책들을 읽어야 했었는지를 주목하지 않은 채 지나친다. 분명 그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읽었고,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실 토마스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토마스가 만일 교수로서의 직분과, 자기 수도회에 대한 제라르파의 공격을 논박하는 데에만 그의 임무를 한정했었더라면, 그는 총장이 그에게 부과한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과된 임무 외에도,《신학대전》의 제Ⅱ부 전체를 끝내고 제Ⅲ부의 일부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 작품들을 정밀하게 주해했고, 중요한 토론 작품들을 논술했으며, 이런저런 절박한 문제들에 답변을 했다.
우리는 토마스가 제2차 파리 시절에 사물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개인적인 깊은 내면적 체험이 그의 저작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현대의 많은 연구가들은 토마스의 몇몇 가르침들을 조사 연구하는 중에 이 점을 깨달았다. 예컨대 에슈만은《대전》의 제Ⅰ부와 나머지 부분 사이에 발견되는 대단히 깊은 차이를 설명할 길을 찾지 못했다. 제Ⅰ부는 인간 문제와 신의 섭리 문제를 다룰 때에도 엄밀하게 형이상학적이고 간단 명료하다. 그런데 제Ⅱ부는 제Ⅱ부 1편의 초두부터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분석적이고 도 복잡하다. 사변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런 대조적인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두 부분이 취급하고 있는 주제와 대상의 상이함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는 좀더 깊은 차원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점은 그 이후의 모든 저술들에서 다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떤 일종의 신비 체험 또는 그의 전 작품의 사상적 성격에 대한 갑작스러운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이었다. 사도 바오로의 환시 속에서 어떤 마케도니아 젊은이가 성인에게 마케도니아로 와서 사람들을 좀 도와달라고 청했던 것처럼(사도 16,7), 젊은 학생들도 토마스에게 자기들의 처지로 내려와서 좀 도와달라고 청하고 있었다.《신학대전》은 바로 젊은 신학도들을 위해 착수된 것이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주해서들도 젊은 철학부 교수들을 위한 것이었다. 고티에가 옳게 보았던 것 같다. 즉 토마스는 이전 작품들에서 취했던 지나친 주지주의적 태도를 중화시키는 데에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 변화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연대는 대체로 제2차 파리 체류 초기에 해당되는 1269년이나 1270년 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이 원숙기 작품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깊은 체험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품 활동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대되었다. 토마스의 경우 이 체험 은, 이미 강열한 사도적 열성으로 살아온 삶에, 그리고 그토록 충만한 구상들에, 더욱 더 활기와 박차를 가하게 해주었다.
대학 교수로서 강의없이 규칙적으로 숙소에서 지내게 될 때에는, 토마스는 생쟈크에서 강의들을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회에《신학대전》제Ⅱ부 저술에 주력했다. 이 제Ⅱ부는 신학계에 기여한 토마스의 가장 독창적인 공헌이었다. 토마스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동시대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윤리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토마스에게는 오직 하나의 ‘신학’만이 존재했고, 그것이 사변적인 교의신학과 실천적인 윤리학을 두로 포괄하고 있었다. 신학을 교의신학, 윤리신학, 신비신학, 변신론 등으로 세분하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토마스에게 어떤 구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순전히 학사력에 따른 것이었지 진정한 의미의 신학 구분은 아니었다. 한편 신학 교육은 인간이 참된 행복에 도달하게 되는 도덕적 행위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이 참된 행복은 이승에서는 은총을 통해, 그리고 저승에서는 영광을 통해 신을 명상하는데서 얻어지게 된다.
4.1. 제2부 제1편
제2부 제1편의 머리글을 읽어 보자: “인간은 신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모상이란 ‘지성과 자유 의지 그리고 자기 행동 통제력을 갖춘 존재’를 가리킨다. 따라서 원형(原型), 즉 신에 대해서 그리고 신의 의지에 합치되는 신의 능력으로부터 유래된 모든 것에 대해 살펴 보았으니, 이제는 그분의 모상(模像, imago Dei) 즉 인간에 대해서 살펴 볼 차례다, 인간은 바로 자유 의지와 행동 통제력 덕분에 자기 행동의 원리인 것이다.” 제Ⅱ부의 첫 5 개 문제들은 ‘인간의 최종 목적’을 탐구한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고유 목적에 도달하려는 각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을 다루고 있다. 제Ⅱ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석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인 그리스도의 성사들을 다룬다. 인생살이에서 갈망하게 되는 최종 목적은, 인간의 정신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끝에 가서야 도달 된다. ‘지향에 있어서 첫째는 실행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스콜라학의 공리가 말해주고 있듯이, 목적인(目的因)이 능동인(能動因)을 선행(先行)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목적인 덕분에 행위의 추동력이 생겨나고 이 추동력을 통해 그 결과로서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마스는 자기 자신이 충분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 ‘최종 목적’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계획을 완성하기 전에 그는 죽게 된다. 토마스 자신이 제Ⅱ부를 일반론과 각론으로 나누었다. 그가 죽자마자 바로 제자들은 그것을 각각Ⅱ부 1편(prima secundae) 과 Ⅱ부 2편(secunda secundae)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이탈리아에서 작성되었을 Ⅱ부 1편의 첫 다섯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되고 있다: 1) 인간에게는 최종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가? 2) 최종 목적이란 무엇 인가? 3)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4) 이승에서의(그리고 저승에서의) 행복의 구성 요소들은 무엇인가? 5) 인간은 어떻게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최종목적>: 토마스에 따르면 모든 피조물은 그 본성상 그에 어울리는 최종 목적을 향해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본성은 모든 행위와 그에 따른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성들의 차이에 따라 나름대로 목적에 도달하는 방식도 다르다.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 이성적 통제를 수행한다. 한편 세상을 구성하는 다른 피조물들은, 화살이 궁수에 의해 표적을 향하게 되듯이, 자기 자신의 본성에 따라 목적을 향해 움직여 간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 능력 덕분에 자신의 목표 설정과 그 목표에 이르려는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다. 목표에 도달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규정짓고 조건지우고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목적이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한 가지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기에 선택하게 되고, 나중에 포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종 목적에 관해 전문적으로 숙고하지 않고, 다만 일상 생활에서 도달될 수 있는 직접적인 목적들에 관해서 부심한다. 이 직접적인 목적들에 관해 수고하는 방식은 실상 각자가 설정하고 있는 일반적 목적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무관심이나 영적 게으름 탓으로, 또는 그날그날의 삶의 필요 때문에, “최종 목적” 같은 추상적 실재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이다.
<대상>: 선택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 능력이 있는 인간은 그의 최종 목적이 부귀영화나 명예, 권세, 성(性)이나 문화 또는 어떤 다른 개인적인 성취에 있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창조되지 않은 선’(善)인 신(神)만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들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행복의 진정한 대상은 신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여, 당신 향해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행복의 본성>: 인간 행복의 참 대상을 살펴 본(제2문) 다음, 토마스는 행복의 본성을 논하는 데에로 나아간다(제3문). 왜냐하면 행복이란 일종의 개인적인 성취 또는 역할에 달려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 행복의 대상이 신이기 때문에, 거기 도달할 수단들은 신 자신에 의해 구성될 수 없고, 오직 피조된 개인적 활동들에 의해 구성된다. 비록 감각들이 정신을 미리 예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는 목적에 도달했을 때 생겨나는 넘치는 기쁨에 보다 완전한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행복은 감각들의 한 기능이 아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 근본적인 것이어서 거기에 도달하려면 인간의 가장 숭고한 활동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 프란치스코회의 전통은 참된 행복을 의지의 한 기능인 사랑 위에 정초한다. 그러나 토마스는 여기서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도, 사랑이 인식의 결실임을 강조한다. 맹목적이지 않으려면, 사랑은 지성적 인식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사랑과 기쁨으로 분출되게 될 명상 속에 있다. 의지에 뿌리박고 있는 사랑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토마스의 주지주의(主知主義, intellectualism)는 프란치스코회의 주의주의(主意主 義, voluntarism)와 날카롭게 대립된다. 그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의 원천은 ‘신에 대한 명상’(contemplatio Dei)에 있다. 이것은 이승에서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저승에서는 직접적인 신 직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토마스는 인간이 이승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 자신의 목적을 신 인식과 신 사랑에 두는 한에서 이다. 행복이, 적어도 이승에서는 지성의 한 기능인 인식에서만 배타적으로 유래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지상에서는 사랑이, 우리의 인식이 도달한 경지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 없이는 사랑도 맹목이 되고 만다. 여기서 귀결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의 중요한 형상적 요소는 ‘신의 지복직관’이고 이것은 지성의 활동이라는 점이다.
신 인식은 행복의 형상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행복이란 천상에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므로, 지상에서는 오직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만족감이 대상의 소유에서 오는 것처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쁨(快)이다. 인간이 이승에서 불완전하고 간헐적으로만 맛보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기쁨의 상태가, 저 미래에서는 완전하게 채워질 것이다. 참된 행복은 또한 “올바른 의지”를 요구한다. 즉 덕스러운 생활을 먼저 살아야 하고, 이것을 통해 인간은 행복에 도달해서 취득한 그 목적을 충만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덕스러운 삶은 이승에서도 또 저승에서도 행복을 얻는 데 절대 불가결하다. 마찬가지로, 충만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신의 몸(신체)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옳다. 이승에서의 인간은 인식하기 위해서 감각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육신이 부활할 때 개개의 인격은 자신의 종적 본성으로 재구성되게 될것이다, 그러나 어떤 희랍 저술가들이 믿었듯이, 죽음과 육신의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 분리된 이성적 영혼이 구원의 결실을 누릴 수 없으리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천상에서 행복의 본질은 신 직관에 있고, 이를 위해서 육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토마스는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이승에서의 행복은 육체의 건강(6항), 인간이 덕스럽게 살기에 필요한 만큼의 세속 재화들(7항), 그리고 우정(8항)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토마스에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친구들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는 우정은, 신의 선물로서 강요될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으며, 또 가장할 수도 없다. 그것은 다만 받아들여 맛들일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 및 천상 행복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천상에서는 성인들과의 우정을 즐기게 될 것이다.
<행복의 추구>: 제5문에서 토마스는 ‘행복의 추구’를 논한다. 그에게 있어서 행복은 도달할 수 있는 실재(1항)로서, 개인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 여러 등급이 있을 수 있다(2항). 토마스는 이승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확인한다(3항). 비록 이 지상의 행복은 생명의 조락성(凋落性) 때문에 너무도 쉽게 상실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과 의지에 토대를 두고 있는 한 얼마간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4항).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건강이나 세상의 재화 그리고 친구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상 행복의 추구는 가능하다. 인간의 본성이 거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인 신 직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순수 자연적인 기능들을 훨씬 넘어가야 한다(5항). 영원한 참 행복은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로서, 오직 은총을 통해서만 도달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 한” 이 행복을 갈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 행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다고 내팽개치기 때문이다(8항).
<행복에 이르는 수단들>:《대전》제Ⅱ부 1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행복에 이르는 데 필 요한 수단들을 규명하고 있다. 인간의 자기 실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마스는 인간 행위의 본성 즉 지성적이고 책임있는 인격인 한에 있어서의 인간에 속하는 행위들을 탐구하고(7-21문), 따라서 인간의 감정 생활(22-48문), 덕과 악습(49-70문), 죄(71-89문)를 논한다. 이 모든 문제는 인간 각자의 “자기 실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수단들을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데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두 원리 즉, 법(90-108문)과 은총(109-114문)을 연구해야 한다. 토마스가 법, 특히 은총의 새로운 법의 본성을 분석하는 방식은 놀랄만큼 정교하고 날카롭다. 이 점은 은총에 관한 논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불행히도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은 토마스의 ‘자연법’(lex naturalis) 이론을 그 맥락으로부터 따로 떼어냄으로써 결국은 왜곡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은총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마스가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정신과학론》, 《자연과학론》,《자연과 은총》에서부터 유래된다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은 놓쳐버리고 있다. 법 일반론과 자연법에 관한 논술은 자연법의 토대에 관한 토마스의 완전한 이론을 충만히 다 담고 있지 못하다. 제Ⅱ부 1편에서 다뤄지고 있는 논술들은, ‘신과 백성 사이에 맺는 옛법과 새법’이라는 그의 더 큰 관심에 비켜 볼 때 단순한 예비적 물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2. 제2부 제2편
덕과 악습 그리고 윤리 문제 일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살피고 나서(Ⅱ부1편), 토마스는《신학대전》에서 가장 긴 부분인 제Ⅱ부 2편을 덕의 세부적 논술과 그에 상응하는 악습의 분석에 바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1-178문), 그 다음 주교, 수도자, 관상 생활, 활동 생활 등 특별한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을 다룬다(179-189문).
토마스는 그의 윤리 이론 전체에서 인간 행복의 토대가 되는 덕스러운 삶을 고찰하고 있다. ‘7가지 주요 악습《七罪宗》’(교만, 인색, 사치, 탐욕, 태만, 질투, 분노)이나 십계명 또는 피해야 할 악습들을 부각시키는 대신, 그는 생생한 사랑의 덕을 통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행복의 신학을 설정한다.
습성(習性, habitus)은 전통에 따라 토마스에게도, 영혼에 의해 취득된 (또는 타고난) 능동적 성질로서, 이것을 통해 사람은 특정 작업 영역에서 자신의 행위들을 쉽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선한 습성 또는 악한 습성은 ‘제2의 본성’과도 같아서, 일단 한번 취득되면, 떨쳐버리기 힘들다. 오늘날은 많은 개인적 성격 특성들(idiosincrasie)이 ‘습관’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것은 스콜라 신학에서 말하는‘습성’(habitus)과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토마스에게도, 덕이란 두 극단 (이것은 결국 두 악습이 된다) 사이의‘중용’(中庸, medium)이다. 흔히 말해지는 ‘덕은 두 극단 사이의 중간에 있다’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컨대, 사랑의 덕은 그 자체로 한 극단이다. 한편, 정의는 결코 어떤 극단도 알지 못하고 다만 그 결핍만을 알 뿐이다.
세 가지 신앙의 덕(믿음, 희망, 사랑)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다음, 토마스는 4추덕(지혜, 용기, 절제)의 탐구에로 나아간다. 4추덕은 아주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진정한 인간 조건을 깊이 알아듣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그 통전적 부분들과 그 기능적 부분들을 탐구해야 하기 때문에,《신학대전》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길다. 바로 여기서 토마스가 인간 조건을 그 심층에서부터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 제Ⅱ부 2편이 고금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이 썼던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한다고 안심하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Ⅱ부 2편을 제Ⅱ부 1편에서 설정된 근본 원리들로부터 따로 갈라내서 연구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수도생활
제Ⅱ부 2편의 마지막 11개 문제들은 명상 생활과 활동 생활, 수도적 완성 상태 등을 다루고 있다. 그 논술 목적은 영성 생활의 여러 완성 단계들을 설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생활과 주교직의 경우처럼 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신학적 관점의 의미와 함축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자는 것이다. 토마스는 그 점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신학적 분석은 로마의 주교로서 교황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리라. 토마스에게 있어서 관상적 및 활동적 수도회들은 주교 신분에 고유한 완전성에 참여한다. 교계 및 활동적 수도회들은 주교 신분에 고유한 완전성에 참여한다. 교계 질서 속에서 도미니코 회원들에 해당되는 자리는 도미니코회를 거스른 논란 속에서 적수들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다.
토마스는《신학대전》의 이 부분을 제라르 다베빌(+1272)을 중심으로 한 논쟁이 극도에 달했을 때 작성했다. 그에게 있어서 수도회들은 우선 염려하고 추진하는 그 ‘목적’과 둘째로 거기 도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수단’에 따라서 구분된다. 예컨대, 시토회나 베네딕도회같은 관상 수도회들은 노동과 영원한 진리 묵상을 통해 주로 개인적인 구원에 헌신하다. 그러나 예컨대, 병원 운영이나 감옥의 죄수를 보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 수도회들은 세속적인 선행과 영적인 자비심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는 수도회들의 경우라도 그 수단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명성이 외부적 활동보다 더욱 완전하기 때문에, 관상 수도회들은 활동 수도회보다 더 높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외부적 활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교육, 설교, 영혼 구원 등의 활동이고, 다른 하나는 그저 세속적인 활동이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단계는 명상에 전념하고 그 결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의 연구 결과들을 설교를 통해 전하고 가르치며 고해성사를 주는 일이다.“그러므로 가르치고 설교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수도 활동 가운데서 으뜸 자리를 차지하고, 주교의 완전성에 가장 가까이 있다.…실상 빛을 단순히 반사하는 것보다는 조명하는 것이 더 큰 완전성의 표지이듯이, 단순한 명상보다는 명상에서 얻은 진리를 남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욱 완전하다”(Ⅱ-Ⅱ, 188문, 6항).
그러므로 토마스에 따르면 설교에 투신하는 수도회가 수도 생활의 가장 완전한 단계이고 주교들의 완전 단계에 가장 가깝다. 물론 토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도미니코회다. 도미니코회의 목적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구를 그 수단으로 삼으며, 공동 생활, 합송 기도, 가난, 순결, 복종을 서약한다.
제Ⅱ부 2편의 마지막 3개 문제들은 도미니코회를 거스르는 재속 교수들의 신학적 논거들을 총망라해서 다루면서, 설교, 교육, 고해성사, 자선, 고아들 수용의 원리를 옹호하고 있다. 이 3개 문제들은 실상 재속 교수들의 논거를 총 요약하고 있는데, 그들은 도미니코회 같은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더더욱 설교나 교육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쟁 속에 말려들 어감 없이 토마스는 냉정히 논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통박하고 있다.
토마스가《신학대전》의 이 부분을 썼을 때 제라르 다베빌은 아직도 생존하고 있었다. 현대의 토미스트들은 도미니코회를 거스른 이 논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관련된 가르침이 어딘가 일관되지 못하고 흥미가 없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토마스가 그 글을 쓰던 당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던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수들의 논거들을 잘 알아야 하고, 따라서 이 문제들을 굴리엘모 생타물과 제라르 다베빌을 거슬러 쓴 직접적 논술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
5. 제3부의 주요 내용
에슈만에 따르면 토마스는 제Ⅱ부 2편을 1270년 말이나 1271년 초에 시작했고, 1272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끝냈던 것 같다. 그러나 토마스는 이 작업을 마치고 오래 쉬었을 것 같지가 않다. 1272년 곧바로 그리스도와 성사들을 다루는 제Ⅲ부를 시작했고, 1273년 12월 6일에 작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해 버렸다. 에슈만은 토마스가 나폴리로 떠나기 전 파리에서 제Ⅲ부의 첫 20개 문제들을 끝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기로 하자. 어쨌든《육화된 말씀의 결합론》문제는 1272년 초에 파리에서, 제Ⅲ부에서 취급되는 ‘육화된 말씀’ 부분을 시작하면서, 강의되었던 것이었다.
1272년 나폴리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토마스의 나이가 47세였다. 여러 가지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에 따르면, 그는 파리에서처럼 아직도 원기 왕성했고 건강 상태도 좋았다. 교육 활동이 비교적 적은 날들에는(이 시기에 ‘토론회’를 열었다는 문서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신학대전》과 아리스토텔레스 ‘주해서들’을 끝내기 위해 전력을 다 기울였다. 토마스는 이 작업을 위해서 레지날도 외에 다른 조교들을 더 두었던 것 같다. 예컨대《형이상학 주해》의 나폴리 사본에서는 7개의 서로 다른 필체가 간파되기 때문이다. 그 필경사들 가운데 하나는 쟈코모 다스티라는 수사였는데, 그는 토마스가 죽은 뒤《이사야 주해서》를 “읽을 수 있게 옮겨 적었다.” 돈데인은《형이상학 주해》의 나폴리 수사본의 ‘A’의 글씨체를 바로 이 쟈코모의 것으로 보면서 그를 토마스의 나폴리 시절 조교 중 한 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성식 과정 동안 도미니코회의 바르톨로메오는 토마스가 나폴리에서 ‘여러 명의 필경사’에게 구술했다고 증언했다. 그 당시 토마스의 학술 활동 기간이 도합 14-15 개월을 넘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느 특정 기간 동안은 저술 활동이 특별히 왕성한 시기였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온통 ‘육화’와 ‘성사’ (특히 성체성사)에 집중되고 있는《신학대전》제Ⅲ부는 그의 천재적 재능, 불굴의 노력, 풍부한 박식 등이 번득이고 있는 찬란한 종합이다.
그렇지만 이 풍요로운 작품 활동 시기에 토마스는 또한 명상과 명상적 기도에 더욱 몰입 하고 있었다. 그의 정신적 몰입(혹 탈혼, abstractio mentis)은 쉽사리 그리고 아무데서나, 특히 미사 시간과 성무일도를 바치는 공동 기도 시간에, 그를 넋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제3부의 머리글을 읽어 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예고한 것처럼,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부활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게 불멸의 삶이라는 행복에로 이르는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분이 소개해 주신 인간 생명의 궁극적 목적, 덕, 악습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신학적 의미에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분과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 그분의 은총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으로 첫째 부 분(1-59문)은 직접적으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둘째 부분(60문-‘보충부분’-68 문)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사(聖事, sacramentum)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충부분 69문 이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얻게 될 영원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첫째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누어 1-26 문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분을 사람이 되게 하신 바, 즉 육화(肉化, Incarnatio)의 신비를 다룰 것이며, 27-59문은 우리의 구원자, 즉 육화하신 말씀(Verbum)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또 고통을 어떻게 감수하셨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신학대전》제Ⅲ부의 ‘서론’을 쓸때, 토마스는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생각이었다: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1-59문), 우리를 구원에로 이끌고 갈 그의 성사들(60문- “보충부” 68문),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도달하는 목표인 영원한 생명, 따라서 우리는 제Ⅲ부가 온통 ‘구세주’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60문의 ‘머리글’에서 토 마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육화된 말씀의 신비에 관해 모든 것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육화된 말씀 자체로부터 그 효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교회의 성사들을 숙고하는 데에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구상을 끝마칠 만큼 오래 살지를 못했다. 1273년 12월 6일 그는 ‘고해성사’에 대해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다. ‘속죄(贖罪)일 반’ 부분을 다루는 제90문에서 그는 갑자기 중단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계속하지 못했다.”
5.1. 육화의 신비
토마스는 ‘육화된 말씀’에 관한 논술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육화의 신비’, 그리고 그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겪은 모든 활동. “육화의 신비”라고 명명된 부분에서 토마스는 세 가지 근본 요점을 검토하고 있다: 신이 우리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는지(an sit), 육화 사건에서 신이 인간이 된 것은 어떤 방식인지(quid sit), 이 결합의 귀결들은 어떤 것인지(quale sit).
토마스에 따르면, 신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은 상상를 초월하는 가장 내밀한 방식으로 사람이 되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을 화해, 회복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신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원죄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개개인의 범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다. 토마스의 동 시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신은 어쨌든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인간이 되어 왔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신의 위업(偉業)들의 근거들을 알게 되는 것 은 오직 그의 계시를 통해서 뿐이며 성서에서 계시되고 교회의 신앙고백문 형식으로 선포되어온 육화의 유일한 동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이 육화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신은 사람이 되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초 축성시에 교회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까닭이다: “오, 복된 죄여 (felix culpa)!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구세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도다!”
5.2. 성사:그리스도 수난의 유산
제Ⅲ부에서 토마스는 ‘육화의 신비’ 외에도, ‘성사(聖事, sacramentum)의 신비’도 검토 하고 있는데, 그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수난의 유해(遺骸)들”(reliquiae Christi passionis) 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구원의 결실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사들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토마스에게 있어서, “새로운 법”의 성사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사적 행위로 의미되는 은총의 주입을 구현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제Ⅲ부에서, 성사들은 이제까지 토마스가 확인해 온 대로 인간으로 하여금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 은총 자체를 실제로 “산출”한다. 이전의 저술들 속에서 토마스는 은총이 무(無)에서부터 창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고 또 신만이 성사들이 축성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학대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주장한다: 성사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도구들”인 한에 있어서, ‘인간의 잠재력’으로부터 은총을 솟아나게 한다. 좀 더 뒤에 가서 그는 이 잠재력을 “순종하는 능력”(potentia oboedientialis)이라고 부르게 될 것 이다.
모든 성사들 중 단연 뛰어난 성사는 ‘제단의 성사’ 즉 ‘성체성사’(聖體聖事)이다. 이 성사는 은총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안에 은총의 주인 자신인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축성의 성사적 행위, 즉 “이것은 내 몸”, “이것은 내 피”라는 선포는, 그리스도 몸과 피의 실재적 현존을, 즉 빵과 포도주라는 가시적(可視的) 형상과 행위(sacramentum) 로 의미된 그 “실물”(res)을 현존하게 만든다. 이 성사에서는, 그 축성의 말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갈보리 산의 희생 제사에서처럼 분리된 방식으로 현존한다. 이 성사 행위를 통해서 희생 제사 (즉 몸과 피의 분리) 속에 현존하는 것은 동일한 갈보리 산상에서 죽는 그리스도(Christus passus)이다. 그리고 흠숭될 수 있도록 높이 거양되고 감실 속에 모셔지게 되는 성체도 성사적으로 피로부터 분리되는 (즉 죽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몸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은 (미사 중에 성사적으로 죽는 것을 예외로 친다면)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동시적으로’ (concomitanter) 현존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이 온통 ‘전체에 남김없이’ (circuminsessione) 현존한다. 토마스에게 있어서 ‘미사’(eucharistia)의 성사적 특성은 회생 제사의 성격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실체변화’ (實體變化, transubstantiatio)를 통한 그리스도의 성사적 현존은 갈바리아를 표상하는 제단의 희생 제사와 동일하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제한된 시간이《신학대전》제Ⅲ부의 이 ‘그리스도의 성사’'에 대해 오래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토마스가 제73-83문에서 다루고 있는 성체성사에 관한 논술은 중세가 제공한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작품이라는 점 만을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거기서 우리는 그가 성체성사의 신비를 강한 집중력으로 명상했을 뿐 아니라 또한 더 없이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구리엘모 토코는 산도미니코 수도원의 제의방 담당자였던 도미니코카세르타 수사에게서 들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 수사는 여러 차례 신비로운 장면들을 목격했다.” 그 수사는 토마스가 아침 기도 전에 수도원 내에 있는 산니콜라라는 한 작은 경당에 자주 가는 행동을 목격하고, 호기심을 발동하게 되었던 것 같다. 어느날 밤 그는 토마스가 기도 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그 경당에 미리 가서 숨어 있었다. 그는 토마스가 “거의 두 큐 빗 정도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았고, 열렬히 울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또한 토마스가 경당 벽에 걸려 있던 십자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십자가의 예수가 말했다; “토마스 네가 나에 관해 쓴 글들은 아주 훌륭하다. 내가 그 보답으로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주님, 저는 다른 아무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토코는 그 당시 토마스가《신학대전》제Ⅲ부의 그리스도 ‘수난과 부활’ 부분을 저술하고 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곧 성체성사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이고 있다. 오늘날도 산도미니코 수도원의 수사들은 산니콜라 경당에서 토마스에게 말을 건넨 그 십자가를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며 그 일화를 설명해 주고 있다.
도미니코 카세르타 수사의 이야기를 어느 만큼 신뢰할 수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든지 사실일 수 있다는 점과 또 그것이 토마스가《신학대전》제Ⅲ부에 임하고 있던 정성과 정신을 완전히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신 체험이 있고나서 토마스는 이제껏 자신이 쓴 모든 것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느껴진다’며 ‘붓을 걸어두었다.’ 즉 모든 집필 활동을 중단했다.
마무리
《신학대전》은 토마스가 ‘신학계’에 기여한 가장 깊고 가장 완전한 선물이다. 토마스는 1273년 12월 6일에 갑자기 중단하기까지 7년에 걸쳐 그것을 저술했다. 토마스의 전 작품 중에서 수사본 형식으로든지 출판본으로서든지 간에 가장 놀리 보급된 작품이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와 사상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고해신부용, 설교가용, 본당 신부용 등 대중용 참고본으로 발췌된 ‘요약’, ’발췌’, ’인구용’ 등의 형식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 작품은 (토마스 자신이 쓴 것만도 )512문에 2,669항 그리고 10,000여 개의 반론과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신학대전》과《보충부》(Supplementum)는 전5권으로 출판된다. 그 형식 구조면에서 볼 때 이 작품을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대작이다.
제Ⅰ부 는 완벽하고 심원한 형이상학적 논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랄만큼 간결하다.
제Ⅱ 부는 인간의 윤리 생활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독창적이다. 저자는 윤리 생활의 복잡성을 잘 알고 있으며 모든 인간적 행위에 있어서 ‘사랑’의 우위를 확립하고 있다. 흔히 토마스의《윤리학 주해》는 ‘사실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윤리학》의 순서를 대체로 따르고 있으면서도 ‘인생은 초자연적 목적인 영원한 신 직관에 도달하려고 투쟁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는 그리스도 교적 인생관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떤 사상가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실적’이다.
제Ⅲ부는 성자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와 그분의 일생 그리고 ‘성사들’ 속에서 계속되는 그분의 삶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성사의 절정은 성체성사이다. 그것은 사랑의 성사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사이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평생에 걸쳐서도 그러했지만, 특히 1269년 파리 복귀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년 동안에는 자신의 사도직을 새롭고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매우 정열적으로 일했다. 그것은 마치 일종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교육, 저술, 설교,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고, 음식과 수면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시간만 할애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의 질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추적하고 있었고, 더욱 간절히 진리 인식에 접근해 가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토록 지대한 지성의 노력 속에서, 그는 불완전한 해결책들로부터 언제나 더욱 간결하고도 명백하게 진리를 표현하는 데에로 나아갔고, 자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견해들을 교정했으며, 때로는 심지어 결정적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그의 전문적 의견을 물어오는 편지들에 응답할 때조차도 이미 발표한 어떤 이론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오히려 언제나 모든 개개의 주제들을 다시 새롭게 검토하기를 좋아했다. 아마도 모든 문제를 언제나 다시 명상함으로써 더욱 새롭고 더욱 엄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바로 그의 가르침들의 ‘독창성’과 ‘신선함’의 비밀일지도 모른다. 그의 사도직은 언제까지나 남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언제나 탐구, 교육, 저술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의 선익을 위해서 추구했다.” 바르톨로메오 카푸아는 이렇게 말한다: “널리 퍼진 통설에 따르면, 그는 그의 시간의 단 일초도 결코 낭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토마스가 언제까지나 그런 생활 리듬을 유지해 나갈 수는 없었다. 날마다 계속적인 긴박감 속에서 5년간을 작업하고 난 뒤에 일종의 ‘침몰’이 따라온 것은 차라리 당연한 일이었다. 49세를 다 채우기 전에 그는 교회를 위해서 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토록 값진 40여 권을 작품을 저술했다. 그에 관해 우리에게 전해진 정보들에 따르면, 토마스의 건강 상태는, 몇 번 열병을 앓았던 것만을 빼고는, 그의 생애 어느 때보다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1273년 12월 6일 토마스에게는 그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을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 세 달 뒤인 1274년 3월 7일에는 죽음이 덮쳐 왔다.
성 토마스가 49세라는 결코 길지 않은 생애 동안 인류 사상사에 기여한 업적은, 체스터튼 (G.Chesterton)의 표현을 빌린다면, “가장 위대한 혁명”이었다. 성 토마스는 참으로 보기 드물게 ‘개방적’인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대다수의 철학자들이나 평범한 일반인들 처럼 어떤 이론이나 사상가를 도매금에 매도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진리는 누가 말하든, 모두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성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그는 오직 편견없이 진리만을 겸손하고 근면하게 추구했고, 아무리 그릇된 이론이나 주장들 속에서도 진리의 편린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릇된 부분들로부터 갈라낼 수 있는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현대인이었고, ‘영원한 현대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중세 사상가들의 저술은 일반적으로 잘 읽히지 않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우성 중세 저작들 가운데 순수 철학적인 것들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중요 저작들은 신학 서적들로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가운데 오늘날 순수 철학적인 주제들을 함께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철학자들이 즐겨 다루는 주제들과 논술 방식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그 서술 방식이 아주 낯설고 달갑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로는, 라틴어로 씌어져 있는 중세 사상가들의 주요 저작들이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전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살았고 훨씬 더 어려운 그리스어로 저술했던 고대 철학자들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까? 그렇지 않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고대 철학자들에 대해서는 근대나 현대의 어느 철학자 못지 않게 친근감을 느끼고 아낌없는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중세사상가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깊은 거부감과 혐오감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어딘가 역설적인 면이 없지 않다.
그 주된 원인은 르네상스 시대의 ‘인본주의자’(Humanist)들에게 있다. 그들은 중세와 중세 문화를 전면 거부하고 스스로를 고대 사상의 직계 계승자로 자처했다. 여기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가세했고, 근대 과학의 폭발적인 발전도 한몫 거들었다. 실상 이들 근대인들의 중세 문화 전반에 대한 반동을 성공으로 이끈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당대에 가능하 게 된 인쇄 기술의 발명이었다(Kretsmann).
그러나 인본주의의 기본 동기가 그 절정에 달한 19세기 말에는 그 내밀한 한계와 약점이 충분히 노정되었고, 그래서 재차 반동의 기운이 무르익어 갔다. 실상 근대인들은 화려한 수사학을 구사하며 저마다 새로운 철학 체계를 발견했다고 떠들어댔지만, 막상 철학에 기여한 것이라고는 그리 많지 않았다(M. 아들러).
19세기 말부터 가톨릭 학자들은 오랜 쇠퇴기를 극복하고, 중세척학 그 중에서도 특히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 부흥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영원한 아버지》(1879)를 도화선으로 20세기 전반에는 그 어느 단일 학파와는 비교도 안될 정 도로 거대한 운동이 되어 부당하게 파뭍혀버렸던 중세철학 전체를 재조명하여 복원시키는 동시에 현대 사상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를 통해 자기 쇄신을 모색했다. 교회는 현대의 요구를 시대적 징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공의회 이후 성 토마스와 중세철학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화 되었다. 가톨릭 교회의 일부 주도적인 신학자들은 ‘신신학’(nou-velle theologie)을 부르짖 으며 과거 전통적인 신학 방법과 결별하고 ‘새로운 신학 모델’을 창안해야 한다고 역설하 고 나왔다(라너, 큉). 너무 먼 데까지 나아간 것일까? 그렇지만 이처럼 교회 내부에서 관심이 시들해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반 철학계에서는 차츰 중세철학과 특히 성 토마스의 사상에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M. 달 사쏘 / R. 꼬지 편, 신학대전 요약 , 이재룡 / 이동익 / 조규만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 부 , 2판, 1995
토마스 아퀴나스 , 신학대전(1-3) , 정의채 역, 성바오로출판사 , 1985-1995
토마스 아퀴나스 , 有와 本質에 대하여 , 정의채 역, 서광사 , 1995
토마스 아퀴나스 , 인간의 사고( Ⅰ, 84-88문) , 박전규 역, 서광사 , 1986
토마스 아퀴나스 , 자연의 원리들 ( 이재룡 옮김), 신학과 사상 17(1996/가을), 가톨릭 대학교출판부 , 219-237쪽.
J. Weisheipl, OP , Friar Thomas D'Aquino His Life, Thought & Works , Washington D. C., The Catholic Univ. of America Press , 1983.
P. Kreeft , A Shorter Summa ,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 1993.
M. Grabmann , Introduzione alla Summa Theologiae di S.Tommaso d'Aquino, Citta del Vaticano, Ed Vaticana, 1989.
N. Kretzmann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Aquinas , Cambridge Univ. Press , 1993.
F. 코플스톤 , 토마스 아퀴나스 , 강성위 역, 성바오로출판사 , 2판, 1993
J. 피퍼 , 토마스 아퀴나스 : 그는 누구인가, 신창석 옮김, 분도출판사 , 1995.
이나가키 료오스케 , 토마스 아퀴나스 , 정종휴 / 정종표 옮김, 새남 , 1995.
G. 잠보니 ,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식론 , 이재룡 역,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99
E. 질송 , 중세 기독교 철학사(상/하) , 김기찬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1994.
E. 질송 , 토미스 실재론과 인식 비판 , 이재룡 옮김, 서광사 , 1994.
정의채 , 존재의 근거 문제 , 성바오로출판사 , 1981.
이재룡 , 토미즘의 형성 및 발전과 근대철학 , 신학과 사상 11(1994/6),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158-187쪽.
이재룡 , 현대 신-토미즘 부흥 운동 , 신학과 사상 12(1994/12), 가톨릭대학교출판 부 , 176-220쪽.
이재룡 , 명저탐방 : 토마스 아퀴나스의‘신학대전’, 철학과현실 24(1995/봄), 철학문화연 구소 , 305-316쪽.
신창석 , 신학대전의 형성과 구조(Ⅰ&Ⅱ) , 현대 가톨릭사상 ( 대구가톨릭대학교 ) 9(1993), 3-40쪽, 11(1994), 41-73쪽.
|
|
혹 글을 퍼오실 때는 경로 (url)까지 함께 퍼와서 올려 주세요 |
|
자료를 올릴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이단 자료는 통보 없이 즉시 삭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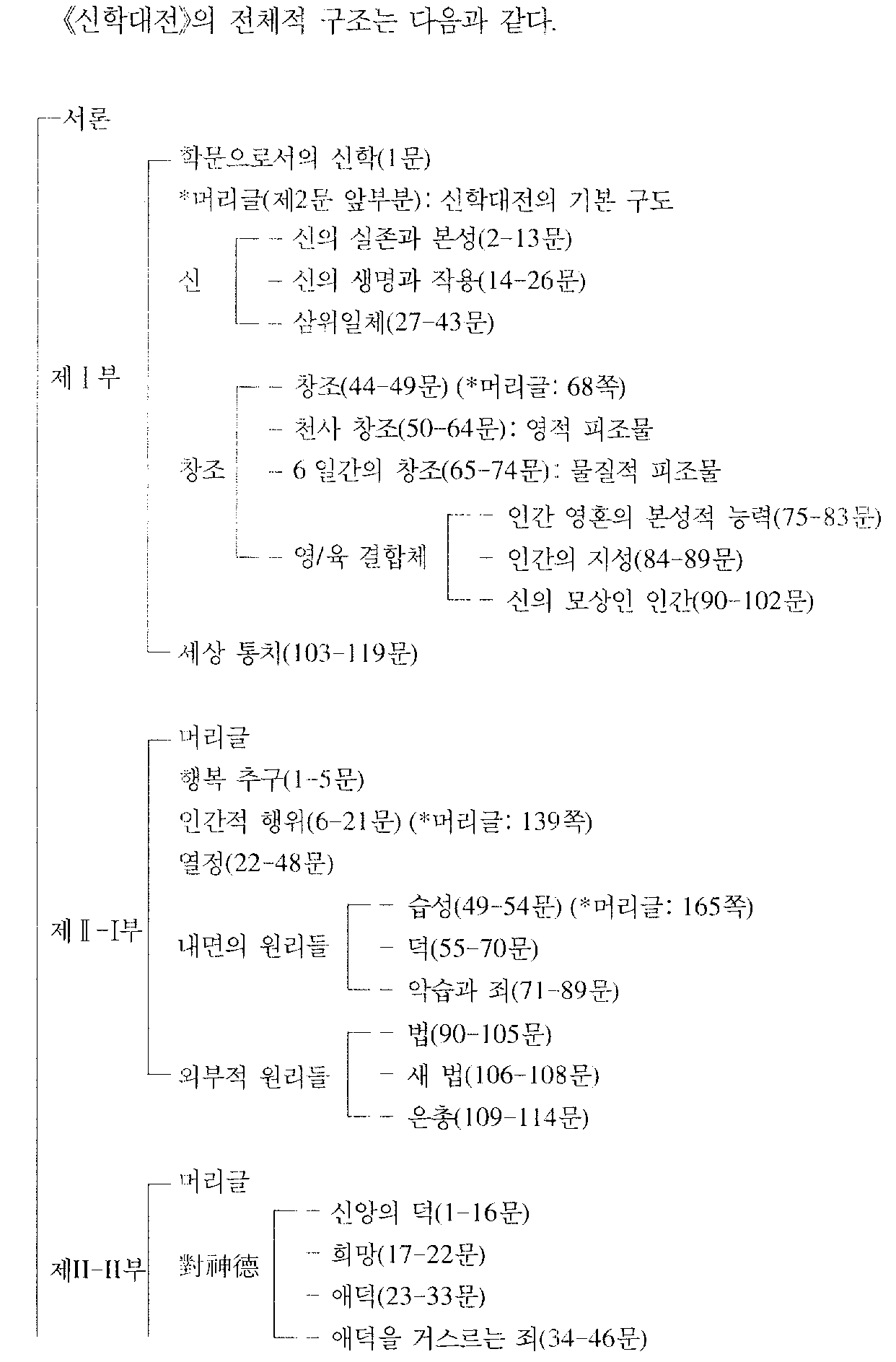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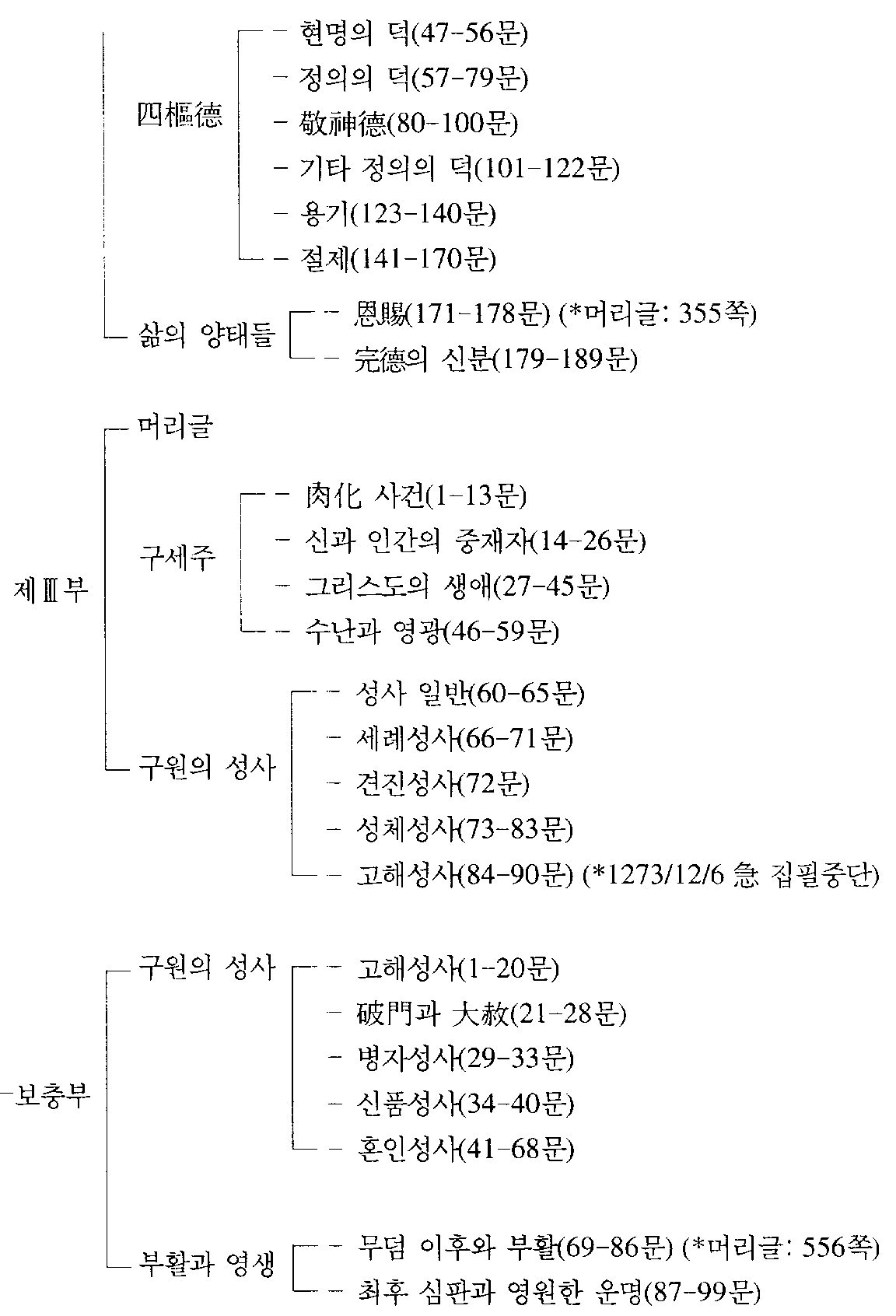

최신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