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개인적인 맨토들의 글을 모았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더 좋은 글들입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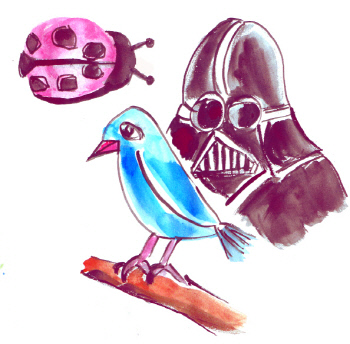
[시골편지] 선한 미소
태풍을 우리말로는 ‘싹쓸바람’이라 부른다. 싹 쓸어가는 바람. 울적하고 답답한 시절도 다 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날쌘 바람이 지나가면서 대나무들 넘어지고 추수를 앞둔 논바닥은 심각한 지경이다. 그래도 담장 밑에 국화가 선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의 태양을 반기고 있어라. 올가을 밭에다는 배추 한 포기 심지 않았다. 갖가지 허브가 자라고 있는데 잡풀이 우거져서 머리꽁지도 보이지 않아. 단감이 익었으나 두어 개 따먹고 그대로 두었다. 엄마 아빠 없이 우는 어린 새들 배곯지 않았으면 바랐다. 새들을 볼 때마다 자동적으로 미소를 머금게 된다. 천사들은 날개가 달려 있다는데, 장차 나도 천사처럼 날개를 갖고 싶어. 천사들과 동급인 새들에게 잘 보이면 그렇게 될까. 새소리가 오늘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합창 같다. 오래전 들불을 놓다가 다같이 불렀던 노래.
“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농사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 그립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역사. 삼천리 방방곡곡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 그립다….” 가톨릭농민회와 기독교농민회가 한창 힘을 내던 때. 줄여서 가농, 기농 이렇게들 불렀다. 천주교 우리밀 살리기 식구들 청으로 창원 마산에 간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백남기 선생을 처음 뵈었다. 선한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내가 보통 새들에게 지어 보이는 그런 미소. 그날 우리는 ‘늙은 군인의 노래’를 개사해 불렀다.
“나 태어나 이 강산에 농민이 되어 괭이 매고 삽질하기 어언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땅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이 땅에 농민들아 손잡고 일어서자.” 황지우 시인이 그랬던가. 새들도 세상을 뜨는 거라고. 선한 미소와 답가들을 뒤로 두고 지상엔 하얀 새털이 가지런히 떨어졌다. 천벌을 받아도 쌀, 저 저주받을 입들조차 농부의 선한 미소를 본받고 싶은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 인생,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다.
임의진 목사·시인 2016.10.05
|
|
|
|
|
|
|
|
개인적인 맨토들의 글을 모았습니다. 천천히 읽으면 더 좋은 글들입니다. |
|
|
(글의 저작권은 각 저자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을 다른데로 옮기면 안됩니다) |










최신댓글